목차
【 백년 후에 읽고 싶은 백편의 시 】中 좋은 시 나쁜 시 각 5편.
1. 좋은 시 5편
(1) 강기원의 「자장면」
(2) 김기택의 「얼굴」
(3) 김병환의 「하루살이」
(4) 박상순의 「한 정신병자의 불타던 사랑」
(5) 장철문의 「破戒」
2. 나쁜 시 5편
(1) 강정의 「대화」
(2) 김규진의 「한 개의 그릇으로 가는 길은5」
(3) 김영승의 「滿開한 性器」
(4) 박백남의 「서랍을 정리하며」
(5) 이원의 「사이보그 1 - 외출 프로그램」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中 좋은 시 나쁜 시 각 3편.
1. 좋은 시 3편
(1) 김언의 「가능하다」
(2) 이낙봉의 「접속 4」
(3) 유종인의 「여행」
2. 나쁜 시 3편
(1) 최승호의 「조개껍질」
(2) 김초하의 「종지」
(3) 엄하경의 「내 안의 무늬」
1. 좋은 시 5편
(1) 강기원의 「자장면」
(2) 김기택의 「얼굴」
(3) 김병환의 「하루살이」
(4) 박상순의 「한 정신병자의 불타던 사랑」
(5) 장철문의 「破戒」
2. 나쁜 시 5편
(1) 강정의 「대화」
(2) 김규진의 「한 개의 그릇으로 가는 길은5」
(3) 김영승의 「滿開한 性器」
(4) 박백남의 「서랍을 정리하며」
(5) 이원의 「사이보그 1 - 외출 프로그램」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中 좋은 시 나쁜 시 각 3편.
1. 좋은 시 3편
(1) 김언의 「가능하다」
(2) 이낙봉의 「접속 4」
(3) 유종인의 「여행」
2. 나쁜 시 3편
(1) 최승호의 「조개껍질」
(2) 김초하의 「종지」
(3) 엄하경의 「내 안의 무늬」
본문내용
러가는 어떤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먼지의 울음소리
은하수의 질감 같은 것
조개껍질과 무늬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살가죽에 수놓은 海馬文身과도 같이
죽은 뒤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무늬
그러나 무늬들도 차츰 지워져 간다
마치 흐름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어떤 부드러운 흐름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처럼
‘최승호는 언어의 연금술사다.’ 이것은 이제 최승호 시인에게 따라 다니는 호칭과도 같은 말이나.
나는 최승호 시인을 좋아한다. 내가 시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최승호 시인의 「고슴도치의 마을」을 읽고나서였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한 사물을 보더라도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바라다보는 시인의 깊은 시선.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전혀 따분하지도 않은 시,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시가 시인 최승호의 시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최승호의 「조개껍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나 1파트가 지나도 2로 넘어가면서도 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난해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찾을 것이 없기에 찾을 수 없는 것에 가까웠다. 1에서는 그저 조개에 대한 배경지식에 불과한 것들이 펼쳐졌다. 그렇다고 2에 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2에서 최승호 다운 표현방식이나 시선들이 나와주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인은 너무나도 평면적으로 조개껍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는 최승호가 아닌 양.
결국 시인은 조개껍질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딱딱한 껍질에 감춰져 있던 고독한 삶. 절대 떨어지지 않는 껍질과 무늬. 혹은 결국 흐름에 따라가는 우리네 삶?
이 시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최승호’의 시에 비해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졌을 뿐더러 평면적인 조개에 대한 설명, 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다 접하고 나서도 허전함을 씻을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다.
(2) 김초하의 「종지」
숟가락 끝으로
꼭 찍고 가는 그 맛
짭짤한
작은 세상이여
조연으로 등장해
쓸쓸히 퇴장하지만
가득하면 넘칠까
부족하면 버림받을까
언제나 그 자리
그만큼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풀잎 깨우는
한 방울 이슬의 운명처럼
그대 밥상 위에 고여 있는
쓸쓸한 시간이
나에겐 행복입니다
시에도 연령이라는 것이 있을까? 1학년의 시. 2학년의 시. 3학년의 시. 나는 연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퇴고라는 것, 그리고 조금은 무겁게 쓸 줄 아는, 가볍게 쓰더라도 그 내면은 무거울 줄 아는 그런 시로 발전이 돼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시 한 편을 쓰기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수 십, 수 백 배다. 어쩌면 많은 분량의 소설보다도 어려운 것이 한 편의 시일지도 모른다. 시라는 것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소설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저 붓 가는 데로 쓰는 것은 수필이다. 비록 내가 금방 썼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시 「종지」는 시를 읽고나서 기운이 쫙 빠지는 시였다. 어쩌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썼을까.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생각하고 쓴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지를 조연으로 보며 중도를 지킬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만족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시인. 그러나 전혀 새롭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표현을 더 일찍 사람들 앞에 내놓았기에 새로울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유치하게 생각 될 뿐이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소한 것에 눈을 맞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허나, 그것을 순간 떠오르는 감정으로 아무 무게감 없이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어쩌면 종지는 강할 수도 있다. 그 짠 간장을 몸에 안고도 묵묵히 밥상 한편을 차지하는 종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3) 엄하경의 「내 안의 무늬」
산문으로 들어서는 길목
잎 떨군 겨울나무들, 수도승처럼
면벽한 자세로 묵묵히 서 있다
청회색으로 저물어 가는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
그들의 지문처럼 찍혀 있다
발바닥모양 그대로 얼어붙은
각양각색의 무늬들
자신의 무늬 깊숙이 새겨둔 채
무거운 근심 한 겹들 벗고
사람들은 가벼워져 돌아갔을 것이다
아카펠라 정돈된 음률로
예불 소리 멀리 울려 퍼지고
발길 둘 곳 몰라 서성대는 나에게
저녁 예불에 참석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긴 무엇 하러 왔냐며 경비원
날카로운 후레쉬를 들이댄다
얼어붙어 발자국조차 찍히지 않는
깜깜한 대웅전 앞마당
앞선 사람들이 남긴 무늬 위에
조심스레 나를 얹어본다
왜 왔냐, 왜 왔냐
주장자처럼 후려치는 내 안의 질책,
단단한 얼음길 위를 떠돌며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한 채 산문 안에 갇히어
길 잃은 내가 허랑하게 서 있다
이 시가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청아해지는 기분이 드는 시였다. 자신의 발바닥 무늬,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 깊숙이 새겨둔 채 무거운 근심 한 겹들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이도저도 못한 채 단단한 얼음길 위를 떠도는 시인. 나는 전면적으로는 이 시를 좋게 봤다.
그러나 이 시를 나쁜 시에 속하게 한 것은 중간 중간 단어의 선택이었다. 앞에도 말했듯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름 한 겹 벗기고 나오는 산사 풍경이다. 그러나 아카펠라로 비유시킨 예불 소리는 동양적인 것에 끼어든 서양적인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읽는데 순간 실망이 확 밀려와 앞의 감동을 이어가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날카로운 후레쉬를 들이대는 것, 이 역시 산사의 풍경과는 조금 동 떨어진 모습인 것 같다. 차라리 후레쉬를 든 경비원 아저씨보다 등을 들고 가는 스님이 더 낳을 것 같다.
너무나도 동양적인 것에 끼어든 아카펠라나 후레쉬는 시 전체의 감동을 떨어뜨리므로 신경을 써서 바꾼다면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먼지의 울음소리
은하수의 질감 같은 것
조개껍질과 무늬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살가죽에 수놓은 海馬文身과도 같이
죽은 뒤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무늬
그러나 무늬들도 차츰 지워져 간다
마치 흐름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어떤 부드러운 흐름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처럼
‘최승호는 언어의 연금술사다.’ 이것은 이제 최승호 시인에게 따라 다니는 호칭과도 같은 말이나.
나는 최승호 시인을 좋아한다. 내가 시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최승호 시인의 「고슴도치의 마을」을 읽고나서였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한 사물을 보더라도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바라다보는 시인의 깊은 시선.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전혀 따분하지도 않은 시,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시가 시인 최승호의 시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최승호의 「조개껍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나 1파트가 지나도 2로 넘어가면서도 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난해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찾을 것이 없기에 찾을 수 없는 것에 가까웠다. 1에서는 그저 조개에 대한 배경지식에 불과한 것들이 펼쳐졌다. 그렇다고 2에 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2에서 최승호 다운 표현방식이나 시선들이 나와주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인은 너무나도 평면적으로 조개껍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는 최승호가 아닌 양.
결국 시인은 조개껍질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딱딱한 껍질에 감춰져 있던 고독한 삶. 절대 떨어지지 않는 껍질과 무늬. 혹은 결국 흐름에 따라가는 우리네 삶?
이 시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최승호’의 시에 비해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졌을 뿐더러 평면적인 조개에 대한 설명, 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다 접하고 나서도 허전함을 씻을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다.
(2) 김초하의 「종지」
숟가락 끝으로
꼭 찍고 가는 그 맛
짭짤한
작은 세상이여
조연으로 등장해
쓸쓸히 퇴장하지만
가득하면 넘칠까
부족하면 버림받을까
언제나 그 자리
그만큼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풀잎 깨우는
한 방울 이슬의 운명처럼
그대 밥상 위에 고여 있는
쓸쓸한 시간이
나에겐 행복입니다
시에도 연령이라는 것이 있을까? 1학년의 시. 2학년의 시. 3학년의 시. 나는 연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퇴고라는 것, 그리고 조금은 무겁게 쓸 줄 아는, 가볍게 쓰더라도 그 내면은 무거울 줄 아는 그런 시로 발전이 돼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시 한 편을 쓰기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수 십, 수 백 배다. 어쩌면 많은 분량의 소설보다도 어려운 것이 한 편의 시일지도 모른다. 시라는 것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소설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저 붓 가는 데로 쓰는 것은 수필이다. 비록 내가 금방 썼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시 「종지」는 시를 읽고나서 기운이 쫙 빠지는 시였다. 어쩌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썼을까.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생각하고 쓴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지를 조연으로 보며 중도를 지킬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만족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시인. 그러나 전혀 새롭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표현을 더 일찍 사람들 앞에 내놓았기에 새로울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유치하게 생각 될 뿐이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소한 것에 눈을 맞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허나, 그것을 순간 떠오르는 감정으로 아무 무게감 없이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어쩌면 종지는 강할 수도 있다. 그 짠 간장을 몸에 안고도 묵묵히 밥상 한편을 차지하는 종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3) 엄하경의 「내 안의 무늬」
산문으로 들어서는 길목
잎 떨군 겨울나무들, 수도승처럼
면벽한 자세로 묵묵히 서 있다
청회색으로 저물어 가는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
그들의 지문처럼 찍혀 있다
발바닥모양 그대로 얼어붙은
각양각색의 무늬들
자신의 무늬 깊숙이 새겨둔 채
무거운 근심 한 겹들 벗고
사람들은 가벼워져 돌아갔을 것이다
아카펠라 정돈된 음률로
예불 소리 멀리 울려 퍼지고
발길 둘 곳 몰라 서성대는 나에게
저녁 예불에 참석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긴 무엇 하러 왔냐며 경비원
날카로운 후레쉬를 들이댄다
얼어붙어 발자국조차 찍히지 않는
깜깜한 대웅전 앞마당
앞선 사람들이 남긴 무늬 위에
조심스레 나를 얹어본다
왜 왔냐, 왜 왔냐
주장자처럼 후려치는 내 안의 질책,
단단한 얼음길 위를 떠돌며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한 채 산문 안에 갇히어
길 잃은 내가 허랑하게 서 있다
이 시가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청아해지는 기분이 드는 시였다. 자신의 발바닥 무늬,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 깊숙이 새겨둔 채 무거운 근심 한 겹들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이도저도 못한 채 단단한 얼음길 위를 떠도는 시인. 나는 전면적으로는 이 시를 좋게 봤다.
그러나 이 시를 나쁜 시에 속하게 한 것은 중간 중간 단어의 선택이었다. 앞에도 말했듯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름 한 겹 벗기고 나오는 산사 풍경이다. 그러나 아카펠라로 비유시킨 예불 소리는 동양적인 것에 끼어든 서양적인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읽는데 순간 실망이 확 밀려와 앞의 감동을 이어가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날카로운 후레쉬를 들이대는 것, 이 역시 산사의 풍경과는 조금 동 떨어진 모습인 것 같다. 차라리 후레쉬를 든 경비원 아저씨보다 등을 들고 가는 스님이 더 낳을 것 같다.
너무나도 동양적인 것에 끼어든 아카펠라나 후레쉬는 시 전체의 감동을 떨어뜨리므로 신경을 써서 바꾼다면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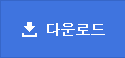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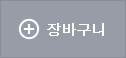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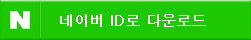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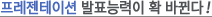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