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청준의 눈물에서 가장 감동적이거나 인상 깊은 부분
1) 가난
2) 빚
3) 수치심
4) 모성애
5) 연민
2. 이청준의 눈물에서 인용한 부분의 전후 이야기 요약 서술
1) 가난
2) 빚
3) 수치심
4) 모성애
5) 연민
3. 이청준의 눈물 감상문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이청준의 눈물에서 가장 감동적이거나 인상 깊은 부분
1) 가난
2) 빚
3) 수치심
4) 모성애
5) 연민
2. 이청준의 눈물에서 인용한 부분의 전후 이야기 요약 서술
1) 가난
2) 빚
3) 수치심
4) 모성애
5) 연민
3. 이청준의 눈물 감상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13쪽)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섭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치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선심에 애초부터 그래줄 가망이 없어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14쪽)
3) 수치심
「눈길」은 그러니까 나 혼자 쓴 소설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아내 셋이서 함께 쓴 소설인 셈이다. 오랜 세월 가려져온 그 새벽 헤어짐 이후의 두려운 사연을 당신의 삶 속에 간직해온 어머니나 그 헌 옷궤의 설운 사연을 실마리삼아 끝내 그 무고한 아픔의 실체를 드러내준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 소설은 씌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눈길」의 실제 실연자로서 소재뿐 아니라, 그 헤어짐을 중심삼아 이야기의 반전시점을 마련해준 구성이나 우리 삶의 원죄성 아픔 부끄러움 따위의 주제까지도 함께 다 제공해준 셈이었다. 거기에 내가 다듬고 덧붙인 바란 무력하고 모멸스런 자신을 더욱 가책하려는 심사에서 어머니에게 우정 ‘빚이 없다’뻔뻔스럽게 우기고 든다거나 당신을 고려한 정도였달까.(43쪽)
4) 모성애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것냐,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새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자석아. 내자석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78쪽)
5) 연민
아내 역시 어니나 우리의 그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끝까지 들추고 있었다. 그건 물론 철없는 호기심에서가 아니었다. 노인에 대한 애틋한 심사에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어머니, 아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답답한 처지에 대한 소리 없는 항변의 표시였다. 나는 그 아내 앞에 더욱 부끄럽고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자신이 참을 수 없도록 가증스럽기만 하였다. (42쪽)
2. 이청준의 눈물에서 인용한 부분의 전후 이야기 요약 서술
1) 가난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박복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자신의 박복함을 인정하는 체념의 정서가 숨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념을 대변한 한(恨)은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고, 빚진 것이 없다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든다. 실제 그는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에 빚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부끄러움에 대해 김윤식은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덕 없음과 박복에다 돌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의 방식은 소박한 자기 원망이나 체념과는 구별되는 인간스런 기품의 일종이다. 아들과 함께 새벽 눈길을 걷고, 그길을 되짚어 온 노모가 잿등 위에 앉아 눈부신 아침 햇빛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것은 물을 것도 없이 대명천지 밝은 세계에 머리를 들 수 없다는 자신의 박복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아들과 자신의 박복함을 인정하는 한(恨)이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말하던 지붕개량사업이, 실은 어머니의 소망임을 넌지시 알리는 이 방법은 여태까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절대적 체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소망이라면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텐데, 지붕 개량 사업 이야기를 일부러 꺼낸 것 자체가 이번에는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나’도 짐짓 놀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자 ‘나’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그 소망을 이야기할 까봐서 지레 겁을 먹고 이리저리 피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아들에게 요구라는 것을 한 적이 없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느끼는 아들에게 진 빚의 무게는 무거웠다.
2) 빚
자신의 빚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나’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빚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나’와 같을지 모르나,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나’가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는 ‘나는 준 것이 없으니,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의 노모는 자신과 가족의 모든 불행을 스스로의 부덕과 허물로 돌려 부끄러워한다.’라고 한 말을 빌면, 어머니가 가진 부채의식은 자식을 위해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하기만 한 ‘죄책감’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자식에게 까지 짊어지게 한 부모로서의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기 껏 고향에 내려와서는 겨우 하루 지내고 다시 서울로 가겠다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머니는 자식에게 부끄럽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어머니는 당신의 체념을 통해서 덮으려 하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작품의 말미에서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 동네 골목에 들어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큰아들을 잘못 키워 크고 넓은 집을 잃어버린 죄, 가난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한 죄, 단칸방에서 아들 내외를 재워야하는 죄, 죽음 이후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를 다 갖추지 못할 것 같은 죄 등등 헤아려보면 한스러운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섭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치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선심에 애초부터 그래줄 가망이 없어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14쪽)
3) 수치심
「눈길」은 그러니까 나 혼자 쓴 소설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아내 셋이서 함께 쓴 소설인 셈이다. 오랜 세월 가려져온 그 새벽 헤어짐 이후의 두려운 사연을 당신의 삶 속에 간직해온 어머니나 그 헌 옷궤의 설운 사연을 실마리삼아 끝내 그 무고한 아픔의 실체를 드러내준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 소설은 씌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눈길」의 실제 실연자로서 소재뿐 아니라, 그 헤어짐을 중심삼아 이야기의 반전시점을 마련해준 구성이나 우리 삶의 원죄성 아픔 부끄러움 따위의 주제까지도 함께 다 제공해준 셈이었다. 거기에 내가 다듬고 덧붙인 바란 무력하고 모멸스런 자신을 더욱 가책하려는 심사에서 어머니에게 우정 ‘빚이 없다’뻔뻔스럽게 우기고 든다거나 당신을 고려한 정도였달까.(43쪽)
4) 모성애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것냐,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새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자석아. 내자석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78쪽)
5) 연민
아내 역시 어니나 우리의 그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끝까지 들추고 있었다. 그건 물론 철없는 호기심에서가 아니었다. 노인에 대한 애틋한 심사에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어머니, 아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답답한 처지에 대한 소리 없는 항변의 표시였다. 나는 그 아내 앞에 더욱 부끄럽고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자신이 참을 수 없도록 가증스럽기만 하였다. (42쪽)
2. 이청준의 눈물에서 인용한 부분의 전후 이야기 요약 서술
1) 가난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박복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자신의 박복함을 인정하는 체념의 정서가 숨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념을 대변한 한(恨)은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고, 빚진 것이 없다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든다. 실제 그는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에 빚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부끄러움에 대해 김윤식은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덕 없음과 박복에다 돌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의 방식은 소박한 자기 원망이나 체념과는 구별되는 인간스런 기품의 일종이다. 아들과 함께 새벽 눈길을 걷고, 그길을 되짚어 온 노모가 잿등 위에 앉아 눈부신 아침 햇빛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것은 물을 것도 없이 대명천지 밝은 세계에 머리를 들 수 없다는 자신의 박복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아들과 자신의 박복함을 인정하는 한(恨)이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말하던 지붕개량사업이, 실은 어머니의 소망임을 넌지시 알리는 이 방법은 여태까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절대적 체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소망이라면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텐데, 지붕 개량 사업 이야기를 일부러 꺼낸 것 자체가 이번에는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나’도 짐짓 놀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자 ‘나’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그 소망을 이야기할 까봐서 지레 겁을 먹고 이리저리 피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아들에게 요구라는 것을 한 적이 없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느끼는 아들에게 진 빚의 무게는 무거웠다.
2) 빚
자신의 빚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나’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빚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나’와 같을지 모르나,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나’가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는 ‘나는 준 것이 없으니,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의 노모는 자신과 가족의 모든 불행을 스스로의 부덕과 허물로 돌려 부끄러워한다.’라고 한 말을 빌면, 어머니가 가진 부채의식은 자식을 위해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하기만 한 ‘죄책감’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자식에게 까지 짊어지게 한 부모로서의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기 껏 고향에 내려와서는 겨우 하루 지내고 다시 서울로 가겠다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머니는 자식에게 부끄럽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어머니는 당신의 체념을 통해서 덮으려 하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작품의 말미에서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 동네 골목에 들어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큰아들을 잘못 키워 크고 넓은 집을 잃어버린 죄, 가난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한 죄, 단칸방에서 아들 내외를 재워야하는 죄, 죽음 이후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를 다 갖추지 못할 것 같은 죄 등등 헤아려보면 한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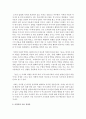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