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熱 에서 列 로
2. 평등, 내가 잘못 알았던가?
3. 동등화? 평등화?
4. 질투에서 비롯되는 평등
5. 19금 투표
6. 풀리지 않는 평등문제
2. 평등, 내가 잘못 알았던가?
3. 동등화? 평등화?
4. 질투에서 비롯되는 평등
5. 19금 투표
6. 풀리지 않는 평등문제
본문내용
끼게 된다. 3) 이 환경은 경쟁 싸움과 이행의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며 능력 있는 아이들은 능력 이하의 것을 요구받고, 능력이 적은 아이들은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 받는다. 등등을 들고 있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이러한 교육체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능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조 하지만 종합 교육체계에 대한 의견에는 단호하게 NO! 라고 말하고 싶다. 특성화고교와 다양한 입시제도로 학생들의 재능과 학업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교육 대신 전국 수재, 인재를 한 학교로 몰아 그들끼리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낸 교육제도는 평등화시키지 못한 교육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듯하다. ‘영리한 자는 우둔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비꼬는 듯이 서술한 저자가 지금 특목고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삶에서도 부의 평등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저자는 전제 자체를 ‘부자들은 가난해야 한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동등화의 경향에는 부자를 지속적으로 중상모략하고 경멸하고 비방하는 것도 속하다는 것이다. 직업에 있어서도 서열의 차이를 말소하는 것은 지금의 활동을 강화하지 않고 그것을 어렵게 하며, 위로 상승하려고 노력하려는 자극의 상실 그리고 기능적인 차이의 상실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열 체계는 의미 깊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공적인 지위 또는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은 일반사람과 구별되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업세계의 서열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모든 분야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 그것이 계층을 나누는 것 외의 것을 수반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서열이 부의 잣대라면? 계급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심에 서열이 있다면?
질투에서 비롯되는 평등
저자는 우리의 질투에서 동등화시키려는 욕구가 발휘되었다고 결론 맺는다. 인간의 순수한 집단 능력은 많은 개인들의 서로 다른 재능을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하게 전개시키지 않고는 만들어 질수 없기에 획일적인 척도에 따라 인간을 단일한 본질로 환원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불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질투에서 비롯한 동등화 욕구를 부끄럽게 인식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과 상이한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제한된 현실적 가능성의 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증가시키고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끝맺는다.
편협한 전제로부터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생긴 대로 살아라.’가 아닐까 싶다. 자신의 우둔함과 열등의식 속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한낱 질투에 불과하고, 처한 환경과 현실에 맞춰 그 속에서 발전하라는 뜻 깊은 조언이다. 아마 이러한 심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소중한 한 표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대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며, 못난 자신을 탓하며 한숨 섞인 대세를
특정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이러한 교육체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능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조 하지만 종합 교육체계에 대한 의견에는 단호하게 NO! 라고 말하고 싶다. 특성화고교와 다양한 입시제도로 학생들의 재능과 학업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교육 대신 전국 수재, 인재를 한 학교로 몰아 그들끼리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낸 교육제도는 평등화시키지 못한 교육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듯하다. ‘영리한 자는 우둔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비꼬는 듯이 서술한 저자가 지금 특목고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삶에서도 부의 평등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저자는 전제 자체를 ‘부자들은 가난해야 한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동등화의 경향에는 부자를 지속적으로 중상모략하고 경멸하고 비방하는 것도 속하다는 것이다. 직업에 있어서도 서열의 차이를 말소하는 것은 지금의 활동을 강화하지 않고 그것을 어렵게 하며, 위로 상승하려고 노력하려는 자극의 상실 그리고 기능적인 차이의 상실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열 체계는 의미 깊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공적인 지위 또는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은 일반사람과 구별되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업세계의 서열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모든 분야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 그것이 계층을 나누는 것 외의 것을 수반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서열이 부의 잣대라면? 계급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심에 서열이 있다면?
질투에서 비롯되는 평등
저자는 우리의 질투에서 동등화시키려는 욕구가 발휘되었다고 결론 맺는다. 인간의 순수한 집단 능력은 많은 개인들의 서로 다른 재능을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하게 전개시키지 않고는 만들어 질수 없기에 획일적인 척도에 따라 인간을 단일한 본질로 환원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불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질투에서 비롯한 동등화 욕구를 부끄럽게 인식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과 상이한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제한된 현실적 가능성의 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증가시키고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끝맺는다.
편협한 전제로부터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생긴 대로 살아라.’가 아닐까 싶다. 자신의 우둔함과 열등의식 속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한낱 질투에 불과하고, 처한 환경과 현실에 맞춰 그 속에서 발전하라는 뜻 깊은 조언이다. 아마 이러한 심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소중한 한 표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대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며, 못난 자신을 탓하며 한숨 섞인 대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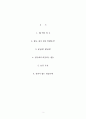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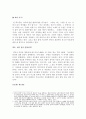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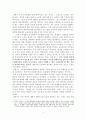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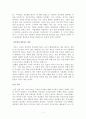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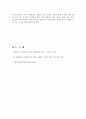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