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러시아 신화란 무엇인가?
1) 러시아 신화의 정의
2) 러시아 신화의 형성과정
2. 러시아 신화의 특징
1) 신인동형(神人同形 : anthrophomorphism)과 의인화(personification)
2) 만유신재론 (panentheism)
3) ‘순환성’과 ‘땅과 하늘의 만남’
3. 러시아 신화의 양적 부족의 원인
1) 슬라브 신화의 분화
2) 기도교의 유입과 국교화
Ⅱ. 본론
1. 러시아의 신
1) 창세기의 신
2) 러시아의 최고신
① 뻬룬(Perun)
② 벨로스 (Volos/Velos)
③ 호르스(Khors)
④ 다쥐보그(Dazh'bog)
⑤ 스뜨리보그(Stribog)
⑥ 모꼬쉬(mokosh')
⑦ 시마르글/세마르글(Simargi/Semargl)
3) 하위신격들과 정령들
(ㄱ) 하위신격들
① 어머니이신 축축한 대지(Mat'-syra zemlja)
② 야릴로(Jarilo)
③ 라다(Lada)
(ㄴ) 동슬라브 민중의 정령
① 레쉬(Leshij)
② 뽈레보이(Polevoj)/뽈레비끄(Polevik)
③ 보자노이(Vodjanoj)/보쟈니끄(Vodjanik
④ 루살까(Rusalka)
⑤ 도모보이(Domovoj)
⑥ 꾸빨라(Kupala)
⑦ 바바-야가(Baba-jaga)
2. 러시아 고대 신화
1) 창조관
2) 인간관
3)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① 토테미즘
② 샤머니즘
③ 곰제의
④ 문화영웅
3. 러시아의 영웅 서사시
1) 브일리나란...
2) 러시아의 신화적 영웅의 특성
3) 러시아의 영웅서사시에 나타난 서사구조
4) 끼예프 브일리나에 나타난 서사구조
① 입문
② 탐색
③ 귀환
4. 19세기 이후 문학 속의 신화
1) 푸슈킨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
① 푸슈킨 소개
②『청동기마상』
③『루슬란과 류드밀라』
2)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
① 도스토예프스키 소개
②『악령』
Ⅲ. 결론
1. 러시아 문학 속 신화의 위치
2. 러시아 신화가 현대의 러시아인들에게 주는 의미
1. 러시아 신화란 무엇인가?
1) 러시아 신화의 정의
2) 러시아 신화의 형성과정
2. 러시아 신화의 특징
1) 신인동형(神人同形 : anthrophomorphism)과 의인화(personification)
2) 만유신재론 (panentheism)
3) ‘순환성’과 ‘땅과 하늘의 만남’
3. 러시아 신화의 양적 부족의 원인
1) 슬라브 신화의 분화
2) 기도교의 유입과 국교화
Ⅱ. 본론
1. 러시아의 신
1) 창세기의 신
2) 러시아의 최고신
① 뻬룬(Perun)
② 벨로스 (Volos/Velos)
③ 호르스(Khors)
④ 다쥐보그(Dazh'bog)
⑤ 스뜨리보그(Stribog)
⑥ 모꼬쉬(mokosh')
⑦ 시마르글/세마르글(Simargi/Semargl)
3) 하위신격들과 정령들
(ㄱ) 하위신격들
① 어머니이신 축축한 대지(Mat'-syra zemlja)
② 야릴로(Jarilo)
③ 라다(Lada)
(ㄴ) 동슬라브 민중의 정령
① 레쉬(Leshij)
② 뽈레보이(Polevoj)/뽈레비끄(Polevik)
③ 보자노이(Vodjanoj)/보쟈니끄(Vodjanik
④ 루살까(Rusalka)
⑤ 도모보이(Domovoj)
⑥ 꾸빨라(Kupala)
⑦ 바바-야가(Baba-jaga)
2. 러시아 고대 신화
1) 창조관
2) 인간관
3)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① 토테미즘
② 샤머니즘
③ 곰제의
④ 문화영웅
3. 러시아의 영웅 서사시
1) 브일리나란...
2) 러시아의 신화적 영웅의 특성
3) 러시아의 영웅서사시에 나타난 서사구조
4) 끼예프 브일리나에 나타난 서사구조
① 입문
② 탐색
③ 귀환
4. 19세기 이후 문학 속의 신화
1) 푸슈킨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
① 푸슈킨 소개
②『청동기마상』
③『루슬란과 류드밀라』
2)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
① 도스토예프스키 소개
②『악령』
Ⅲ. 결론
1. 러시아 문학 속 신화의 위치
2. 러시아 신화가 현대의 러시아인들에게 주는 의미
본문내용
있으며, 날개도 달려 있었다.
고대 동슬라브인들은 때로는 붉은 색 윗도리를 입고 있는 보자노이가 인간을 미워 해서 인간을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함으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믿었다.
④ 루살까(Rusalka) - 물의 요정
- ‘루살까’는 웅덩이나 호수에 거주하는 젊은 여자 정령으로서, 동슬라브인은 결혼하기 전의 젊은 처녀가 사랑 때문에 물 속에 빠져 죽으면 ‘물의 요정 루살까’가 된다고 믿 었다. 또 정교 수용 이후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은 아이의 혼도 루살까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러시아 민담에는 루살까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 다.
루살까는 사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이다. 그것은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공동 모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무덤 뒤편에야 묻히게 된다. ‘루살리 주일’이 되면 죽은 그녀는 사랑하던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루살까로 변신한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미모의 루살가는 창백한 안색에 하얀 옷을 입고서 물가의 바위나 나뭇가지에 앉아, 깔깔 거리고 웃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린아이나 미모의 청 년을 유혹하여 물에 빠뜨리며, 장난질을 치기도 하는데, 손벽을 치면서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 남자들의 눈을 멀 게 한다고 전해온다.
루살까는 모꼬쉬와 같은 동슬라브 신화의 여성적 신격 에서 파생하며, 기독교 수용 후에는 ‘빠라스께바 뺘드니 짜’의 이미지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러한 루살까의 신비 스러운 이미지는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뿌쉬낀, 그리고 드볼작이나 다비도프의 오페라에도 자주 등장하 는 주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난간의 문양이 나 건물 전면부의 파사드, 등대의 장식물로도 자주 이용 되고 있다.
⑤ 도모보이(Domovoj) - 집의 정령
- 동슬라브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집(dom)\'에는 집과 가족과 집안일을 보살펴 주는 수호 정령, 즉 흰 수염을 기른 ‘도모보이’라는 집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 다. 한 가족의 죽은 조상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도모보 이’는 털이 무성하게 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문 지만, 다락 등에 거주하면서 인자하게 집안을 돌보기도 하지만,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한 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부지런 한 사람을 옹호하고, 게으른 사람은 질책하는 ‘도모보이’ 는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동슬라브인들의 전통적인 의 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민들의 정령이기도 하다.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할 경우, 이 ‘도모보이’의 비 위를 맞추어야 하는 까닭에 새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은 미리 빵을 문간 옆 에 놔두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난로의 불씨를 함께 들고 가면서, “도모 보이, 도모보이,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라는 말을 하며 도모보이를 공식적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도모보이’라는 이름은 집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돔(dom)\'에서 파생하고 있으며, 보자노이, 레쉬, 뽈레보이 등처럼, 신이 죄를 지어 하늘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한 천사 들이 변해서 형성된 정령이라는 전설도 전해온다.
또한 러시아 농민들은 ‘도모보이’를 죽은 집안의 조상들을 존경하듯이 받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모보이가 화가 나서 집안을 등질 경우, 그 집을 돌봐 줄 영혼이 없어서 그 집에는 액운과 질병과 불행이 찾아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모보이라는 정령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농민들의 조상 숭배 전 통을 찾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한 가정 내의 가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 범적 장치의 특성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⑥ 꾸빨라(Kupala) - 목욕과 세례의 정령
- 동슬라브인의 세시풍속과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인 ‘꾸빨라’는 ‘물’ 과 연관이 깊은 존재여서, ‘목욕하다’라는 ‘kupat’라는 동사에서 파생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꾸빨라’의 기능은 ‘물’과 ‘불’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정화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꾸빨라’는 일년에 한번만 ‘꾸빨라’축일에 나타난다.
비잔틴으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동슬라브-러시아 신화의 ‘꾸빨라’는 ‘성 요 한’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반 꾸빨라’가 된다. 요한의 러시아식 발음은 ‘이반’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반 꾸빨라’ 축제는 ‘이바노프의 날’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⑦ 바바-야가(Baba-jaga)
- ‘바바’는 체코어로 노파를 의미하고, ‘야가’는 러시아어로 ‘마귀할멈’을 의미하며, 악 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슬라브의 설화나 민간 신앙, 구전 동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숲 속의 마법 노파로서, 다른 요괴들과 함께 여름날의 하지가 되면 끼예프의 어느 민 둥산에 모인다고 전해온다. 마법을 부리거나 아이를 잡아서 게걸스럽게 구어 먹거나 절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죽음의 여신이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피하는 습성을 지녔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바바-야가와 같은 신화적 인물로서 꼬쉬체이(Koshchei)와 솔로베이-라즈보이니끄 (Solvej-razbojnik) 등도 러시아의 전래 민담 속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불길한 세력’들이 모여 형성된 ‘악령’들이다. 동슬라브-러시아 신화나 영웅서 사시, 그리고 민담에 ‘두견새-강도’ 또는 ‘꾀꼬리-강도’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솔로베이-라즈보이니끄’는 숲 속에 있는 자신의 둥지에 앉아 있다가 주인공의 갈 길을 가로막는 악한 또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적이나 강 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마당의 정령 ‘드보로비(Dvorovij)\', 탈곡장의 정령 \'오빈니끄(Ovinnik)\', 목욕탕의 정령 ‘반니끄(Vannik)\', 창고와 헛간의 정령 \'구멘니끄(Gumennik)\', 둔갑을 하는 \'오보로β (Oboroten\')\', 집안의 정령 \'끼끼모라(Kikimora)\', 그리고 백설 공주이자 물의 요정인 fntkfRK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겨 울의 정령 \'스네구로취까(Snegurochika)\' 등과 같은 하급 정 령들이 동슬라브의 민담 등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
고대 동슬라브인들은 때로는 붉은 색 윗도리를 입고 있는 보자노이가 인간을 미워 해서 인간을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함으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믿었다.
④ 루살까(Rusalka) - 물의 요정
- ‘루살까’는 웅덩이나 호수에 거주하는 젊은 여자 정령으로서, 동슬라브인은 결혼하기 전의 젊은 처녀가 사랑 때문에 물 속에 빠져 죽으면 ‘물의 요정 루살까’가 된다고 믿 었다. 또 정교 수용 이후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은 아이의 혼도 루살까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러시아 민담에는 루살까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 다.
루살까는 사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이다. 그것은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공동 모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무덤 뒤편에야 묻히게 된다. ‘루살리 주일’이 되면 죽은 그녀는 사랑하던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루살까로 변신한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미모의 루살가는 창백한 안색에 하얀 옷을 입고서 물가의 바위나 나뭇가지에 앉아, 깔깔 거리고 웃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린아이나 미모의 청 년을 유혹하여 물에 빠뜨리며, 장난질을 치기도 하는데, 손벽을 치면서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 남자들의 눈을 멀 게 한다고 전해온다.
루살까는 모꼬쉬와 같은 동슬라브 신화의 여성적 신격 에서 파생하며, 기독교 수용 후에는 ‘빠라스께바 뺘드니 짜’의 이미지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러한 루살까의 신비 스러운 이미지는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뿌쉬낀, 그리고 드볼작이나 다비도프의 오페라에도 자주 등장하 는 주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난간의 문양이 나 건물 전면부의 파사드, 등대의 장식물로도 자주 이용 되고 있다.
⑤ 도모보이(Domovoj) - 집의 정령
- 동슬라브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집(dom)\'에는 집과 가족과 집안일을 보살펴 주는 수호 정령, 즉 흰 수염을 기른 ‘도모보이’라는 집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 다. 한 가족의 죽은 조상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도모보 이’는 털이 무성하게 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문 지만, 다락 등에 거주하면서 인자하게 집안을 돌보기도 하지만,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한 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부지런 한 사람을 옹호하고, 게으른 사람은 질책하는 ‘도모보이’ 는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동슬라브인들의 전통적인 의 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민들의 정령이기도 하다.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할 경우, 이 ‘도모보이’의 비 위를 맞추어야 하는 까닭에 새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은 미리 빵을 문간 옆 에 놔두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난로의 불씨를 함께 들고 가면서, “도모 보이, 도모보이,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라는 말을 하며 도모보이를 공식적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도모보이’라는 이름은 집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돔(dom)\'에서 파생하고 있으며, 보자노이, 레쉬, 뽈레보이 등처럼, 신이 죄를 지어 하늘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한 천사 들이 변해서 형성된 정령이라는 전설도 전해온다.
또한 러시아 농민들은 ‘도모보이’를 죽은 집안의 조상들을 존경하듯이 받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모보이가 화가 나서 집안을 등질 경우, 그 집을 돌봐 줄 영혼이 없어서 그 집에는 액운과 질병과 불행이 찾아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모보이라는 정령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농민들의 조상 숭배 전 통을 찾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한 가정 내의 가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 범적 장치의 특성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⑥ 꾸빨라(Kupala) - 목욕과 세례의 정령
- 동슬라브인의 세시풍속과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인 ‘꾸빨라’는 ‘물’ 과 연관이 깊은 존재여서, ‘목욕하다’라는 ‘kupat’라는 동사에서 파생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꾸빨라’의 기능은 ‘물’과 ‘불’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정화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꾸빨라’는 일년에 한번만 ‘꾸빨라’축일에 나타난다.
비잔틴으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동슬라브-러시아 신화의 ‘꾸빨라’는 ‘성 요 한’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반 꾸빨라’가 된다. 요한의 러시아식 발음은 ‘이반’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반 꾸빨라’ 축제는 ‘이바노프의 날’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⑦ 바바-야가(Baba-jaga)
- ‘바바’는 체코어로 노파를 의미하고, ‘야가’는 러시아어로 ‘마귀할멈’을 의미하며, 악 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슬라브의 설화나 민간 신앙, 구전 동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숲 속의 마법 노파로서, 다른 요괴들과 함께 여름날의 하지가 되면 끼예프의 어느 민 둥산에 모인다고 전해온다. 마법을 부리거나 아이를 잡아서 게걸스럽게 구어 먹거나 절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죽음의 여신이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피하는 습성을 지녔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바바-야가와 같은 신화적 인물로서 꼬쉬체이(Koshchei)와 솔로베이-라즈보이니끄 (Solvej-razbojnik) 등도 러시아의 전래 민담 속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불길한 세력’들이 모여 형성된 ‘악령’들이다. 동슬라브-러시아 신화나 영웅서 사시, 그리고 민담에 ‘두견새-강도’ 또는 ‘꾀꼬리-강도’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솔로베이-라즈보이니끄’는 숲 속에 있는 자신의 둥지에 앉아 있다가 주인공의 갈 길을 가로막는 악한 또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적이나 강 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마당의 정령 ‘드보로비(Dvorovij)\', 탈곡장의 정령 \'오빈니끄(Ovinnik)\', 목욕탕의 정령 ‘반니끄(Vannik)\', 창고와 헛간의 정령 \'구멘니끄(Gumennik)\', 둔갑을 하는 \'오보로β (Oboroten\')\', 집안의 정령 \'끼끼모라(Kikimora)\', 그리고 백설 공주이자 물의 요정인 fntkfRK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겨 울의 정령 \'스네구로취까(Snegurochika)\' 등과 같은 하급 정 령들이 동슬라브의 민담 등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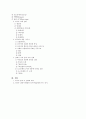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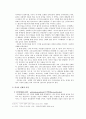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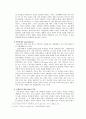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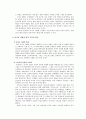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