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본문내용
에서는 ‘노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노옹이든 노인이든 그 뜻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식 표현이다. 노옹과 노인을 구분해서 논의하는 연구자들도 상당수 있으나 양자의 변별력을 묵과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헌화가 다음에 나오는 해가에서는 <또 한 노인이 있어 고하되(又有一老人告曰>로 기술되어 있는데 앞의 노옹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설화의 끝 부분에 해가의 소개가 끝나고 나서 <노인의 헌화가는 다음과 같다(老人獻花歌曰)>로 이어진다. 즉, 일연은 노옹과 노인이라는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노옹, 노인에 관해 연구자들이 밝히 주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묶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이 불교적 관점, 둘째 그룹이 제의적 관점(여기에는 초인, 산신, 농신, 몸주, 용의 변신 등 각종 신격이 포함된다), 셋째 그룹이 신선(이인, 현자 등)이라는 관점이고 넷째 그룹이 농부, 촌로 등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해석하는 관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그 밖의 족장설 등 논지가 상식에서 먼 것은 제외한다).
노옹, 노인 등에 대한 불교적 용례를 따져본 결과 그다지 無緣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꽃을 꺾어 미인에게 바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하화중생의 실천적 보살행이라든가 관음의 현신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서사 문맥과 조화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이 농부나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던 촌로였을 것이라는 네 번째 그룹의 주장은 너무 무미건조한 설화 해석의 태도로 느껴진다. 가령 수로부인이 아름답게 핀 철쭉꽃을 갖고자 했지, 반드시 천 길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니까 노옹이 꺾은 꽃은 벼랑 위의 꽃이 아닐 수도 있다든지, 노인이 그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샛길을 잘 알아 험준한 벼랑에 핀 꽃도 꺾을 수 있었으리라는 종류의 추측은 합리적인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만 따져야 한다면 우리가 들어온 상당수의 설화는 무미건조한 산문 기록으로 전락하거나 황당무계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건 옛날 옛적 이야기야>라는 말을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이야기야>라고 말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나라에 담배가 수입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묻는다든지 <호랑이가 과연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방식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이 선승이나 현자, 이인이었으리라는 세 번째 그룹의 견해는 대체로 헌화가 부분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노옹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신선에 가장 가까운 편이지만 본문 어디에도 노옹을 신선이라고 해석할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옛 이야기나 문헌 설화, 심지어는 오늘날 광고에까지 등장하면서 면면히 이어져온 신선의 모습을 이 설화에서 연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마리 암소를 끌고 흰 수염을 바닷바람에 날리며 유유히 바닷가를 지나던 노옹, 천 길 절벽 위의 꽃을 가지고 싶어하던 수로에게 시 몇 줄과 꽃묶음을 함께 건네주었을 노옹의 모습은 아무래도 옛이야기들 속의 신선처럼 상상된다.
그렇다면 노옹은 선승이며 동시에 신선이고 또한 이인, 현자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무엇이면서 동시에 무엇인 복합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가? 삼국유사만 통해서 검토해 보더라도 승려이면서 呪師 라든지 용이면서 인간이고 벼슬아치라든가 하는 복합적 신분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가령 도솔가에서 월명사는 승려의 신분이지만 임금의 청으로 二日竝現의 日怪를 퇴치하는 주사처럼 표현되어 있고 처용가에서 처용은 용왕의 아들인 용이지만 사람으로 화신하여 결혼 생활도 하고 별슬살이도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분명한 복합적 신분의 사례들이다.
요약하건대 고대적 신정일치 사회에서 무와 선가의 도인과 불가의 선승 등의 모습이나 역할이 어렵지 않게 한 인물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설화 속의 인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
원문
去隱春皆林米
毛冬居叱沙器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貌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郞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작품 개요
신라 효소왕(孝昭王) 때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가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여 불렀다는 노래이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그를 그리는 마음이 행여 무심치 않다면, 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죽지랑 사후에 이 노래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석 3>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함께 화랑을 기리고 있는 노래로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주를 일루고 있으며 주술성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순수 서정시에로의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삼국 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여러 대에 걸쳐 대신으로서 존경과 찬미를 한 몸에 받았던 老화랑의 쇠잔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득오곡의 심정에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失勢하여 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노래이다.
작가 소개
得烏谷(?~?) 득오(得烏), 득곡(得谷), 급간(級干)이라고도 한다. 신라 효소왕 때의 화랑. 700년(효소왕 9)에 신라 향가(鄕歌)인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를 지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효소왕대 죽지랑조(孝昭王代竹旨郞條)>에는 화랑 죽지랑의 낭도로서 득오가 당전모량익선아간(幢典牟梁益宣阿干)에게 볼모로 붙잡혀가서 벼슬이 신라 아홉 번째 등급인 급간(及干; 창고지기)으로 고생할 때 죽지랑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득오가 그를 사모하여 만가(挽歌)인 《모죽지랑가》를 지어 불렀다는 유래가 전해온다.
해석
▶ 해석 1. 양주동 해독
▶ 해석 2. 김완진 해독
간 봄 그리매
모 것자 우리 시름
아 나토샤온
그지 살 ㈓ 디니져
눈 돌칠 이예
맛보디지리
郎이여 그릴 미 녀올 길
다
노옹, 노인에 관해 연구자들이 밝히 주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묶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이 불교적 관점, 둘째 그룹이 제의적 관점(여기에는 초인, 산신, 농신, 몸주, 용의 변신 등 각종 신격이 포함된다), 셋째 그룹이 신선(이인, 현자 등)이라는 관점이고 넷째 그룹이 농부, 촌로 등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해석하는 관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그 밖의 족장설 등 논지가 상식에서 먼 것은 제외한다).
노옹, 노인 등에 대한 불교적 용례를 따져본 결과 그다지 無緣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꽃을 꺾어 미인에게 바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하화중생의 실천적 보살행이라든가 관음의 현신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서사 문맥과 조화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이 농부나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던 촌로였을 것이라는 네 번째 그룹의 주장은 너무 무미건조한 설화 해석의 태도로 느껴진다. 가령 수로부인이 아름답게 핀 철쭉꽃을 갖고자 했지, 반드시 천 길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니까 노옹이 꺾은 꽃은 벼랑 위의 꽃이 아닐 수도 있다든지, 노인이 그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샛길을 잘 알아 험준한 벼랑에 핀 꽃도 꺾을 수 있었으리라는 종류의 추측은 합리적인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만 따져야 한다면 우리가 들어온 상당수의 설화는 무미건조한 산문 기록으로 전락하거나 황당무계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건 옛날 옛적 이야기야>라는 말을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이야기야>라고 말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나라에 담배가 수입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묻는다든지 <호랑이가 과연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방식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이 선승이나 현자, 이인이었으리라는 세 번째 그룹의 견해는 대체로 헌화가 부분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노옹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신선에 가장 가까운 편이지만 본문 어디에도 노옹을 신선이라고 해석할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옛 이야기나 문헌 설화, 심지어는 오늘날 광고에까지 등장하면서 면면히 이어져온 신선의 모습을 이 설화에서 연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마리 암소를 끌고 흰 수염을 바닷바람에 날리며 유유히 바닷가를 지나던 노옹, 천 길 절벽 위의 꽃을 가지고 싶어하던 수로에게 시 몇 줄과 꽃묶음을 함께 건네주었을 노옹의 모습은 아무래도 옛이야기들 속의 신선처럼 상상된다.
그렇다면 노옹은 선승이며 동시에 신선이고 또한 이인, 현자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무엇이면서 동시에 무엇인 복합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가? 삼국유사만 통해서 검토해 보더라도 승려이면서 呪師 라든지 용이면서 인간이고 벼슬아치라든가 하는 복합적 신분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가령 도솔가에서 월명사는 승려의 신분이지만 임금의 청으로 二日竝現의 日怪를 퇴치하는 주사처럼 표현되어 있고 처용가에서 처용은 용왕의 아들인 용이지만 사람으로 화신하여 결혼 생활도 하고 별슬살이도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분명한 복합적 신분의 사례들이다.
요약하건대 고대적 신정일치 사회에서 무와 선가의 도인과 불가의 선승 등의 모습이나 역할이 어렵지 않게 한 인물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설화 속의 인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
원문
去隱春皆林米
毛冬居叱沙器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貌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郞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작품 개요
신라 효소왕(孝昭王) 때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가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여 불렀다는 노래이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그를 그리는 마음이 행여 무심치 않다면, 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죽지랑 사후에 이 노래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석 3>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함께 화랑을 기리고 있는 노래로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주를 일루고 있으며 주술성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순수 서정시에로의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삼국 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여러 대에 걸쳐 대신으로서 존경과 찬미를 한 몸에 받았던 老화랑의 쇠잔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득오곡의 심정에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失勢하여 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노래이다.
작가 소개
得烏谷(?~?) 득오(得烏), 득곡(得谷), 급간(級干)이라고도 한다. 신라 효소왕 때의 화랑. 700년(효소왕 9)에 신라 향가(鄕歌)인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를 지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효소왕대 죽지랑조(孝昭王代竹旨郞條)>에는 화랑 죽지랑의 낭도로서 득오가 당전모량익선아간(幢典牟梁益宣阿干)에게 볼모로 붙잡혀가서 벼슬이 신라 아홉 번째 등급인 급간(及干; 창고지기)으로 고생할 때 죽지랑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득오가 그를 사모하여 만가(挽歌)인 《모죽지랑가》를 지어 불렀다는 유래가 전해온다.
해석
▶ 해석 1. 양주동 해독
▶ 해석 2. 김완진 해독
간 봄 그리매
모 것자 우리 시름
아 나토샤온
그지 살 ㈓ 디니져
눈 돌칠 이예
맛보디지리
郎이여 그릴 미 녀올 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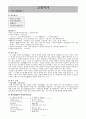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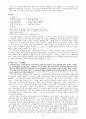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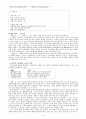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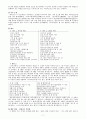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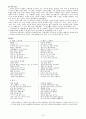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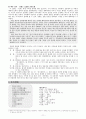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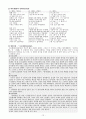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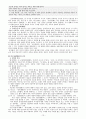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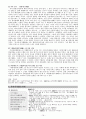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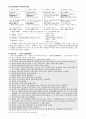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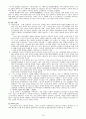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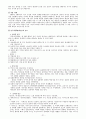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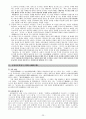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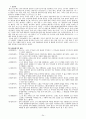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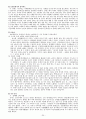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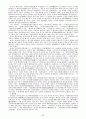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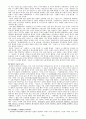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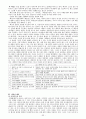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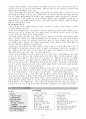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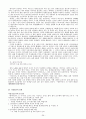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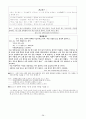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