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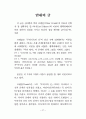 2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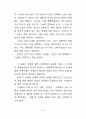 3
3
-
 4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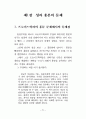 5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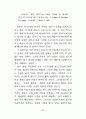 6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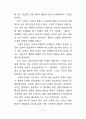 7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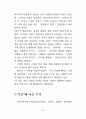 8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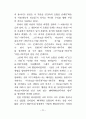 9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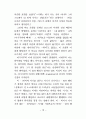 10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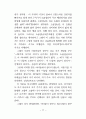 11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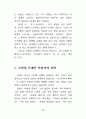 12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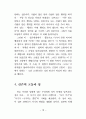 13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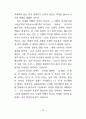 14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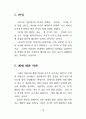 15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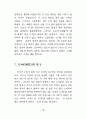 16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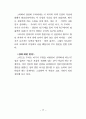 17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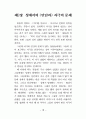 18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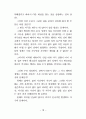 19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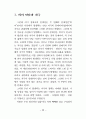 20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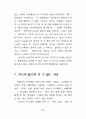 21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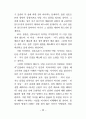 22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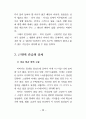 23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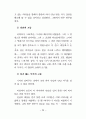 24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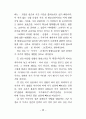 25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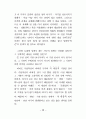 26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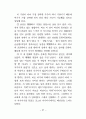 27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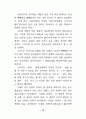 28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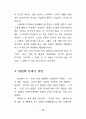 29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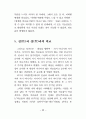 30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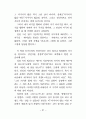 31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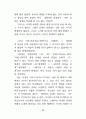 32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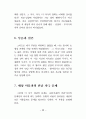 33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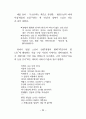 34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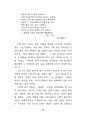 35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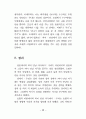 36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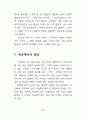 37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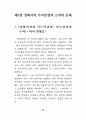 38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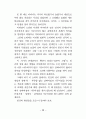 39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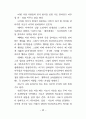 40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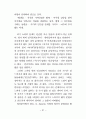 41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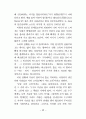 42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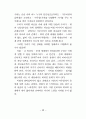 43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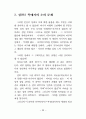 44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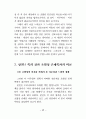 45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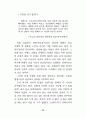 46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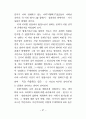 47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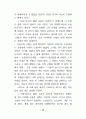 48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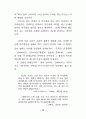 49
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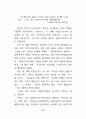 50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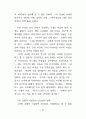 51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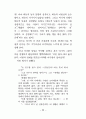 52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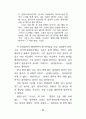 53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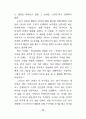 54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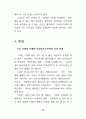 55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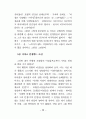 56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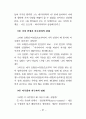 57
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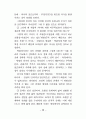 58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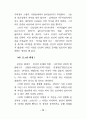 59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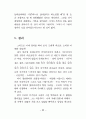 60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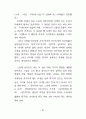 61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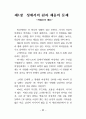 62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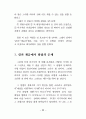 63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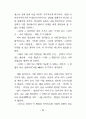 64
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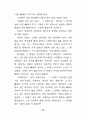 65
65
-
 66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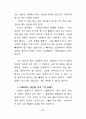 67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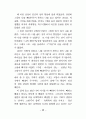 68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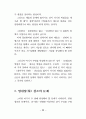 69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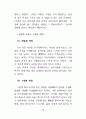 70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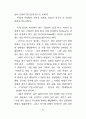 71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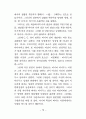 72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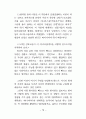 73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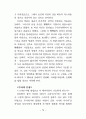 74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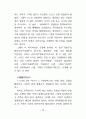 75
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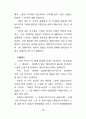 76
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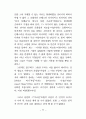 77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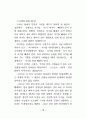 78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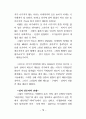 79
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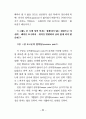 80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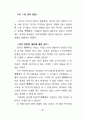 81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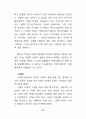 82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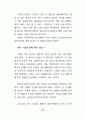 83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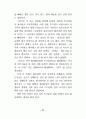 84
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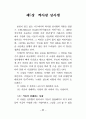 85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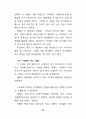 86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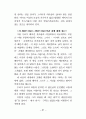 87
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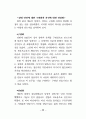 88
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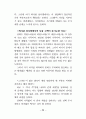 89
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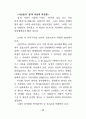 90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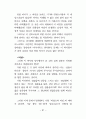 91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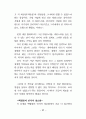 92
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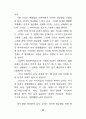 93
93
-
 94
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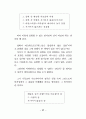 95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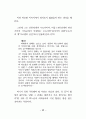 96
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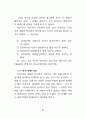 97
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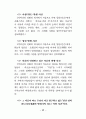 98
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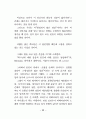 99
99
-
 100
100
-
 101
101
-
 102
102
-
 103
103
-
 104
104
-
 105
105
-
 106
106
-
 107
107
-
 108
108
-
 109
109
-
 110
110
-
 111
111
-
 112
112
-
 113
113
-
 114
114
-
 115
115
-
 116
116
-
 117
117
-
 118
118
-
 119
119
-
 120
120
-
 121
121
-
 122
122
-
 123
123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목차
1장 성의 흥분의 문제
2장 성의 자극문제
3장 성의 소외문제
4장 성의 실존적 공허
5장 짝사랑
6장 성의 엄숙성
7장 프로이드에 대한 반성
2장 성의 자극문제
3장 성의 소외문제
4장 성의 실존적 공허
5장 짝사랑
6장 성의 엄숙성
7장 프로이드에 대한 반성
본문내용
론, 즉 성의 의지가 인간 생의 의지(리비도)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현상학과 해석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러한 프로이드의 주장이 인간의 의식 현상과 인간의 인식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내용이란 이런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본능의 코스는 언제나 긴장 상태로부터 이완 상태로 일정해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일 듯하다. 그러나 사람의 성이 대량의 긴장을 일시에 해방하는 일이 단순히 유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강화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자. 이 문장에 보면,“긴장의 이완”이 인간 행위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편 인간의 성에서는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은 모순되지 않는가. 긴장을 빨리 없애려면 긴장을 최소로 하고 최대로 짧게 하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에서는 긴장과 흥분을 최대로 오래 끌려하고 최대로 높게 하려고 하니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이를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면 성에서의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긴장 이완 이론에 거역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량의 긴장을 일시에 해방하는 일이 유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의 이완이 인간의 목표이지만 성에서는 오히려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긴장 이완의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인 것이다.
보자. 인간은 성에서 흥분이 모자라면 흥분의 약(긴장 유발 약)을 사러 다니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면 긴장에서 이완으로 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표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에너지의 배출 때의 유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누가 긴장을 새로이 유발하는 약을 사려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말일까 말이 안되는 말일까. 인간만이 흥분과 긴장을 찾아다니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은 프로이드학파의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인간의 실존과 연결지어서 파악하는데 소홀이 한 면이 있다고 보고 싶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파헤쳐주어야 할 실존을 다루는 분들마저 정확히 파헤쳐 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외람된 생각을 하여본다.
우선 보자. 성호르몬에 의한 긴장은 흥분으로 자기를 주고 싶게 만든다. 이는 축적된 성호르몬의 에너지가 일으키는 당연한 문제일 것이다. 동물들에서는 이 압박하는 흥분의 요구대로 자기를 흥분에 주면 그만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물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의 실존 삶에서, 흥분이 없어서 흥분에 목마른 인간에게는 이 성에서 일으켜지는 흥분이 동물들에서처럼 그렇게 별것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이다. 인간은 흥분하고, 흥분하고, 더 흥분해서 흥분 결핍 콤플렉스가 해소될 때까지 절대의 흥분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다. 흥분이 모자라면 흥분 약을 사서라도 흥분 결핍 콤플렉스가 만족될 때까지 흥분 갈증을 해소하려 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서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흥분 약을 사서까지 흥분을 이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동물은 성의 긴장에서 흥분이 이루어 졌으면 그것으로 사태가 종료된다. 성호르몬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종료 안된 다른 흥분하지 못한 긴장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반성이 있어야 할 듯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흥분이란 위험이나 공포심을 느낄 때의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쌓여서 긴장되어 있는 자기 의지를 내어 보내거나 자기를 내주는 의지의 배출 혹은 긴장된 에너지의 배출 때에 일어나는 흥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의 흥분을 규정한다면 흥분은 자기가 (의미에) 나가지지 않은 긴장에서 자기가 (의미에) 나가지는 흥분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행위로 실현되지 못하여) 긴장되어 있는 자기의 의지가 (의미를 향하여) 쓸려나가지는 현상의 흥분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까지 흥분 결핍 콤플렉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따른다.
본인은 그 이유를 단순히 인간이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애에 둘러싸여) 내 속에 외로이 나를 부르고 있는 초월성 존재인“어림”의 부름을 외면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인간 속의 초월성 존재인 의로운 어림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속의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부름”에 나를 주기
(여기의“부름”(독일어:ruf)이라는 용어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용어이고 본인은 이 부름을 인간속의 초월성 존재인“하늘적 어림·하늘적 의로움”의 의지로 부터의 우리를 향한 부름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어림의 부름을 외면한 결과의 그 내용이란 다음과 같다. 즉, 그 내용이란 이 초월성 존재는 의로운 의리(=어린 마음에서 애가타서 놓지 못함)와 동시에 애틋한 어림의 존재라고 하였다. 즉, 그는 의지의 존재이니까 계속적인 자기를 주는“…하다”이다. 그는“의로움…하다”즉, 의로워서 자기를 내주기의“…하다”이고,“어림…하다”즉, 자기를 부정하여“…하다”이다. 그는 존재이니까 순간이라도 의로운 의리(=애가 타서 놓지 못함)의“…하다”와“어림···하다”의 행위를 정지하여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는“의로움…하다”와“어림…하다”등의 말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혹시 만일 내가 (내 속의 초월성 존재인 이“로고스 어림”의 이러한 어린 부름을 받아들여) 인격인“의로움·어림”존재를 수용했다면, 그래서 내가“초월적 어림”그에 취직되고 그와 합일되어졌다면 (물론 그의 부름에 나의 생명을 양보하여서이다) 나는 내 속의 초월적 존재인 그 로고스·어림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하다”에 취직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자면서도 이“의로움…하다”와“어림…하다”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의지가 그 의로움·어림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 나가지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었다(초월적 의로움·어림이란 인간 속에 있는
그 내용이란 이런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본능의 코스는 언제나 긴장 상태로부터 이완 상태로 일정해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일 듯하다. 그러나 사람의 성이 대량의 긴장을 일시에 해방하는 일이 단순히 유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강화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자. 이 문장에 보면,“긴장의 이완”이 인간 행위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편 인간의 성에서는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은 모순되지 않는가. 긴장을 빨리 없애려면 긴장을 최소로 하고 최대로 짧게 하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에서는 긴장과 흥분을 최대로 오래 끌려하고 최대로 높게 하려고 하니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이를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면 성에서의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긴장 이완 이론에 거역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량의 긴장을 일시에 해방하는 일이 유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의 이완이 인간의 목표이지만 성에서는 오히려 긴장을 높여 가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긴장 이완의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인 것이다.
보자. 인간은 성에서 흥분이 모자라면 흥분의 약(긴장 유발 약)을 사러 다니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면 긴장에서 이완으로 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표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에너지의 배출 때의 유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누가 긴장을 새로이 유발하는 약을 사려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말일까 말이 안되는 말일까. 인간만이 흥분과 긴장을 찾아다니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은 프로이드학파의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인간의 실존과 연결지어서 파악하는데 소홀이 한 면이 있다고 보고 싶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파헤쳐주어야 할 실존을 다루는 분들마저 정확히 파헤쳐 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외람된 생각을 하여본다.
우선 보자. 성호르몬에 의한 긴장은 흥분으로 자기를 주고 싶게 만든다. 이는 축적된 성호르몬의 에너지가 일으키는 당연한 문제일 것이다. 동물들에서는 이 압박하는 흥분의 요구대로 자기를 흥분에 주면 그만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물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의 실존 삶에서, 흥분이 없어서 흥분에 목마른 인간에게는 이 성에서 일으켜지는 흥분이 동물들에서처럼 그렇게 별것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이다. 인간은 흥분하고, 흥분하고, 더 흥분해서 흥분 결핍 콤플렉스가 해소될 때까지 절대의 흥분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다. 흥분이 모자라면 흥분 약을 사서라도 흥분 결핍 콤플렉스가 만족될 때까지 흥분 갈증을 해소하려 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서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흥분 약을 사서까지 흥분을 이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동물은 성의 긴장에서 흥분이 이루어 졌으면 그것으로 사태가 종료된다. 성호르몬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종료 안된 다른 흥분하지 못한 긴장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반성이 있어야 할 듯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흥분이란 위험이나 공포심을 느낄 때의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쌓여서 긴장되어 있는 자기 의지를 내어 보내거나 자기를 내주는 의지의 배출 혹은 긴장된 에너지의 배출 때에 일어나는 흥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의 흥분을 규정한다면 흥분은 자기가 (의미에) 나가지지 않은 긴장에서 자기가 (의미에) 나가지는 흥분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행위로 실현되지 못하여) 긴장되어 있는 자기의 의지가 (의미를 향하여) 쓸려나가지는 현상의 흥분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까지 흥분 결핍 콤플렉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따른다.
본인은 그 이유를 단순히 인간이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애에 둘러싸여) 내 속에 외로이 나를 부르고 있는 초월성 존재인“어림”의 부름을 외면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인간 속의 초월성 존재인 의로운 어림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속의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부름”에 나를 주기
(여기의“부름”(독일어:ruf)이라는 용어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용어이고 본인은 이 부름을 인간속의 초월성 존재인“하늘적 어림·하늘적 의로움”의 의지로 부터의 우리를 향한 부름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어림의 부름을 외면한 결과의 그 내용이란 다음과 같다. 즉, 그 내용이란 이 초월성 존재는 의로운 의리(=어린 마음에서 애가타서 놓지 못함)와 동시에 애틋한 어림의 존재라고 하였다. 즉, 그는 의지의 존재이니까 계속적인 자기를 주는“…하다”이다. 그는“의로움…하다”즉, 의로워서 자기를 내주기의“…하다”이고,“어림…하다”즉, 자기를 부정하여“…하다”이다. 그는 존재이니까 순간이라도 의로운 의리(=애가 타서 놓지 못함)의“…하다”와“어림···하다”의 행위를 정지하여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는“의로움…하다”와“어림…하다”등의 말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혹시 만일 내가 (내 속의 초월성 존재인 이“로고스 어림”의 이러한 어린 부름을 받아들여) 인격인“의로움·어림”존재를 수용했다면, 그래서 내가“초월적 어림”그에 취직되고 그와 합일되어졌다면 (물론 그의 부름에 나의 생명을 양보하여서이다) 나는 내 속의 초월적 존재인 그 로고스·어림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하다”에 취직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자면서도 이“의로움…하다”와“어림…하다”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의지가 그 의로움·어림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 나가지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었다(초월적 의로움·어림이란 인간 속에 있는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