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1
Ⅱ. 몸말-------------------------------------------------------1
1. 두로 출신 이세벨------------------------------------------1
2. 아합 - 이세벨 시대의 배경----------------------------------2
3. 경제적 영향----------------------------------------------3
1) 땅의 매매와 착취------------------------------------------3
2) 부의 편중------------------------------------------------4
4. 종교적 영향----------------------------------------------5
1) 이세벨의 바알 숭배-----------------------------------------5
2) 바알종교 공식화 움직임-------------------------------------6
Ⅲ. 나가는 말--------------------------------------------------8
Ⅱ. 몸말-------------------------------------------------------1
1. 두로 출신 이세벨------------------------------------------1
2. 아합 - 이세벨 시대의 배경----------------------------------2
3. 경제적 영향----------------------------------------------3
1) 땅의 매매와 착취------------------------------------------3
2) 부의 편중------------------------------------------------4
4. 종교적 영향----------------------------------------------5
1) 이세벨의 바알 숭배-----------------------------------------5
2) 바알종교 공식화 움직임-------------------------------------6
Ⅲ. 나가는 말--------------------------------------------------8
본문내용
. 종교적 영향
----------------------------------------------
5
1) 이세벨의 바알 숭배
-----------------------------------------
5
2) 바알종교 공식화 움직임
-------------------------------------
6
Ⅲ. 나가는 말
--------------------------------------------------
8
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에는 왕국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아합이 두로 출신의 여인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 하는 등 왕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명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매우 부당하게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였다는 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사가가 특별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다. 아합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6:29에서 열왕기하 10:31에 이르는 방대한 부분에 걸쳐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히 촉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 혁혁한 공헌을 남긴 왕이다.
사실 두 왕국 중 북 왕국이 앗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지만 남 유다보다 결코 나약한 나라는 아니었다. 비록 성서 기자가 ‘유다’가 보다 강대국이며 북 이스라엘은 한갓 떨어져 나간 일부 조각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영토의 크기, 지리적 위치, 군사력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열왕기하 14:8-14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열왕기하 14:12절 -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등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주도적 왕국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단순히 지파 수에서도 10:2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이집트-시리아 지역에 이르는 국제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효용성도 남 왕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언제나 야훼종교 특히 예루살렘 제의 중심으로 평가하는 신명기 사가는 열왕기서에서 아합을 극도로 나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시돈의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함으로써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이방문물을 무분별히 수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합왕과 이세벨이 신명기 사가에 의해 왜 그토록 지탄을 받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몸말
1. 두로 출신 이세벨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특정한 왕국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리아-레바논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였던 도시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북쪽해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일컫는 그리스어식 표현이었다.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B. C 1200년경에 페니키아와 국제 무역을 했던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는 ‘페니키아’와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다. 결국 페니키아는 인종 지리적 폐쇄성 언어 문화 종교와 같은 특정 민족을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광범위한 영토의 지리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많은 요소들을 가나안 민족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대표적인 도시 두로(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 언급되고 있다. 두로는 시돈에서 남쪽으로 40km에 위치한 도시국가였다. 이 도시 국가의 기원 시기와 전성기에 대한 의문은 체계적인 고고학에 기초한 발굴 작업과 역사 문헌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먼저 두로의 기원 시기는 B. C. 3000년경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B. C. 5C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시대보다 2300년 이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두로를 여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Herodotos, 「역사(상)」, 박광순 역(서울 : 범우사, 1996), 23-24, 183-184.
, 전성기는 철기 시대에 두 차례 구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히람Ⅰ세의 통치시기(B.C. 969-936)였다. 이 시기는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을 위협했던 해양민족들 중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된 시기이자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바다의 패권을 다시 차지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페니키아의 문화와 경제,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블레셋’을 제거하고 두로의 해상 무역을 보장한 다윗은 그 대가로 자신의 성을 건축하기 위한 백향목과 그 외의 자재를 받게 된다(삼하 5:11). 이러한 관계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공식적인 계약체결로 결실을 맺는다.
두 번째 황금 시기(B. C. 880-850)를 이끈 인물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시돈의 왕(왕상 16:31)이라는 칭호와 그에 의해서 개척된 두 개의 식민도시(Botrys, Auza), 그리고 두로의 주신(主神)이었던 바알-멜카트(Baal-Melqart) 문제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바알 - 메카르트가 동일한 신인지, 또한 ’이세벨이 장려하고 섬기고자 했던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가?’하는 것이다. 비록 바알과 멜카르트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빈약할 지라도,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은 가나안의 폭풍우의 신이었던 바알과 동일한 신으로 생각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은 구름, 번개, 그리고 비를 가져오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가 시돈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리고 아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때부터 시돈은 산헤립에 의해서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되기까지(B. C. 710년) 두로
----------------------------------------------
5
1) 이세벨의 바알 숭배
-----------------------------------------
5
2) 바알종교 공식화 움직임
-------------------------------------
6
Ⅲ. 나가는 말
--------------------------------------------------
8
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에는 왕국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아합이 두로 출신의 여인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 하는 등 왕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명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매우 부당하게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였다는 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사가가 특별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다. 아합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6:29에서 열왕기하 10:31에 이르는 방대한 부분에 걸쳐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히 촉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 혁혁한 공헌을 남긴 왕이다.
사실 두 왕국 중 북 왕국이 앗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지만 남 유다보다 결코 나약한 나라는 아니었다. 비록 성서 기자가 ‘유다’가 보다 강대국이며 북 이스라엘은 한갓 떨어져 나간 일부 조각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영토의 크기, 지리적 위치, 군사력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열왕기하 14:8-14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열왕기하 14:12절 -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등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주도적 왕국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단순히 지파 수에서도 10:2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이집트-시리아 지역에 이르는 국제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효용성도 남 왕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언제나 야훼종교 특히 예루살렘 제의 중심으로 평가하는 신명기 사가는 열왕기서에서 아합을 극도로 나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시돈의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함으로써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이방문물을 무분별히 수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합왕과 이세벨이 신명기 사가에 의해 왜 그토록 지탄을 받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몸말
1. 두로 출신 이세벨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특정한 왕국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리아-레바논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였던 도시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북쪽해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일컫는 그리스어식 표현이었다.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B. C 1200년경에 페니키아와 국제 무역을 했던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는 ‘페니키아’와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다. 결국 페니키아는 인종 지리적 폐쇄성 언어 문화 종교와 같은 특정 민족을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광범위한 영토의 지리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많은 요소들을 가나안 민족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대표적인 도시 두로(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 언급되고 있다. 두로는 시돈에서 남쪽으로 40km에 위치한 도시국가였다. 이 도시 국가의 기원 시기와 전성기에 대한 의문은 체계적인 고고학에 기초한 발굴 작업과 역사 문헌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먼저 두로의 기원 시기는 B. C. 3000년경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B. C. 5C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시대보다 2300년 이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두로를 여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Herodotos, 「역사(상)」, 박광순 역(서울 : 범우사, 1996), 23-24, 183-184.
, 전성기는 철기 시대에 두 차례 구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히람Ⅰ세의 통치시기(B.C. 969-936)였다. 이 시기는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을 위협했던 해양민족들 중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된 시기이자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바다의 패권을 다시 차지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페니키아의 문화와 경제,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블레셋’을 제거하고 두로의 해상 무역을 보장한 다윗은 그 대가로 자신의 성을 건축하기 위한 백향목과 그 외의 자재를 받게 된다(삼하 5:11). 이러한 관계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공식적인 계약체결로 결실을 맺는다.
두 번째 황금 시기(B. C. 880-850)를 이끈 인물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시돈의 왕(왕상 16:31)이라는 칭호와 그에 의해서 개척된 두 개의 식민도시(Botrys, Auza), 그리고 두로의 주신(主神)이었던 바알-멜카트(Baal-Melqart) 문제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바알 - 메카르트가 동일한 신인지, 또한 ’이세벨이 장려하고 섬기고자 했던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가?’하는 것이다. 비록 바알과 멜카르트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빈약할 지라도,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은 가나안의 폭풍우의 신이었던 바알과 동일한 신으로 생각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은 구름, 번개, 그리고 비를 가져오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가 시돈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리고 아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때부터 시돈은 산헤립에 의해서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되기까지(B. C. 710년) 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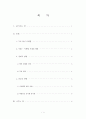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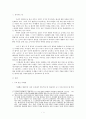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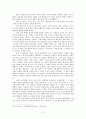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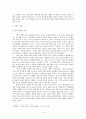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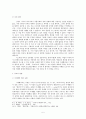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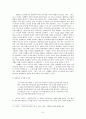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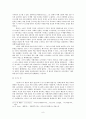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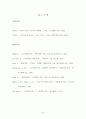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