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중간고사 범위
1.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차자표기법)
2. 한글 표기법의 변천
3. 자모 순서와 이름의 변천
4.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5. 한글 맞춤법의 원리
6. '어법에 맞도록' 규정의 원리
7. '어법에 맞도록' 표기의 실제
8. 두음법칙
9. 모음조화
10. 불규칙 용언
11. 사이시옷
- 기말고사 범위
1. 띄어쓰기
2. 표준어
3. 표준 발음법
4. 외래어 표기법
5.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어문규범 자가 평가지
1. 사이시옷
2. 표준어 규정
3. 표준 발음법
4. 외래어 표기법
5. 로마자 표기법
1.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차자표기법)
2. 한글 표기법의 변천
3. 자모 순서와 이름의 변천
4.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5. 한글 맞춤법의 원리
6. '어법에 맞도록' 규정의 원리
7. '어법에 맞도록' 표기의 실제
8. 두음법칙
9. 모음조화
10. 불규칙 용언
11. 사이시옷
- 기말고사 범위
1. 띄어쓰기
2. 표준어
3. 표준 발음법
4. 외래어 표기법
5.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어문규범 자가 평가지
1. 사이시옷
2. 표준어 규정
3. 표준 발음법
4. 외래어 표기법
5. 로마자 표기법
본문내용
- 한국어어문규범 중간고사 범위
●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 (차자표기법)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의 접촉을 통하여 한자를 받아들였고 우리말을 적는 데 이 문자를 사용해왔다.
우리말을 한자로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말을 중국어로 변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말 그대로를 한자를 빌려 적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지만 글로는 중국어 문어인 한문으로 적는, 이러한 기형적인 이중 언어생활은 한글이 창제된 훨씬 이후인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언문이치, 언문불일치’라고도 했다.
후자의 경우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한자 차용 표기법’, ‘차자 표기법’이라고 했다.
차자 표기 방식으로 알려진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두, 구결, 향찰’이다. 이두는 우리말 배열에 맞게 한자를 재배열한 것이고, 구결은 중국어 어순에 조사, 어미등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삽입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두의 경우 문법적 요소를 제외하면 한문 문장으로 복원되지 않는 반면 구결문의 경우 구결을 제외하면 한문 원문에 전혀 변형을 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두와 구결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
향찰은 향가의 표기에 사용된 차자 표기법이다. 향찰 표기의 기본 원리는 우리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글 표기법의 변천
: 국문연구의정안(1909)-언문철자법(1930)-한글마춤법통일안(1933)
국어 표기법의 변천의 배경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당시인 15세기에서 19세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약 4세기 동안이나 문자 생활의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 후, 이른바 운양호 사건에 의한 강화도조약이후, 부산, 원산, 인천 개항 이후 자각을 통한 한글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는 ‘언문’이라 하여 천대받던 한글이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인 ‘국문’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을 말한다.
국어 표기법의 변천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문 연구 의정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으나, 현대국어 표기법의 효시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표의주의를 표방했다. 1907년에서 2년이 지난 1909년에 국문 연구 의정안을 최종 통일안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 「국문 연구 의정안」은 이듬해의 일제의 국권 침탈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국권이 상실되고 난 후인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문연구소 통일안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표음주의를 표방한다. 그리고 그 뒤인 1921년 3월에 이 철자법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고, 1930년 2월에 「언문 철자법」이란 이름으로 개정·공포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이 공포되었다. 표의주의를 표방하고,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제정된 이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 등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겪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은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 맞춤법」이다.
● 자모 순서와 이름의 변천
현행 한글 자모, 곧 한글 낱글자의 수효는 자음 글자 14자, 모음 글자 10자, 도합 24자이다. 창제 당시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도합 28자였으나, 그 뒤로 여린히읗, 반치음, 옛이응, 아래아가 쓰이지 않게 되어 현재 24자가 된 것이다.
한글 자모의 수효뿐만 아니라 순서와 이름도 시대에 따라 달랐다. 세종 28년 한글이 세상에 반포될 때만 하더라도 글자의 배열 순서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
훈민정음에서의 초성은 당시 중국 음운학의 이론에 따라 아음 ㄱ,ㅋ,옛이응, 설음 ㄷ,ㅌ,ㄴ 순음 ㅂ,ㅍ,ㅁ 치음 ㅈ,ㅊ,ㅅ 후음 여린히읗, ㅎ,ㅇ 반설음 ㄹ, 반치음 의 순서로 배열되고,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 ·, ㅡ, ㅣ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 조합에 따라 만들어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오면 그 순서가 바뀌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순서와 상당히 비슷해진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창제 당시의 28자에서 여린히읗이 빠진 27자를 벌여 놓았는데, 그 순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는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글자와 초성에만 쓰는 글자를 나누어서 익히도록 한 결과이다.
또한 각 한글 자모의 양 옆에는 해당 자모의 음가를 설명해 주는 한자가 달려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역, 디귿, 시옷은 다른 글자들의 명칭과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훈몽자회 편찬 당시에 ‘윽,
●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 (차자표기법)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의 접촉을 통하여 한자를 받아들였고 우리말을 적는 데 이 문자를 사용해왔다.
우리말을 한자로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말을 중국어로 변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말 그대로를 한자를 빌려 적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지만 글로는 중국어 문어인 한문으로 적는, 이러한 기형적인 이중 언어생활은 한글이 창제된 훨씬 이후인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언문이치, 언문불일치’라고도 했다.
후자의 경우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한자 차용 표기법’, ‘차자 표기법’이라고 했다.
차자 표기 방식으로 알려진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두, 구결, 향찰’이다. 이두는 우리말 배열에 맞게 한자를 재배열한 것이고, 구결은 중국어 어순에 조사, 어미등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삽입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두의 경우 문법적 요소를 제외하면 한문 문장으로 복원되지 않는 반면 구결문의 경우 구결을 제외하면 한문 원문에 전혀 변형을 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두와 구결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
향찰은 향가의 표기에 사용된 차자 표기법이다. 향찰 표기의 기본 원리는 우리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글 표기법의 변천
: 국문연구의정안(1909)-언문철자법(1930)-한글마춤법통일안(1933)
국어 표기법의 변천의 배경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당시인 15세기에서 19세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약 4세기 동안이나 문자 생활의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 후, 이른바 운양호 사건에 의한 강화도조약이후, 부산, 원산, 인천 개항 이후 자각을 통한 한글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는 ‘언문’이라 하여 천대받던 한글이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인 ‘국문’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을 말한다.
국어 표기법의 변천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문 연구 의정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으나, 현대국어 표기법의 효시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표의주의를 표방했다. 1907년에서 2년이 지난 1909년에 국문 연구 의정안을 최종 통일안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 「국문 연구 의정안」은 이듬해의 일제의 국권 침탈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국권이 상실되고 난 후인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문연구소 통일안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표음주의를 표방한다. 그리고 그 뒤인 1921년 3월에 이 철자법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고, 1930년 2월에 「언문 철자법」이란 이름으로 개정·공포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이 공포되었다. 표의주의를 표방하고,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제정된 이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 등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겪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은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 맞춤법」이다.
● 자모 순서와 이름의 변천
현행 한글 자모, 곧 한글 낱글자의 수효는 자음 글자 14자, 모음 글자 10자, 도합 24자이다. 창제 당시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도합 28자였으나, 그 뒤로 여린히읗, 반치음, 옛이응, 아래아가 쓰이지 않게 되어 현재 24자가 된 것이다.
한글 자모의 수효뿐만 아니라 순서와 이름도 시대에 따라 달랐다. 세종 28년 한글이 세상에 반포될 때만 하더라도 글자의 배열 순서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
훈민정음에서의 초성은 당시 중국 음운학의 이론에 따라 아음 ㄱ,ㅋ,옛이응, 설음 ㄷ,ㅌ,ㄴ 순음 ㅂ,ㅍ,ㅁ 치음 ㅈ,ㅊ,ㅅ 후음 여린히읗, ㅎ,ㅇ 반설음 ㄹ, 반치음 의 순서로 배열되고,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 ·, ㅡ, ㅣ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 조합에 따라 만들어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오면 그 순서가 바뀌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순서와 상당히 비슷해진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창제 당시의 28자에서 여린히읗이 빠진 27자를 벌여 놓았는데, 그 순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는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글자와 초성에만 쓰는 글자를 나누어서 익히도록 한 결과이다.
또한 각 한글 자모의 양 옆에는 해당 자모의 음가를 설명해 주는 한자가 달려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역, 디귿, 시옷은 다른 글자들의 명칭과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훈몽자회 편찬 당시에 ‘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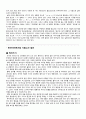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