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어원
2.2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탄생
2.3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재현과 지배
2.4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초월
Ⅲ. 결론
Ⅱ. 본론
2.1 어원
2.2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탄생
2.3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재현과 지배
2.4 죽음으로부터 탄생된 이미지: 초월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이라는 존재를 영속 시키고, 보이지 않는 권력과 명예라는 가치를 가시화 해두는 것, 이는 인간 스스로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임을 자각한 채 불멸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수단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종교적으로, 인간은 스스로가 영생을 욕심내는 피조물이라 설명되고 있는 만큼, 불멸에 대한 욕구만이 인간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필연적 사안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표출하는 출구가 되며, 이는 예술이 되었다.
Ⅲ. 결론
본문은 레지스 드브레 著 『이미지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미지image의 어원과 의미의 확장에대해 살펴보았다. 이미지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시대를 거듭할수록 복잡해진 의미관계를 아는 것은 그것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미지의 영문 표기는 image로, 영어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이미지의 어원을 알기 위해 라틴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의 어원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우상idole 과 에이돌론eidolon으로 인간의 죽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때문에 ‘이미지’의 의미 확장 과정은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이미지는 수수께끼투성이인 ‘죽음’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생기를 잃고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로 돌아가 버린 인간의 모습에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낸다. 개중에는 처참해진 육신의 모습을 덮기 위해,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인간의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이, 인간의 불멸에 대한 욕망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살아생전 영위하던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된 왕의 그림에 혼이 담겨 그 그림 자체가 곧 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던 이미지는, 죽음에 대한 필연을 인정하면서 생긴 간극에 ‘유희’가 자리 잡자 ‘예술’이라 표명하기에 이른다. 의미의 확장은 이전 의미를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의미를 새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예술을 표방하던 당시의 이미지는 여전히 인간의 불멸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Debray, Regis, 1940-____.\"이미지의 삶과 죽음\"VOL.- NO.- (1994)
Ⅲ. 결론
본문은 레지스 드브레 著 『이미지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미지image의 어원과 의미의 확장에대해 살펴보았다. 이미지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시대를 거듭할수록 복잡해진 의미관계를 아는 것은 그것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미지의 영문 표기는 image로, 영어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이미지의 어원을 알기 위해 라틴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의 어원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우상idole 과 에이돌론eidolon으로 인간의 죽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때문에 ‘이미지’의 의미 확장 과정은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이미지는 수수께끼투성이인 ‘죽음’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생기를 잃고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로 돌아가 버린 인간의 모습에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낸다. 개중에는 처참해진 육신의 모습을 덮기 위해,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인간의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이, 인간의 불멸에 대한 욕망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살아생전 영위하던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된 왕의 그림에 혼이 담겨 그 그림 자체가 곧 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던 이미지는, 죽음에 대한 필연을 인정하면서 생긴 간극에 ‘유희’가 자리 잡자 ‘예술’이라 표명하기에 이른다. 의미의 확장은 이전 의미를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의미를 새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예술을 표방하던 당시의 이미지는 여전히 인간의 불멸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Debray, Regis, 1940-____.\"이미지의 삶과 죽음\"VOL.- NO.-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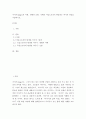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