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정이유
2. 이괄의 난
1) 배경
2) 전개 및 결과
3. 이괄의 난이 한국사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
4. 이괄의 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이괄의 난
1) 배경
2) 전개 및 결과
3. 이괄의 난이 한국사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
4. 이괄의 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문내용
, 북방방어에 보내야 할 군대를 왕실과 수도 방어에 치중시킨 것이다.
방어체계가 수도방어체제로 변화하자 당연히, 안 그래도 약화된 북방군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내렸고 병자호란 당시에는 후방을 공격할만한 병력조차 되지 못했다.
4. 이괄의 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괄이 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최고 강병이라 여겨지던 북방군이 쉽사리 궤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유능한 지휘관과 맹장이 살아서 조선을 수호했을 것이다.
병자호란 때처럼 약화된 북방군을 무시하고 내려오는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게 내 생각이다. 북방군으로 인해 지체될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이 아닌 더 남쪽으로 피난갔을 것이며, 삼도의 근왕병과 북방군이 후금군을 포위했을 것이다.
당시 후금군의 숫자는 고작 4만 5천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북방군만 최소 3만 5천 ~ 4만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며 남방에서도 4만, 중앙에서도 1만 여명의 군대가 있었을 것이기에 장기전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후금에서는 장기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묘호란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받고 퇴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다소 밀리는 정도로 외교관계가 성립되게 되었을 것이며, 북벌론을 주장하며 정권, 군권을 유지했던 서인정권 역시 그토록 강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오래 버텨주기만 했어도 명나라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명나라의 멸망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괄의 난의 발발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역사적 사건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논문
박기훈,「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朝鮮時代史學報』제98호, 2021, pp.175~215
이준상,「17세기 초 이괄의 난 전후 조선의 대후금 방어체계 변화」,『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pp.1~68
이상훈,「인조대 이괄의 난과 안현전투」,『한국군사학논집』제61권 제1호, 2013, pp.59~82
2. 책
『承政院日記』, 54冊.
3. 인터넷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인조와 이경증의 대화 중 한명련에 대한 부분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
방어체계가 수도방어체제로 변화하자 당연히, 안 그래도 약화된 북방군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내렸고 병자호란 당시에는 후방을 공격할만한 병력조차 되지 못했다.
4. 이괄의 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괄이 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최고 강병이라 여겨지던 북방군이 쉽사리 궤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유능한 지휘관과 맹장이 살아서 조선을 수호했을 것이다.
병자호란 때처럼 약화된 북방군을 무시하고 내려오는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게 내 생각이다. 북방군으로 인해 지체될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이 아닌 더 남쪽으로 피난갔을 것이며, 삼도의 근왕병과 북방군이 후금군을 포위했을 것이다.
당시 후금군의 숫자는 고작 4만 5천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북방군만 최소 3만 5천 ~ 4만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며 남방에서도 4만, 중앙에서도 1만 여명의 군대가 있었을 것이기에 장기전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후금에서는 장기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묘호란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받고 퇴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다소 밀리는 정도로 외교관계가 성립되게 되었을 것이며, 북벌론을 주장하며 정권, 군권을 유지했던 서인정권 역시 그토록 강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오래 버텨주기만 했어도 명나라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명나라의 멸망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괄의 난의 발발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역사적 사건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논문
박기훈,「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朝鮮時代史學報』제98호, 2021, pp.175~215
이준상,「17세기 초 이괄의 난 전후 조선의 대후금 방어체계 변화」,『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pp.1~68
이상훈,「인조대 이괄의 난과 안현전투」,『한국군사학논집』제61권 제1호, 2013, pp.59~82
2. 책
『承政院日記』, 54冊.
3. 인터넷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인조와 이경증의 대화 중 한명련에 대한 부분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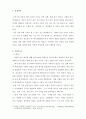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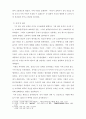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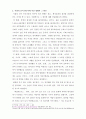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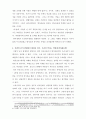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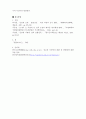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