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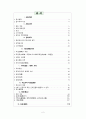 2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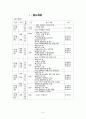 3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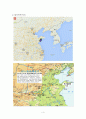 4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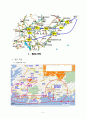 5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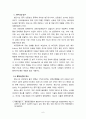 6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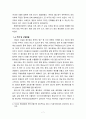 7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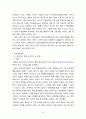 8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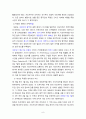 9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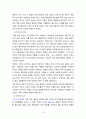 10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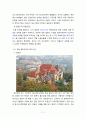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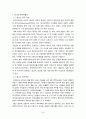 16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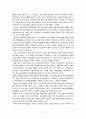 17
17
-
 18
18
-
 19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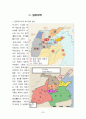 20
20
-
 21
21
-
 22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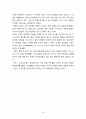 23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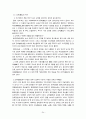 24
24
-
 25
25
-
 26
26
-
 27
27
-
 28
28
-
 29
29
-
 30
30
-
 31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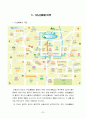 32
32
-
 33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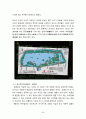 34
34
-
 35
35
-
 36
36
-
 37
37
-
 38
38
-
 39
39
-
 40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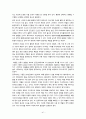 41
41
-
 42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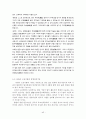 43
43
-
 44
44
-
 45
45
-
 46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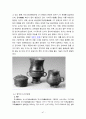 47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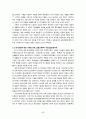 48
48
-
 49
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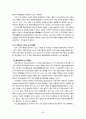 50
50
-
 51
51
-
 52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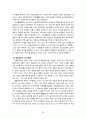 53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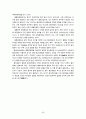 54
54
-
 55
55
-
 56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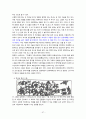 57
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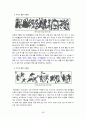 58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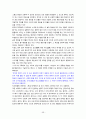 59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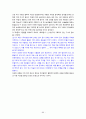 60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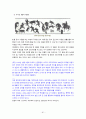 61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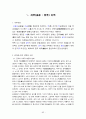 62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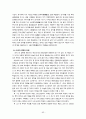 63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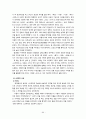 64
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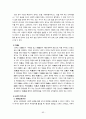 65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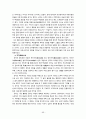 66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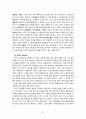 67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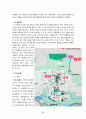 68
68
-
 69
69
-
 70
70
-
 71
71
-
 72
72
-
 73
73
-
 74
74
-
 75
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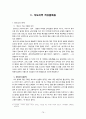 76
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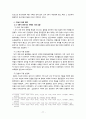 77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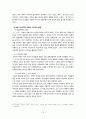 78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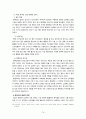 79
79
-
 80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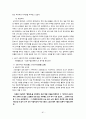 81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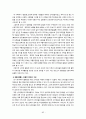 82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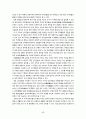 83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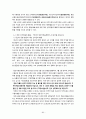 84
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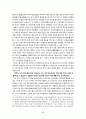 85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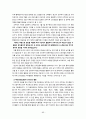 86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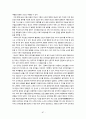 87
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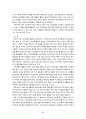 88
88
-
 89
89
-
 90
90
-
 91
91
-
 92
92
-
 93
93
-
 94
94
-
 95
95
-
 96
96
-
 97
97
-
 98
98
-
 99
99
-
 100
100
-
 101
101
-
 102
102
-
 103
103
-
 104
104
-
 105
105
-
 106
106
-
 107
107
-
 108
108
-
 109
109
-
 110
110
-
 111
111
-
 112
112
-
 113
113
-
 114
114
-
 115
115
-
 116
116
-
 117
117
-
 118
118
-
 119
119
-
 120
120
-
 121
121
-
 122
122
-
 123
123
-
 124
124
-
 125
125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목차
Ⅰ. 답사개관
1. 답사일정
2. 답사지역 지도
Ⅱ. 청도지역
1. 청도 개관
2. 독일 총독관저
3. 잔교
4. 소어산공원
5. 칭다오 맥주박물관
Ⅲ. 임치지역
1.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와 임치
2. 강태공사당
3. 고차박물관
Ⅳ. 지난[濟南]지역1. 지난[濟南]시 개관
2. 따밍후(大明湖 : 대명호) 와 빠오투취안(趵突泉 : 표돌천)
3. 신통사 사문탑
4. 용산문화 유적
5. 무씨사당(武氏祠堂)
Ⅴ. 곡부(曲阜 : 취푸) 지역
1. 곡부개관
2. 공자(孔子)의 생애와 사상
3. 공묘(孔廟)
4. 공부(孔府)
5. 공림(孔琳)
Ⅵ. 석도지역 적산법화원
1. 장보고의 생애
2. 9세기 산동지역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과 그 성격
3. 적산법화원
Ⅶ. 태산(泰山)
1. 태산 개요
2. 봉선(封禪)의식
3. 벽하사(碧霞祠), 청제궁(靑帝宮), 공자묘(孔子廟)
4. 대묘(岱廟)
Ⅷ. 도교(道敎)
1. 답사일정
2. 답사지역 지도
Ⅱ. 청도지역
1. 청도 개관
2. 독일 총독관저
3. 잔교
4. 소어산공원
5. 칭다오 맥주박물관
Ⅲ. 임치지역
1.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와 임치
2. 강태공사당
3. 고차박물관
Ⅳ. 지난[濟南]지역1. 지난[濟南]시 개관
2. 따밍후(大明湖 : 대명호) 와 빠오투취안(趵突泉 : 표돌천)
3. 신통사 사문탑
4. 용산문화 유적
5. 무씨사당(武氏祠堂)
Ⅴ. 곡부(曲阜 : 취푸) 지역
1. 곡부개관
2. 공자(孔子)의 생애와 사상
3. 공묘(孔廟)
4. 공부(孔府)
5. 공림(孔琳)
Ⅵ. 석도지역 적산법화원
1. 장보고의 생애
2. 9세기 산동지역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과 그 성격
3. 적산법화원
Ⅶ. 태산(泰山)
1. 태산 개요
2. 봉선(封禪)의식
3. 벽하사(碧霞祠), 청제궁(靑帝宮), 공자묘(孔子廟)
4. 대묘(岱廟)
Ⅷ. 도교(道敎)
본문내용
地神)에는 한나라 때부터 이사(里社) · 촌락수호신의 면(面:; 後世, 福德正神의 이름이 됨)과 이사민(里社民)의 관리 · 감찰신의 면이 병존했다. 후자는 그 토지민의 명계(冥界)를 관장하는 신이 되기도 하고, 명계신 태산(太山)의 하료(下僚)가 되었다.
5. 도교의 의식과 수행
5-1. 의식
도교의 의식으로 무술(巫術)과 재초, 주문, 부록을 들 수 있다. 무술은 점복(占卜)과 기우(祈雨), 구역(驅疫), 원몽(圓夢) 따위를 포함한 방대하고 복잡한 의식이다. 번잡한 제사와 가무, 저주 등을 포괄하는 무술의 토대는 ‘사람과 신의 상호 결합’이다. 무술은 신의 힘을 빌려 현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노력의 과정에서 신과 교통(交通)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을 선발하게 되었으니 이들이 무격(巫覡)이라 불리는 이들이다. 사람들은 신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데 신에게 존경과 제물(祭物)을 바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다.
재초(齋醮)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하는 무격의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재’는 오두미도에서 병자(病者)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하게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식화된 것이다. 신에게 기도드리기에 앞서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재계 의식 역시 이와 같이 고착화되었다. ‘초’는 주로 도사들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천지의 신을 대신하여 신탁을 전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초’의 시초이다.
주문(呪文)은 사악한 잡귀나 잡신을 쫓아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의 수단이다. 주문을 사용한 까닭은 귀신에게도 인간과 같이 약점이나 금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귀신의 약점이나 금기를 알면 신의 힘을 빌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부록(符)은 특별한 문자나 물건으로 신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부’로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 수 있다. 고대 사람들은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귀신은 복숭아나무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복숭아나무 가지에 복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말을 써넣는다는 기록이 있다. ‘록’은 주문이나 신에게 갈구하는 말을 적은 것이다. 부록은 신분별로 규정에 따라 소지할 수 있었다. 왕, 제후, 백성이 차는 부록이 모두 달랐다. 또한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 불에 태우거나, 태운 가루를 물에 타 마시거나, 땅에 파묻거나,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5-2. 도교의 수행방법
도교의 대표적인 수행방법으로 건신술(建身術)과 연단술(煉丹術)이 있다. 이는 무술(巫術)과 의술(醫術)이 동일시되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이것은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도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신술은 원기(元氣)를 보양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의 동요나 욕구의 충동, 피로 등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론이다.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유순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도들은 또한 섭생(攝生)에 관해서도 기를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던 고기요리와 매운 음식을 꺼렸다.
건신술은 소극적인 감정 조절이나 섭생에서 그치지 않고 토납(吐納)이나 체조를 행하여 기의 순환을 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방법은 나중에 신비주의가 가미되어 일종의 술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연단술은 광물과 금속, 약물 등을 제련한 후 섭취하여 몸을 건강히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금과 단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성상 신선의 장생불사와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는 “금의 성질은 썩지 않으니 .. 그것을 먹으면 장생불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단사(丹砂)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이다. 단사는 유명한 한식산(漢食散)의 주재료로 활용되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보면 한식산은 위나라 때 하안(何晏)이 효능을 체험한 후로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한식산은 한대(漢代)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위진 시대 이후 비로소 연단의 풍습이 생겨나면서 유행하게 된 것이다.
한식산은 수은, 비소, 납, 주석 등 인체에 중독성을 일으키는 위험한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한식산을 복용하고 나면 부작용으로 가슴과 배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발작을 일으켜 기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사람들이 한식산을 복용한 이유는 한식산이 정력 증강에 효력이 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식산은 기분을 좋게 하고 흥분을 느끼는 약효가 있어 이 믿음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식산은 재료의 값이 비싸고 복용법이 복잡하여 부유한 사람들만 복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한식산 복용 후의 증상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약을 복용할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조차 약을 먹은 듯 흉내를 내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중국 중세는 혼란의 시기였다. 통일제국의 치세보다는 여기저기 찢어져 천하를 서로 다툰 시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천하를 쥐어 보겠다고 등장한 영웅호걸에 못지않게 여기저기서 뭇사람의 마음을 잡아 보겠다고 등장한 종교와 그 지도자 역시 많았다. 이들 중 가장 중국에 가까웠던 종교가 도교였다. 도교는 근세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그러들었지만 중국의 민중 사이에 면면히 전해오는 전통 사이에 도교의 영향이 녹아든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도교는 정립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동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미개척지인 도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저술, 정리 사업보다는 몇 권의 저술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도교는 중국인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앞으로 도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5. 도교의 의식과 수행
5-1. 의식
도교의 의식으로 무술(巫術)과 재초, 주문, 부록을 들 수 있다. 무술은 점복(占卜)과 기우(祈雨), 구역(驅疫), 원몽(圓夢) 따위를 포함한 방대하고 복잡한 의식이다. 번잡한 제사와 가무, 저주 등을 포괄하는 무술의 토대는 ‘사람과 신의 상호 결합’이다. 무술은 신의 힘을 빌려 현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노력의 과정에서 신과 교통(交通)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을 선발하게 되었으니 이들이 무격(巫覡)이라 불리는 이들이다. 사람들은 신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데 신에게 존경과 제물(祭物)을 바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다.
재초(齋醮)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하는 무격의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재’는 오두미도에서 병자(病者)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하게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식화된 것이다. 신에게 기도드리기에 앞서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재계 의식 역시 이와 같이 고착화되었다. ‘초’는 주로 도사들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천지의 신을 대신하여 신탁을 전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초’의 시초이다.
주문(呪文)은 사악한 잡귀나 잡신을 쫓아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의 수단이다. 주문을 사용한 까닭은 귀신에게도 인간과 같이 약점이나 금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귀신의 약점이나 금기를 알면 신의 힘을 빌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부록(符)은 특별한 문자나 물건으로 신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부’로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 수 있다. 고대 사람들은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귀신은 복숭아나무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복숭아나무 가지에 복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말을 써넣는다는 기록이 있다. ‘록’은 주문이나 신에게 갈구하는 말을 적은 것이다. 부록은 신분별로 규정에 따라 소지할 수 있었다. 왕, 제후, 백성이 차는 부록이 모두 달랐다. 또한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 불에 태우거나, 태운 가루를 물에 타 마시거나, 땅에 파묻거나,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5-2. 도교의 수행방법
도교의 대표적인 수행방법으로 건신술(建身術)과 연단술(煉丹術)이 있다. 이는 무술(巫術)과 의술(醫術)이 동일시되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이것은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도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신술은 원기(元氣)를 보양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의 동요나 욕구의 충동, 피로 등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론이다.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유순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도들은 또한 섭생(攝生)에 관해서도 기를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던 고기요리와 매운 음식을 꺼렸다.
건신술은 소극적인 감정 조절이나 섭생에서 그치지 않고 토납(吐納)이나 체조를 행하여 기의 순환을 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방법은 나중에 신비주의가 가미되어 일종의 술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연단술은 광물과 금속, 약물 등을 제련한 후 섭취하여 몸을 건강히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금과 단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성상 신선의 장생불사와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는 “금의 성질은 썩지 않으니 .. 그것을 먹으면 장생불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단사(丹砂)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이다. 단사는 유명한 한식산(漢食散)의 주재료로 활용되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보면 한식산은 위나라 때 하안(何晏)이 효능을 체험한 후로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한식산은 한대(漢代)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위진 시대 이후 비로소 연단의 풍습이 생겨나면서 유행하게 된 것이다.
한식산은 수은, 비소, 납, 주석 등 인체에 중독성을 일으키는 위험한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한식산을 복용하고 나면 부작용으로 가슴과 배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발작을 일으켜 기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사람들이 한식산을 복용한 이유는 한식산이 정력 증강에 효력이 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식산은 기분을 좋게 하고 흥분을 느끼는 약효가 있어 이 믿음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식산은 재료의 값이 비싸고 복용법이 복잡하여 부유한 사람들만 복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한식산 복용 후의 증상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약을 복용할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조차 약을 먹은 듯 흉내를 내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중국 중세는 혼란의 시기였다. 통일제국의 치세보다는 여기저기 찢어져 천하를 서로 다툰 시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천하를 쥐어 보겠다고 등장한 영웅호걸에 못지않게 여기저기서 뭇사람의 마음을 잡아 보겠다고 등장한 종교와 그 지도자 역시 많았다. 이들 중 가장 중국에 가까웠던 종교가 도교였다. 도교는 근세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그러들었지만 중국의 민중 사이에 면면히 전해오는 전통 사이에 도교의 영향이 녹아든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도교는 정립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동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미개척지인 도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저술, 정리 사업보다는 몇 권의 저술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도교는 중국인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앞으로 도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