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목차
Ⅰ. 담양과 가사문학
담양개관 · 가사문화권 ·
가사의 명칭과 개념 · 가사문학의 기원
Ⅱ. 담양의 정자
송순의 면앙정과 문학세계 · 정철의 송강정과 식영정
명옥헌원림 · 환벽당 · 취가정 · 독수당
Ⅲ. 소쇄원
개관 · 소쇄원의 구조 · 소쇄원48영
담양개관 · 가사문화권 ·
가사의 명칭과 개념 · 가사문학의 기원
Ⅱ. 담양의 정자
송순의 면앙정과 문학세계 · 정철의 송강정과 식영정
명옥헌원림 · 환벽당 · 취가정 · 독수당
Ⅲ. 소쇄원
개관 · 소쇄원의 구조 · 소쇄원48영
본문내용
이 바로 산야로다.
<광풍각 옆의 암반에 있었던 석가산>
- 광풍각 아래 물가에 생긴 조그만 가산 (假山)에 작은 화초와 나무를 심어 산처 럼 꾸민 것을 노래한 시
- 가산초수는 현재 없고 소쇄원도에 있는 석가산(石假山)의 경치에 대한 노래임.
소쇄원도를 양쪽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교차하는 정 중앙에 석가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산 안에 정원이 있고 정원 안에 산이 있는 구성이다. 소쇄원의 정 중앙에 있는 석가산은 주변의 산하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축소하여 표현하면서도 대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인공적 풍경인데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화로운 결합을 잘 보여 주는 고대의 조경법에 유래한 양식이다.
8) 제24영 倚睡塊石(의수계석) 회나무 옆의 바위에 기대어 졸다가
自 掃 槐 邊 石(자소괴변석) 몸소 회나무 옆의 바위를 쓸어내고
無 人 獨 坐 時(무인독좌시)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서
睡 來 驚 起 立(수래경기립) 밀려오는 졸음 중에 문득 놀라 일어나니
恐 被 蟻 王 知(공피의왕지) 개미 왕께 알려질까 두렵네
이 시는 23영과 함께 제2단락의 결론 부분으로 12영까지인 제1단락보다 더욱 무르익은 선계의 감상을 노래했다. 제24영은 당나라 사람 이공좌가 지은 『남가기(南柯記)』의 일화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남가기(南柯記)』의 내용을 보면 「순우분은 광릉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집 남쪽에 오래된 회나무가 있었다. 분은 자기 생일에 실컷 취하여 그 회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괴안국에 이르러 남가 태수가 되었다. 20년을 봉직하며 장가를 들어 5남2녀를 낳았으며 영화와 영달을 마음껏 누렸으나, 나중에 적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고 공주도 세상을 떠나 자신도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 깨어보니 동자가 빗자루로 뜰을 쓸고 있고 해는 떨어지지 않고 술동이는 그대로 있었다. 회나무의 구멍을 찾아보니 남가군이라는 회나무 밑에 개미구멍이 있었으며, 꿈에서 본 왕이란 곧 의왕, 즉 개미왕을 나타내었다.」 후세 사람들이 꿈을 들어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한 것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9) 제25영 槽潭放浴(조담방욕) 조담에 멱 감으며
潭 淸 深 見 底(담청심견저) 조담의 물 맑아 깊어도 바닥이 보이는데
浴 罷 碧 (욕파벽인린) 멱 감고 나도 여전히 푸르고 푸르구나.
不 信 人 間 世(불신인간세)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곳을 믿지 않지만
炎 程 脚 沒 塵(염정각몰진) 뜨거워진 바위에 오르니 발에 티끌 하나 없구나.
원림 전체 구조에서 보면 하류의 두 지당과 함께 조담은 천연 지당이다. 그런데 하류의 두 지당이 정적이라면 조담은 동적이다. 개천의 동적인 흐름에 따라 배치한 두 개의 지당은 정적인 구조물로서 동적인 개천과 서로 잘 어우러져 원림 전체에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전체 개천의 구조에서 보면 이 세 곳의 물을 담는 부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개울 물 소리를 끊어주는 음절 역할을 하면서 개천에 일종의 리듬을 준다. 오곡류의 힘찬 물살이 조담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폭포로 내려가 떨어진 후, 소당에 들었다가 다시 물방아로, 그리고 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강약의 리듬감이 정원 전체 구조에 삽입되어 악흥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10) 제37영 桐臺夏陰(동대하음) 오동나무에 드리워진 여름 그늘
巖 崖 承 老 幹(암애승노간) 바위 벼랑에 늙은 가지 드리웠고
雨 露 長 淸 陰(우로장청음) 비와 이슬에 자라 맑은 그늘 쳤으니
舜 日 明 千 古(순일명천고) 순임금 태평시절 태양은 천고에 밝고
南 風 吹 至 今(남풍음지금) 남쪽 바람 불어 오늘에 이르네
제 4단락의 첫 시다. 제 1단락에서는 도에 나아가는 실상을 노래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도에 무르익어 도취의 즐김을 노래했다. 이 무르익은 선경은 요순시대를 말하는 이상세계다. 순일과 남풍은 \'도\'가 실천되던 이 시대는 임금님의 은덕임을 말하고 있다.
오동나무는 긴 담의 모서리에 심은 동백과 어울려 여름과 겨울의 대조를 이룬다. 즉 양인 오동나무와 음인 동백나무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 음양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예천의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 새이다. 즉 봉황이 앉아 쉬는 나무인 오동나무를 심어 손님을 귀하게 맞이한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11) 제40영 隔澗芙(격간부거) 개울 건너 핀 연꽃
淨 植 非 凡 卉(정식비범훼) 맑은 물에 뿌리내린 비범한 화초
閑 姿 可 遠 觀(한자가원관) 고운 자태 멀리서도 볼 만하네.
春 風 橫 度 壑(춘풍횡도학) 향긋한 바람이 계곡을 가로질러
入 室 勝 芝 蘭(인실승지란) 방에 스며드니 지초와 난보다 더 좋네.
유영정객은 계곡을 두고 격리된 광풍각과 소쇄정을 연계시키기 위한 시이다. 소쇄원도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시에 따르면 향기를 통해 서로 연계된다. 이 시로 미루어 소쇄정 아래 조그만 방지에 연을 심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연꽃은 주무숙이 『애련설』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기어도 요사스럽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비의 바른 모습으로 양산보를 연꽃에 비유한 것이다.
12) 제43영 滴雨芭蕉(적우파초) 물 방울은 파초를 적시고
錯 落 投 銀 箭(착락투은전) 빗방울이 은빛 화살같이 쏟아지니
低 昻 舞 翠 (저앙무취초) 밑에는 푸른 명주실 춤추듯 너울거리네.
不 比 思 鄕 聽(불비사향청) 향수 어린 고향 소리엔 비할 수 없어
還 憐 破 寂 寥(환린파적료) 적막 고요를 깨니 연민으로 돌아오네.
이 시는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조경 요소로 잡아들이는 시경으로 빗소리와 더불어 빗방울이 파초를 때리는 느낌을 잘 표현한 시이다. 자연을 담아 원림을 만들고 그 원림 안에 다시 자연이 빚어내는 음악과 춤을 집어넣는 이 시경은 자연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예술임을 일깨워 준다. 마지막 구절에 연민으로 돌아온다고 노래한 것은 파초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파초는 본래 우리나라의 초목이 아니므로 고향을 떠나온 식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연명처럼 고향에 묻힌 심정을 절절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풍각 옆의 암반에 있었던 석가산>
- 광풍각 아래 물가에 생긴 조그만 가산 (假山)에 작은 화초와 나무를 심어 산처 럼 꾸민 것을 노래한 시
- 가산초수는 현재 없고 소쇄원도에 있는 석가산(石假山)의 경치에 대한 노래임.
소쇄원도를 양쪽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교차하는 정 중앙에 석가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산 안에 정원이 있고 정원 안에 산이 있는 구성이다. 소쇄원의 정 중앙에 있는 석가산은 주변의 산하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축소하여 표현하면서도 대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인공적 풍경인데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화로운 결합을 잘 보여 주는 고대의 조경법에 유래한 양식이다.
8) 제24영 倚睡塊石(의수계석) 회나무 옆의 바위에 기대어 졸다가
自 掃 槐 邊 石(자소괴변석) 몸소 회나무 옆의 바위를 쓸어내고
無 人 獨 坐 時(무인독좌시)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서
睡 來 驚 起 立(수래경기립) 밀려오는 졸음 중에 문득 놀라 일어나니
恐 被 蟻 王 知(공피의왕지) 개미 왕께 알려질까 두렵네
이 시는 23영과 함께 제2단락의 결론 부분으로 12영까지인 제1단락보다 더욱 무르익은 선계의 감상을 노래했다. 제24영은 당나라 사람 이공좌가 지은 『남가기(南柯記)』의 일화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남가기(南柯記)』의 내용을 보면 「순우분은 광릉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집 남쪽에 오래된 회나무가 있었다. 분은 자기 생일에 실컷 취하여 그 회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괴안국에 이르러 남가 태수가 되었다. 20년을 봉직하며 장가를 들어 5남2녀를 낳았으며 영화와 영달을 마음껏 누렸으나, 나중에 적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고 공주도 세상을 떠나 자신도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 깨어보니 동자가 빗자루로 뜰을 쓸고 있고 해는 떨어지지 않고 술동이는 그대로 있었다. 회나무의 구멍을 찾아보니 남가군이라는 회나무 밑에 개미구멍이 있었으며, 꿈에서 본 왕이란 곧 의왕, 즉 개미왕을 나타내었다.」 후세 사람들이 꿈을 들어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한 것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9) 제25영 槽潭放浴(조담방욕) 조담에 멱 감으며
潭 淸 深 見 底(담청심견저) 조담의 물 맑아 깊어도 바닥이 보이는데
浴 罷 碧 (욕파벽인린) 멱 감고 나도 여전히 푸르고 푸르구나.
不 信 人 間 世(불신인간세)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곳을 믿지 않지만
炎 程 脚 沒 塵(염정각몰진) 뜨거워진 바위에 오르니 발에 티끌 하나 없구나.
원림 전체 구조에서 보면 하류의 두 지당과 함께 조담은 천연 지당이다. 그런데 하류의 두 지당이 정적이라면 조담은 동적이다. 개천의 동적인 흐름에 따라 배치한 두 개의 지당은 정적인 구조물로서 동적인 개천과 서로 잘 어우러져 원림 전체에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전체 개천의 구조에서 보면 이 세 곳의 물을 담는 부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개울 물 소리를 끊어주는 음절 역할을 하면서 개천에 일종의 리듬을 준다. 오곡류의 힘찬 물살이 조담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폭포로 내려가 떨어진 후, 소당에 들었다가 다시 물방아로, 그리고 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강약의 리듬감이 정원 전체 구조에 삽입되어 악흥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10) 제37영 桐臺夏陰(동대하음) 오동나무에 드리워진 여름 그늘
巖 崖 承 老 幹(암애승노간) 바위 벼랑에 늙은 가지 드리웠고
雨 露 長 淸 陰(우로장청음) 비와 이슬에 자라 맑은 그늘 쳤으니
舜 日 明 千 古(순일명천고) 순임금 태평시절 태양은 천고에 밝고
南 風 吹 至 今(남풍음지금) 남쪽 바람 불어 오늘에 이르네
제 4단락의 첫 시다. 제 1단락에서는 도에 나아가는 실상을 노래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도에 무르익어 도취의 즐김을 노래했다. 이 무르익은 선경은 요순시대를 말하는 이상세계다. 순일과 남풍은 \'도\'가 실천되던 이 시대는 임금님의 은덕임을 말하고 있다.
오동나무는 긴 담의 모서리에 심은 동백과 어울려 여름과 겨울의 대조를 이룬다. 즉 양인 오동나무와 음인 동백나무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 음양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예천의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 새이다. 즉 봉황이 앉아 쉬는 나무인 오동나무를 심어 손님을 귀하게 맞이한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11) 제40영 隔澗芙(격간부거) 개울 건너 핀 연꽃
淨 植 非 凡 卉(정식비범훼) 맑은 물에 뿌리내린 비범한 화초
閑 姿 可 遠 觀(한자가원관) 고운 자태 멀리서도 볼 만하네.
春 風 橫 度 壑(춘풍횡도학) 향긋한 바람이 계곡을 가로질러
入 室 勝 芝 蘭(인실승지란) 방에 스며드니 지초와 난보다 더 좋네.
유영정객은 계곡을 두고 격리된 광풍각과 소쇄정을 연계시키기 위한 시이다. 소쇄원도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시에 따르면 향기를 통해 서로 연계된다. 이 시로 미루어 소쇄정 아래 조그만 방지에 연을 심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연꽃은 주무숙이 『애련설』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기어도 요사스럽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비의 바른 모습으로 양산보를 연꽃에 비유한 것이다.
12) 제43영 滴雨芭蕉(적우파초) 물 방울은 파초를 적시고
錯 落 投 銀 箭(착락투은전) 빗방울이 은빛 화살같이 쏟아지니
低 昻 舞 翠 (저앙무취초) 밑에는 푸른 명주실 춤추듯 너울거리네.
不 比 思 鄕 聽(불비사향청) 향수 어린 고향 소리엔 비할 수 없어
還 憐 破 寂 寥(환린파적료) 적막 고요를 깨니 연민으로 돌아오네.
이 시는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조경 요소로 잡아들이는 시경으로 빗소리와 더불어 빗방울이 파초를 때리는 느낌을 잘 표현한 시이다. 자연을 담아 원림을 만들고 그 원림 안에 다시 자연이 빚어내는 음악과 춤을 집어넣는 이 시경은 자연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예술임을 일깨워 준다. 마지막 구절에 연민으로 돌아온다고 노래한 것은 파초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파초는 본래 우리나라의 초목이 아니므로 고향을 떠나온 식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연명처럼 고향에 묻힌 심정을 절절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전라도답사기행문
전라도답사기행문 중국 문화유적답사 기행문
중국 문화유적답사 기행문 포항지역 고인돌과 산성터, 고분을 답사하고..
포항지역 고인돌과 산성터, 고분을 답사하고.. 전북지역주요 문화재 답사를 다녀와서
전북지역주요 문화재 답사를 다녀와서 경주의 문화유적지 분포와 특성
경주의 문화유적지 분포와 특성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의 정의와 분류,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의 필요성, 현장체험학습(현...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의 정의와 분류,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의 필요성, 현장체험학습(현... [만리장성][금성산성][부소산성][수원화성][가산산성][나성][왜성][성곽]만리장성, 금성산성,...
[만리장성][금성산성][부소산성][수원화성][가산산성][나성][왜성][성곽]만리장성, 금성산성,... [문화유적, 유적조사연구, 경산시, 삼척시, 강화도, 중국]문화유적과 유적조사연구, 문화유적...
[문화유적, 유적조사연구, 경산시, 삼척시, 강화도, 중국]문화유적과 유적조사연구, 문화유적... [담양][담양 문화재][담양 식생][담양 석기문화][담양 가사문화권][문화재][식생][석기문화][...
[담양][담양 문화재][담양 식생][담양 석기문화][담양 가사문화권][문화재][식생][석기문화][... 제주 지역 문화유적 답사 후기
제주 지역 문화유적 답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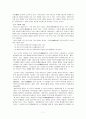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