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목차
Ⅰ. 계룡산(鷄龍山)과 굿당
Ⅱ. 신원사(新元寺)
Ⅲ. 갑사(甲寺)
Ⅳ. 오뉘탑[男妹塔]
Ⅴ. 상신리 · 하신리 장승과 솟대
Ⅵ. 학봉리 가마터와 분청사기
Ⅱ. 신원사(新元寺)
Ⅲ. 갑사(甲寺)
Ⅳ. 오뉘탑[男妹塔]
Ⅴ. 상신리 · 하신리 장승과 솟대
Ⅵ. 학봉리 가마터와 분청사기
본문내용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굿당의 효시이기도 한 ‘밤나무집 굿당’의 운영 방식이다. 당주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생계 수단으로 굿당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굿당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규모면에서 제일 큰 ‘대문사 굿당’의 운영 방식이다. 당주는 신앙과 관계없이 경제적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굿당은 그리 많지 않다. 세 번째의 대표적인 보기는 ‘보현사 굿당’의 운영 방식이다. 당주는 무속과 불교 양 쪽을 다 수용하여 굿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 점점 힘을 얻을 듯하다. 네 번째는 ‘백세암’의 운영 방식이다. 당주는 무속종교인으로 자처하며 굿당을 하나의 도량으로 보려고 한다.
4. 계룡산의 굿청
4-1. 천존단
천존은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통하여 힘을 미칠 수 있는 지존의 존재이다. 천존에게 올리는 설위설경과 굿거리는 흔한 것은 아니다. 설위설경의 위청에 대설경을 친다는 것은 사대 경문 즉 옥추경 · 옥갑경 · 천지팔양경 · 기문경을 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천존에게 올리는 설위설경이나 굿거리는 아주 나쁜 질병 등을 다스릴 때 쓰인다. 천존은 도교의 신격으로 원시천존 · 영보천존 · 도덕천존 등을 들지만, 옥추경에는 도덕천존만 등장한다. 천존탑의 현시 탑이 산신과 칠성이라고도 하고 칠성 대신 장군이라고도 하고 좌우가 다 장군이라고도 한다.
4-2. 허공 산신단
산신단 앞에 허공이란 관형어가 붙은 것은 산신각처럼 당에 모시지 못하고 자연에 모신 산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법사나 보살에 따라서는 석불 혹은 미륵이라고 하기도 한다. 허공 산신단은 일반적으로 굿당의 제일 위 쪽, 즉 산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 무속인들이 산신단에서 비는 것은 사업 · 우환 · 질병 등과 관련이 있다. 액운이 많은 사람은 큰 산을 오를 때 수수와 팥으로 밥을 지어 한 숟갈 정도의 분량으로 주먹밥을 12개 만들어 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좌우로 하나씩 던지며 올라가면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도 하다.
4-3. 용궁단
용궁단은 석간수 혹은 옹달샘이 가장 많이 모셔지는데,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수조로 덮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이나 옆에 단을 조성한다. 용왕은 천상이나 지상과 지하 어디에ㅔ나 상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신령에게 올리는 정화수에도 용왕은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용궁단에서 모시는 제수는 산신과 큰 차이가 없다.
4-4. 서낭단
서낭단은 나무 단독형, 나무와 원추형 돌무더기 탑의 복합형, 돌무더기 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개 굿당 입구에 위치하지만, ‘밤나무집 굿당’과 같은 경우는 굿당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 서낭수는 대개 오방색 끈을 묶어서 표시되고, 그 아래는 제단이 마련되어 정한수와 촛불로 모시게 된다. 아직도 시골 마을에 가면 서낭당이 있는 곳이 있다. 서낭신을 모신 곳으로 신앙적 공간이다. 서낭단은 한 지역의 수호신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앙 · 액 · 질병 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5. 굿청과 굿상
굿청이란 굿이 열리는 방을 말한다. 굿청에는 신당을 모시는 굿상이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굿상이라 함은 벽면에 신 그림이나 설위설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아래 방바닥에 보통 삼단으로, 혹은 이단으로 구성해 놓은 기물을 말한다. 굿상은 불단과 대비하여 새로 만든 용어이다. 굿상이란 용어를 쓰는 까닭은 무속신을 봉청하여 설경이란 종교 행위를 수행하는 무속인의 제단이기 때문이다. 무속인들은 불사의 요소가 포함된 신 그림이나 조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단과 같은 내용을 상징으로 하는 무단을 꾸미고 싶었을 것이다.
5. 굿청의 신 그림
5-1. 계룡산 신 그림과 강신무의 신령과의 비교
신령의 기능에서 볼 때에 높은 신령이든 낮은 신령이든 그 힘은 똑같은 것이라서 잡귀들 역시 높은 신 못지않게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관계한다고 강신무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신령이 등급이 없다는 견해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 천신이나 산신이나 성주신을 굿의 현장에 모시기 위해서는 조상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조상도 후망조상을 통하고, 그런 연후에 다기 후망조상이 선망조상을 통하고, 선망조상이 다시 산신이나 천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천신이 직접 강림하기도 하나 신장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상위의 신령을 모셔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신령에 신분상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분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주제가 다른 이야기이다. 계룡산 굿당에 걸려있는 신 그림은 원래의 계룡산에 모셔지던 신령들이 아니다. 말하자면 소위 선거리 굿판에서 온 신령들인 것이다. 신 그림의 신령들의 위계는 다른 신앙 체계 즉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면서 없어지고 그 기능만이 남아서 오늘날 전한다고 할 수 있다.
5-2. 신 그림의 해독
신 그림은 종교화로서 불교의 경전과 같은 무경(巫經)이다. 따라서 무교의 신 그림은 당대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 천연두와 눈병, 아들의 점지, 여행의 안전, 무당의 영험, 생업의 보호 등은 아주 구체적 예시를 들어 그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교해 수명장수 · 행운재복 · 길흉화복 등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개별 기능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 만큼 당대 사람들에게 절실한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신 그림의 도상에 나타난 신령이 입고 있는 복식과 소지하고 있는 서품 혹은 물품을 통해 신 그림을 읽을 수도 있다.
<설위설경(設位設經)은 설경(設經)이라고도 하는데 경청(經廳)
주위를 한지로 각종형상을 장엄하게 만들어 장식하고 경문을 독경하는 앉은굿 일체를 포함한다.>
6. 굿청과 설위설경(김경영 법사의 설위설경)
6-1위청(位廳) 만들기
<설경>
한 시절 전만 해도 병이 걸리는 걸 귀신의 작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병원균을 창을 든 귀신 모양으로 상상하였음.) 그귀신은 겁내는 게 많아, 창이나 칼 같은걸로 협박하면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그렇게 우환 있는 집에 가서 귀신
4. 계룡산의 굿청
4-1. 천존단
천존은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통하여 힘을 미칠 수 있는 지존의 존재이다. 천존에게 올리는 설위설경과 굿거리는 흔한 것은 아니다. 설위설경의 위청에 대설경을 친다는 것은 사대 경문 즉 옥추경 · 옥갑경 · 천지팔양경 · 기문경을 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천존에게 올리는 설위설경이나 굿거리는 아주 나쁜 질병 등을 다스릴 때 쓰인다. 천존은 도교의 신격으로 원시천존 · 영보천존 · 도덕천존 등을 들지만, 옥추경에는 도덕천존만 등장한다. 천존탑의 현시 탑이 산신과 칠성이라고도 하고 칠성 대신 장군이라고도 하고 좌우가 다 장군이라고도 한다.
4-2. 허공 산신단
산신단 앞에 허공이란 관형어가 붙은 것은 산신각처럼 당에 모시지 못하고 자연에 모신 산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법사나 보살에 따라서는 석불 혹은 미륵이라고 하기도 한다. 허공 산신단은 일반적으로 굿당의 제일 위 쪽, 즉 산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 무속인들이 산신단에서 비는 것은 사업 · 우환 · 질병 등과 관련이 있다. 액운이 많은 사람은 큰 산을 오를 때 수수와 팥으로 밥을 지어 한 숟갈 정도의 분량으로 주먹밥을 12개 만들어 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좌우로 하나씩 던지며 올라가면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도 하다.
4-3. 용궁단
용궁단은 석간수 혹은 옹달샘이 가장 많이 모셔지는데,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수조로 덮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이나 옆에 단을 조성한다. 용왕은 천상이나 지상과 지하 어디에ㅔ나 상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신령에게 올리는 정화수에도 용왕은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용궁단에서 모시는 제수는 산신과 큰 차이가 없다.
4-4. 서낭단
서낭단은 나무 단독형, 나무와 원추형 돌무더기 탑의 복합형, 돌무더기 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개 굿당 입구에 위치하지만, ‘밤나무집 굿당’과 같은 경우는 굿당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 서낭수는 대개 오방색 끈을 묶어서 표시되고, 그 아래는 제단이 마련되어 정한수와 촛불로 모시게 된다. 아직도 시골 마을에 가면 서낭당이 있는 곳이 있다. 서낭신을 모신 곳으로 신앙적 공간이다. 서낭단은 한 지역의 수호신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앙 · 액 · 질병 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5. 굿청과 굿상
굿청이란 굿이 열리는 방을 말한다. 굿청에는 신당을 모시는 굿상이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굿상이라 함은 벽면에 신 그림이나 설위설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아래 방바닥에 보통 삼단으로, 혹은 이단으로 구성해 놓은 기물을 말한다. 굿상은 불단과 대비하여 새로 만든 용어이다. 굿상이란 용어를 쓰는 까닭은 무속신을 봉청하여 설경이란 종교 행위를 수행하는 무속인의 제단이기 때문이다. 무속인들은 불사의 요소가 포함된 신 그림이나 조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단과 같은 내용을 상징으로 하는 무단을 꾸미고 싶었을 것이다.
5. 굿청의 신 그림
5-1. 계룡산 신 그림과 강신무의 신령과의 비교
신령의 기능에서 볼 때에 높은 신령이든 낮은 신령이든 그 힘은 똑같은 것이라서 잡귀들 역시 높은 신 못지않게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관계한다고 강신무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신령이 등급이 없다는 견해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 천신이나 산신이나 성주신을 굿의 현장에 모시기 위해서는 조상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조상도 후망조상을 통하고, 그런 연후에 다기 후망조상이 선망조상을 통하고, 선망조상이 다시 산신이나 천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천신이 직접 강림하기도 하나 신장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상위의 신령을 모셔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신령에 신분상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분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주제가 다른 이야기이다. 계룡산 굿당에 걸려있는 신 그림은 원래의 계룡산에 모셔지던 신령들이 아니다. 말하자면 소위 선거리 굿판에서 온 신령들인 것이다. 신 그림의 신령들의 위계는 다른 신앙 체계 즉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면서 없어지고 그 기능만이 남아서 오늘날 전한다고 할 수 있다.
5-2. 신 그림의 해독
신 그림은 종교화로서 불교의 경전과 같은 무경(巫經)이다. 따라서 무교의 신 그림은 당대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 천연두와 눈병, 아들의 점지, 여행의 안전, 무당의 영험, 생업의 보호 등은 아주 구체적 예시를 들어 그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교해 수명장수 · 행운재복 · 길흉화복 등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개별 기능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 만큼 당대 사람들에게 절실한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신 그림의 도상에 나타난 신령이 입고 있는 복식과 소지하고 있는 서품 혹은 물품을 통해 신 그림을 읽을 수도 있다.
<설위설경(設位設經)은 설경(設經)이라고도 하는데 경청(經廳)
주위를 한지로 각종형상을 장엄하게 만들어 장식하고 경문을 독경하는 앉은굿 일체를 포함한다.>
6. 굿청과 설위설경(김경영 법사의 설위설경)
6-1위청(位廳) 만들기
<설경>
한 시절 전만 해도 병이 걸리는 걸 귀신의 작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병원균을 창을 든 귀신 모양으로 상상하였음.) 그귀신은 겁내는 게 많아, 창이나 칼 같은걸로 협박하면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그렇게 우환 있는 집에 가서 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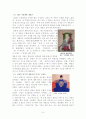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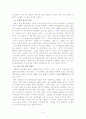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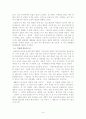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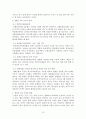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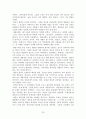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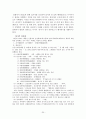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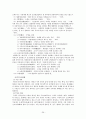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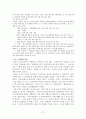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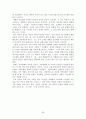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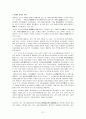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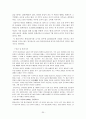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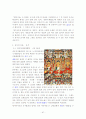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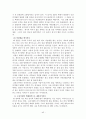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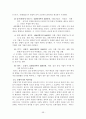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