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괴산(槐山) 개관
Ⅱ. 원풍리 마애불좌상(보물)
Ⅲ. 연풍성지
Ⅳ. 김홍도 유적
Ⅴ. 벽초(碧初) 홍명희(洪命熹)의 유적
홍명희의 삶의 자취 · 인간성과 사상 ·
『임꺽정』의 민족 문학적 가치 · 홍명희의 유적
Ⅵ. 각연사(覺淵寺)
각연사 창건연기 · 석조비로자나불(보물) · 대웅전과 닫집 ·
통일대사 탑비(보물) · 각연사 돌거북
Ⅱ. 원풍리 마애불좌상(보물)
Ⅲ. 연풍성지
Ⅳ. 김홍도 유적
Ⅴ. 벽초(碧初) 홍명희(洪命熹)의 유적
홍명희의 삶의 자취 · 인간성과 사상 ·
『임꺽정』의 민족 문학적 가치 · 홍명희의 유적
Ⅵ. 각연사(覺淵寺)
각연사 창건연기 · 석조비로자나불(보물) · 대웅전과 닫집 ·
통일대사 탑비(보물) · 각연사 돌거북
본문내용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가잠성을 괴주(槐州)라 부르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괴산(槐山)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라고 전해진다.
괴산(槐山)이라는 의미가 언뜻 듣기에는 괴이한 산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괴산은 홰나무 괴(槐), 즉 느티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지칭하는 괴부(槐府), 왕궁을 지칭하는 괴신(槐宸),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승정원을 괴원(槐院)이라 부른 것 등을 보면 괴(槐)자는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괴(槐)자는 어느 분야 혹은 인물이나 지명 등이 으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글자인 것이다.
2. 괴산의 역사
2-1. 선사시대
괴산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삼국사기』인데 이미 선사시대 이래로 일정한 주민들이 거주했음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간돌검, 돌도끼, 돌화살촉이 있으며 고인돌(支石墓)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삼국시대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청천을 제외한 괴산, 연풍, 청안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영역에 들어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다. 삼국이 서로 충돌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삼국의 전장이 되기도 했다. 본래 고구려의 잉근내군(仍斤內君)으로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槐壤郡)으로 하였다.
2-3. 고려시대
고려 성종 14년(995) 지방제도 정비 후에 괴산은 충주, 청주 등 13주 45현으로 구성된 중원도(中原道)에 속했으나 이후 현종 9년(1018) 괴산지역은 충주목의 속군인 괴주군(槐州郡)과 속현인 장연현(長延縣), 장풍현(長豊縣) 및 청주목의 속현인 청주현(靑川縣)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종 때 시안(始安)이라 별호를 하였다.
2-4.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르러 괴산지역은 고려 말의 양광도(楊廣道)에서 충청도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대체로 충청좌도(忠淸左道)에 속하였다. 左道의 괴산군은 조선 태종 3년 (1403)에 지괴주사(知槐州事)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 (1413)10월 15일 괴산군이라 하였다.
* 2010년 5월 괴산군 총인구수 : 36,913명(남:18,620, 여:18,293) 세대수 : 17,049세대
<괴산군 오가리의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
Ⅱ. 원풍리 마애불좌상(보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고려시대 불상. 높이 3m. 충주에서 경상북도 상주로 가는 국도변 산마루턱에 암벽을 뚫어 감실(龕室)을 마련하고, 그 안에 불좌상 2구와 화불(化佛) 등을 조각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특히 하부는 마멸이 심하여 형체가 불분명하다.
두 불상은 옷주름을 대칭으로 표현하는 등 동일한 형태를 보여 주는데, 이불병좌상(二佛幷坐像)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넓적하며 평면적인 얼굴에는 가는 눈, 뭉툭한 코, 꽉 다문 입 등이 묘사되어 있어, 건장한 인상을 준다. 직사각형의 신체는 넓은 어깨와 굵은 팔로 인해 매우 강건해 보이면서도 가슴이 들어가서 움츠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 놓았는데, 그 위로 옷자락이 덮으며 흘러내렸다.
배 부근까지 깊게 파인 U자형의 통견의(通肩衣)는 굵은 선각으로 평행하게 처리하였으며, 가슴에는 옷깃 모양(y형 또는 Y형)의 승각기(僧脚岐:下裙)가 표현되었다. 복부 아랫부분은 마멸이 심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불상 좌우의 좁은 여백에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살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머리 주위에 각 5구씩의 화불이 새겨져 있다. 또한 불상의 군데군데에는 채색을 가했던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이불병좌상은 중국에서는 북위시대, 특히 5, 6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그 예가 많지 않다. 이 작품 외에는 두 불상을 나란히 조각한 예는 죽령마애불, 전(傳) 대전사지 출토 청동이불병좌상 등이 있는데 법화경의 사상을 반영한 석가·다보이불병좌상(多寶二佛幷坐像)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불병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벽화로는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변상 등이 있을 뿐이다.
이 불상이 희귀한 이불병좌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며, 고려시대의 작품이면서도 고식(古式)을 남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Ⅲ. 연풍성지
1. 괴산 · 세재와 천주교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접하고 있는 문경새재를 넘어서면 괴산군 남동쪽 끝에 연풍면이 나온다. 해발 1,017미터의 험준한 고갯길, 새재의 서쪽 기슭에 연풍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연풍은 갈매못에서 순교한 성 황석두 루가의 고향이며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으로 초대 교회부터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 있던 뿌리 깊은 교우촌이다. 연풍 마을과 문경 새재의 구석구석마다 선조들의 자취와 피의 순교 역사가 어려 있다.
연풍은 전체가 소백산맥의 산릉에 속한 험지이고 문경군과 접경지대에 조령산과 백화산 등 소백산맥의 주봉들이 높이 솟아 있다. 그만큼 험난하기에 예로부터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충청도와 경상도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서는 순교자들의 피난의 요로로 일찍이 교우촌이 형성 됐었다.
남부여대(男負女戴)로 보따리를 싸서 박해의 서슬을 피해 연풍으로 몰린 교우들은 새재라는 천험의 도주로를 이용해 여차 하면 밤을 틈타 험준한 산 속으로 숨어들어 새재 제 1·2·3관문 성벽 밑에 있는 수구문(水口門)을 통해 문경 땅을 넘나들며 모진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죄인 아닌 죄인, 도둑 아닌 도둑으로 한스럽게 살았던 교우들이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잠깐 눈을 붙인 틈을 타 숨죽여 가며 드나들던 그 수구문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2. 연풍의 천주교 신부와 순교자들
연풍과 새재가 기억하는 첫 인물은 최양업 신부이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 유학해 13년간의 각고 끝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849년부터 12년간 새재를 넘나들며 이 지역에 신앙의 꽃을 피운다. 은신처로서 새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그는 김대건 신부가 1년 남짓 사목한 데 비해 오랫동안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새재 아랫마을인 문경읍 진안리의 어느 주막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선종했다는 최 신부는 생전에 쉴 새 없이 넘나들던 새재의 연봉인 배론 신학당 뒷산에
괴산(槐山)이라는 의미가 언뜻 듣기에는 괴이한 산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괴산은 홰나무 괴(槐), 즉 느티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지칭하는 괴부(槐府), 왕궁을 지칭하는 괴신(槐宸),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승정원을 괴원(槐院)이라 부른 것 등을 보면 괴(槐)자는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괴(槐)자는 어느 분야 혹은 인물이나 지명 등이 으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글자인 것이다.
2. 괴산의 역사
2-1. 선사시대
괴산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삼국사기』인데 이미 선사시대 이래로 일정한 주민들이 거주했음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간돌검, 돌도끼, 돌화살촉이 있으며 고인돌(支石墓)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삼국시대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청천을 제외한 괴산, 연풍, 청안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영역에 들어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다. 삼국이 서로 충돌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삼국의 전장이 되기도 했다. 본래 고구려의 잉근내군(仍斤內君)으로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槐壤郡)으로 하였다.
2-3. 고려시대
고려 성종 14년(995) 지방제도 정비 후에 괴산은 충주, 청주 등 13주 45현으로 구성된 중원도(中原道)에 속했으나 이후 현종 9년(1018) 괴산지역은 충주목의 속군인 괴주군(槐州郡)과 속현인 장연현(長延縣), 장풍현(長豊縣) 및 청주목의 속현인 청주현(靑川縣)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종 때 시안(始安)이라 별호를 하였다.
2-4.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르러 괴산지역은 고려 말의 양광도(楊廣道)에서 충청도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대체로 충청좌도(忠淸左道)에 속하였다. 左道의 괴산군은 조선 태종 3년 (1403)에 지괴주사(知槐州事)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 (1413)10월 15일 괴산군이라 하였다.
* 2010년 5월 괴산군 총인구수 : 36,913명(남:18,620, 여:18,293) 세대수 : 17,049세대
<괴산군 오가리의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
Ⅱ. 원풍리 마애불좌상(보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고려시대 불상. 높이 3m. 충주에서 경상북도 상주로 가는 국도변 산마루턱에 암벽을 뚫어 감실(龕室)을 마련하고, 그 안에 불좌상 2구와 화불(化佛) 등을 조각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특히 하부는 마멸이 심하여 형체가 불분명하다.
두 불상은 옷주름을 대칭으로 표현하는 등 동일한 형태를 보여 주는데, 이불병좌상(二佛幷坐像)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넓적하며 평면적인 얼굴에는 가는 눈, 뭉툭한 코, 꽉 다문 입 등이 묘사되어 있어, 건장한 인상을 준다. 직사각형의 신체는 넓은 어깨와 굵은 팔로 인해 매우 강건해 보이면서도 가슴이 들어가서 움츠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 놓았는데, 그 위로 옷자락이 덮으며 흘러내렸다.
배 부근까지 깊게 파인 U자형의 통견의(通肩衣)는 굵은 선각으로 평행하게 처리하였으며, 가슴에는 옷깃 모양(y형 또는 Y형)의 승각기(僧脚岐:下裙)가 표현되었다. 복부 아랫부분은 마멸이 심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불상 좌우의 좁은 여백에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살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머리 주위에 각 5구씩의 화불이 새겨져 있다. 또한 불상의 군데군데에는 채색을 가했던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이불병좌상은 중국에서는 북위시대, 특히 5, 6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그 예가 많지 않다. 이 작품 외에는 두 불상을 나란히 조각한 예는 죽령마애불, 전(傳) 대전사지 출토 청동이불병좌상 등이 있는데 법화경의 사상을 반영한 석가·다보이불병좌상(多寶二佛幷坐像)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불병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벽화로는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변상 등이 있을 뿐이다.
이 불상이 희귀한 이불병좌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며, 고려시대의 작품이면서도 고식(古式)을 남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Ⅲ. 연풍성지
1. 괴산 · 세재와 천주교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접하고 있는 문경새재를 넘어서면 괴산군 남동쪽 끝에 연풍면이 나온다. 해발 1,017미터의 험준한 고갯길, 새재의 서쪽 기슭에 연풍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연풍은 갈매못에서 순교한 성 황석두 루가의 고향이며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으로 초대 교회부터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 있던 뿌리 깊은 교우촌이다. 연풍 마을과 문경 새재의 구석구석마다 선조들의 자취와 피의 순교 역사가 어려 있다.
연풍은 전체가 소백산맥의 산릉에 속한 험지이고 문경군과 접경지대에 조령산과 백화산 등 소백산맥의 주봉들이 높이 솟아 있다. 그만큼 험난하기에 예로부터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충청도와 경상도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서는 순교자들의 피난의 요로로 일찍이 교우촌이 형성 됐었다.
남부여대(男負女戴)로 보따리를 싸서 박해의 서슬을 피해 연풍으로 몰린 교우들은 새재라는 천험의 도주로를 이용해 여차 하면 밤을 틈타 험준한 산 속으로 숨어들어 새재 제 1·2·3관문 성벽 밑에 있는 수구문(水口門)을 통해 문경 땅을 넘나들며 모진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죄인 아닌 죄인, 도둑 아닌 도둑으로 한스럽게 살았던 교우들이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잠깐 눈을 붙인 틈을 타 숨죽여 가며 드나들던 그 수구문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2. 연풍의 천주교 신부와 순교자들
연풍과 새재가 기억하는 첫 인물은 최양업 신부이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 유학해 13년간의 각고 끝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849년부터 12년간 새재를 넘나들며 이 지역에 신앙의 꽃을 피운다. 은신처로서 새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그는 김대건 신부가 1년 남짓 사목한 데 비해 오랫동안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새재 아랫마을인 문경읍 진안리의 어느 주막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선종했다는 최 신부는 생전에 쉴 새 없이 넘나들던 새재의 연봉인 배론 신학당 뒷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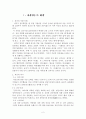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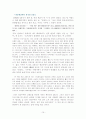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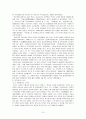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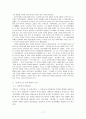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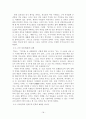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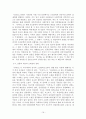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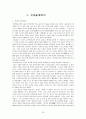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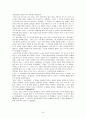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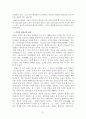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