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건창의 <녹언>에서 가장 돋보인다고 판단하는 2개의 대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하나 이상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3점)
2.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에서 경치(풍광)를 묘사하는 방식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해당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경치에 기대어 두 시의 화자가 각각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12점)
3. 로만 야콥슨(R. Jakobson)이 제시한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하여, 교재(방송강의)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13점)
(1) 정보적 기능(情報的機能)
(2) 표출적 기능(表出的機能)
(3) 명령적 기능(命令的機能)
(4) 친교적 기능(親交的機能)
(5) 관어적 기능(關語的機能)
(6) 미학적 기능(美學的機能)
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12점)
5. 참고문헌
2.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에서 경치(풍광)를 묘사하는 방식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해당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경치에 기대어 두 시의 화자가 각각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12점)
3. 로만 야콥슨(R. Jakobson)이 제시한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하여, 교재(방송강의)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13점)
(1) 정보적 기능(情報的機能)
(2) 표출적 기능(表出的機能)
(3) 명령적 기능(命令的機能)
(4) 친교적 기능(親交的機能)
(5) 관어적 기능(關語的機能)
(6) 미학적 기능(美學的機能)
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12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덥지 않아!. 이런 날에는 점심으로 냉면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면, 이는 와이프에게 점심에 냉면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적 기능은 일상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말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행동을 구속하거나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 준다.
(4) 친교적 기능(親交的機能)
말이 반드시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환경(⑤), 즉 의사소통의 경로를 열어 놓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대화는 말의 내용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에 밥이나 먹자”, “식사하였어요?”는 두 사람 사이의 의례적인 인사이다. 또한 “얼굴 좋아졌다”, “살 빠졌다” 등의 말도 오랜만에 만난 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확인하거나 친교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화통화에서 “여보세요”는 대화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5) 관어적 기능(關語的機能)
관어적 기능은 ⑥과 관련되는데, 언어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한자로 母라고 한다” 할 때, 고유어와 한자의 관계를 맺어준다. 또한 “제가 말하는 사랑이란, ~을 의미합니다” 도 언어의 관어적 기능을 사용하여 사랑의 의미를 규정한 것이다.
(6) 미학적 기능(美學的機能)
미학적 기능은 ③과 관련되는데, 자신의 말이 듣는 이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듣기에 좋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미학적 특성은 특히 문학에서 강조되며, 문학적 표현은 이러한 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저녁, 나뭇잎이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은유적 표현으로 언어의 미학적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미학적 요소를 의식하며 대화를 구성한다. 속담과 같은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언어의 미학적 기능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간결하게 전달하며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한다.
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12점)
<훈민정음 해례 서문>과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관점을 보여준다. 이 두 문서는 한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언어 정책과 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서문에서 기존 한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훈민정음이 어떻게 각 음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 문자가 어떻게 학습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훈민정음이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자 학문적 업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이 상소문은 한글 창제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중국 문자의 우월성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들은 새로운 문자 체계가 기존의 학문적 전통과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이들은 언문이 한자를 대체할 경우, 문화적 정체성의 손실과 학문적 타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문화적 유산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중화의 제도와 문화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최만리 등은 수단을 목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중화의 제도와 문화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글이 있다면 굳이 남의 글을 사용할 일은 아니다.
글은 의사소통이 그 본질이다. 한자는 중국 땅에서 사는 중국인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전혀 다른 땅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에게는 조선인에게 적합한 언어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중국의 신민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또한 한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자의 독점을 통해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백성이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문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반면,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는 “중국 글자를 빌려 통용하는 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며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려 살피고 있다. 또한 “글을 배우려는 이는 그 뜻의 깨우치기 어려움을 근심 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재판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따라서 두 글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으로 백성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이 두 문서의 비교를 통해 어떤 백성이라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실정에 맞춰 설계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이며, 백성들이 각자의 뜻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 그러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에서 제시된 반대 의견은, 양반으로서의 기득권 유지와 사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 백성의 현실적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5. 참고문헌
임유경·박종성·이호권, 『글과 생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4) 친교적 기능(親交的機能)
말이 반드시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환경(⑤), 즉 의사소통의 경로를 열어 놓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대화는 말의 내용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에 밥이나 먹자”, “식사하였어요?”는 두 사람 사이의 의례적인 인사이다. 또한 “얼굴 좋아졌다”, “살 빠졌다” 등의 말도 오랜만에 만난 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확인하거나 친교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화통화에서 “여보세요”는 대화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5) 관어적 기능(關語的機能)
관어적 기능은 ⑥과 관련되는데, 언어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한자로 母라고 한다” 할 때, 고유어와 한자의 관계를 맺어준다. 또한 “제가 말하는 사랑이란, ~을 의미합니다” 도 언어의 관어적 기능을 사용하여 사랑의 의미를 규정한 것이다.
(6) 미학적 기능(美學的機能)
미학적 기능은 ③과 관련되는데, 자신의 말이 듣는 이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듣기에 좋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미학적 특성은 특히 문학에서 강조되며, 문학적 표현은 이러한 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저녁, 나뭇잎이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은유적 표현으로 언어의 미학적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미학적 요소를 의식하며 대화를 구성한다. 속담과 같은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언어의 미학적 기능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간결하게 전달하며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한다.
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12점)
<훈민정음 해례 서문>과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관점을 보여준다. 이 두 문서는 한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언어 정책과 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서문에서 기존 한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훈민정음이 어떻게 각 음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 문자가 어떻게 학습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훈민정음이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자 학문적 업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이 상소문은 한글 창제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중국 문자의 우월성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들은 새로운 문자 체계가 기존의 학문적 전통과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이들은 언문이 한자를 대체할 경우, 문화적 정체성의 손실과 학문적 타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문화적 유산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중화의 제도와 문화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최만리 등은 수단을 목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중화의 제도와 문화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글이 있다면 굳이 남의 글을 사용할 일은 아니다.
글은 의사소통이 그 본질이다. 한자는 중국 땅에서 사는 중국인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전혀 다른 땅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에게는 조선인에게 적합한 언어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중국의 신민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또한 한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자의 독점을 통해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백성이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문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반면,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는 “중국 글자를 빌려 통용하는 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며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려 살피고 있다. 또한 “글을 배우려는 이는 그 뜻의 깨우치기 어려움을 근심 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재판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따라서 두 글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으로 백성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이 두 문서의 비교를 통해 어떤 백성이라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실정에 맞춰 설계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이며, 백성들이 각자의 뜻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 그러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에서 제시된 반대 의견은, 양반으로서의 기득권 유지와 사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 백성의 현실적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5. 참고문헌
임유경·박종성·이호권, 『글과 생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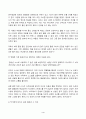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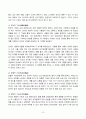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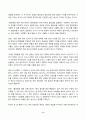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