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언
1. {금강경}의 심
2. {금강경}의 논리방식과 참구방식
결 언
1. {금강경}의 심
2. {금강경}의 논리방식과 참구방식
결 언
본문내용
祇 何況書寫受持讀誦修行爲人廣說\"
이와 같은 보시의 복덕에 대하여 차제적인 강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긍정 - 부정 - 대긍정의 구조를 적용시키고 있다. 우선 일단 재물보시의 복덕을 긍정한다. 이와 아울러 다음으로 재물보시의 부정
) 재물보시의 부정은 뒤에 오는 신명보시의 복덕에 비하여(비교할 경우라는 전제가 따른다) 보다 하열하다는 의미의 부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긍정 - 부정 - 대긍정이 의미하는 논지전개가 앞의 내용을 딛고 일어선다는 초월을 전제한 극복의 부정이다.
을 통하여 신명보시를 긍정한다. 나아가서 다시 신명보시의 부정과 함께 법보시의 대긍정으로 나아간다.
법보시의 대긍정에 대해서는 위의 두 번째의 예에서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긍정) 곧 불법이 아니다.(부정) 바로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대긍정)」이라 말한다. 이것은 석존의 불법이 불법이라는 형태나 언설로서의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수지하고 위타연설하는 불법임을 말한다. 이 경문에 대하여 천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모든 불법을 다른 사람들은 증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이름하여 불법이라 한다. 때문에 유독 모든 불법만이 제일의 불공의로서 제일의 법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저 (재물보시·신명보시의) 복덕들 가운데서 이 복덕(수지와 위타연설)이 (제일) 수승하다. 이리하여 많은 복덕을 이루는 것이다.」
) 天親, 『金剛般若波羅蜜經論』 卷上, (大正藏25, p.785上-中)
\"彼諸佛法餘人不得 是故彼佛法名爲佛法 是故言唯獨諸佛法 第一不共義 以能作第一法因 是故彼福德 中 此福爲勝 如是成福德多故\"
이와 같이 일단 재물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서 바로 그 재물보시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물보시에 대한 부정은 단순부정이 아닌 신명보시의 강조를 향한 조건부정이다. 또한 재물보시의 부정을 통한 신명보시에 대한 부정도 단순부정이 아닌 법보시를 향한 조건부정이다. 다시 신명보시의 조건부정은 궁극적으로 법보시를 향한 대긍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복덕의 차제적인 부정의 강조는 궁극적으로는 재물보시에 대한 신명보시의 긍정과 나아가서 신명보시에 대한 법보시의 긍정으로서 전개되어 간다. 곧 부정의 차제를 통하여 긍정의 차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덕의 부정 내지 긍정이 아니다. 부정은 철저하게 긍정을 향한 부정이고, 긍정은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 부정을 초월한 긍정이다. 이것은 긍정(재물보시의 복덕)의 초월을 향한 부정(신명보시의 복덕을 향한 재물보시의 부정)이면서 이 부정은 동시에 또 다른 초월을 향한 긍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이다. 그리고 이 긍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은 다시 궁극적인 초월을 향한 부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제3의 대긍정(법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반론리로서의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향한 초월론리로서의 긍정과 부정이야말로 대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강경』 논리의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종에서 공안의 참구방식인 일단긍정(대신근)과 조건부정(대의단)과 절대긍정(대의단)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
결 어
『금강경』의 심은 다름 아닌 존재이면서 그 존재에 대한 방식이기도 하다. 심이 존재일 경우 그것은 제법일 뿐만 아니라 청정심이기도 하다. 그 청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금강경』의 운하응주의 질문이라면 그 부정형태인 번뇌심의 타파는 운하항복기심이라는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청정심과 번뇌심의 긍정과 부정은 심의 무소주와 무집착의 경지에서 승화된 대긍정의 청정심(아누다라삼막삼보제)을 발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응당 주함이 없이 그 마음을 생한다」는 것으로서 「응무소주」가 무주라 하여 부정의 형태라면 「이생기심」은 그 본심에 대한 긍정형태이다. 그래서 무소주는 곧 무주이고 이 무주는 무주심으로서 번뇌심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와 같은 심은 응무소주라는 무집착한 작용과 이생기심이라는 작용의 현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응무소주와 이생기심의 구조는 A이므로 B가 된다는 관계가 아니라 A라야 비로소 B가 되는 관계, 내지 A이면서 동시에 B가 되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공안참구의 테크닉에서 강조하는 긍정과 부정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연속관계와 관련성이 있다.
조주의 「무자」는 곧 부정작용의 무[의식을 탕진하기 위한 수단]라는 의미와 주체로서의 무[자기의 심성에 철저한 상태]라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부정작용으로서의 무는 주체적인 무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상대적인 개념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주체로서의 무는 이러한 대립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무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무의 부정작용은 분별심의 허구를 타파하는 것이고, 무의 주체적인 작용은 본래면목의 현성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닌 무는 단순한 무라는 의미의 초월로서 \'무자\'화 되어 있다.
이 무자공안의 참구방식은 대신근 - 대의단 - 대분지의 구조를 띠고 있다. 바로 『금강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초월의 논리방식도 마찬가지의 긍정 - 부정 - 대긍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A → A ∴ ∼A」 곧 「A → ∼A ∴ A」는 자기초월의 구조이다.
이 『금강경』의 논리구조는 공안참구의 구조인 대신근(긍정) - 대의단(부정) - 대분지(대긍정)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곧 『금강경』의 자기초월의 논리구조는 긍정은 대긍정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하고, 부정은 긍정의 바탕 위에서 의의가 있으며, 대긍정은 부정을 통한 자기초월의 승화가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안의 참구방식은 대분지를 통하지 않은 대신근은 이론이나 철학일 뿐이고, 대의단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근은 맹신에 불과하며, 대분지가 결여되어 있는 대의단은 한낱 논리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금강경』의 자기초월의 논리구조와 공안참구의 방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시의 복덕에 대하여 차제적인 강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긍정 - 부정 - 대긍정의 구조를 적용시키고 있다. 우선 일단 재물보시의 복덕을 긍정한다. 이와 아울러 다음으로 재물보시의 부정
) 재물보시의 부정은 뒤에 오는 신명보시의 복덕에 비하여(비교할 경우라는 전제가 따른다) 보다 하열하다는 의미의 부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긍정 - 부정 - 대긍정이 의미하는 논지전개가 앞의 내용을 딛고 일어선다는 초월을 전제한 극복의 부정이다.
을 통하여 신명보시를 긍정한다. 나아가서 다시 신명보시의 부정과 함께 법보시의 대긍정으로 나아간다.
법보시의 대긍정에 대해서는 위의 두 번째의 예에서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긍정) 곧 불법이 아니다.(부정) 바로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대긍정)」이라 말한다. 이것은 석존의 불법이 불법이라는 형태나 언설로서의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수지하고 위타연설하는 불법임을 말한다. 이 경문에 대하여 천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모든 불법을 다른 사람들은 증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이름하여 불법이라 한다. 때문에 유독 모든 불법만이 제일의 불공의로서 제일의 법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저 (재물보시·신명보시의) 복덕들 가운데서 이 복덕(수지와 위타연설)이 (제일) 수승하다. 이리하여 많은 복덕을 이루는 것이다.」
) 天親, 『金剛般若波羅蜜經論』 卷上, (大正藏25, p.785上-中)
\"彼諸佛法餘人不得 是故彼佛法名爲佛法 是故言唯獨諸佛法 第一不共義 以能作第一法因 是故彼福德 中 此福爲勝 如是成福德多故\"
이와 같이 일단 재물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서 바로 그 재물보시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물보시에 대한 부정은 단순부정이 아닌 신명보시의 강조를 향한 조건부정이다. 또한 재물보시의 부정을 통한 신명보시에 대한 부정도 단순부정이 아닌 법보시를 향한 조건부정이다. 다시 신명보시의 조건부정은 궁극적으로 법보시를 향한 대긍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복덕의 차제적인 부정의 강조는 궁극적으로는 재물보시에 대한 신명보시의 긍정과 나아가서 신명보시에 대한 법보시의 긍정으로서 전개되어 간다. 곧 부정의 차제를 통하여 긍정의 차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덕의 부정 내지 긍정이 아니다. 부정은 철저하게 긍정을 향한 부정이고, 긍정은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 부정을 초월한 긍정이다. 이것은 긍정(재물보시의 복덕)의 초월을 향한 부정(신명보시의 복덕을 향한 재물보시의 부정)이면서 이 부정은 동시에 또 다른 초월을 향한 긍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이다. 그리고 이 긍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은 다시 궁극적인 초월을 향한 부정(신명보시의 복덕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제3의 대긍정(법보시의 복덕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반론리로서의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향한 초월론리로서의 긍정과 부정이야말로 대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강경』 논리의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종에서 공안의 참구방식인 일단긍정(대신근)과 조건부정(대의단)과 절대긍정(대의단)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
결 어
『금강경』의 심은 다름 아닌 존재이면서 그 존재에 대한 방식이기도 하다. 심이 존재일 경우 그것은 제법일 뿐만 아니라 청정심이기도 하다. 그 청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금강경』의 운하응주의 질문이라면 그 부정형태인 번뇌심의 타파는 운하항복기심이라는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청정심과 번뇌심의 긍정과 부정은 심의 무소주와 무집착의 경지에서 승화된 대긍정의 청정심(아누다라삼막삼보제)을 발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응당 주함이 없이 그 마음을 생한다」는 것으로서 「응무소주」가 무주라 하여 부정의 형태라면 「이생기심」은 그 본심에 대한 긍정형태이다. 그래서 무소주는 곧 무주이고 이 무주는 무주심으로서 번뇌심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와 같은 심은 응무소주라는 무집착한 작용과 이생기심이라는 작용의 현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응무소주와 이생기심의 구조는 A이므로 B가 된다는 관계가 아니라 A라야 비로소 B가 되는 관계, 내지 A이면서 동시에 B가 되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공안참구의 테크닉에서 강조하는 긍정과 부정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연속관계와 관련성이 있다.
조주의 「무자」는 곧 부정작용의 무[의식을 탕진하기 위한 수단]라는 의미와 주체로서의 무[자기의 심성에 철저한 상태]라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부정작용으로서의 무는 주체적인 무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상대적인 개념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주체로서의 무는 이러한 대립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무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무의 부정작용은 분별심의 허구를 타파하는 것이고, 무의 주체적인 작용은 본래면목의 현성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닌 무는 단순한 무라는 의미의 초월로서 \'무자\'화 되어 있다.
이 무자공안의 참구방식은 대신근 - 대의단 - 대분지의 구조를 띠고 있다. 바로 『금강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초월의 논리방식도 마찬가지의 긍정 - 부정 - 대긍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A → A ∴ ∼A」 곧 「A → ∼A ∴ A」는 자기초월의 구조이다.
이 『금강경』의 논리구조는 공안참구의 구조인 대신근(긍정) - 대의단(부정) - 대분지(대긍정)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곧 『금강경』의 자기초월의 논리구조는 긍정은 대긍정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하고, 부정은 긍정의 바탕 위에서 의의가 있으며, 대긍정은 부정을 통한 자기초월의 승화가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안의 참구방식은 대분지를 통하지 않은 대신근은 이론이나 철학일 뿐이고, 대의단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근은 맹신에 불과하며, 대분지가 결여되어 있는 대의단은 한낱 논리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금강경』의 자기초월의 논리구조와 공안참구의 방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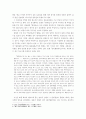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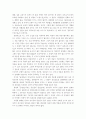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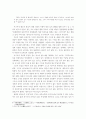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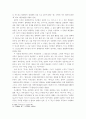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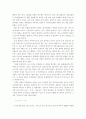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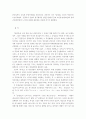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