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정관계관서
2. 중앙재정
1) 세입․세출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3. 지방재정
4. 조세
1) 전세
2) 전결제
5. 공물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2) 방납
6. 진상
1) 진상의 종류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7. 환곡
1) 의창
8. 역
1) 요역
2) 국역
3) 호수과 봉족
4) 신역의 포납화
2. 중앙재정
1) 세입․세출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3. 지방재정
4. 조세
1) 전세
2) 전결제
5. 공물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2) 방납
6. 진상
1) 진상의 종류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7. 환곡
1) 의창
8. 역
1) 요역
2) 국역
3) 호수과 봉족
4) 신역의 포납화
본문내용
사무 담당자, 사법·경찰 잡무 담당자, 관원 수종 담당자등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鄕吏와 軍校가 있었다. 향리는 세습직으로 鄕役이라 하였다. 또한 공천의 경우 노비신공을 바쳐 국역이라 할 수 있으며 사천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양반은 현직관료의 경우 관직 자체가 신역이라 별도의 국역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성균관과 향교의 유생도 역이 면제 되었다. 3품이하 전직관료 등 양반에게는 군역의 부담이 지워졌으나 이를 피하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군역의 부과는 병종에 따라 우열관계로 나타났는데 양인의 의무 병종은 정병과 수군이었으며 양반자제는 직업군인, 특수층 자손에 대한 특전으로 편성된 병종으로는 忠義衛와 忠順衛 등이 있었다. 시취에 의한 병종도 신분적 토대 위에 이루어 졌다.
3) 호수과 봉족
일반 군정은 대체로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立役 기간 중의 부담은 스스로 부담해야했다. 이 입역하는 정정을 戶首 또는 甲首라 하였고, 호수를 돕는 인정을 봉족이라 하였는데, 태조6년 처음 정급(定給)되었다.
戶는 「살림」이라는 의미와 공물을 부담케 하기 위한 「법제적」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입역은 3정 1호리 원칙에 의하였는데 부호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벼웠다. 세조 때에는 2丁 1保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保에는 戶를 대신하는 개념이 있어 종래의 호 단위에서 인정단위로 개혁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호수를 급여하는 봉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법은 보의 구조 자체가 호와 유리되어 군역을 문란케 하였으며 戶首와 보인의 관계는 수탈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군역 부담자는 군적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호적은 3년마다 한 번씩 만들도록 규정되었고, 군적은 6년마다 호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태조2년에 군적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태종 때 이래 세종 초까지 호적법이 정비되고 인구의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4) 신역의 포납화
보법 이후 모든 인정이 군역에 충당되어 군역과 요역의 구별이 무의미해졌으므로 군역과 요역은 역을 부담하는 자에겐 이중적인 것이 되었다. 번상군(番上軍)에 대한 경비염출책으로 번상(番上)하지 않는 양인은 신역을 지는 대신 보라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되었다. 보의 대역세(代役稅)로서 포(布) 2필씩을 바치는 양역이 뒤에 와서는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를 바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어른과 같이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납세의무자가 도망하거나 내지 못하면 그 일족이나 마을에 부담시키는 족징(族徵), 동징(洞徵)까지도 유행하는 사회로 타락하고 있었다. 삼정(三政)문란의 극치였다.
참고문헌 ------------------------------------------------------
1. 김윤수 지음, 탐구한국사, 형설출판사, 2002.
2. 변태섭 지음,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3.
3. 이영철 지음, 한국사총론, 고시연구사, 2003.
군역의 부과는 병종에 따라 우열관계로 나타났는데 양인의 의무 병종은 정병과 수군이었으며 양반자제는 직업군인, 특수층 자손에 대한 특전으로 편성된 병종으로는 忠義衛와 忠順衛 등이 있었다. 시취에 의한 병종도 신분적 토대 위에 이루어 졌다.
3) 호수과 봉족
일반 군정은 대체로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立役 기간 중의 부담은 스스로 부담해야했다. 이 입역하는 정정을 戶首 또는 甲首라 하였고, 호수를 돕는 인정을 봉족이라 하였는데, 태조6년 처음 정급(定給)되었다.
戶는 「살림」이라는 의미와 공물을 부담케 하기 위한 「법제적」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입역은 3정 1호리 원칙에 의하였는데 부호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벼웠다. 세조 때에는 2丁 1保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保에는 戶를 대신하는 개념이 있어 종래의 호 단위에서 인정단위로 개혁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호수를 급여하는 봉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법은 보의 구조 자체가 호와 유리되어 군역을 문란케 하였으며 戶首와 보인의 관계는 수탈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군역 부담자는 군적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호적은 3년마다 한 번씩 만들도록 규정되었고, 군적은 6년마다 호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태조2년에 군적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태종 때 이래 세종 초까지 호적법이 정비되고 인구의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4) 신역의 포납화
보법 이후 모든 인정이 군역에 충당되어 군역과 요역의 구별이 무의미해졌으므로 군역과 요역은 역을 부담하는 자에겐 이중적인 것이 되었다. 번상군(番上軍)에 대한 경비염출책으로 번상(番上)하지 않는 양인은 신역을 지는 대신 보라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되었다. 보의 대역세(代役稅)로서 포(布) 2필씩을 바치는 양역이 뒤에 와서는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를 바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어른과 같이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납세의무자가 도망하거나 내지 못하면 그 일족이나 마을에 부담시키는 족징(族徵), 동징(洞徵)까지도 유행하는 사회로 타락하고 있었다. 삼정(三政)문란의 극치였다.
참고문헌 ------------------------------------------------------
1. 김윤수 지음, 탐구한국사, 형설출판사, 2002.
2. 변태섭 지음,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3.
3. 이영철 지음, 한국사총론, 고시연구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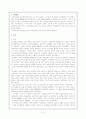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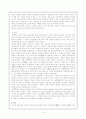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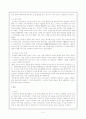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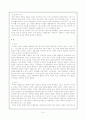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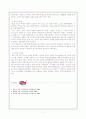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