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4세기의 고구려와 가야
3. 중장기마전사단의 파급
4. 광개토왕 군대의 가야 원정
5. 남정 이후 가야연맹의 재편
6. 맺음말
2. 4세기의 고구려와 가야
3. 중장기마전사단의 파급
4. 광개토왕 군대의 가야 원정
5. 남정 이후 가야연맹의 재편
6. 맺음말
본문내용
히려 전쟁의 직접적인 화를 입지 않고 기왕의 세력 기반을 착실히 성장시켜갈 수 있었다.
우선 성주, 창녕, 부산 지방은 4세기 경까지는 가야연맹에 속해 있다가 4세기 말, 5세기 초의 시기에 신라에게 자발적으로 투항하였다고 보인다. 이 지방의 세력들은 5세기 내내 크게 발전하여 고분 규모가 커지고 그 안에서 유물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다만 관모, 장신구, 유개고배 등의 유물은 경주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경주 지방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된 지방은 아직 그 지역 지배층의 통치기반이 해체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주 세력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신라는 5세기 대에 이른바 \'낙동강 동안양식\' 문화권에
金元龍, 1960. <<新羅土器의 硏究>>(國立博物館叢書 甲 第四), 乙酉文化社.
속하는 성주, 대구, 창녕, 양산, 부산 등의 소국들에게 문물을 지원하고 대내적 통치권을 보장하여, 가야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였던 듯하다.
낙동강 서쪽의 나머지 가야 지역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문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고학적인 유적 상황을 토대로 5세기 이후 가야 지역 내부의 정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후기 가야 문화권은 고령권, 함안-고성-진주권, 김해권의 3개 권역으로 나뉘고, 각 권역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특징과 발전과정을 보이지만, 이들이 4세기 이전의 영남 지역 진변한 공통 문화기반을 계승하고 있는 후예들이라는 점은 같아서, 그 공통 기반에서 이탈해 나간 신라 문화권이나 원래부터 다른 백제 문화권과는 크게 구별된다.
패총 및 대형 목곽분 등이 다량 출토되던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 유역의 해안지대에서는 5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분 유적의 수효가 줄어들고 규모도 소형 석곽분 정도로 위축되었다. 그와 동시에 김해 예안리 고분군이나 창원 도계동 고분군과 같은 곳에서는 이단교열투창유개고배나 대부장경호와 같은 신라계통 토기 유물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전기 가야연맹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김해 예안리 36호분에서 신라 지역과는 다른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가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金海 禮安里 古墳群Ⅰ>>
대국적으로는 가야 문화권과 교류를 끊지 않고 그와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공략하고 그 순라병이 배치되었던 주요 지역이었지만 고구려 계통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라병의 주둔은 그리 길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 서부의 함안 및 그 서쪽 지역에서는 신라 유물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기존의 문화 내용을 점진적으로 팽창시켜 나갔다. 이들은 전기의 경쟁 세력이었던 김해 세력의 약화에 힘입어 가까운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충시켜 나갔던 것이다.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硏究 -晉州式土器와 관련하여->, <<慶尙史學>> 9, 경상대학교, 27쪽.
安在晧, 1997. <鐵鎌의 變化와 劃期>, <<伽耶考古學論叢>> 2,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79~88쪽.
朴天秀, 1999. <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98쪽.
이는 \'안라인수병\'이라는 것이 함안의 안라국과 연관이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케 한다. 다만 함안을 비롯한 가야 중서부 지역은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인접한 지역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었고, 고성-진주 등의 가야 서남부 지역은 발전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존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맹 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강대한 힘과 경제력을 갖춘 존재가 이 지역에서는 배출될 수 없는 일정한 한계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전기 가야 시대에 후진 지역이었던 고령, 합천 등의 경상 내륙 산간지대는 4세기까지는 이렇다할 유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5세기 전반 이후 새삼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묘제나 유물의 성격 면에서 그들은 4세기 이전 김해, 부산 등 낙동강 하류 유역의 것과 현저한 유사성을 보였고, 신라 문화권의 고분들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는 전기 가야의 토기 제작과 철 생산 등의 선진 문화가 이주민의 직접적 이주를 동반하여 파급된 것에 있다고 하겠다. 고령 대가야 초기와 합천 옥전 Ⅱ기의 토기 문화는 김해, 부산, 창원 등 경남 해안지대 4세기 말의 토기 문화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金泰植, 1986.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 11, 부산사학회.
趙榮濟, 2000, <多羅國의 成立에 대한 硏究>,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분석소 편, 혜안.
다만 이 지역 문화권의 성장은 5세기 전반에는 두드러지지 못하다가 5세기 후반에 들어 본격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즉, 후기 가야연맹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6. 맺음말
고구려의 동향은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야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킨 이후, 가야사도 고구려의 역사와 연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낙랑, 대방 멸망은 가야에 내분을 불러 동서 분열을 야기했고, 고구려가 그 고지를 요동 방면의 망명객으로 하여금 간접 경영케 한 것은 결국 가야 지역에 주민 이동을 수반하여 중장 기마 전사단 문화가 파급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가야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광개토왕이 보낸 군대가 가야연맹의 국읍인 임나가라를 함락시킨 데 있다. 이는 가야사가 김해의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연맹과 고령 대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으로 나뉘는 분수령을 이룬 것이다. 가야는 이로 인한 발전의 지체 현상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의 속도가 신라에 비해 약간 뒤쳐져서 결국 이로 인하여 6세기 중엽에 신라에게 멸망되고 마니, 이는 궁극적으로 가야가 멸망한 근본 원인이었다.
우선 성주, 창녕, 부산 지방은 4세기 경까지는 가야연맹에 속해 있다가 4세기 말, 5세기 초의 시기에 신라에게 자발적으로 투항하였다고 보인다. 이 지방의 세력들은 5세기 내내 크게 발전하여 고분 규모가 커지고 그 안에서 유물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다만 관모, 장신구, 유개고배 등의 유물은 경주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경주 지방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된 지방은 아직 그 지역 지배층의 통치기반이 해체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주 세력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신라는 5세기 대에 이른바 \'낙동강 동안양식\' 문화권에
金元龍, 1960. <<新羅土器의 硏究>>(國立博物館叢書 甲 第四), 乙酉文化社.
속하는 성주, 대구, 창녕, 양산, 부산 등의 소국들에게 문물을 지원하고 대내적 통치권을 보장하여, 가야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였던 듯하다.
낙동강 서쪽의 나머지 가야 지역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문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고학적인 유적 상황을 토대로 5세기 이후 가야 지역 내부의 정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후기 가야 문화권은 고령권, 함안-고성-진주권, 김해권의 3개 권역으로 나뉘고, 각 권역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특징과 발전과정을 보이지만, 이들이 4세기 이전의 영남 지역 진변한 공통 문화기반을 계승하고 있는 후예들이라는 점은 같아서, 그 공통 기반에서 이탈해 나간 신라 문화권이나 원래부터 다른 백제 문화권과는 크게 구별된다.
패총 및 대형 목곽분 등이 다량 출토되던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 유역의 해안지대에서는 5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분 유적의 수효가 줄어들고 규모도 소형 석곽분 정도로 위축되었다. 그와 동시에 김해 예안리 고분군이나 창원 도계동 고분군과 같은 곳에서는 이단교열투창유개고배나 대부장경호와 같은 신라계통 토기 유물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전기 가야연맹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김해 예안리 36호분에서 신라 지역과는 다른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가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金海 禮安里 古墳群Ⅰ>>
대국적으로는 가야 문화권과 교류를 끊지 않고 그와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공략하고 그 순라병이 배치되었던 주요 지역이었지만 고구려 계통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라병의 주둔은 그리 길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 서부의 함안 및 그 서쪽 지역에서는 신라 유물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기존의 문화 내용을 점진적으로 팽창시켜 나갔다. 이들은 전기의 경쟁 세력이었던 김해 세력의 약화에 힘입어 가까운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충시켜 나갔던 것이다.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硏究 -晉州式土器와 관련하여->, <<慶尙史學>> 9, 경상대학교, 27쪽.
安在晧, 1997. <鐵鎌의 變化와 劃期>, <<伽耶考古學論叢>> 2,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79~88쪽.
朴天秀, 1999. <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98쪽.
이는 \'안라인수병\'이라는 것이 함안의 안라국과 연관이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케 한다. 다만 함안을 비롯한 가야 중서부 지역은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인접한 지역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었고, 고성-진주 등의 가야 서남부 지역은 발전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존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맹 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강대한 힘과 경제력을 갖춘 존재가 이 지역에서는 배출될 수 없는 일정한 한계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전기 가야 시대에 후진 지역이었던 고령, 합천 등의 경상 내륙 산간지대는 4세기까지는 이렇다할 유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5세기 전반 이후 새삼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묘제나 유물의 성격 면에서 그들은 4세기 이전 김해, 부산 등 낙동강 하류 유역의 것과 현저한 유사성을 보였고, 신라 문화권의 고분들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는 전기 가야의 토기 제작과 철 생산 등의 선진 문화가 이주민의 직접적 이주를 동반하여 파급된 것에 있다고 하겠다. 고령 대가야 초기와 합천 옥전 Ⅱ기의 토기 문화는 김해, 부산, 창원 등 경남 해안지대 4세기 말의 토기 문화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金泰植, 1986.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 11, 부산사학회.
趙榮濟, 2000, <多羅國의 成立에 대한 硏究>,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분석소 편, 혜안.
다만 이 지역 문화권의 성장은 5세기 전반에는 두드러지지 못하다가 5세기 후반에 들어 본격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즉, 후기 가야연맹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6. 맺음말
고구려의 동향은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야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킨 이후, 가야사도 고구려의 역사와 연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낙랑, 대방 멸망은 가야에 내분을 불러 동서 분열을 야기했고, 고구려가 그 고지를 요동 방면의 망명객으로 하여금 간접 경영케 한 것은 결국 가야 지역에 주민 이동을 수반하여 중장 기마 전사단 문화가 파급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가야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광개토왕이 보낸 군대가 가야연맹의 국읍인 임나가라를 함락시킨 데 있다. 이는 가야사가 김해의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연맹과 고령 대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으로 나뉘는 분수령을 이룬 것이다. 가야는 이로 인한 발전의 지체 현상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의 속도가 신라에 비해 약간 뒤쳐져서 결국 이로 인하여 6세기 중엽에 신라에게 멸망되고 마니, 이는 궁극적으로 가야가 멸망한 근본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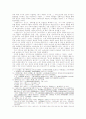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