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論
II. 本 論
1. 資料의 檢證
2. 杜詩 缺點의 批判
3. 註釋上의 誤謬 修正
4. 語彙의 辨證
Ⅲ. 結 論
II. 本 論
1. 資料의 檢證
2. 杜詩 缺點의 批判
3. 註釋上의 誤謬 修正
4. 語彙의 辨證
Ⅲ. 結 論
본문내용
장한다. 매화를 읊은 시구만도 30여개나 되며, 그 가운데 ‘巡索共梅花笑 冷蘂疎枝半不禁’(*舍弟觀赴藍田取妻子到江陵喜寄三首(二)-7,8)은 梅詩의 제일로 人口에 널리 膾炙되기도 한다. 또 두시에는 주석에 인용된 ‘欲發照江梅’(*徐九少尹見過-8), ‘江路野梅香’(*西郊-4), ‘陰風過嶺梅’(*秋日荊南述懷三十韻-24) ‘東閣官梅動詩興’(*和裵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 이외에도 ‘*和裵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 ‘四月熟黃梅’(*梅雨-2), ‘江縣紅梅已放春’(*留別公安太易沙門-6)같은 각종 매화가 등장한다. 이처럼 매화는 두시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지봉이 인용한 주석은 纂註分類杜詩에 趙註(趙:趙註杜律)로 되어 있는데 杜詩諺解(권18-장4b)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趙의 주를 보면 단순히 피는 장소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봉은 宋의 范成大(字:至能)가 지은 范村梅譜(1권)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范村梅譜는 지능이 12종의 매화를 손수 기르며 기록한 것이기에 매화에 관한한 전문서로 볼 수 있다. 또 그는 36종이나 되는 국화에 대한 기록을 적은 范村菊譜(1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원예에 박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봉의 ‘江梅’에 대한 고증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봉은 ‘煖老思燕玉’(*獨坐二首(一)-5), ‘早時金出人間’(*諸將五首(一)-4), ‘上有蔚藍天’(*冬到金華山觀因得故拾遺陳公學堂遺跡-3), ‘江湖多白鳥 天地有靑蠅’(*寄劉峽州伯華使君四十韻-79,80), ‘走置錦屠蘇’(*槐葉冷淘-12), ‘御氣雲樓敞 含風帳殿高’(*千秋節有感二首(二)-1,2), ‘爲君沽酒滿眼’(*入秦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28)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11 역주하7,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20 역주하9,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15 역주하8,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9 역주하7, 卷十 <文章部三> 古詩 역주상449,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45 역주하15,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46 역주하16.
에 대한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같이 여러 典籍을 끌어들인 철저한 고증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凡例에서 밝힌 348종이나 되는 많은 參考書籍이 이를 立證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봉은 도처에서 철저한 문헌의 고증을 통하여 주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그동안 비판없이 수용해 온 기존의 諸學說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 역시 두시의 결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문단의 만연된 풍조를 개조해 보려는 일단의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비평이 우리 나라에서 지봉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전개된 일이 없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4. 語彙의 辨證
芝峰類說 가운데 語彙나 語句에 대한 釋義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시를 읽고 難澁하거나 論難이 있어 온 어휘나 어구를 각종 문헌을 근거로 하여 두시를 새로이 해석하고자 했다. 이들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지봉의 고증과 해석이 얼마나 독창성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겠으나 이미 주석의 오류를 통해서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므로 重論을 피하기 위해 한 두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논란 많은 ‘業工’에 대한 풀이부터 보기로 한다.
# 杜詩 杜鵑行曰 ‘業工竄伏深樹裏’(*杜鵑行-7) 車天輅嘗言 杜鵑雛曰 業工出雜書云 而余意業工猶言能工 謂杜鵑善竄伏於深樹間也(두시의 두견행에 말하기를 ‘業工竄伏深樹裏’라고 하였다. 차천로가 일찍이 말하기를 “두견의 새끼를 업공이라 한다고 잡서에 나온다”라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업공은 ‘能工’과 같은 것이니 “두견은 깊이 나무 사이에 숨어 엎드리기를 잘한다”고 말한 것이다).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35. 역주하13.
‘業工’에 대해서 중국의 주석서에는 물론 纂註分類杜詩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杜詩諺解에도 ‘제 논 이리 기픈 나못 소배 수머 굽스러슈믈 바지로이 니’(초17-05a)라고만 풀이되어 있고 별다른 주를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車五山에서 비롯된 것 같다. 오산이 五山說林草藁에서 “소시에 어떤 책을 보니 두견 새끼를 업공이라 하였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긴 뒤 霽湖, 芝峰, 澤堂, 星湖, 五洲 安大會, 朝鮮時代의 杜詩註釋의 양상, p.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杜詩와 杜詩諺解, 1997년 학술세미나 별쇄본.
등이 모두 이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다. 오산과 지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業業’의 訛傳으로 뒷글자를 중복하여 쓸 때 찍은 점(業)이 잘못되어 ‘業工’으로 전해진 것이라 풀이하고, 그 뜻은 恐懼라고 했다. 五洲는 여기에다 ‘業已’의 業과 ‘工夫’의 工이 합친 뜻으로 보는 설도 있음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事文類聚에 ‘業業竄伏深樹裏’의 ‘業業’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業工’으로 쓰고 있고, 또 邵寶도 集註에서 ‘業工竄伏 言昔爲天子身 臨萬方 今日之事 乃以竄伏深樹爲工’라고 ‘工’字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굳이 ‘業業’의 중복자로 볼 필요는 없다. 事文類聚 後集 44卷 羽蟲部, 邵寶의 集註 14권 17장.
또한 그 의미도 숨기를 工巧히 잘하는 두견의 습성을 그린 것으로 본다면 위에서 지적한 지봉의 설은 매우 독창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 지봉은 글자에 따라 작품의 문학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하고 있다.
# 杜詩曰 ‘隣人有美酒 稚子也能’(*遣意二首(二)-7,8) 註放翁以也字作夜 最得村意云 余謂詩意 以爲隣家有酒 故稚子亦能來 此尤有味 作夜字未穩(두시에 ‘이웃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에 방옹이 ‘也라는 글자를 夜자로 한다면 시골이란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뜻은 이웃집에 술이 있으니 어린아이라도 또한 능히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 맛이 있다. 也를 夜로 하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32 역주하12.
이본에 따라 ‘也’와 ‘夜’로 가지각색이다. 심지어 纂註分類杜詩와 이를 언해한 杜詩諺解와도 서로 다르다. 언해에서는 ‘이웃 지
이외에도 지봉은 ‘煖老思燕玉’(*獨坐二首(一)-5), ‘早時金出人間’(*諸將五首(一)-4), ‘上有蔚藍天’(*冬到金華山觀因得故拾遺陳公學堂遺跡-3), ‘江湖多白鳥 天地有靑蠅’(*寄劉峽州伯華使君四十韻-79,80), ‘走置錦屠蘇’(*槐葉冷淘-12), ‘御氣雲樓敞 含風帳殿高’(*千秋節有感二首(二)-1,2), ‘爲君沽酒滿眼’(*入秦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28)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11 역주하7,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20 역주하9,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15 역주하8,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9 역주하7, 卷十 <文章部三> 古詩 역주상449,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45 역주하15,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46 역주하16.
에 대한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같이 여러 典籍을 끌어들인 철저한 고증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凡例에서 밝힌 348종이나 되는 많은 參考書籍이 이를 立證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봉은 도처에서 철저한 문헌의 고증을 통하여 주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그동안 비판없이 수용해 온 기존의 諸學說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 역시 두시의 결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문단의 만연된 풍조를 개조해 보려는 일단의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비평이 우리 나라에서 지봉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전개된 일이 없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4. 語彙의 辨證
芝峰類說 가운데 語彙나 語句에 대한 釋義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시를 읽고 難澁하거나 論難이 있어 온 어휘나 어구를 각종 문헌을 근거로 하여 두시를 새로이 해석하고자 했다. 이들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지봉의 고증과 해석이 얼마나 독창성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겠으나 이미 주석의 오류를 통해서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므로 重論을 피하기 위해 한 두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논란 많은 ‘業工’에 대한 풀이부터 보기로 한다.
# 杜詩 杜鵑行曰 ‘業工竄伏深樹裏’(*杜鵑行-7) 車天輅嘗言 杜鵑雛曰 業工出雜書云 而余意業工猶言能工 謂杜鵑善竄伏於深樹間也(두시의 두견행에 말하기를 ‘業工竄伏深樹裏’라고 하였다. 차천로가 일찍이 말하기를 “두견의 새끼를 업공이라 한다고 잡서에 나온다”라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업공은 ‘能工’과 같은 것이니 “두견은 깊이 나무 사이에 숨어 엎드리기를 잘한다”고 말한 것이다).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35. 역주하13.
‘業工’에 대해서 중국의 주석서에는 물론 纂註分類杜詩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杜詩諺解에도 ‘제 논 이리 기픈 나못 소배 수머 굽스러슈믈 바지로이 니’(초17-05a)라고만 풀이되어 있고 별다른 주를 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車五山에서 비롯된 것 같다. 오산이 五山說林草藁에서 “소시에 어떤 책을 보니 두견 새끼를 업공이라 하였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긴 뒤 霽湖, 芝峰, 澤堂, 星湖, 五洲 安大會, 朝鮮時代의 杜詩註釋의 양상, p.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杜詩와 杜詩諺解, 1997년 학술세미나 별쇄본.
등이 모두 이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다. 오산과 지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業業’의 訛傳으로 뒷글자를 중복하여 쓸 때 찍은 점(業)이 잘못되어 ‘業工’으로 전해진 것이라 풀이하고, 그 뜻은 恐懼라고 했다. 五洲는 여기에다 ‘業已’의 業과 ‘工夫’의 工이 합친 뜻으로 보는 설도 있음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事文類聚에 ‘業業竄伏深樹裏’의 ‘業業’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業工’으로 쓰고 있고, 또 邵寶도 集註에서 ‘業工竄伏 言昔爲天子身 臨萬方 今日之事 乃以竄伏深樹爲工’라고 ‘工’字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굳이 ‘業業’의 중복자로 볼 필요는 없다. 事文類聚 後集 44卷 羽蟲部, 邵寶의 集註 14권 17장.
또한 그 의미도 숨기를 工巧히 잘하는 두견의 습성을 그린 것으로 본다면 위에서 지적한 지봉의 설은 매우 독창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 지봉은 글자에 따라 작품의 문학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하고 있다.
# 杜詩曰 ‘隣人有美酒 稚子也能’(*遣意二首(二)-7,8) 註放翁以也字作夜 最得村意云 余謂詩意 以爲隣家有酒 故稚子亦能來 此尤有味 作夜字未穩(두시에 ‘이웃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에 방옹이 ‘也라는 글자를 夜자로 한다면 시골이란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뜻은 이웃집에 술이 있으니 어린아이라도 또한 능히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 맛이 있다. 也를 夜로 하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32 역주하12.
이본에 따라 ‘也’와 ‘夜’로 가지각색이다. 심지어 纂註分類杜詩와 이를 언해한 杜詩諺解와도 서로 다르다. 언해에서는 ‘이웃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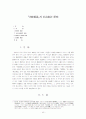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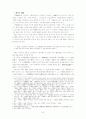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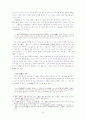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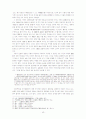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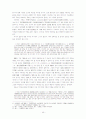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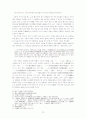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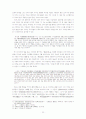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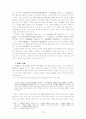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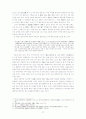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