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묘제와 유물의 특징
1) 묘제
2) 유물
3. 분묘군의 유형화
1) '옥성리유형'의 설정
2) '임당유형'의 설정
4. 분묘자료에 반영된 지방통제방식
5. 맺음말
2. 묘제와 유물의 특징
1) 묘제
2) 유물
3. 분묘군의 유형화
1) '옥성리유형'의 설정
2) '임당유형'의 설정
4. 분묘자료에 반영된 지방통제방식
5. 맺음말
본문내용
.
상주는 경북내륙통치의 중요 거점이며 신라에서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이다. 근래에 들어 청리(靑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靑里遺蹟(I∼VIII)』
----------------, 1999 『尙州 靑里遺蹟(IX∼X)』
, 신흥리(新興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新興里古墳群(I∼V)』
, 성동리(城洞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尙州 城洞里古墳群』
등 중요한 분묘군이 발굴되었다. 이중 성동리에서는 유구의 규모는 작지만 몇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고 모두 8점의 마형대구(馬形帶鉤)가 출토되었다.
) 마형대구는 천안의 청당동과 청원의 송대리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어 수량적으로는 마한지역이 우세하지만, 진한의 경우 조양동, 변한의 경우 김해 구지로에서 출토된 바 있어 아직 분포의 중심권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성동리의 마형대구는 매우 형식화된 것이며 표면에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고 머리나 몸체의 표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다. 보고자는 4세기 중엽의 연대를 부여하고 있다.
청리에는 주로 5∼7세기대 분묘가 집중 조영되어 있다. 5세기대의 무덤은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경주산토기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고,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유구가 대형화된다.
) 이 시기가 되면 기존의 대형분묘군의 축조가 종료되고 새로이 주변에서 비교적 균등한 규모의 많은 분묘군이 축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신라의 중앙에 의한 지방사회재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李漢祥,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軍史』35, 國防軍史硏究所, p. 27
상주의 4세기대 무덤으로는 신흥리를 들 수 있다. 대체로 4세기 후반부터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갑주류와 마구, 토기는 경주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일하며 경주산(慶州産)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4세기의 어느 시점부터 신라의 영향력이 상주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4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포항과 울산에서는 수장의 존재를 상징하는 무덤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래·경산은 대형의 수장묘가 축조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아직 자료의 축적이 적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국명이 전하는 청도·안강·영천도 \'옥성리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세기대 이후가 되면 동래나 경산보다 더욱 외곽에 위치한 대구·창녕·선산·성주·의성·안동·영해에 대형 수장묘의 축조가 누세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4세기대의 \'임당유형\' 분묘군이 더욱 확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4세기대의 신라는 경주에 인접한 포항·울산·영천·청도·안강 등지의 수장층을 해체하고 모든 기반을 중앙에서 통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경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이나 인력을 이 지역에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산이나 동래를 비롯한 \'임당유형\'분묘군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지역에서도 각종 물품이나 인력을 중앙에 공급했을 것이지만 \'옥성리유형\'분묘군이 존재하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졌을 것이며, 수장층의 자치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고고자료를 분석하여 4세기대 신라의 지방지배방식을 추론하여 보았다. 간략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4세기대의 신라는 옛 진한(辰韓)지역을 모두 복속시키고, 김해의 금관가야(金官加耶)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강자(强者)로 부각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비로소 신라의 실체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무덤의 형태에서 신라적인 모습을 찾으려 할 때 주목되는 예가 같은 묘광 내에 주부곽을 설치하는 세장방형 목곽묘이다. 이러한 유형의 무덤은 경주의 구정동·죽동리·구어리를 비롯하여 포항의 옥성리, 울산의 중산리와 다운동, 경산의 임당 등 구(舊) 진한(辰韓)지역 각지에서 공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 묘제가 분포하는 울산, 포항, 경산은 모두 경주와 지근거리에 있고 경주의 영향이 일찍부터 미친 곳이다.
이 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신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로는 와질(瓦質)의 압형토기가 있다. 현재까지 울산의 중산리 ID-15호묘와 하대 46호묘, 경산의 임당 EI-3호묘, 부산의 복천동 38호묘, 흥해 옥성리 나-108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중심연대는 3세기후반에서 4세기 전반 무렵이다. 그밖에 고사리무늬가 표현된 궐수문철모(蕨手紋鐵 )와 비취옥(翡翠玉)이 있다.
4세기대의 신라는 사로국(斯盧國)이 중심이 되어 진한소국을 본격적으로 정복하였던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경북내륙의 일부, 낙동강 이동, 동해안(삼척 이하) 일부지역이 그 범위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연(外緣)은 가변적이었을 것이고 이중 세장방형목곽묘와 압형토기·궐수문철모·갑주·비취제 곡옥이 출토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지녔을 것이다. 즉 서로는 경산, 동북으로는 포항, 동남으로는 울산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 지역 중 특히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나 안강, 포항, 영천 등지에 존재했던 소국의 경우 기존에 지녔던 자치적인 기반의 상당부분이 신라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포항 옥성리분묘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이 잘 확인된다. 즉 3세기대까지 비교적 뚜렷하던 수장(首長)의 존재가 잘 관찰되지 않게 된다.
반면 신라의 변경지대에 위치하면서 가야와 접경하고 있거나 지방지배에 있어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세력은 이전부터 지녀왔던 소국적 기반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산 임당분묘군 자료에서 표지적으로 확인된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단발적인 군사행동이나 위세품의 하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과 통제를 병행하면서 신라권으로부터의 이탈을 막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시기부터 지방지배의 유효한 수단이던 철소재 혹은 철기의 공급도 여전히 중요한 통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4세기대의 이러한 모습은 5세기대로 그대로 이어지며, 특히 5세기 중후반부터는 각종 노역에 지방민을 직접 동원하면서 자율보다는 규제가 더욱 강해져 6세기대 영역지배의 단초가 열리게 된다.
상주는 경북내륙통치의 중요 거점이며 신라에서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이다. 근래에 들어 청리(靑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靑里遺蹟(I∼VIII)』
----------------, 1999 『尙州 靑里遺蹟(IX∼X)』
, 신흥리(新興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新興里古墳群(I∼V)』
, 성동리(城洞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尙州 城洞里古墳群』
등 중요한 분묘군이 발굴되었다. 이중 성동리에서는 유구의 규모는 작지만 몇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고 모두 8점의 마형대구(馬形帶鉤)가 출토되었다.
) 마형대구는 천안의 청당동과 청원의 송대리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어 수량적으로는 마한지역이 우세하지만, 진한의 경우 조양동, 변한의 경우 김해 구지로에서 출토된 바 있어 아직 분포의 중심권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성동리의 마형대구는 매우 형식화된 것이며 표면에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고 머리나 몸체의 표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다. 보고자는 4세기 중엽의 연대를 부여하고 있다.
청리에는 주로 5∼7세기대 분묘가 집중 조영되어 있다. 5세기대의 무덤은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경주산토기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고,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유구가 대형화된다.
) 이 시기가 되면 기존의 대형분묘군의 축조가 종료되고 새로이 주변에서 비교적 균등한 규모의 많은 분묘군이 축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신라의 중앙에 의한 지방사회재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李漢祥,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軍史』35, 國防軍史硏究所, p. 27
상주의 4세기대 무덤으로는 신흥리를 들 수 있다. 대체로 4세기 후반부터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갑주류와 마구, 토기는 경주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일하며 경주산(慶州産)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4세기의 어느 시점부터 신라의 영향력이 상주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4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포항과 울산에서는 수장의 존재를 상징하는 무덤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래·경산은 대형의 수장묘가 축조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아직 자료의 축적이 적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국명이 전하는 청도·안강·영천도 \'옥성리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세기대 이후가 되면 동래나 경산보다 더욱 외곽에 위치한 대구·창녕·선산·성주·의성·안동·영해에 대형 수장묘의 축조가 누세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4세기대의 \'임당유형\' 분묘군이 더욱 확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4세기대의 신라는 경주에 인접한 포항·울산·영천·청도·안강 등지의 수장층을 해체하고 모든 기반을 중앙에서 통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경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이나 인력을 이 지역에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산이나 동래를 비롯한 \'임당유형\'분묘군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지역에서도 각종 물품이나 인력을 중앙에 공급했을 것이지만 \'옥성리유형\'분묘군이 존재하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졌을 것이며, 수장층의 자치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고고자료를 분석하여 4세기대 신라의 지방지배방식을 추론하여 보았다. 간략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4세기대의 신라는 옛 진한(辰韓)지역을 모두 복속시키고, 김해의 금관가야(金官加耶)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강자(强者)로 부각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비로소 신라의 실체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무덤의 형태에서 신라적인 모습을 찾으려 할 때 주목되는 예가 같은 묘광 내에 주부곽을 설치하는 세장방형 목곽묘이다. 이러한 유형의 무덤은 경주의 구정동·죽동리·구어리를 비롯하여 포항의 옥성리, 울산의 중산리와 다운동, 경산의 임당 등 구(舊) 진한(辰韓)지역 각지에서 공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 묘제가 분포하는 울산, 포항, 경산은 모두 경주와 지근거리에 있고 경주의 영향이 일찍부터 미친 곳이다.
이 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신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로는 와질(瓦質)의 압형토기가 있다. 현재까지 울산의 중산리 ID-15호묘와 하대 46호묘, 경산의 임당 EI-3호묘, 부산의 복천동 38호묘, 흥해 옥성리 나-108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중심연대는 3세기후반에서 4세기 전반 무렵이다. 그밖에 고사리무늬가 표현된 궐수문철모(蕨手紋鐵 )와 비취옥(翡翠玉)이 있다.
4세기대의 신라는 사로국(斯盧國)이 중심이 되어 진한소국을 본격적으로 정복하였던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경북내륙의 일부, 낙동강 이동, 동해안(삼척 이하) 일부지역이 그 범위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연(外緣)은 가변적이었을 것이고 이중 세장방형목곽묘와 압형토기·궐수문철모·갑주·비취제 곡옥이 출토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지녔을 것이다. 즉 서로는 경산, 동북으로는 포항, 동남으로는 울산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 지역 중 특히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나 안강, 포항, 영천 등지에 존재했던 소국의 경우 기존에 지녔던 자치적인 기반의 상당부분이 신라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포항 옥성리분묘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이 잘 확인된다. 즉 3세기대까지 비교적 뚜렷하던 수장(首長)의 존재가 잘 관찰되지 않게 된다.
반면 신라의 변경지대에 위치하면서 가야와 접경하고 있거나 지방지배에 있어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세력은 이전부터 지녀왔던 소국적 기반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산 임당분묘군 자료에서 표지적으로 확인된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단발적인 군사행동이나 위세품의 하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과 통제를 병행하면서 신라권으로부터의 이탈을 막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시기부터 지방지배의 유효한 수단이던 철소재 혹은 철기의 공급도 여전히 중요한 통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4세기대의 이러한 모습은 5세기대로 그대로 이어지며, 특히 5세기 중후반부터는 각종 노역에 지방민을 직접 동원하면서 자율보다는 규제가 더욱 강해져 6세기대 영역지배의 단초가 열리게 된다.
추천자료
 교수 매체의 활용, 교수매체 자료의 제작과 활용, 교수 매체의 유형
교수 매체의 활용, 교수매체 자료의 제작과 활용, 교수 매체의 유형 교육 평가의 유형에 대한 발표 자료(ppt)+교육평가 동영상 자료 링크
교육 평가의 유형에 대한 발표 자료(ppt)+교육평가 동영상 자료 링크 [리더쉽관련 자료] 리더쉽 유형의 자기점검을 위한 소고 리포트~
[리더쉽관련 자료] 리더쉽 유형의 자기점검을 위한 소고 리포트~ 수준별학습(교육, 수업) 교수학습자료의 특징, 수준별학습(교육, 수업) 교수학습자료의 유형,...
수준별학습(교육, 수업) 교수학습자료의 특징, 수준별학습(교육, 수업) 교수학습자료의 유형,... MBTI 성격유형검사와 4가지선호지표별 16가지 성격유형 설명 PPT 발표자료
MBTI 성격유형검사와 4가지선호지표별 16가지 성격유형 설명 PPT 발표자료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마한 분구묘 호남지역의 분묘유형과 전개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마한 분구묘 호남지역의 분묘유형과 전개 심화보충교수학습의 유형, 심화보충교수학습 성격, 심화보충교수학습 운영과 원리, 수학과 심...
심화보충교수학습의 유형, 심화보충교수학습 성격, 심화보충교수학습 운영과 원리, 수학과 심... 영어과교육 지도자료(교수자료)의 유형, 영어과교육 지도자료(교수자료)의 필요성, 영어과교...
영어과교육 지도자료(교수자료)의 유형, 영어과교육 지도자료(교수자료)의 필요성, 영어과교...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유형,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필요성,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구성과 ...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유형,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필요성, 교수학습자료(지도자료)구성과 ... 장애인고용의 유형과 장애인취업 현황 통계자료 분석
장애인고용의 유형과 장애인취업 현황 통계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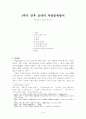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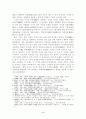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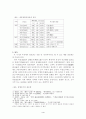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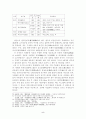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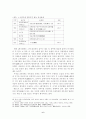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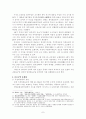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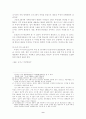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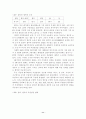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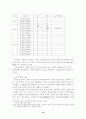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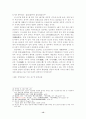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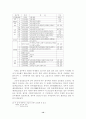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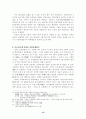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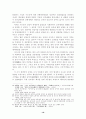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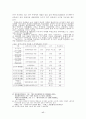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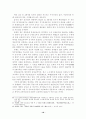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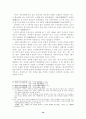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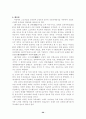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