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그러한데, 초등학교가 더욱 관료적인 것을 교육의 효과를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과업의 기능적인 분화라는 전문화의 원칙도 학교의 경우 전문적 기능의 합리적 분할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영역의 경우, 자격증은 1급, 2급 또는 준교사로 엄연히 다른데도 이들 교사의 역할은 모두 동일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관리적 영역의 경우도 업무분장이라 하여 잡다하게 의무를 분화시켜 놓았으나 그 전문성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흔히 잡무라고 보는 것이 허다하다.
세 번째로 관료제 이론은 작업단위제 분업을 강조하는 나머지 상호관련성의 문제는 덜 강조하여 전체보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조직의 내적 구조나 기능을 강조하는 나머지 조직의 외부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등한시하는 폐쇄적이고 경직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조직내의 어떤 부서의 일에만 뛰어날 뿐,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로 옮기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소위 훈련받은 무능력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현상은 학교조직의 경우 교무직과 서무직 간의 갈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육행정 기관의 경우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간의 갈등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분하다. 그리고 교육조직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가 구태의연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능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외부 사태의 변동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있다.
네 번째로 교육행정조직의 경우 교육부의 일반직은 대체로 계층제를 따르고 교육전문직은 담당관제라 하여 엄격한 계층제를 따르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교육청의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은 다 같이 국-과-계의 계층제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느 구조가 더 합리적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양자간의 기능 관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직이 전문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입장에 서느냐 또는 전문직이 오히려 일반직으로 업무수행에 보조적 기능을 하도록, 다시 말해 일반직이 전문직을 활용하는 입장에 서느냐 또는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전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가 그러하듯이 교육조직은 관료제화와 전문직화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료적 기대와 전문적 기대간의 상충과 갈등의 해결이 근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조직의 독자적 성격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조직보다도 극심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쓰레기통 모형이라든가 느슨하게 연결된 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관료제적 특성과 전문직적 특성을 한 연속상의 상재거, 정도상의 문제로 보고 교육조직의 독자성을 유지ㆍ발전시키면서 관료제적 속성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관료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적정정도에 관한 연구가 촉진되고, 교육행정가의 능력을 향상시켜 관료제적 특징과 전문직적 특성을 통합하고 조정 할 수 있는 교육행정가의 양성체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과업의 기능적인 분화라는 전문화의 원칙도 학교의 경우 전문적 기능의 합리적 분할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영역의 경우, 자격증은 1급, 2급 또는 준교사로 엄연히 다른데도 이들 교사의 역할은 모두 동일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관리적 영역의 경우도 업무분장이라 하여 잡다하게 의무를 분화시켜 놓았으나 그 전문성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흔히 잡무라고 보는 것이 허다하다.
세 번째로 관료제 이론은 작업단위제 분업을 강조하는 나머지 상호관련성의 문제는 덜 강조하여 전체보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조직의 내적 구조나 기능을 강조하는 나머지 조직의 외부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등한시하는 폐쇄적이고 경직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조직내의 어떤 부서의 일에만 뛰어날 뿐,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로 옮기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소위 훈련받은 무능력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현상은 학교조직의 경우 교무직과 서무직 간의 갈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육행정 기관의 경우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간의 갈등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분하다. 그리고 교육조직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가 구태의연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능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외부 사태의 변동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있다.
네 번째로 교육행정조직의 경우 교육부의 일반직은 대체로 계층제를 따르고 교육전문직은 담당관제라 하여 엄격한 계층제를 따르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교육청의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은 다 같이 국-과-계의 계층제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느 구조가 더 합리적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양자간의 기능 관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직이 전문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입장에 서느냐 또는 전문직이 오히려 일반직으로 업무수행에 보조적 기능을 하도록, 다시 말해 일반직이 전문직을 활용하는 입장에 서느냐 또는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전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가 그러하듯이 교육조직은 관료제화와 전문직화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료적 기대와 전문적 기대간의 상충과 갈등의 해결이 근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조직의 독자적 성격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조직보다도 극심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쓰레기통 모형이라든가 느슨하게 연결된 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관료제적 특성과 전문직적 특성을 한 연속상의 상재거, 정도상의 문제로 보고 교육조직의 독자성을 유지ㆍ발전시키면서 관료제적 속성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관료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적정정도에 관한 연구가 촉진되고, 교육행정가의 능력을 향상시켜 관료제적 특징과 전문직적 특성을 통합하고 조정 할 수 있는 교육행정가의 양성체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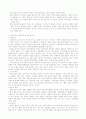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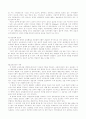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