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목차
권두언
서두. 춘추시대의 개괄
1. 춘추전국시대의 시기구분
2. 춘추시대 초기의 정치형세
3. 춘추시대의 시대적 특징
본론1. 춘추시대의 사상
1.제자백가란
2.등장배경
3.내용
1)유가
(1)공자
(2)맹자
(3)순자
2)도가:
(1) 노자
(2)장자.
3)법가
(1)한비자 이전의 법가 사상
(2)한비자
4)묵가
(1)묵자
5)명가
(1)등석의 사상
(2)혜시와 공손룡의 사상
6)음양가
(1)추연의 사상
7)종횡가
(1)소진과 장의의 사상
8)잡가
(1)여씨춘추
(2)회남자
9)농가
10)병가
(1)손무
(2)오기
(3)손빈
4.동양사상에서의 제자백가의 중요성
본론2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의 활동구분
본론3 춘주 전국시대 이전의 사상이 성립과정 및 배경
1. 周나라
2. 주나라의 시대적 성격
3. 西周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
4. 西周시대의 이데올로기
5. 서주시대의 사상
본론4 진나라, 한나라 사상 성립과정 및 배경
결론
서두. 춘추시대의 개괄
1. 춘추전국시대의 시기구분
2. 춘추시대 초기의 정치형세
3. 춘추시대의 시대적 특징
본론1. 춘추시대의 사상
1.제자백가란
2.등장배경
3.내용
1)유가
(1)공자
(2)맹자
(3)순자
2)도가:
(1) 노자
(2)장자.
3)법가
(1)한비자 이전의 법가 사상
(2)한비자
4)묵가
(1)묵자
5)명가
(1)등석의 사상
(2)혜시와 공손룡의 사상
6)음양가
(1)추연의 사상
7)종횡가
(1)소진과 장의의 사상
8)잡가
(1)여씨춘추
(2)회남자
9)농가
10)병가
(1)손무
(2)오기
(3)손빈
4.동양사상에서의 제자백가의 중요성
본론2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의 활동구분
본론3 춘주 전국시대 이전의 사상이 성립과정 및 배경
1. 周나라
2. 주나라의 시대적 성격
3. 西周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
4. 西周시대의 이데올로기
5. 서주시대의 사상
본론4 진나라, 한나라 사상 성립과정 및 배경
결론
본문내용
강조한 한(韓)의 신불해(申不害), 그리고 신하가 군주에 복종하는 것은 군주의 세력이지 결코 그의 덕행이나 재능때문이 아니라고 하여 \'세(勢)\'를 강조한 신도(愼到), 그리고 진(秦) 효공(孝公)을 도와 2차 걸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여 이후 진(秦)의 통일기반을 제공한 상앙(商) 역시 법가(法家)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2)한비자
①한비자의 생애
한비자는 한(韓)나라의 왕족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일은 잘 알 수 없지만 사망일은 그가 약 50세가 되던 해, 즉 B.C 233년 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탄생한 해는 B.C 282~280년 사이가 된다.
그는 진시황의 영의정 이사 중국 진(秦)나라 통일에 공적을 세운 법가(法家)의 정치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상채(上蔡) 출신. 순자(荀子)에게 제왕학(帝王學)을 배웠으며, 초나라나 동방의 여러 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쪽의 진나라로 갔다. 이후 그의 책략이 중용되어 진왕을 도와 천하통일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군현제(郡縣制)·분서갱유및 문자와 도량형의 통일 등은 그의 진언에 의한 것이다. 시황제가 죽은 뒤 조고(趙高)가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2대 황제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으나, 나중에 두 사람의 횡포를 비난하다가 투옥되어 요참형(腰斬刑)에 처해졌다.
와 더불어 순자의 문하생이었다. 법가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순자의 인성론이 <난폭상태>를 제어함에 있어서 법이 도덕에 대치되어야 한다는 법가의 논변에 훌륭한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귀족이었던 그는 사회질서의 테두리로서 단호한 귀족정치와 법률을 창도하였다. 그는 한나라가 직면한 위험을 깨닫고 왕에게 간언하기도 하였으나 왕의 거절로 낙담하고 실망한 나머지 생활에 묻혀 저술에 꾸준히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의 시황은 달라서 그의 <고분>과 <오두>논문을 보고 \" 이사람과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까지 감탄하였다. 후에 한이 평화의 사신으로 한비자를 보내자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아주 진에 머물게 하였으나 이사는 내심 이를 못마땅히 여겨 시황에게 참언하여 한비자를 옥에 가두게 한 후, 독약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그의 사후 그의 주장은 진시황이 강력한 전제체제를 확립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문장을 모은 것이 『한비자』 55편이다.
②한비자의 사상
한비는 이전 국가통치의 최고원리인 예(禮)를 분명하게 법(法)으로 대체시켜 제자백가 중 법가(法家)를 종합한 전국시대 마지막 대학자이다. 그가 주장한 법치(法治)사상은 한마디로 법(法)과 술(術)로 요약된다.
㉠도덕에 대한 법(法)의 우위
한비자가 배움을 받은 순자는 예에 중심을 두었다고 하지만, 유가의 사람이었을 뿐, 도덕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비자에 이르러 여러가지 각도에서 법의 도덕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정치의 유일한 방법은 법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률만능(法律 萬能)의 정치 사상이다. 한비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란 철두 철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善)이란 설은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속의 속마음을 파헤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가슴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익은 항상 상반되기 마련이다. 군주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군주의 이익과 백성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사이에도 이해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노리고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임금과 신하는 본래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남과 남의 사이이며, 임금과 백성의 사이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힘에 의한 관계이다. 그러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충성심만을 기대하는 정치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신하와 백성들을 인의나 도덕, 인정이나 은애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잘 운용한다면 천하의 백정들은 법의 궤도 안에 매이게 되어 나라의 질서는 저절로 정연하게 될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는 형벌을 엄하고 중하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잘 운용한다는 말은 법을 그야말로 만인에게 평등가게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추호만큼의 사(私)도 두지 말아야 하며, 조금의 부욕이나 온정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정치 사상이다.
㉡법 운용의 기술(術)
1.형명참동(刑名參同)의 설
법이 아무리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임금된 자는 이익이 상반할 수도 있는 신하들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오직 임금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 주도록 신하들을 잘 부려야 할 것이다. 그 신하를 잘 부리는 데는 술(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술(術)의 제 1은 형명참동이라 하는 것이다. 형(形)은 구체적인 실질, 명(名)은 표면의 명의(名義)라는 의미이어서, 명실(名實)이 일치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느 직명을 가진 관리가 그 직명에 따라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이, 즉 형명참동이다. 그 직명 보다도 이하의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물론 벌하지만 그 직명을 벗어난 실적을 거둔 경우에도 벌한다. 이 직명을 넘은 실적이 있는 자를 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의 일률적 적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대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법의 운용은 재판관의 인정에 의한 것이 모범이지만, 거기에는 재판관의 개성이라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법 적용의 공평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손상된다. 근대법은 이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법문을 기계적 . 형식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한비자의 형명참동의 사상은 근대법의 정신을 앞서 가
(2)한비자
①한비자의 생애
한비자는 한(韓)나라의 왕족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일은 잘 알 수 없지만 사망일은 그가 약 50세가 되던 해, 즉 B.C 233년 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탄생한 해는 B.C 282~280년 사이가 된다.
그는 진시황의 영의정 이사 중국 진(秦)나라 통일에 공적을 세운 법가(法家)의 정치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상채(上蔡) 출신. 순자(荀子)에게 제왕학(帝王學)을 배웠으며, 초나라나 동방의 여러 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쪽의 진나라로 갔다. 이후 그의 책략이 중용되어 진왕을 도와 천하통일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군현제(郡縣制)·분서갱유및 문자와 도량형의 통일 등은 그의 진언에 의한 것이다. 시황제가 죽은 뒤 조고(趙高)가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2대 황제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으나, 나중에 두 사람의 횡포를 비난하다가 투옥되어 요참형(腰斬刑)에 처해졌다.
와 더불어 순자의 문하생이었다. 법가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순자의 인성론이 <난폭상태>를 제어함에 있어서 법이 도덕에 대치되어야 한다는 법가의 논변에 훌륭한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귀족이었던 그는 사회질서의 테두리로서 단호한 귀족정치와 법률을 창도하였다. 그는 한나라가 직면한 위험을 깨닫고 왕에게 간언하기도 하였으나 왕의 거절로 낙담하고 실망한 나머지 생활에 묻혀 저술에 꾸준히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의 시황은 달라서 그의 <고분>과 <오두>논문을 보고 \" 이사람과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까지 감탄하였다. 후에 한이 평화의 사신으로 한비자를 보내자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아주 진에 머물게 하였으나 이사는 내심 이를 못마땅히 여겨 시황에게 참언하여 한비자를 옥에 가두게 한 후, 독약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그의 사후 그의 주장은 진시황이 강력한 전제체제를 확립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문장을 모은 것이 『한비자』 55편이다.
②한비자의 사상
한비는 이전 국가통치의 최고원리인 예(禮)를 분명하게 법(法)으로 대체시켜 제자백가 중 법가(法家)를 종합한 전국시대 마지막 대학자이다. 그가 주장한 법치(法治)사상은 한마디로 법(法)과 술(術)로 요약된다.
㉠도덕에 대한 법(法)의 우위
한비자가 배움을 받은 순자는 예에 중심을 두었다고 하지만, 유가의 사람이었을 뿐, 도덕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비자에 이르러 여러가지 각도에서 법의 도덕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정치의 유일한 방법은 법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률만능(法律 萬能)의 정치 사상이다. 한비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란 철두 철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善)이란 설은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속의 속마음을 파헤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가슴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익은 항상 상반되기 마련이다. 군주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군주의 이익과 백성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사이에도 이해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노리고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임금과 신하는 본래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남과 남의 사이이며, 임금과 백성의 사이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힘에 의한 관계이다. 그러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충성심만을 기대하는 정치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신하와 백성들을 인의나 도덕, 인정이나 은애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잘 운용한다면 천하의 백정들은 법의 궤도 안에 매이게 되어 나라의 질서는 저절로 정연하게 될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는 형벌을 엄하고 중하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잘 운용한다는 말은 법을 그야말로 만인에게 평등가게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추호만큼의 사(私)도 두지 말아야 하며, 조금의 부욕이나 온정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정치 사상이다.
㉡법 운용의 기술(術)
1.형명참동(刑名參同)의 설
법이 아무리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임금된 자는 이익이 상반할 수도 있는 신하들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오직 임금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 주도록 신하들을 잘 부려야 할 것이다. 그 신하를 잘 부리는 데는 술(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술(術)의 제 1은 형명참동이라 하는 것이다. 형(形)은 구체적인 실질, 명(名)은 표면의 명의(名義)라는 의미이어서, 명실(名實)이 일치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느 직명을 가진 관리가 그 직명에 따라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이, 즉 형명참동이다. 그 직명 보다도 이하의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물론 벌하지만 그 직명을 벗어난 실적을 거둔 경우에도 벌한다. 이 직명을 넘은 실적이 있는 자를 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의 일률적 적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대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법의 운용은 재판관의 인정에 의한 것이 모범이지만, 거기에는 재판관의 개성이라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법 적용의 공평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손상된다. 근대법은 이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법문을 기계적 . 형식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한비자의 형명참동의 사상은 근대법의 정신을 앞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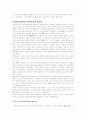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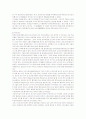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