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학이
제2편
제3편 ‘팔 일’
제4편 ‘이 인’
제5편 공야장
제6편 옹야
제7편 술이
제8편 ‘태 백’
제9편 ‘자 한’
10.향당
11.선진
12. 안연(顔淵)
13장
14장
제15장 위영공
제16장 계 씨 (季 氏)
제17장 양 화 (陽 貨)
제18편 미 자 (微 子)
제19편 자 장 (子 張)
제20장 요 왈 (堯 曰)
제2편
제3편 ‘팔 일’
제4편 ‘이 인’
제5편 공야장
제6편 옹야
제7편 술이
제8편 ‘태 백’
제9편 ‘자 한’
10.향당
11.선진
12. 안연(顔淵)
13장
14장
제15장 위영공
제16장 계 씨 (季 氏)
제17장 양 화 (陽 貨)
제18편 미 자 (微 子)
제19편 자 장 (子 張)
제20장 요 왈 (堯 曰)
본문내용
람을 대하는 것이 간사한 사람, 겉으로는 굽신거리며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말로만 처리하려는 사람 등은 사귀어서 해롭다고 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도리에 밝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아첨하고 굽실거리고 말로만 떠벌이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뜻이다.
5. 사람이 즐기는 것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다. 예(禮)와 악(樂)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남의 좋은 점을 입에 올리고, 훌륭한 벗을 많이 사귀는 것 등은 즐기면 즐길수록 이롭다. 그러나 예로 절제를 하지 않은 교만한 악을 즐기고,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주색의 향락 등을 즐기면 해롭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은 힘쓰고 해로운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7장 양 화 (陽 貨)
2. 사람이 타고난 천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의하여 심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라고도 불리며 환경과 교육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3.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의와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리에 현혹되어 마음이나 뜻이 변하지 않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싱다. 상지(上知)와 하우(下愚)에 대하여서는 전편(前篇) 9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재는 아무리 해도 어리석게 만들 수 없고, 바보는 아무리해도 지혜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12. 겉만 위엄있는 체 꾸미고 있는 사람은 도둑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위선을 가장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간은 사실 도둑보다 더 나쁜 존재가 아니겠는가.
제18편 미 자 (微 子)
7. 세상에 나와 벼슬하지 않음은 의리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이에 있어서의 예절도 벌리 수 없거늘 하물며 군신의 의리를 어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내 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대의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자가 세상에 나아가 벼슬함은 대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며, 천하에 정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9. 공자는 학문과 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육예의 기예에도 통달했었다. 그는 예에 못지 않게 약도 몹시 존중했다. 본문에 나오는 악사들은 모두 공자 당시의 노나라 악사들이었는데, 노나라에 있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는 아마 노 소공 25년경의 일이라 짐작된다. 궁중의 악을 책임지던 태사는 제나라로 가고, 임금의 식사 때 악장을 맡던 사람들도 각기 초, 채, 진나라로 갔으며, 심지어 북을 치는 사람, 보조 악관까지 먼 지방이나 섬으로 들어갔다. 본장의 글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 당시 노나라가 점점 무도해져 가고 있음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 본다.
제 19편 자 장 (子 張)
2. 덕은 지니되 넓지 않고, 도를 믿되 두텁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덕이나 도가 있으나마나이다. 덕의 요소는 다양하다.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다 덕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또 적재적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진다. 그러므로 때로는 선행이 덕이 될 수 있고, 또 예가 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도를 믿으면 말이나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생활에서 도를 실천하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행(德行)의 범위를 넓게 가지고 도를 굳게 지켜 도의(道義)를 실행하여야 한다.
6.학문이란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박학(博學)할 뿐 뜻이 독실하지 않다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산 지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앎을 명확히 하고, 뜻을 독실히 하기 위해서 의심나느 것은 기탄없이 묻는 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해결점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도를 올바로 아는 길이며, 인(仁)을 구하는 태도라고 한 것이다.
8.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숨기려 들고 또 그것이 남에게 발각되면 변명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이는 자신의 발전을 막을뿐더러 불의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어넣는 행위이다. 그래서 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고치려 들지 않고 변명하려 드는 사람을 소인(小人)이라고 한 것이다.
17.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진심을 다하여 인정을 베풀려 들지 않지만, 부모님의 상을 당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제 20장 요 왈 (堯 曰)
2. 자장(子張)이 선정을 행함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다섯가지 미덕을 받들어 행하고 네가지 악덕을 버리라고 일러 주었다. 먼저 다섯 가지 미덕을 말했다. 백성의 이로운 바에 좇아서 이로움을 행한다. 이것이 곧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첫째이다. 백성들이 수고해야 될 일만을 가려서 백성들에게 수고를 시킨다. 이것이 곧 수고를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둘째이다. 진실로 인(仁)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함을 베푼다. 이것이 곧 하고자 하되 탐욕을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셋째이다. 군자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리지 않고 감히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넷째이다. 군자는 그 의관을 단정히 하고 바라보는 눈매를 엄숙하게 한다. 이것이 곧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으로, 그 다섯째이다.
이어서 네 가지 악덕에 대하여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을 교화시키지 않고 엄한 벌로 다스리는 것을 잔악함이라 한다. 미리 경계하지 않고서 일의 결과만 보고 따지는 것은 난폭함이라한다. 명령은 소홀히 하고서도 일의 완성을 독촉하는 것을 해침이라 한다. 마땅히 내주어야 할 것을 내놓기에 인색한 사람을 창고지기라 한다 하였다. 이상의 네가지를 위정자들이 속히 버려야 할 악덕이라고 한 것이다.
3. 천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서서 처세할 수 없다. 말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다. <논어>에서는 본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내용이 앞서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 보면, 여기에 기록된 명(命), 예(禮), 언(言)의 세 항목은 늘 군자가 새기고 있어야 할 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사람이 즐기는 것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다. 예(禮)와 악(樂)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남의 좋은 점을 입에 올리고, 훌륭한 벗을 많이 사귀는 것 등은 즐기면 즐길수록 이롭다. 그러나 예로 절제를 하지 않은 교만한 악을 즐기고,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주색의 향락 등을 즐기면 해롭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은 힘쓰고 해로운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7장 양 화 (陽 貨)
2. 사람이 타고난 천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의하여 심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라고도 불리며 환경과 교육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3.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의와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리에 현혹되어 마음이나 뜻이 변하지 않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싱다. 상지(上知)와 하우(下愚)에 대하여서는 전편(前篇) 9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재는 아무리 해도 어리석게 만들 수 없고, 바보는 아무리해도 지혜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12. 겉만 위엄있는 체 꾸미고 있는 사람은 도둑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위선을 가장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간은 사실 도둑보다 더 나쁜 존재가 아니겠는가.
제18편 미 자 (微 子)
7. 세상에 나와 벼슬하지 않음은 의리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이에 있어서의 예절도 벌리 수 없거늘 하물며 군신의 의리를 어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내 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대의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자가 세상에 나아가 벼슬함은 대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며, 천하에 정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9. 공자는 학문과 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육예의 기예에도 통달했었다. 그는 예에 못지 않게 약도 몹시 존중했다. 본문에 나오는 악사들은 모두 공자 당시의 노나라 악사들이었는데, 노나라에 있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는 아마 노 소공 25년경의 일이라 짐작된다. 궁중의 악을 책임지던 태사는 제나라로 가고, 임금의 식사 때 악장을 맡던 사람들도 각기 초, 채, 진나라로 갔으며, 심지어 북을 치는 사람, 보조 악관까지 먼 지방이나 섬으로 들어갔다. 본장의 글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 당시 노나라가 점점 무도해져 가고 있음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 본다.
제 19편 자 장 (子 張)
2. 덕은 지니되 넓지 않고, 도를 믿되 두텁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덕이나 도가 있으나마나이다. 덕의 요소는 다양하다.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다 덕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또 적재적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진다. 그러므로 때로는 선행이 덕이 될 수 있고, 또 예가 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도를 믿으면 말이나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생활에서 도를 실천하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행(德行)의 범위를 넓게 가지고 도를 굳게 지켜 도의(道義)를 실행하여야 한다.
6.학문이란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박학(博學)할 뿐 뜻이 독실하지 않다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산 지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앎을 명확히 하고, 뜻을 독실히 하기 위해서 의심나느 것은 기탄없이 묻는 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해결점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도를 올바로 아는 길이며, 인(仁)을 구하는 태도라고 한 것이다.
8.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숨기려 들고 또 그것이 남에게 발각되면 변명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이는 자신의 발전을 막을뿐더러 불의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어넣는 행위이다. 그래서 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고치려 들지 않고 변명하려 드는 사람을 소인(小人)이라고 한 것이다.
17.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진심을 다하여 인정을 베풀려 들지 않지만, 부모님의 상을 당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제 20장 요 왈 (堯 曰)
2. 자장(子張)이 선정을 행함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다섯가지 미덕을 받들어 행하고 네가지 악덕을 버리라고 일러 주었다. 먼저 다섯 가지 미덕을 말했다. 백성의 이로운 바에 좇아서 이로움을 행한다. 이것이 곧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첫째이다. 백성들이 수고해야 될 일만을 가려서 백성들에게 수고를 시킨다. 이것이 곧 수고를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둘째이다. 진실로 인(仁)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함을 베푼다. 이것이 곧 하고자 하되 탐욕을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셋째이다. 군자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리지 않고 감히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넷째이다. 군자는 그 의관을 단정히 하고 바라보는 눈매를 엄숙하게 한다. 이것이 곧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으로, 그 다섯째이다.
이어서 네 가지 악덕에 대하여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을 교화시키지 않고 엄한 벌로 다스리는 것을 잔악함이라 한다. 미리 경계하지 않고서 일의 결과만 보고 따지는 것은 난폭함이라한다. 명령은 소홀히 하고서도 일의 완성을 독촉하는 것을 해침이라 한다. 마땅히 내주어야 할 것을 내놓기에 인색한 사람을 창고지기라 한다 하였다. 이상의 네가지를 위정자들이 속히 버려야 할 악덕이라고 한 것이다.
3. 천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서서 처세할 수 없다. 말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다. <논어>에서는 본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내용이 앞서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 보면, 여기에 기록된 명(命), 예(禮), 언(言)의 세 항목은 늘 군자가 새기고 있어야 할 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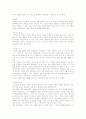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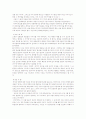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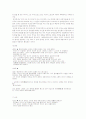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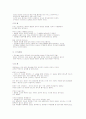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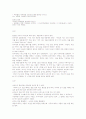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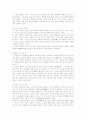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