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자와 논어
1) 공자의 일생
2) 논어에 대하여
3) 논어와 공자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2)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
1) 인
2) 윤리
3) 교육
4) 정치
3. 결론
※ 참고문헌
2. 본론
(1) 공자와 논어
1) 공자의 일생
2) 논어에 대하여
3) 논어와 공자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2)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
1) 인
2) 윤리
3) 교육
4) 정치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 일정 계급적 도덕이론은 이 계급의 정치제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자의 \"인\"도 \"예\"에 종속되는 것이다.
공자는 \"인\"을 \"復禮\"를 추진하는 일종의 도덕적 동력이자 사상적 근거로 보는 한편, \"인\"의 실행 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인이 어찌 멀리 있으랴? 내가 인을 바란다면 그 인 은 이미 와 있다.\"라고 공자는 말한다. 자신이 \"인\"은 바로 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을 행 하려고만 한다면 \"인\"은 바로 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을 양심이나 자아의식의 산물롤 보 는 것이다. 이러한 유심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공자는 주관적인 도덕동기와 소위 \"내성적\"인 자아수양의 역할을 크게 내세웠다. 그는 \"인의 실천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서 비롯되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인\"의 실천이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자각과 주관에 따른 노력에 의거할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자는 노예소유주 귀족들이 오직 \"인\"을 실행하고 자각적으로 자기를 억제하며 주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면 \"인\"의 원칙 이 실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례 또한 옹호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예제 사회가 해체되어 봉건적 소유제 사회로 나아가돈 역사적 변혁기에 위치하는 공자의 인에 대한 학설은 한 역사시대의 복잡한 사회모순, 특히 통치계급 상층에서 발생한 모순으로서 분화와 투쟁을 반영한다. 공자가 중국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통치계급의 내부관계를 조정하는 원칙으로서 하나의 도덕범주인 \"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치계급 내부에 새로운 위기가 출현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불가결한 새로운 조치였다. 그러나 공자는 노예제 사회의 종법제도를 옹호하는 반동적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도덕학설도 위선과 기만적 성질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같은 본질이 일체의 반동계급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이로써 그는 중국 역대의 반동통치자나 모 든 착취제도의 옹호자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공자의 \"인\"의 학설은 역대 봉건지주계급 사상가에 의해 지지, 보완되어 \"三綱五常\"과 \"忠孝節義\"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봉건 예교사상으로 발전하여 봉건통치를 옹호하는 냉혹한 사상적 압박도구가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 역사상 공자 때까지 \"仁 慈\"의 의미밖에 없었던 \"인\"이 봉건지주계급의 독재를 위한 마취제이자 항상 노동인민의 신체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② 윤리에 대한 본문 내용
학위편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신근어의면 언가복야며 공근어례면 원치욕야며 인부실기친이면 역가종야니라.
近 가까울 근 , 復 돌아올 복 , 遠 멀 원 , 恥 부끄러워할 치 , 因 인할 인 , 失 잃을 실, 亦 또 역 , 宗 마루 종
해석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의지하여 친근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존경하여 받들 수 있다.
해설 - 도올
선진문헌에서 \'信\'의 의미는 곧 인간의 \'말\'이다. 信은 곧 言인 것이다. 이 장의 信과 言도 결국 같은 단어의 배열이다. 인간의 믿음은 모두 말 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약속도 결국 \'말\'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해석은 이와 같다. 약속이라구 다 약속이냐? 그 약속이 義(의)에 가까운 것이래야, 즉 의로운 것이래야 지킬만 한 것이 아닌가? 인간의 말이란 의로운 것이래야 그 말이 되풀이되어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恭(공손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손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손한 자일 수록 위선자가 많다. 공손함도 禮에 가까워야만 비로소 치욕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다.
因은 앞 문장의 내용을 받은 전치사에 불과하다. \'因信恭不失其親\'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親(친)\'도 꼭 부모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부모로 시작해서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지, 친구들...... 나에게서 가까운 연줄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명사로 보면 될 것이다. \'宗(종)\'은 동사로서 종주로 모신다, 섬긴다, 받든다의 뜻이다. 평범하게 말하면 \'존경하다\'의 뜻이다.
주석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제에 있어서 모두 처음부터 삼가고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옹야편
子華使於齊(자화사어제)러니 : 자화가 공자의 명령으로 제나라에 가니
子爲其母請粟(염자위기모청속)한데 :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니
子曰與之釜(자왈여지부)하라 : 공자 말씀하시기를, “한 부를 주라”하니
請益(청익)하니 : 자화가 더 청하니
曰與之庾(청익왈여지유)하라 하시거늘 : 공자 말씀하시기를, “한 유를 주라.”하시니
子與之粟五秉(염자여지속오병)한데 : 염자가 곡식을 다섯 병을 주었더니
子曰赤之適齊也(자왈적지적제야)에 : 공자 말씀하시기를, “적이 제나라에 갈 때
乘肥馬(승비마)하며 : 말을 타고
衣輕(의경구)하니 : 가벼운 갓옷을 입었으니
吾聞之也(오문지야)하니 : 내가 듣기에는
君子周急(군자주급)이요 : 군자는 부족한 이를 도와주고 궁핍한 이를 도와주나
不繼富(불계부)라하니라 : 부유한 이를 보태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原思爲之宰(원사위지재)러니 :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다.
與之粟九百(여지속구백)이어시늘 : 곡식 구백 말을 주시니
辭(사)한대 : 사양하거늘
子曰毋(자왈무)하여 :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지 말라,
以與爾里鄕黨乎(이여이린리향당호)인저 : 너의 이웃과 마을과 향당에 나누어주어라.“고 하셨다.
子曰賢哉라回也(子曰賢哉라회야)여: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질구나! 안회여,
一簞食(일단사)와: 한 그릇의 밥과
一瓢飮(일표음)으로: 한 표주박의 음료로
在陋巷(재루항)을: 누항에 살면
人不堪其憂(인불감기우)어늘: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回也不改其樂(회야불개기락)하니: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賢哉(현재)라: 어질구나!
回也(회야)여: 안회여.\"라고 하셨다.
子謂子夏曰女爲君子儒(자위자하왈녀위군자유)요: 공자님이 자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자다운
공자는 \"인\"을 \"復禮\"를 추진하는 일종의 도덕적 동력이자 사상적 근거로 보는 한편, \"인\"의 실행 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인이 어찌 멀리 있으랴? 내가 인을 바란다면 그 인 은 이미 와 있다.\"라고 공자는 말한다. 자신이 \"인\"은 바로 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을 행 하려고만 한다면 \"인\"은 바로 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을 양심이나 자아의식의 산물롤 보 는 것이다. 이러한 유심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공자는 주관적인 도덕동기와 소위 \"내성적\"인 자아수양의 역할을 크게 내세웠다. 그는 \"인의 실천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서 비롯되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인\"의 실천이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자각과 주관에 따른 노력에 의거할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자는 노예소유주 귀족들이 오직 \"인\"을 실행하고 자각적으로 자기를 억제하며 주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면 \"인\"의 원칙 이 실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례 또한 옹호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예제 사회가 해체되어 봉건적 소유제 사회로 나아가돈 역사적 변혁기에 위치하는 공자의 인에 대한 학설은 한 역사시대의 복잡한 사회모순, 특히 통치계급 상층에서 발생한 모순으로서 분화와 투쟁을 반영한다. 공자가 중국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통치계급의 내부관계를 조정하는 원칙으로서 하나의 도덕범주인 \"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치계급 내부에 새로운 위기가 출현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불가결한 새로운 조치였다. 그러나 공자는 노예제 사회의 종법제도를 옹호하는 반동적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도덕학설도 위선과 기만적 성질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같은 본질이 일체의 반동계급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이로써 그는 중국 역대의 반동통치자나 모 든 착취제도의 옹호자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공자의 \"인\"의 학설은 역대 봉건지주계급 사상가에 의해 지지, 보완되어 \"三綱五常\"과 \"忠孝節義\"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봉건 예교사상으로 발전하여 봉건통치를 옹호하는 냉혹한 사상적 압박도구가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 역사상 공자 때까지 \"仁 慈\"의 의미밖에 없었던 \"인\"이 봉건지주계급의 독재를 위한 마취제이자 항상 노동인민의 신체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② 윤리에 대한 본문 내용
학위편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신근어의면 언가복야며 공근어례면 원치욕야며 인부실기친이면 역가종야니라.
近 가까울 근 , 復 돌아올 복 , 遠 멀 원 , 恥 부끄러워할 치 , 因 인할 인 , 失 잃을 실, 亦 또 역 , 宗 마루 종
해석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의지하여 친근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존경하여 받들 수 있다.
해설 - 도올
선진문헌에서 \'信\'의 의미는 곧 인간의 \'말\'이다. 信은 곧 言인 것이다. 이 장의 信과 言도 결국 같은 단어의 배열이다. 인간의 믿음은 모두 말 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약속도 결국 \'말\'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해석은 이와 같다. 약속이라구 다 약속이냐? 그 약속이 義(의)에 가까운 것이래야, 즉 의로운 것이래야 지킬만 한 것이 아닌가? 인간의 말이란 의로운 것이래야 그 말이 되풀이되어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恭(공손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손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손한 자일 수록 위선자가 많다. 공손함도 禮에 가까워야만 비로소 치욕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다.
因은 앞 문장의 내용을 받은 전치사에 불과하다. \'因信恭不失其親\'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親(친)\'도 꼭 부모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부모로 시작해서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지, 친구들...... 나에게서 가까운 연줄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명사로 보면 될 것이다. \'宗(종)\'은 동사로서 종주로 모신다, 섬긴다, 받든다의 뜻이다. 평범하게 말하면 \'존경하다\'의 뜻이다.
주석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제에 있어서 모두 처음부터 삼가고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옹야편
子華使於齊(자화사어제)러니 : 자화가 공자의 명령으로 제나라에 가니
子爲其母請粟(염자위기모청속)한데 :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니
子曰與之釜(자왈여지부)하라 : 공자 말씀하시기를, “한 부를 주라”하니
請益(청익)하니 : 자화가 더 청하니
曰與之庾(청익왈여지유)하라 하시거늘 : 공자 말씀하시기를, “한 유를 주라.”하시니
子與之粟五秉(염자여지속오병)한데 : 염자가 곡식을 다섯 병을 주었더니
子曰赤之適齊也(자왈적지적제야)에 : 공자 말씀하시기를, “적이 제나라에 갈 때
乘肥馬(승비마)하며 : 말을 타고
衣輕(의경구)하니 : 가벼운 갓옷을 입었으니
吾聞之也(오문지야)하니 : 내가 듣기에는
君子周急(군자주급)이요 : 군자는 부족한 이를 도와주고 궁핍한 이를 도와주나
不繼富(불계부)라하니라 : 부유한 이를 보태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原思爲之宰(원사위지재)러니 :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다.
與之粟九百(여지속구백)이어시늘 : 곡식 구백 말을 주시니
辭(사)한대 : 사양하거늘
子曰毋(자왈무)하여 :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지 말라,
以與爾里鄕黨乎(이여이린리향당호)인저 : 너의 이웃과 마을과 향당에 나누어주어라.“고 하셨다.
子曰賢哉라回也(子曰賢哉라회야)여: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질구나! 안회여,
一簞食(일단사)와: 한 그릇의 밥과
一瓢飮(일표음)으로: 한 표주박의 음료로
在陋巷(재루항)을: 누항에 살면
人不堪其憂(인불감기우)어늘: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回也不改其樂(회야불개기락)하니: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賢哉(현재)라: 어질구나!
回也(회야)여: 안회여.\"라고 하셨다.
子謂子夏曰女爲君子儒(자위자하왈녀위군자유)요: 공자님이 자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자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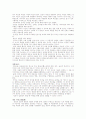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