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Arthur Miller(b.1915)
Ⅱ. Death of a Salesman(1949)
Ⅲ. 표현주의(EXPRESSIONISM)
Ⅱ. Death of a Salesman(1949)
Ⅲ. 표현주의(EXPRESSIONISM)
본문내용
생애
아서 밀러(Arthur Miller)는 1940년대 말 테네시 윌리엄즈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전후 미국의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들 중 한 사람이다. 아서 밀러는 1915년 10월 17일 미국 뉴욕 출생으로 아버지는 의류 제조업자이며, 어머니는 전직 교사인 유대인계 중류 가정의 3남매 중 둘째 아들이었다. 극작가로 입문 전 밀러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1929년의 경제 대공황으로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그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접시닦이, 사환, 트럭 운전사, 하역부, 창고 직원, 웨이터 등의 직업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은 하층민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결론적으로 밀러의 작품 세계에 많이 반영되게 된다.
재학 중에 쓴 몇 편의 희곡 작품으로 상을 받은 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고학으로 미시간 대학 연극과를 겨우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뉴욕 시에 가서 생활을 위하여 라디오 드라마를 쓰게 되었으며, 여가 시간을 이용 희곡 창작을 계속하였다.
1947년 실업계의 비인간성과 양심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립을 다룬 《모두가 나의 아들(All My Sons, 1947)》로 뉴욕비평가상을 수상하였다. 49년 초연된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 1949)》으로 뉴욕비평가상·퓰리처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고 일약 세계적인 극작가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 작품은 거대한 문명구조 아래 좌절·패배해 가는 인간, 가정의 붕괴, 자기실현의 가능성, 인간의 운명 같은 문제를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묘사하여 주제의 보편성과 더불어 신선한 무대 연출로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은 미국 연극에 한 획을 긋는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17세기 식민지의 마녀재판에서 제재를 취하여 집단히스테리의 광포한 힘과 매카시즘 선풍에 휩싸인 미국의 정치 상황을 결부시킨 《도가니(The Crucible, 1953)》, 그리스 비극의 골격을 빌려 인간의 비뚤어진 정념을 역사적인 조망으로 묘사한 《다리에서의 조망(A View from the Bridge, 1955)》 등을 발표하여 퓰리처상을 받았다. 64년 《전락 후에(After the Fall)》 《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표했는데 전자는 두 번째 아내인 배우 M. 먼로를 모델로 한 자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후자는 나치스 지배하의 유대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2편 모두 인간에 내재하는 죄의식을 그린 것이다. 《대가(代價, 1968)》는 밀러 특유의 가정극 스타일로 가족의 대립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성공의 대가로서의 죄악감과 행복의 대가로서의 자기희생이 대비된다. 이 밖에 소설·연극론집이 있고, 특히 현대 보통사람의 비극에 대한 에세이 《비극과 보통사람(1949)》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를 흔히 <미국의 입센>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도덕적·윤리적 리얼리즘 계보에 속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나듯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라는 무대기법을 구사한 실험적 작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극적 리얼리티나 극적 인식에 대한 과감한 실험과 시도가 밀러 작품의 현대적 의의를 뚜렷이 보여준다. 그 외 《대주교의 천장(1977)》 《모르간산에서의 추락(1991)》 등 노익장의 작품이 있다.
2) 아서 밀러의 작품세계
밀러는 사회주의적 극작가라고 일컬어진다. 그의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밀러의 작품 가운데 일관성잇게 나타나는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밀러의 말에 의하면 “society is inside of man and man is inside of society”이 된다.
밀러가 개인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그의 극작품의 기본적 주제로 삼고 있다는 말은, 개인은 사회에 깊이 서로 관계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는 사회 속의 개인의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 자신과 가정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밀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는 그의 작품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 및 양심의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려 놓고 있다. 이는 밀러의 극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탕 위에서 한 인간이 추구한 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집요하게 그려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밀러는 또한 자주 도덕주의자(moralist)라고 일컬어진다.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자신 및 타인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라는 문제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밀러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에 입각,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다. 밀러극의 주인공들은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거기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률로 스스로 재판함과 아울러 자기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도 재판된다. 밀러에게는 무대 그 자체가 법정이고 극자체가 재판인 듯한 작품이 적지 않다. 항상 누군가가 재판되고 있다. 그 재판은 세속의 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은 마음속의 소리인 양심에 의한 재판이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분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맞물려 있는 작가의 생각이다. 밀러의 신념은 진정한 극작가는 사회극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극은 단순히 사회악이나 병폐의 고발이 아니다. 그가 완전 연극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사회극은 인간이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존재이며,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밀러는 기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극작가이다. 그의 극작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수법과 사실주의를 초
아서 밀러(Arthur Miller)는 1940년대 말 테네시 윌리엄즈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전후 미국의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들 중 한 사람이다. 아서 밀러는 1915년 10월 17일 미국 뉴욕 출생으로 아버지는 의류 제조업자이며, 어머니는 전직 교사인 유대인계 중류 가정의 3남매 중 둘째 아들이었다. 극작가로 입문 전 밀러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1929년의 경제 대공황으로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그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접시닦이, 사환, 트럭 운전사, 하역부, 창고 직원, 웨이터 등의 직업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은 하층민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결론적으로 밀러의 작품 세계에 많이 반영되게 된다.
재학 중에 쓴 몇 편의 희곡 작품으로 상을 받은 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고학으로 미시간 대학 연극과를 겨우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뉴욕 시에 가서 생활을 위하여 라디오 드라마를 쓰게 되었으며, 여가 시간을 이용 희곡 창작을 계속하였다.
1947년 실업계의 비인간성과 양심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립을 다룬 《모두가 나의 아들(All My Sons, 1947)》로 뉴욕비평가상을 수상하였다. 49년 초연된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 1949)》으로 뉴욕비평가상·퓰리처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고 일약 세계적인 극작가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 작품은 거대한 문명구조 아래 좌절·패배해 가는 인간, 가정의 붕괴, 자기실현의 가능성, 인간의 운명 같은 문제를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묘사하여 주제의 보편성과 더불어 신선한 무대 연출로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은 미국 연극에 한 획을 긋는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17세기 식민지의 마녀재판에서 제재를 취하여 집단히스테리의 광포한 힘과 매카시즘 선풍에 휩싸인 미국의 정치 상황을 결부시킨 《도가니(The Crucible, 1953)》, 그리스 비극의 골격을 빌려 인간의 비뚤어진 정념을 역사적인 조망으로 묘사한 《다리에서의 조망(A View from the Bridge, 1955)》 등을 발표하여 퓰리처상을 받았다. 64년 《전락 후에(After the Fall)》 《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표했는데 전자는 두 번째 아내인 배우 M. 먼로를 모델로 한 자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후자는 나치스 지배하의 유대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2편 모두 인간에 내재하는 죄의식을 그린 것이다. 《대가(代價, 1968)》는 밀러 특유의 가정극 스타일로 가족의 대립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성공의 대가로서의 죄악감과 행복의 대가로서의 자기희생이 대비된다. 이 밖에 소설·연극론집이 있고, 특히 현대 보통사람의 비극에 대한 에세이 《비극과 보통사람(1949)》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를 흔히 <미국의 입센>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도덕적·윤리적 리얼리즘 계보에 속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나듯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라는 무대기법을 구사한 실험적 작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극적 리얼리티나 극적 인식에 대한 과감한 실험과 시도가 밀러 작품의 현대적 의의를 뚜렷이 보여준다. 그 외 《대주교의 천장(1977)》 《모르간산에서의 추락(1991)》 등 노익장의 작품이 있다.
2) 아서 밀러의 작품세계
밀러는 사회주의적 극작가라고 일컬어진다. 그의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밀러의 작품 가운데 일관성잇게 나타나는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밀러의 말에 의하면 “society is inside of man and man is inside of society”이 된다.
밀러가 개인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그의 극작품의 기본적 주제로 삼고 있다는 말은, 개인은 사회에 깊이 서로 관계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는 사회 속의 개인의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 자신과 가정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밀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는 그의 작품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 및 양심의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려 놓고 있다. 이는 밀러의 극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탕 위에서 한 인간이 추구한 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집요하게 그려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밀러는 또한 자주 도덕주의자(moralist)라고 일컬어진다.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자신 및 타인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라는 문제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밀러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에 입각,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다. 밀러극의 주인공들은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거기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률로 스스로 재판함과 아울러 자기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도 재판된다. 밀러에게는 무대 그 자체가 법정이고 극자체가 재판인 듯한 작품이 적지 않다. 항상 누군가가 재판되고 있다. 그 재판은 세속의 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은 마음속의 소리인 양심에 의한 재판이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분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맞물려 있는 작가의 생각이다. 밀러의 신념은 진정한 극작가는 사회극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극은 단순히 사회악이나 병폐의 고발이 아니다. 그가 완전 연극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사회극은 인간이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존재이며,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밀러는 기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극작가이다. 그의 극작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수법과 사실주의를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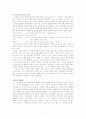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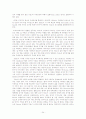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