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화와 성리학의 토착화
2. 서경덕의 세계관과 이기론
노자에 대한 비판과 기의 실재성
선천과 후천
이기론
3.이언적(1491-1533)의 태극․이기론과 경학사상
노불에 대한 비판과 ‘실리’의 정초
‘下學而上達’적 방법론
정치의식과 경전의 재해석
4.이황의 사단칠정론과 이기론
사단칠정론
이동설(理動說)과 이도설(理到說)
5. 율곡 이이의 사단칠정론과 ‘理氣之妙’적 사유구조
사단칠정론
이기지묘와 이통기국설
시대인식과 개혁사상
2. 서경덕의 세계관과 이기론
노자에 대한 비판과 기의 실재성
선천과 후천
이기론
3.이언적(1491-1533)의 태극․이기론과 경학사상
노불에 대한 비판과 ‘실리’의 정초
‘下學而上達’적 방법론
정치의식과 경전의 재해석
4.이황의 사단칠정론과 이기론
사단칠정론
이동설(理動說)과 이도설(理到說)
5. 율곡 이이의 사단칠정론과 ‘理氣之妙’적 사유구조
사단칠정론
이기지묘와 이통기국설
시대인식과 개혁사상
본문내용
조선성리학의 성립과 사단칠정론
1. 사화와 성리학의 토착화
16세기 초에 해당하는 중종초기에 기묘사림(己卯士林)으로 불리우는 조광조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사회에 정치적으로 구현하고자 진력하였으나 중종14년(1519년) 기묘사화로 좌절되었다. 중종후기에는 권습(權習) 조식(曺植) 서경덕(徐敬德)등이 등장하며, 명종 대에는 이언적(李彦迪) 이황 기대승(奇大升)등 100여명에 이르는 학자들이 학문 활동을 통하여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 시기에 주자대전이 수입되어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기대승의 주자문록은 주자학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정밀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황보다 한 세대 후인 선조대에 율곡 이이가 출현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상윤이 조선성리학의 육대가(六大家)로 거론한 서경덕, 이황, 이이, 기정진, 이진상, 임성주 가운데 그 절반이 이 시기에 몰려 있는 셈이 된다. 16세기는 이른바 사대사화로 불리우는 무오사화(연산군 4년, 1498년)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년) 기묘사화(중종14년, 1519년) 을사사화(명종 즉위년, 1545년) 가운데 3회의 사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사림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 시기에 사단칠정론으로 대표되는 정밀한 이기심성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퇴계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정암 조광조는 천품이 진실하고 아름다웠지만 학문적 역량이 미흡하여 그의 행위가 지나침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다. 만약 학문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덕이 성취된 뒤에 나아가 세상의 일을 담당하였더라면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글에서 퇴계는, 정암을 위시한 사림들이 순결한 이상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를 ‘학문적 역량의 미흡’에서 찾고 있다. 즉 ‘지치’라고 하는 성리학의 이상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불층분했다는 자기반성이다. 정치현장에서부터 물러난 사림들이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이기심성론을 발전시켜, 마침내 조선성리학의 기초이론을 정립하게 된 이유는, 순수한 학문적 동기이외에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성리설 가운데에서도 사단칠정론, 인심도심설 등 심성론이 중심 주제로서 논의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모순의 근본요인을 인간의 심성에서 찾는 것이 유교, 특히 성리학의 기본관점이다. 즉 외적인 문제는 내적인 양심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퇴계와 율곡은 사화기와 경장기라는 시대상황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음에서부터 모색하였으며, 그 이론적 기초로서 이기론을 정립한 것이다. 그들이 정립한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토대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라는 학파가 형성되어 조선 후기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정치 경제등 사회 전반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자성리학이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되어 한국 사상사의 커다란 줄기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2. 서경덕의 세계관과 이기론
노자에 대한 비판과 기의 실재성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송대 성리학은 도가와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조에서 성리학이 토착화 해 나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이어서 노자에 대한 이론적 극복이 시도 된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정도전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학자가 서경덕이다. 서경덕(徐敬德)은 성종 기유년에서 부터 명종 병오년(丙午年)까지 생존했던 성리학자로서 호는 화담(花潭)이다. 화담의 노자비판은 ‘虛’와 ‘無’에 집중된다. 노자는 “허가 능히 기를 낳는다.”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라고 하여 세계의 근원적 존재를 ‘허’ 또는 ‘무’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세계는 ‘무’에서 창조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노자의 주장에 대하여 화담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허가 기를 낳는다고 한다면 기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가 없으니 허는 죽은 것이 되며, 이미 기가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 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기는) 시작도 없고 생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이미 시작이 없는데 어찌 끝이 있으며 이미 생이 없는데 어찌 멸이 있겠는가.”
화담은, 기는 생멸과 시종이 없다는 성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노자의 생성론적 우주관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허는 다순히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기로서〔허즉기〕, 비록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는 없으나 지극히 실한 존재이기
1. 사화와 성리학의 토착화
16세기 초에 해당하는 중종초기에 기묘사림(己卯士林)으로 불리우는 조광조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사회에 정치적으로 구현하고자 진력하였으나 중종14년(1519년) 기묘사화로 좌절되었다. 중종후기에는 권습(權習) 조식(曺植) 서경덕(徐敬德)등이 등장하며, 명종 대에는 이언적(李彦迪) 이황 기대승(奇大升)등 100여명에 이르는 학자들이 학문 활동을 통하여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 시기에 주자대전이 수입되어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기대승의 주자문록은 주자학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정밀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황보다 한 세대 후인 선조대에 율곡 이이가 출현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상윤이 조선성리학의 육대가(六大家)로 거론한 서경덕, 이황, 이이, 기정진, 이진상, 임성주 가운데 그 절반이 이 시기에 몰려 있는 셈이 된다. 16세기는 이른바 사대사화로 불리우는 무오사화(연산군 4년, 1498년)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년) 기묘사화(중종14년, 1519년) 을사사화(명종 즉위년, 1545년) 가운데 3회의 사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사림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 시기에 사단칠정론으로 대표되는 정밀한 이기심성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퇴계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정암 조광조는 천품이 진실하고 아름다웠지만 학문적 역량이 미흡하여 그의 행위가 지나침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다. 만약 학문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덕이 성취된 뒤에 나아가 세상의 일을 담당하였더라면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글에서 퇴계는, 정암을 위시한 사림들이 순결한 이상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를 ‘학문적 역량의 미흡’에서 찾고 있다. 즉 ‘지치’라고 하는 성리학의 이상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불층분했다는 자기반성이다. 정치현장에서부터 물러난 사림들이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이기심성론을 발전시켜, 마침내 조선성리학의 기초이론을 정립하게 된 이유는, 순수한 학문적 동기이외에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성리설 가운데에서도 사단칠정론, 인심도심설 등 심성론이 중심 주제로서 논의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모순의 근본요인을 인간의 심성에서 찾는 것이 유교, 특히 성리학의 기본관점이다. 즉 외적인 문제는 내적인 양심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퇴계와 율곡은 사화기와 경장기라는 시대상황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음에서부터 모색하였으며, 그 이론적 기초로서 이기론을 정립한 것이다. 그들이 정립한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토대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라는 학파가 형성되어 조선 후기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정치 경제등 사회 전반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자성리학이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되어 한국 사상사의 커다란 줄기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2. 서경덕의 세계관과 이기론
노자에 대한 비판과 기의 실재성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송대 성리학은 도가와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조에서 성리학이 토착화 해 나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이어서 노자에 대한 이론적 극복이 시도 된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정도전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학자가 서경덕이다. 서경덕(徐敬德)은 성종 기유년에서 부터 명종 병오년(丙午年)까지 생존했던 성리학자로서 호는 화담(花潭)이다. 화담의 노자비판은 ‘虛’와 ‘無’에 집중된다. 노자는 “허가 능히 기를 낳는다.”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라고 하여 세계의 근원적 존재를 ‘허’ 또는 ‘무’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세계는 ‘무’에서 창조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노자의 주장에 대하여 화담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허가 기를 낳는다고 한다면 기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가 없으니 허는 죽은 것이 되며, 이미 기가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 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기는) 시작도 없고 생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이미 시작이 없는데 어찌 끝이 있으며 이미 생이 없는데 어찌 멸이 있겠는가.”
화담은, 기는 생멸과 시종이 없다는 성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노자의 생성론적 우주관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허는 다순히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기로서〔허즉기〕, 비록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는 없으나 지극히 실한 존재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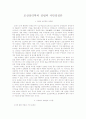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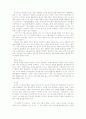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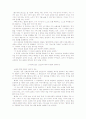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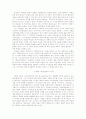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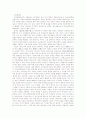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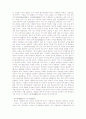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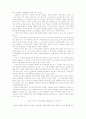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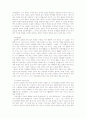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