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역사주의 - 전체주의
2) 행태주의 - 심리주의
3) 구조주의 - 포스트모더니즘
2) 행태주의 - 심리주의
3) 구조주의 - 포스트모더니즘
본문내용
이다. 사람이 자기자신을 집착하면 거짓을 참으로, 허상을 실제로, 폭력과 추함을 미와 정의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광기의 상징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고 자신을 비추어보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 나타나는 꿈을 은밀하게 선사하는 거울과도 같다.
이쯤에서 폭력의 의미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더욱 세심하게 고민한다면 그 작업은 무한대로 지속될 것이다. 지상의 어느 행동이든 결국 ‘폭력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그 배후와 주변에 권력이나 지식의 조종이 뒤따를 것이란 사실은 쉽게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체’와 ‘차이’, ‘전복’과 ‘패러디’ 혹은 ‘거부’의 담론들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던 사고체계 속의 폭력의미 지평은 물론 푸꼬나 그 주변 사상들로 집약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또 다시 다양하게 핵분열하는 담론구조와 그 변용을 통해 입체화한다. 단선적 사고의 결과로만 인식되던 폭력이 새로운 의식 대상으로 변용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그것이 곧 또하나의 역사였고 극적인 실타래였음을 말해 준다.
이제까지 폭력이론사를 지배한 세 가지 조류를 압축, 체계적으로 회고해보면 폭력의 사상적 발전도 단순한 경로로 이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분화상 역시 단세포 구조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끝없이 지속될 논쟁이나 기왕에 축적된 논의의 맥락구조를 모조리 훑는데 있지 않다. 그 같은 작업보다, 아니 사후적 정리보다 그들 담론 전체가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 고민하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쯤에서 폭력의 의미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더욱 세심하게 고민한다면 그 작업은 무한대로 지속될 것이다. 지상의 어느 행동이든 결국 ‘폭력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그 배후와 주변에 권력이나 지식의 조종이 뒤따를 것이란 사실은 쉽게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체’와 ‘차이’, ‘전복’과 ‘패러디’ 혹은 ‘거부’의 담론들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던 사고체계 속의 폭력의미 지평은 물론 푸꼬나 그 주변 사상들로 집약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또 다시 다양하게 핵분열하는 담론구조와 그 변용을 통해 입체화한다. 단선적 사고의 결과로만 인식되던 폭력이 새로운 의식 대상으로 변용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그것이 곧 또하나의 역사였고 극적인 실타래였음을 말해 준다.
이제까지 폭력이론사를 지배한 세 가지 조류를 압축, 체계적으로 회고해보면 폭력의 사상적 발전도 단순한 경로로 이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분화상 역시 단세포 구조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끝없이 지속될 논쟁이나 기왕에 축적된 논의의 맥락구조를 모조리 훑는데 있지 않다. 그 같은 작업보다, 아니 사후적 정리보다 그들 담론 전체가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 고민하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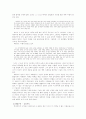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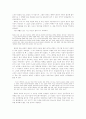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