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원효의 생애
- 본론
원효의 회통사상
- 결론
원효와 그에 대한 생각
원효의 생애
- 본론
원효의 회통사상
- 결론
원효와 그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자량의 원리와 회통시키고 있다. 즉 십선업을 바큇살에, 정공덕자량을 속 바퀴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바큇살은 유, 속 바퀴는 무에 해당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도 역시 제명을 해석하는 대목에서 因(인)에는 공용이 있으나 果(과)에는 공용이 필요 없으므로 덜고 덜어 무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因有功用 果無功用 損之又損之 以至無爲故)(인유공용 과무공용 손지우손지 이지무위고) 『金剛三昧經論』(韓佛全(한불전), p. 606).
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도덕경』48장의학문을 하면 날로 더해 가는 것이요 도를 닦으면 날로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함이 없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위학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위 무위이무불위)를 인용한 것이다. 원효는 금강삼매의 경지를 인위적인 공용을 넘어선 무위의 경지로 해석함으로써 『도덕경』의 핵심사상인 무위와 회통시키고 있다. 원효 저술의 정수라고 평가되는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도덕경』의 내용이 발견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로 미루어 보아 원효는 불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통되던 도교 문헌들도 섭렵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한국 사상사의 특징인 삼교합일적 관점이 원효시대에도 이미 있었다고 추론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원효사상의 위대함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신론소』에서 중관유식의 사상적 대립을 회통한 점, 둘째 『금강삼매경론』에서 선과 교학간의 긴장을 회통한 점, 셋째 이러한 회통을 시도하면서 一心으로 귀결시킨 점, 넷째 『도덕경』의 내용도 자유스럽게 사용한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모든 불교사상을 집결 회통시킬 때마다 즐겨 사용한 一心이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원효의 총체적인 사상을 한 마디로일심철학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일심은 그 당시의 유명한 중국 고승들한테서 빌려온 말이 아니고 원효 그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즉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없어지면 만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오도송이 그것이다. 원효는 이 때의 체험을 통하여 외국유학을 취소할 정도로 확고한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이 자신감이 결국 세계적인 수준의 중국 승려들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상적 문제들을 종횡무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원효를 이야기 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
원효와 그에 대한 생각
원효는 큰스님으로 실천 신앙인 이었으며 대저술가로서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이름 그대로 그가 살던 신라 불교의 새벽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한길로 벗어난 일체 무애인으로 대 자유인으로서 무애행으로 서민과 대중에게다가 섰다. 원효는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제도하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보살도 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또 100여부 240여권의 초인적인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엄청난 저술량은 그의 사상과도 비례하여 심오한 불교의 이치를 통찰한 탁월한 능력자로서 대저술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또 원효의 사상은 역사상 인도와 중국 그리고 신라에 많은 저술을 한 스님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불교의 여러분야를 망라하여 대저술을 한 사람으로는 원효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만 원효의 많은 저서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현존하고 많은 것들이 유실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원효는 소, 논, 종요, 별기 및 요략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십문에서의 이설과 쟁론을 화쟁하는 화쟁사상 또는 통불교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또 대승기신론소와 별기로서 진속원융무애 철학의 성립이론을 밝혔는가 하면 금강삼매경론으로서 일심의 본원을 목적으로 한 실천원리를 제시하였다.
원효가 연구한 분야가 그 누구의 추종도 불허할 정도로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착한 깊이가 실로 심오한 경지에 이르고 있고 나아가 그의 논리는 모는 쟁론을 회통시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그의 깨달음이나 불교에 관한 이해의 경지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효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예우와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은 그를 존경하여 원효를 보살 또는 원효성자라고 불렀다. 한편 원효의 금강삼매경소를 중국에서는 금강삼매경론으로 예우하였으며 해동사문인 원효의대승기신론소는 해동소라하여 중국의 법장 규봉을 비롯한 고승들의 교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응연은 『승만경소상현기』에서 원효의 『승만경소』를 무려 80여회 나 인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없는 일부 자료가 보존되고 그들도 원효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서 원효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얼마나 존경받는지 알 수 있고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에서 분파 불교로 발전한 다음 신라의 원효에 의하여 통불교로 마무리지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원효는 많은 저술과 사상 그리고 민중과 함께 한 삶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의 삶은 위대했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다. 화쟁과 회통 일심 등 많은 그의 사상은 아직도 연구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 또 그의 무애행도 많은 존경과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효는 그의 삶 자체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연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원효는 그 위대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참고 문헌
1~25까지의 각주에 해당되는 자료들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 (제1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2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3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4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5집)
원효 대사의 일생
원효
원효 대사
『신라사상사연구』이기백, 1986 일조각
[우리문화유산 기행-9] 원효사상과 대승기신론소
원효학 연구원 원효의 중심사상
신라 불교의 이해 인터넷
한국의 불교 인터넷
원효의 생애와 사상 -국학 자료원 황영선 편저
불교의 역사와 기본 사상 -대원정사 쓰까모또 게이쇼, 우에야마
『금강삼매경론』에서도 역시 제명을 해석하는 대목에서 因(인)에는 공용이 있으나 果(과)에는 공용이 필요 없으므로 덜고 덜어 무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因有功用 果無功用 損之又損之 以至無爲故)(인유공용 과무공용 손지우손지 이지무위고) 『金剛三昧經論』(韓佛全(한불전), p. 606).
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도덕경』48장의학문을 하면 날로 더해 가는 것이요 도를 닦으면 날로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함이 없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위학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위 무위이무불위)를 인용한 것이다. 원효는 금강삼매의 경지를 인위적인 공용을 넘어선 무위의 경지로 해석함으로써 『도덕경』의 핵심사상인 무위와 회통시키고 있다. 원효 저술의 정수라고 평가되는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도덕경』의 내용이 발견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로 미루어 보아 원효는 불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통되던 도교 문헌들도 섭렵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한국 사상사의 특징인 삼교합일적 관점이 원효시대에도 이미 있었다고 추론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원효사상의 위대함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신론소』에서 중관유식의 사상적 대립을 회통한 점, 둘째 『금강삼매경론』에서 선과 교학간의 긴장을 회통한 점, 셋째 이러한 회통을 시도하면서 一心으로 귀결시킨 점, 넷째 『도덕경』의 내용도 자유스럽게 사용한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모든 불교사상을 집결 회통시킬 때마다 즐겨 사용한 一心이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원효의 총체적인 사상을 한 마디로일심철학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일심은 그 당시의 유명한 중국 고승들한테서 빌려온 말이 아니고 원효 그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즉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없어지면 만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오도송이 그것이다. 원효는 이 때의 체험을 통하여 외국유학을 취소할 정도로 확고한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이 자신감이 결국 세계적인 수준의 중국 승려들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상적 문제들을 종횡무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원효를 이야기 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
원효와 그에 대한 생각
원효는 큰스님으로 실천 신앙인 이었으며 대저술가로서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이름 그대로 그가 살던 신라 불교의 새벽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한길로 벗어난 일체 무애인으로 대 자유인으로서 무애행으로 서민과 대중에게다가 섰다. 원효는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제도하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보살도 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또 100여부 240여권의 초인적인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엄청난 저술량은 그의 사상과도 비례하여 심오한 불교의 이치를 통찰한 탁월한 능력자로서 대저술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또 원효의 사상은 역사상 인도와 중국 그리고 신라에 많은 저술을 한 스님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불교의 여러분야를 망라하여 대저술을 한 사람으로는 원효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만 원효의 많은 저서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현존하고 많은 것들이 유실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원효는 소, 논, 종요, 별기 및 요략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십문에서의 이설과 쟁론을 화쟁하는 화쟁사상 또는 통불교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또 대승기신론소와 별기로서 진속원융무애 철학의 성립이론을 밝혔는가 하면 금강삼매경론으로서 일심의 본원을 목적으로 한 실천원리를 제시하였다.
원효가 연구한 분야가 그 누구의 추종도 불허할 정도로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착한 깊이가 실로 심오한 경지에 이르고 있고 나아가 그의 논리는 모는 쟁론을 회통시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그의 깨달음이나 불교에 관한 이해의 경지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효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예우와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은 그를 존경하여 원효를 보살 또는 원효성자라고 불렀다. 한편 원효의 금강삼매경소를 중국에서는 금강삼매경론으로 예우하였으며 해동사문인 원효의대승기신론소는 해동소라하여 중국의 법장 규봉을 비롯한 고승들의 교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응연은 『승만경소상현기』에서 원효의 『승만경소』를 무려 80여회 나 인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없는 일부 자료가 보존되고 그들도 원효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서 원효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얼마나 존경받는지 알 수 있고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에서 분파 불교로 발전한 다음 신라의 원효에 의하여 통불교로 마무리지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원효는 많은 저술과 사상 그리고 민중과 함께 한 삶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의 삶은 위대했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다. 화쟁과 회통 일심 등 많은 그의 사상은 아직도 연구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 또 그의 무애행도 많은 존경과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효는 그의 삶 자체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연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원효는 그 위대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참고 문헌
1~25까지의 각주에 해당되는 자료들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 (제1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2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3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4집)
인터넷으로 읽는 원효학연구 논문집(제5집)
원효 대사의 일생
원효
원효 대사
『신라사상사연구』이기백, 1986 일조각
[우리문화유산 기행-9] 원효사상과 대승기신론소
원효학 연구원 원효의 중심사상
신라 불교의 이해 인터넷
한국의 불교 인터넷
원효의 생애와 사상 -국학 자료원 황영선 편저
불교의 역사와 기본 사상 -대원정사 쓰까모또 게이쇼, 우에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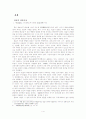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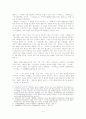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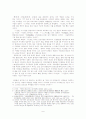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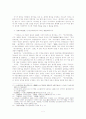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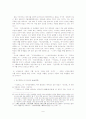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