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장자의 사상적 배경
3. 장자는 누구인가
4. “장자”의 사상
5. 다른 사상가와의 비교
6. 나오면서
2. 장자의 사상적 배경
3. 장자는 누구인가
4. “장자”의 사상
5. 다른 사상가와의 비교
6. 나오면서
본문내용
오는 것이라는 뜻)
\"이것은 저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에서 말미암으니 저것과 이것은 같이 생긴다는 말이다\" . 같은 책, \"彼出於是,是亦因彼.彼是方生之說也\"
(모순의 저쪽은 이쪽에서 나오고 모순의 이쪽은 또 모순의 저쪽에 의거하므로 모순의 쌍방이 서로 의지하 고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모순된 쌍방은 같이 생겨나 공존한다는 뜻)
※ < 제물론에 나오는 우화와 성어 >
나비의 꿈
胡蝶之夢(호접지몽)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胡(오랑캐 호:蝴(나비 호)의 가차자) 蝶(나비 접) 之(-의 지) 夢(꿈 몽)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
莊周之夢(장주지몽)
옛날 장주(莊周)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이 자신인 장주가 아닌가. 도대체 장주인 자기가 꿈속에 나비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것(胡蝶之夢爲周與)일까?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물화(物化)라고 한다. “물화(物化)”, 즉 만물의 변화란 피상적인 분별이나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다. 장자는 상대적인 차이가 없는 세계, 차별이 없는 세계를 그렸던 것이다.
朝三暮四(조삼모사)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눈 앞의 차이만을 알뿐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것. 또는 간사한 잔꾀로 남을 속이고 농락함을 비유함.
송(宋)나라에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숭이를 너무 사랑하여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원숭이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들도 저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원숭이를 사육하다 보니 먹이 대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는 원숭이의 먹이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먼저 그들을 속여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엔 세 개, 저녁엔 네 개 준다면(若與朝三而暮四) 족하겠느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준다면 족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장자는 이 비유를 통하여 명의와 실질에 변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노여움이 일게 됨을 지적하였다. 지나친 인위적 구별은 자연의 모습인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고사는 ≪장자≫의<제물론>외에 ≪열자(列子)≫의 <황제(黃帝)>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 인생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양생주(養生主)
2) 인간세(人間世)
3) 대종사(大宗師)
소요유‘,제물론의 두 편에서 상대적 세계를 초월해야 할 논리를 설명한 장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려 한다. 그것이 제3편양생주(養生主), 제4편인간세(人間世)의 두 편이다.
양생주에 있어서는 주로 개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인간세에 있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했다. 여느 때처럼 장자는 교묘한 우화를 인용했다. 양생주의 처음에 인용되는 포정(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目無全牛(목무전우) -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
기술이나 예술이 최고의 경지에 이름을 비유한 말.
丁解牛(포정해우)
“아! 정말 훌륭하도다. 소 잡는 기술이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느냐?”
포정은 칼을 놓고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道)이니 기술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은 모두 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소의 온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未嘗見全牛也). 요즈음 저는 정신으로써 소를 처리하고 있지,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눈의 작용이 멋으니 정신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천리(天理)를 따라 큰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솜씨 좋은 소잡이가 해마다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잡이는 매달 칼을 바꾸는데, 이는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칼은 19년이나 되어 잡은 소가 수천에 달합니다만, 칼날은 막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그 뼈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遊刃有餘(유인유여) -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
遊(놀 유) 刃(칼날 인) 有(있을 유) 餘(남을 여)
일 처리가 매우 능수능란(能手能爛)함을 비유한 말.
포정은 말을 계속한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놀리는데 반드시 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其於游刃, 必有餘地矣). 이렇기에 19년이나 되었지만 칼날이 막 숫돌에 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과 뼈가 엉킨 곳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여기어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눈을 거기에 모으고 천천히 움직여서 칼을 매우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살이 뼈에서 싹하고 떨어져 나오면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흐뭇해지면 칼을 씻어 챙겨 넣습니다.”
문혜군은 말했다.
“훌륭하도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느니라.”
이 우화는 處生訓으로서 훌륭하다. 대체로 기술은 모두 丁 의 이야기와 같은 경과를 더듬어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험을 쌓는 사람은 무리를 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힘을 낭비하는 일 없이 그리고 일의 마무리도 무리함이 없이 훌륭하다. 그것이 修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道가 있으며 거기에 인생 본연의 자세의 모형이 있다. 힘으로 무릅쓰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대상의 접은 줄에 따라 자연히 대상이 해체되도록 궁리하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이(理:접은 줄)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달인(達人)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다.
장자는 인간의 禍福도, 生死도, 떠나는 자는 뒤
\"이것은 저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에서 말미암으니 저것과 이것은 같이 생긴다는 말이다\" . 같은 책, \"彼出於是,是亦因彼.彼是方生之說也\"
(모순의 저쪽은 이쪽에서 나오고 모순의 이쪽은 또 모순의 저쪽에 의거하므로 모순의 쌍방이 서로 의지하 고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모순된 쌍방은 같이 생겨나 공존한다는 뜻)
※ < 제물론에 나오는 우화와 성어 >
나비의 꿈
胡蝶之夢(호접지몽)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胡(오랑캐 호:蝴(나비 호)의 가차자) 蝶(나비 접) 之(-의 지) 夢(꿈 몽)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
莊周之夢(장주지몽)
옛날 장주(莊周)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이 자신인 장주가 아닌가. 도대체 장주인 자기가 꿈속에 나비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것(胡蝶之夢爲周與)일까?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물화(物化)라고 한다. “물화(物化)”, 즉 만물의 변화란 피상적인 분별이나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다. 장자는 상대적인 차이가 없는 세계, 차별이 없는 세계를 그렸던 것이다.
朝三暮四(조삼모사)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눈 앞의 차이만을 알뿐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것. 또는 간사한 잔꾀로 남을 속이고 농락함을 비유함.
송(宋)나라에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숭이를 너무 사랑하여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원숭이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들도 저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원숭이를 사육하다 보니 먹이 대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는 원숭이의 먹이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먼저 그들을 속여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엔 세 개, 저녁엔 네 개 준다면(若與朝三而暮四) 족하겠느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준다면 족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장자는 이 비유를 통하여 명의와 실질에 변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노여움이 일게 됨을 지적하였다. 지나친 인위적 구별은 자연의 모습인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고사는 ≪장자≫의<제물론>외에 ≪열자(列子)≫의 <황제(黃帝)>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 인생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양생주(養生主)
2) 인간세(人間世)
3) 대종사(大宗師)
소요유‘,제물론의 두 편에서 상대적 세계를 초월해야 할 논리를 설명한 장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려 한다. 그것이 제3편양생주(養生主), 제4편인간세(人間世)의 두 편이다.
양생주에 있어서는 주로 개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인간세에 있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했다. 여느 때처럼 장자는 교묘한 우화를 인용했다. 양생주의 처음에 인용되는 포정(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目無全牛(목무전우) -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
기술이나 예술이 최고의 경지에 이름을 비유한 말.
丁解牛(포정해우)
“아! 정말 훌륭하도다. 소 잡는 기술이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느냐?”
포정은 칼을 놓고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道)이니 기술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은 모두 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소의 온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未嘗見全牛也). 요즈음 저는 정신으로써 소를 처리하고 있지,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눈의 작용이 멋으니 정신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천리(天理)를 따라 큰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솜씨 좋은 소잡이가 해마다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잡이는 매달 칼을 바꾸는데, 이는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칼은 19년이나 되어 잡은 소가 수천에 달합니다만, 칼날은 막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그 뼈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遊刃有餘(유인유여) -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
遊(놀 유) 刃(칼날 인) 有(있을 유) 餘(남을 여)
일 처리가 매우 능수능란(能手能爛)함을 비유한 말.
포정은 말을 계속한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놀리는데 반드시 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其於游刃, 必有餘地矣). 이렇기에 19년이나 되었지만 칼날이 막 숫돌에 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과 뼈가 엉킨 곳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여기어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눈을 거기에 모으고 천천히 움직여서 칼을 매우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살이 뼈에서 싹하고 떨어져 나오면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흐뭇해지면 칼을 씻어 챙겨 넣습니다.”
문혜군은 말했다.
“훌륭하도다.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느니라.”
이 우화는 處生訓으로서 훌륭하다. 대체로 기술은 모두 丁 의 이야기와 같은 경과를 더듬어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험을 쌓는 사람은 무리를 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힘을 낭비하는 일 없이 그리고 일의 마무리도 무리함이 없이 훌륭하다. 그것이 修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道가 있으며 거기에 인생 본연의 자세의 모형이 있다. 힘으로 무릅쓰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대상의 접은 줄에 따라 자연히 대상이 해체되도록 궁리하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이(理:접은 줄)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달인(達人)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다.
장자는 인간의 禍福도, 生死도, 떠나는 자는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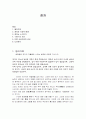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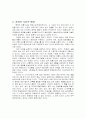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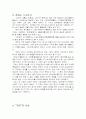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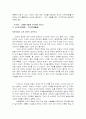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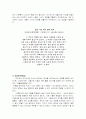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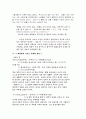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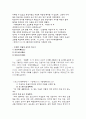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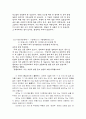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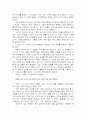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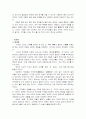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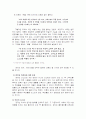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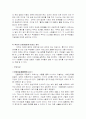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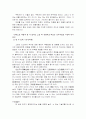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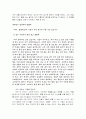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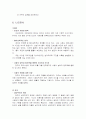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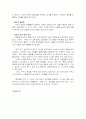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