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화의 전파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에 퍼지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는 곡선적인 문양이 대부분이다(쿠쿠테니 문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양사오[仰韶] 문화기에 출현하여 항아리나 사발 등에 곡선적인 기하학무늬를 주로 한 채색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인물이나 개물고기새 등의 동물 문양도 있고, 중앙아시아의 나마즈가문화 등을 받아들여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새로운 단계의 토기 수법의 전파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채문토기는 채도(彩陶)라 일컬으며, 그 분포의 동쪽 끝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미치고 있다(피쯔워 문화[子窩文化]).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형성기 단계부터 채색문양을 가진 토기가 출현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는데, 구대륙의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문양의 기원에 주술적(呪術的)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기존의 가설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 문양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문은 토기의 편년(編年)을 하는 데에 기초적인 요소이며, 편년에 따라 문화의 발달전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한국에서는 BC 700~BC 300년 무렵의 것으로서 평북 용천군 신암리(新岩里)에서 평저(平底)토기에 적황갈흑색으로 기하학무늬를 그린 채문토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토기는 용천군 쌍학리(雙鶴里), 함북 웅기 송평동(松坪洞)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또 랴오둥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 형태가 중국 채문토기와 흡사한 것으로 본다. 서남만주에서 일어난 채색토기 계통 토기의 주민이 압록강 유역까지 뻗어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북 웅기 송평동의 채문토기와 함께 이 시기에 서남만주에 퍼졌던 주연채색토기문화(周緣彩色土器文化)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때에 주민이 동쪽으로 팽창해 갔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신암리에서는 청동제포(靑銅製泡)와 손칼[刀子]이 각 1개씩 나와 이 채문토기의 주민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서남만주의 주민이란 BC 2000년경에 이미 중국의 농경을 한국에 전한 바 있고, BC 제1철기 초기에 발달된 농경기술, 청동기술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의 한국에로의 파상적 집단이주를 한 예맥(濊貊) 퉁구스이다. 서울 근교에서 출토한 화분형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표면에 주(朱)담흑색(淡黑色)의 문양 비슷한 것을 그린 것 하나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함북 회령군 오동(五洞), 무산군 호곡(虎谷)에서는 기면을 먼저 반들거리게 마연(磨硏)한 다음 주칠(朱漆)을 한 것이 있으며, 또 나진(羅津) 초도(草島)에서도 융기문(隆起文)과 침각기하문(針刻幾何文)을 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적색토기라 부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可樂洞), 여주 흔암리(欣岩里) 등에서 나온 화분형의 겹아가리[二重口緣], 하단에 점 또는 짧은 사선을 두른 붉은토기를 붉은간토기[紅陶]라 하는데, 이러한 붉은간토기는 아가리 세부에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붉은토기가 전파된 것이다.
2.하모도
하모도(河姆渡)란, 작은 나룻터란 뜻으로 여강(余江)어귀에 있는 그 당시의 마을이름(지명)으로 1973년 여름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었으며, 면적이 40,000㎡이나 발굴된 면적은 28,000㎡에 이름.
중국 고대 신석기 시대의 생활기구, 생산기구, 원시예술품 등 6,700여점의 유물이 대량 발굴된 곳으로 옛날 벼농사가 주종을 이루었고, 7,000여년전 당시의 나무로 집지은 흔적을 발견했다.
나무집은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벌레, 뱀으로부터 보호)을 두고 나무못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건축하였다.
그 당시의 태양과 조류, 상아, 배를 움직이는 노, 페인트, 물감 등 발견으로 중국문화연구에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현지에 1993. 9월 河姆渡박물관을 건립하였는데 중국 총서기 강택민의 친필 현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박물관내에는 그 당시 생활상을 담은 390여종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40여만명이 관람했다.
\'99. 6월부터 제2의 유적박물관 건립을 착수 했으며, 발굴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보존하고
시연하였음. 특히, 전시유물중 썩지 않은 벼알을 볼 수 있다.
본 유적지 발굴전에는 인도에서 벼농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하모도 유적지의
발굴로 7천여년전부터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벼농사가 성행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
3.홍산(紅山文化
중국 북방지역의 신석기 문화. 1935년 내몽고자치구 赤峰市 紅山後 유적지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홍산문화라고 한다. 처음에는 \"적봉 제1기 문화\"라고 명명했으나, 1954년 \"홍산문화\"라는 정식명칭이 정해졌다. 이 문화는 채도\"之\"자형 문양細石器, 그리고 땅을 파는 도구(掘土工具) 등를 기본 특징으로 한다.
집터와 가마터
발굴된 수량은 많지 않지만 집터는 사각형의 반지하 혈거식이며 소형과 대형의 두 종류이다. 소형의 길이와 폭은 4미터 안팎으로, 남아 있는 방벽은 아주 낮다. 실내 지면은 다져져있으며 중앙에는 표주박형의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서수천 유적지에서 발견된 대형 집터는 동서로 9미터, 남북으로 11.7미터인데, 남쪽에는 경사진 출입구가 있고 실내 중앙에 표주박형의 커다란 아궁이가 설치되었다. 특히 북쪽에 또다른 아궁이가 있어서 남북쪽 아궁이 사이에 방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릉산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기 가마터는 窯室과 火道火 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單室窯외에도 雙火 의 連室窯이 있다. 후자는 화당이 좌우로 병렬되어 경사진 화도와 장방형의 요실로 통하게 되어 있고 요실 내부에는 몇 개의 요주가 있다. 이러한 도기 가마의 구조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것이다.
문화유물
문화유물로는 석기와 도기 그리고 정교한 옥기가 있다. 석기는 마제석기를 주로 하는데 그중의 굴토용 도구인 犁(쟁기 려) (보습 사)에는 담배잎 모양의 煙葉形과 짚신 모양의 草履形 두 종류가 있는데 형태가 비교적 크다.
桂葉形의 雙孔石刀는 표면 전체에서 광택이 있고 칼날과 칼등부분이 대칭의 활형이며 칼등부분에 두 개의 구멍이
한국에서는 BC 700~BC 300년 무렵의 것으로서 평북 용천군 신암리(新岩里)에서 평저(平底)토기에 적황갈흑색으로 기하학무늬를 그린 채문토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토기는 용천군 쌍학리(雙鶴里), 함북 웅기 송평동(松坪洞)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또 랴오둥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 형태가 중국 채문토기와 흡사한 것으로 본다. 서남만주에서 일어난 채색토기 계통 토기의 주민이 압록강 유역까지 뻗어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북 웅기 송평동의 채문토기와 함께 이 시기에 서남만주에 퍼졌던 주연채색토기문화(周緣彩色土器文化)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때에 주민이 동쪽으로 팽창해 갔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신암리에서는 청동제포(靑銅製泡)와 손칼[刀子]이 각 1개씩 나와 이 채문토기의 주민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서남만주의 주민이란 BC 2000년경에 이미 중국의 농경을 한국에 전한 바 있고, BC 제1철기 초기에 발달된 농경기술, 청동기술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의 한국에로의 파상적 집단이주를 한 예맥(濊貊) 퉁구스이다. 서울 근교에서 출토한 화분형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표면에 주(朱)담흑색(淡黑色)의 문양 비슷한 것을 그린 것 하나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함북 회령군 오동(五洞), 무산군 호곡(虎谷)에서는 기면을 먼저 반들거리게 마연(磨硏)한 다음 주칠(朱漆)을 한 것이 있으며, 또 나진(羅津) 초도(草島)에서도 융기문(隆起文)과 침각기하문(針刻幾何文)을 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적색토기라 부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可樂洞), 여주 흔암리(欣岩里) 등에서 나온 화분형의 겹아가리[二重口緣], 하단에 점 또는 짧은 사선을 두른 붉은토기를 붉은간토기[紅陶]라 하는데, 이러한 붉은간토기는 아가리 세부에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붉은토기가 전파된 것이다.
2.하모도
하모도(河姆渡)란, 작은 나룻터란 뜻으로 여강(余江)어귀에 있는 그 당시의 마을이름(지명)으로 1973년 여름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었으며, 면적이 40,000㎡이나 발굴된 면적은 28,000㎡에 이름.
중국 고대 신석기 시대의 생활기구, 생산기구, 원시예술품 등 6,700여점의 유물이 대량 발굴된 곳으로 옛날 벼농사가 주종을 이루었고, 7,000여년전 당시의 나무로 집지은 흔적을 발견했다.
나무집은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벌레, 뱀으로부터 보호)을 두고 나무못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건축하였다.
그 당시의 태양과 조류, 상아, 배를 움직이는 노, 페인트, 물감 등 발견으로 중국문화연구에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현지에 1993. 9월 河姆渡박물관을 건립하였는데 중국 총서기 강택민의 친필 현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박물관내에는 그 당시 생활상을 담은 390여종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40여만명이 관람했다.
\'99. 6월부터 제2의 유적박물관 건립을 착수 했으며, 발굴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보존하고
시연하였음. 특히, 전시유물중 썩지 않은 벼알을 볼 수 있다.
본 유적지 발굴전에는 인도에서 벼농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하모도 유적지의
발굴로 7천여년전부터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벼농사가 성행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
3.홍산(紅山文化
중국 북방지역의 신석기 문화. 1935년 내몽고자치구 赤峰市 紅山後 유적지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홍산문화라고 한다. 처음에는 \"적봉 제1기 문화\"라고 명명했으나, 1954년 \"홍산문화\"라는 정식명칭이 정해졌다. 이 문화는 채도\"之\"자형 문양細石器, 그리고 땅을 파는 도구(掘土工具) 등를 기본 특징으로 한다.
집터와 가마터
발굴된 수량은 많지 않지만 집터는 사각형의 반지하 혈거식이며 소형과 대형의 두 종류이다. 소형의 길이와 폭은 4미터 안팎으로, 남아 있는 방벽은 아주 낮다. 실내 지면은 다져져있으며 중앙에는 표주박형의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서수천 유적지에서 발견된 대형 집터는 동서로 9미터, 남북으로 11.7미터인데, 남쪽에는 경사진 출입구가 있고 실내 중앙에 표주박형의 커다란 아궁이가 설치되었다. 특히 북쪽에 또다른 아궁이가 있어서 남북쪽 아궁이 사이에 방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릉산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기 가마터는 窯室과 火道火 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單室窯외에도 雙火 의 連室窯이 있다. 후자는 화당이 좌우로 병렬되어 경사진 화도와 장방형의 요실로 통하게 되어 있고 요실 내부에는 몇 개의 요주가 있다. 이러한 도기 가마의 구조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것이다.
문화유물
문화유물로는 석기와 도기 그리고 정교한 옥기가 있다. 석기는 마제석기를 주로 하는데 그중의 굴토용 도구인 犁(쟁기 려) (보습 사)에는 담배잎 모양의 煙葉形과 짚신 모양의 草履形 두 종류가 있는데 형태가 비교적 크다.
桂葉形의 雙孔石刀는 표면 전체에서 광택이 있고 칼날과 칼등부분이 대칭의 활형이며 칼등부분에 두 개의 구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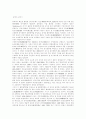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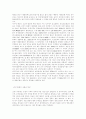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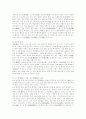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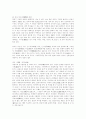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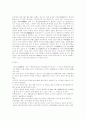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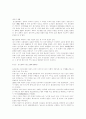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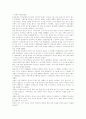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