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기의 장점
=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전통 상차림
= 일상의 음식, 그릇으로 새롭게
=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전통 상차림
= 일상의 음식, 그릇으로 새롭게
= 물 안새지만 공기는 통과…부패 막고 발효 잘돼
= 살아 숨쉬는 그릇의 전당 장독대
= 옹기의 역사, 종류, 특징, 좋은점.
= 살아 숨쉬는 그릇의 전당 장독대
= 현대화에 밀려나는 전통옹기
=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전통 상차림
= 일상의 음식, 그릇으로 새롭게
=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전통 상차림
= 일상의 음식, 그릇으로 새롭게
= 물 안새지만 공기는 통과…부패 막고 발효 잘돼
= 살아 숨쉬는 그릇의 전당 장독대
= 옹기의 역사, 종류, 특징, 좋은점.
= 살아 숨쉬는 그릇의 전당 장독대
= 현대화에 밀려나는 전통옹기
본문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특히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흙으로 빚은 옹기들이 명확히 분류돼 있다. 옹기를 굽는 가마는 도자기 가마와는 달리 경사진 곳에 기다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옹기가마를 보통 통가마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튜브킬른(tubekiln)이라하고 일본에서는 아니가마라고 부른다. 작은 가마는 3~4미터, 큰 것은 40~50미터의 긴 튜브형태로 20~30도의 경사진 언덕에 설치하며 가마 밑 부분이나 옆 부분 한두 군데에 있는 문을 통해 기물을 재임하고 밑에서부터 소성(燒成)하면서 예열(豫熱)한다. 천장에 난 작은 화구를 통해 나무를 투입하여 가마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정함으로 가마가 길어도 균일한 소성이 가능하다. 경사진 언덕에 가마를 짓기 때문에 경사도 그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한다. 밑에서부터 점차 소성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소성이 끝난 부분은 자연히 냉각되고 그 윗부분이 예열이 되기 때문에 반연속가마로 부르기도 한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일원에서는 조대불통가마를 사용한다. 이 가마는 외형상 ‘ㄱ\' 자형 구조로, 불통과 가마 칸이 90도로 꺾여져 있다. 가마 중간에 2, 3개의 문이 있고 봉통과 기물 실이 살창으로 막혀 있어 기물에 직접 닿지 않고 예열이 되므로 기물의 파손이 적은데 이런 형태의 가마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조대불통가마 구조도. 조대불통가마는 외형상 ‘ㄱ\' 자형 구조로 불통과 가마 칸이 90도로 꺾여져 있는데 이런 형태의 가마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현대화에 밀려나는 전통옹기〉 옹기의 내화도(耐火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화학조성 중 Al2O3가 많아야 하며, 착색을 할 때에는 Fe2O3나 MgO와 같은 금속 산화물의 양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옹기를 만들 대에는 주로 환원분위기에서 옹기가 구워짐으로 TiO2의 함유량도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옹기를 만들 대 가마의 분위기나 옹기의 착색도에 따라 Fe2O3,. MgO, TiO2의 양을 적당히 조절한다. 그러나 정확한 흙의 화학분석기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흙의 빛깔과 뭉쳤을 때 부서지는 강도 등을 참고하여 옹기를 굽는 장소와 흙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옹기를 제작하는 태토의 일반적인 화학조성은 SiO2가 65~70%, Al2O3가 20~24%, 알칼리산화물이 6~8%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기수 교수는 이와 같은 조성물이 1200~1300도에서 소결하여 내화도가 약 SK30(1천6백70도)이 되는 소지를 얻는다고 발표했다.
태토의 화학 분석치.
재래식 약토잿물은 유기물 속에서 흙이 산화된 것에 잿물을 약 30% 가량 섞은 것이다. 옹기 표면에 재래식 약토잿물을 입힌 후 대략 1,000~1,300도에서 구어 내는데 약토잿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식염유(食鹽油)를 사용하기도 한다. 약토잿물이 녹을 때 식염을 뿌려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옹기는 현대화 추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질이 낮고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물질인 광명단(光明丹)이 재래식 약토잿물 대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단이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개 19세기 초기에 유럽(프랑스)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 같다. 광명단 약토잿물(Pb3O4)은 광명단 약 40~50%, 약토 약 40~50%, 재약 10%을 배합해서 만든다. 때로는 망간도 넣는다. 광명단은 산화납이 주성분으로 매용제(융제)로 사용하는데 옹기에 입혀 구우면 붉은 색이 나고 표면이 유리처럼 광택이 뛰어나다. 망간은 착색제로 쓰이는데 구우면 검은색이 된다. 광명단과 망간을 포함한 유약을 사용하면 옹기의 빛깔이 새까맣게 빛남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한다. 사용된 유약의 숙성온도는 약 1천50도이다. 그러나 광명단의 주성분은 사산화납(Pb3O4)으로 이는 약 550도에서 분해되며, 제1산화납(PbO)으로 되는 융점은 880도가 된다. 바닥 흙이 가장 잘 익는 온도가 1200~1300도임을 감안하면 바닥 흙이 설 익는 상태에서 광명단이 녹음으로 옹기의 견고성 면에서도 결함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명단과 망간이 포함된 옹기는 인체에 해로운 납과 망간 성분이 용출될 수 있는데다가 납유약이 완전히 녹아 옹기의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에 저장되는 음식물이 ‘질식’해 죽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광명단 유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약이 산에 용해되는데 우리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발효식품이 주로 산성이므로 유약이 음식물 속으로 침투한다는 점이다. 침투된 유약은 인체의 동맥에 중금속 형태로 유입돼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한다. 특히 납은 무서운 공해병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광명단을 사용한 옹기가 납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자 1976년 보건사회부에서는 도자기 제조 및 옹기류 제조시 납이 함유된 유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물론 광명단을 무조건 유해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1978년 법원은 광명단을 사용한 용기일지라도 인체에 꼭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명단을 섞은 유약이라도 1,200도 이상에서 구우면 납 성분은 모두 날라 가고 규산연으로 변하여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광명단을 섞는 것은 고운 색깔과 매끄러운 윤기를 위해서인데 이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850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현재 쓰이고 있는 광명단을 사용한 옹기의 납 문제는 항상 남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하튼 광명단 문제는 생산업자나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제기해 주어 근래에는 무광택 광명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명단 옹기가 국민건강과 보건에 해를 준다고 하자 광명단 옹기의 생산을 막자는 운동과 함께 전통 옹기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통 옹기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전통 옹기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온, 뛰어난 과학적 기능을 가진 옹기가 제 대접을 받는 날이 금명간 오리라고 생각된다. 이종호(mystery123@korea.com · 과학저술가)
조대불통가마 구조도. 조대불통가마는 외형상 ‘ㄱ\' 자형 구조로 불통과 가마 칸이 90도로 꺾여져 있는데 이런 형태의 가마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현대화에 밀려나는 전통옹기〉 옹기의 내화도(耐火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화학조성 중 Al2O3가 많아야 하며, 착색을 할 때에는 Fe2O3나 MgO와 같은 금속 산화물의 양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옹기를 만들 대에는 주로 환원분위기에서 옹기가 구워짐으로 TiO2의 함유량도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옹기를 만들 대 가마의 분위기나 옹기의 착색도에 따라 Fe2O3,. MgO, TiO2의 양을 적당히 조절한다. 그러나 정확한 흙의 화학분석기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흙의 빛깔과 뭉쳤을 때 부서지는 강도 등을 참고하여 옹기를 굽는 장소와 흙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옹기를 제작하는 태토의 일반적인 화학조성은 SiO2가 65~70%, Al2O3가 20~24%, 알칼리산화물이 6~8%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기수 교수는 이와 같은 조성물이 1200~1300도에서 소결하여 내화도가 약 SK30(1천6백70도)이 되는 소지를 얻는다고 발표했다.
태토의 화학 분석치.
재래식 약토잿물은 유기물 속에서 흙이 산화된 것에 잿물을 약 30% 가량 섞은 것이다. 옹기 표면에 재래식 약토잿물을 입힌 후 대략 1,000~1,300도에서 구어 내는데 약토잿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식염유(食鹽油)를 사용하기도 한다. 약토잿물이 녹을 때 식염을 뿌려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옹기는 현대화 추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질이 낮고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물질인 광명단(光明丹)이 재래식 약토잿물 대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단이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개 19세기 초기에 유럽(프랑스)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 같다. 광명단 약토잿물(Pb3O4)은 광명단 약 40~50%, 약토 약 40~50%, 재약 10%을 배합해서 만든다. 때로는 망간도 넣는다. 광명단은 산화납이 주성분으로 매용제(융제)로 사용하는데 옹기에 입혀 구우면 붉은 색이 나고 표면이 유리처럼 광택이 뛰어나다. 망간은 착색제로 쓰이는데 구우면 검은색이 된다. 광명단과 망간을 포함한 유약을 사용하면 옹기의 빛깔이 새까맣게 빛남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한다. 사용된 유약의 숙성온도는 약 1천50도이다. 그러나 광명단의 주성분은 사산화납(Pb3O4)으로 이는 약 550도에서 분해되며, 제1산화납(PbO)으로 되는 융점은 880도가 된다. 바닥 흙이 가장 잘 익는 온도가 1200~1300도임을 감안하면 바닥 흙이 설 익는 상태에서 광명단이 녹음으로 옹기의 견고성 면에서도 결함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명단과 망간이 포함된 옹기는 인체에 해로운 납과 망간 성분이 용출될 수 있는데다가 납유약이 완전히 녹아 옹기의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에 저장되는 음식물이 ‘질식’해 죽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광명단 유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약이 산에 용해되는데 우리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발효식품이 주로 산성이므로 유약이 음식물 속으로 침투한다는 점이다. 침투된 유약은 인체의 동맥에 중금속 형태로 유입돼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한다. 특히 납은 무서운 공해병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광명단을 사용한 옹기가 납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자 1976년 보건사회부에서는 도자기 제조 및 옹기류 제조시 납이 함유된 유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물론 광명단을 무조건 유해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1978년 법원은 광명단을 사용한 용기일지라도 인체에 꼭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명단을 섞은 유약이라도 1,200도 이상에서 구우면 납 성분은 모두 날라 가고 규산연으로 변하여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광명단을 섞는 것은 고운 색깔과 매끄러운 윤기를 위해서인데 이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850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현재 쓰이고 있는 광명단을 사용한 옹기의 납 문제는 항상 남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하튼 광명단 문제는 생산업자나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제기해 주어 근래에는 무광택 광명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명단 옹기가 국민건강과 보건에 해를 준다고 하자 광명단 옹기의 생산을 막자는 운동과 함께 전통 옹기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통 옹기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전통 옹기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온, 뛰어난 과학적 기능을 가진 옹기가 제 대접을 받는 날이 금명간 오리라고 생각된다. 이종호(mystery123@korea.com · 과학저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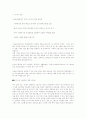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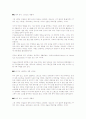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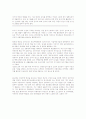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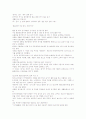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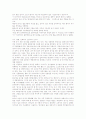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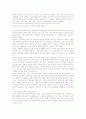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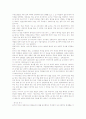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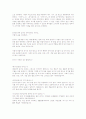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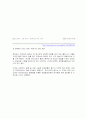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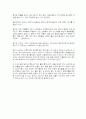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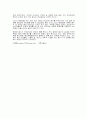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