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본론
■ 최승희의 일대기
■ 일본인들의 평가
■ 북한에서의 작품활동
■ 최승희의 무용관
■ 월북과 그 이후
▶ 결론
■ 최승희에 대한 재평가
▶ 본론
■ 최승희의 일대기
■ 일본인들의 평가
■ 북한에서의 작품활동
■ 최승희의 무용관
■ 월북과 그 이후
▶ 결론
■ 최승희에 대한 재평가
본문내용
인 명성을 가진 최승희가 코리안 댄서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전쟁을 목전에 둔 일본으로서는 최승희가 너무 좋은 선전 도구였다. 일본 군부는 최승희에게 ‘전선 위문 공연’을 강요한다.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 무용가가 된 최승희가 전선을 돌며 공연을 하는 것은 일본군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이미 구미에서 명성을 얻은 최승희였기에 외국에 대한 선전효과도 아주 컸다. 1942년부터 2년 간 최승희는 일제의 총칼 아래서 하는 수 없이 만주와 중국 본토 등지를 떠돌며 전선 위문공연을 다녀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조선, 만주, 중국에서 130회에 이르는 공연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북경에서의 18회 공연을 하는 동안 수천 년의 중국 춤의 전통을 공부하였고 매란방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등 그녀에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해 12월 6일부터 일본에 돌아와 그때까지의 자신의 작품을 총 정리하는 무대를 가졌다. 일본 제국극장(수용인원 2천명)에서 17일간 24회라는 기록적인 장기 공연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그동안의 대표작과 조선춤 뿐 아니라 일본춤, 중국춤 까지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춤을 위한 시험무대로 삼았던 것이다. 그 후, 자신의 대중적인 기반을 염두에 둔 회원제도를 모색하여 당시 문화인을 망라한 500명의 특별회원과 동일한 인원수의 일반회원으로 구성하였다.
1943년 8월8일 제국극장에서 그녀는 고도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새로운 춤을 선보이게 된다. 이 무대는 무용 해설 형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어 1944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23회의 솔로 중심의 장기공연을 극장에서 가졌다. 관객은 매회 초만원이었다. 평론가들은 “이번 공연의 경향을 보면 중국무용을 조선무용과 같은 창작 수법으로 안무했으며 중국의 고전예술을 무용화한 것은 세계무용사의 신기원이 될 것” 이라는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승희는 처음에 발레로 시작하여 현대무용과 서양의 캐릭터를 추었으나 1930년대부터 한국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공연 이후부터는 동양무용에 대한 작품에 손을 댄다. 그녀의 춤동작은 우아하다기보다는 흥겨운 멋이 있었고 낙천성과 풍자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며 움직임이 매우 역동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춤동작 이외에 표현력에서도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는 얼굴 표정이 작품마다 달라서 관객으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흡인력이 있었다고 한다.
월북과 그 이후
45년 8월 해방이 됐으나 중국에 있던 안막은 청년시절부터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처지여서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몹시 고뇌했다고 한다. 결국 45년 8월말 안막은 중국내 조선인 공산군과 함께 평양으로 향했다. 한편 최승희는 이듬해 김백봉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중국 천진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해방 후 서울에서는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 친일파로 몰린 최승희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뺏으려고 할 때, 나는 dfl 민족의 정신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내가 조선의 딸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승희는 북한에 가 있던 안막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고 46년 7월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최승희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백봉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 김백봉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최승희 동무 살러왔소, 다니러 왔소”라고 물었다. 김일성은 “살러왔다”는 최승희에게 원하던 대로 대동강변 요정이었던 동일관 자리에
1943년 8월8일 제국극장에서 그녀는 고도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새로운 춤을 선보이게 된다. 이 무대는 무용 해설 형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어 1944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23회의 솔로 중심의 장기공연을 극장에서 가졌다. 관객은 매회 초만원이었다. 평론가들은 “이번 공연의 경향을 보면 중국무용을 조선무용과 같은 창작 수법으로 안무했으며 중국의 고전예술을 무용화한 것은 세계무용사의 신기원이 될 것” 이라는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승희는 처음에 발레로 시작하여 현대무용과 서양의 캐릭터를 추었으나 1930년대부터 한국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공연 이후부터는 동양무용에 대한 작품에 손을 댄다. 그녀의 춤동작은 우아하다기보다는 흥겨운 멋이 있었고 낙천성과 풍자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며 움직임이 매우 역동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춤동작 이외에 표현력에서도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는 얼굴 표정이 작품마다 달라서 관객으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흡인력이 있었다고 한다.
월북과 그 이후
45년 8월 해방이 됐으나 중국에 있던 안막은 청년시절부터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처지여서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몹시 고뇌했다고 한다. 결국 45년 8월말 안막은 중국내 조선인 공산군과 함께 평양으로 향했다. 한편 최승희는 이듬해 김백봉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중국 천진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해방 후 서울에서는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 친일파로 몰린 최승희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뺏으려고 할 때, 나는 dfl 민족의 정신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내가 조선의 딸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승희는 북한에 가 있던 안막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고 46년 7월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최승희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백봉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 김백봉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최승희 동무 살러왔소, 다니러 왔소”라고 물었다. 김일성은 “살러왔다”는 최승희에게 원하던 대로 대동강변 요정이었던 동일관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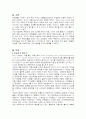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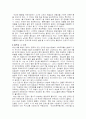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