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개관
2) 청자, 분청사기, 백자-국보를 중심으로
3. 결론
2. 본론
1)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개관
2) 청자, 분청사기, 백자-국보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법이나 유의 특징은 대단히 고려적이어서 오히려 14세기의 고려 백자 상감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이런 유의 조선 초기 백자 상감들은 대개 유가 거칠고 상감 솜씨도 날림이 많으며, 굽도리의 마무리도 허술한 데 비해 이 대접은 아주 정제되어 있으며, 특히 굽다리는 비할 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문양의 선은 예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풍긴다. 조선 백자 상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② 백자의 변화
16세기에 이르면 상감백자는 사라지고 기형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도자기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조선전기에 번조된 백자 중 상감백자는 사라지게 되었다.
17세기 초에는 왜란으로 도자기 생산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제작수법도 거칠어지고 질도 떨어지게 되며. 이 시기의 백자의 종류로는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등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진사백자가 제작되었다. 이때의 백자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어두운 회색 회백자의 백자로 거칠게 구워졌다. 17C후반에는 사회가 안정되어가며 백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었으며 철회백자가 제작되었다. 철화백자는 달덩어리 같은 둥근 항아리에 굵은 필치로 자유롭게 그려진 구름과 용이 주로 등장하는 백자이다.
18C는 문화의 전성기로 백자에 있어서 고전적인 유백색(乳白色), 설백색(雪白色)의 백자와 간결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국보 중 철화백자는 2점이 있다.
첫째로, 국보 93호 백자철화포도문호는 입 부분이 적당한 높이로 서 있고, 몸체가 어깨에서부터 둥그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허리께로부터 서서히 좁아졌으며 바닥에 이르러 다시 약간 벌어진 항아리이다. 이처럼 항아리의 입 부분이 직립한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항아리들의 특징이다. 철채(鐵彩) 안료로 입 둘레에 도안화된 무늬를 두르고 몸체에는 어깨에서 허리 부분에 걸쳐 능숙한 필치로 포도 덩굴을 그려 넣었다. 원래 철분 안료는 붓을 대자마자 태토에 스며드는데다가 이 작품의 경우 안료가 너무 많이 묻어서 포도와 잎이 번져 엉켜 버렸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화원(畵員)의 능숙한 필력과 구도는 살필 수가 있다. 이 항아리는 조선 왕조 관요에서 만든 철화문 백자의 대표작이다.
둘째로, 국보166호 백자철화매죽문대호는 약간 높직한 입 부분이 안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어깨와 몸체 윗부분이 풍만하게 부풀었다가 조금씩 좁아져 내려오면서 당당하고 힘찬 선을 그으며 바닥에 이른다. 이런 종류의 대호는 조선 초 분청사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16-17세기 전반 백자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다. 입 부분에 당초 모양의 구름무늬가 있고 어깨에 변형된 연화문이 있다. 몸체 양면에는 대나무와 매화 그림이 철채(鐵彩)로 가득 그려져 있으며 아랫단에 파도 무늬가 있다. 매죽을 그린 솜씨가 원숙한 것을 볼 때 도공이 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항아리의 대나무는 몰골법(沒骨法)으로 그렸고 매화는 구륵법(鉤勒法)을 구사하였는데, 당시 화단의 사군자 기법 양식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유(釉)도 옥색이 비낀 유백색으로 빙렬(氷裂)이 없으며 표면이 치밀하고 안정감 있다. 제작처는 분명하지 않으나, 단정하게 마무리한 작풍이나 뛰어난 유태(釉胎)의 질로 미루어보아 광주(廣州) 관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3. 결론
옛 도자기는 우리 민족 문화 유산의 하나로서 비록 그릇이지만 단지 그릇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옛 도자기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길은 많은 부분의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마치 좋은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보다 자주 듣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체험과도 같다. 도자에 관련된 책들을 처음 접해 보면서 난해한 점들도 많아 힘들었지만 어렴풋이나마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차츰 도자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자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박물관 전시실을 찾거나 도자에 관련된 도서들을 읽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게 도자기에 다가가는 방법은 아마도 옛 도자를 제작하는 가마의 작업장을 찾아가 제작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배워보는 것일텐데, 영화에 나오는 여느 장면처럼 한밤 가마에서 불을 때는 장인과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서 장인정신으로 서서히 익어가는 도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도자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또한 그런 연후에 이미 완성품으로서 박물관에 안치되어있는 도자를 맞이해 본다면 우리가 가질 그 느낌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새롭고 소중한 것일까. 또한 이와 함께 고려, 조선의 도자가 만들어진 당대 역사적 배경(;사상이나 종교적인 측면)과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함께 어우러 본다면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찰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상감청자, 분청사기, 이조백자에 이르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아직 우리 민족의 온갖 애환이 깃든 도자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문화가 아닌 셈이 된다. 도자 역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다. 우리 눈에 의해 조명되고, 우리 마음에 의해 감흥 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kbf.or.kr 웹진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호암미술관 홈페이지 www.hoammuseum.org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강경숙,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1986.
고유섭, 『고려청자』, 을유문화사, 1954.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http://www.hankook.com 한국도자기
여주민속도자기조합 홈페이지 www.yeoju.co.kr
② 백자의 변화
16세기에 이르면 상감백자는 사라지고 기형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도자기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조선전기에 번조된 백자 중 상감백자는 사라지게 되었다.
17세기 초에는 왜란으로 도자기 생산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제작수법도 거칠어지고 질도 떨어지게 되며. 이 시기의 백자의 종류로는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등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진사백자가 제작되었다. 이때의 백자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어두운 회색 회백자의 백자로 거칠게 구워졌다. 17C후반에는 사회가 안정되어가며 백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었으며 철회백자가 제작되었다. 철화백자는 달덩어리 같은 둥근 항아리에 굵은 필치로 자유롭게 그려진 구름과 용이 주로 등장하는 백자이다.
18C는 문화의 전성기로 백자에 있어서 고전적인 유백색(乳白色), 설백색(雪白色)의 백자와 간결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국보 중 철화백자는 2점이 있다.
첫째로, 국보 93호 백자철화포도문호는 입 부분이 적당한 높이로 서 있고, 몸체가 어깨에서부터 둥그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허리께로부터 서서히 좁아졌으며 바닥에 이르러 다시 약간 벌어진 항아리이다. 이처럼 항아리의 입 부분이 직립한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항아리들의 특징이다. 철채(鐵彩) 안료로 입 둘레에 도안화된 무늬를 두르고 몸체에는 어깨에서 허리 부분에 걸쳐 능숙한 필치로 포도 덩굴을 그려 넣었다. 원래 철분 안료는 붓을 대자마자 태토에 스며드는데다가 이 작품의 경우 안료가 너무 많이 묻어서 포도와 잎이 번져 엉켜 버렸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화원(畵員)의 능숙한 필력과 구도는 살필 수가 있다. 이 항아리는 조선 왕조 관요에서 만든 철화문 백자의 대표작이다.
둘째로, 국보166호 백자철화매죽문대호는 약간 높직한 입 부분이 안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어깨와 몸체 윗부분이 풍만하게 부풀었다가 조금씩 좁아져 내려오면서 당당하고 힘찬 선을 그으며 바닥에 이른다. 이런 종류의 대호는 조선 초 분청사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16-17세기 전반 백자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다. 입 부분에 당초 모양의 구름무늬가 있고 어깨에 변형된 연화문이 있다. 몸체 양면에는 대나무와 매화 그림이 철채(鐵彩)로 가득 그려져 있으며 아랫단에 파도 무늬가 있다. 매죽을 그린 솜씨가 원숙한 것을 볼 때 도공이 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항아리의 대나무는 몰골법(沒骨法)으로 그렸고 매화는 구륵법(鉤勒法)을 구사하였는데, 당시 화단의 사군자 기법 양식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유(釉)도 옥색이 비낀 유백색으로 빙렬(氷裂)이 없으며 표면이 치밀하고 안정감 있다. 제작처는 분명하지 않으나, 단정하게 마무리한 작풍이나 뛰어난 유태(釉胎)의 질로 미루어보아 광주(廣州) 관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3. 결론
옛 도자기는 우리 민족 문화 유산의 하나로서 비록 그릇이지만 단지 그릇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옛 도자기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길은 많은 부분의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마치 좋은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보다 자주 듣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체험과도 같다. 도자에 관련된 책들을 처음 접해 보면서 난해한 점들도 많아 힘들었지만 어렴풋이나마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차츰 도자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자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박물관 전시실을 찾거나 도자에 관련된 도서들을 읽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게 도자기에 다가가는 방법은 아마도 옛 도자를 제작하는 가마의 작업장을 찾아가 제작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배워보는 것일텐데, 영화에 나오는 여느 장면처럼 한밤 가마에서 불을 때는 장인과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서 장인정신으로 서서히 익어가는 도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도자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또한 그런 연후에 이미 완성품으로서 박물관에 안치되어있는 도자를 맞이해 본다면 우리가 가질 그 느낌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새롭고 소중한 것일까. 또한 이와 함께 고려, 조선의 도자가 만들어진 당대 역사적 배경(;사상이나 종교적인 측면)과 실생활에서의 쓰임을 함께 어우러 본다면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찰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상감청자, 분청사기, 이조백자에 이르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아직 우리 민족의 온갖 애환이 깃든 도자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문화가 아닌 셈이 된다. 도자 역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다. 우리 눈에 의해 조명되고, 우리 마음에 의해 감흥 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kbf.or.kr 웹진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호암미술관 홈페이지 www.hoammuseum.org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강경숙,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1986.
고유섭, 『고려청자』, 을유문화사, 1954.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http://www.hankook.com 한국도자기
여주민속도자기조합 홈페이지 www.yeo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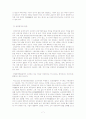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