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동양과 서양
1.1 동양과 서양을 무엇으로 나눌까?
1.2.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이 가능할 것인가?
2. 오리엔탈리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1. 서양에게 있어 동양은 어떤 존재였을까?
2.2. 이슬람과 오리엔탈리즘
2.3. 학문으로 시작되는 오리엔탈리즘
3. 제국주의와 만난 오리엔탈리즘
4. 최근의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을 만드는 시스템
5. 오리엔탈리즘의 함정
6.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Ⅱ. 결론
1. 동양과 서양
1.1 동양과 서양을 무엇으로 나눌까?
1.2.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이 가능할 것인가?
2. 오리엔탈리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1. 서양에게 있어 동양은 어떤 존재였을까?
2.2. 이슬람과 오리엔탈리즘
2.3. 학문으로 시작되는 오리엔탈리즘
3. 제국주의와 만난 오리엔탈리즘
4. 최근의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을 만드는 시스템
5. 오리엔탈리즘의 함정
6.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Ⅱ. 결론
본문내용
이다. 경제만이 서양의 모습을 본 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화마저 서구를 따라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구우월주의! 서구가 우월하므로 동양은 서양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느냐는 문제이다.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회복일 것이다. 각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선조의 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서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의 것을 발전시킨다면 서구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요즈음 동양의 정신문화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서양에서 일고 있다.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강의마다 노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가르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양의 자연친화사상과 조화사상이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면서 피폐해진 환경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정신문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서구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이기주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싶다.
식상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양을 따라가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서구우월주의의 극복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월등하다는 시각으로 우리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중심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양의 문명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우리사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되, 우리선조가 물려준 유산은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강대국의 의미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오래도록 꿈꾸었던 선진국 진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무엇이 선진이고 무엇이 후진을 나누는 기준일까? 경제력만을 가지고, 서양의 모든 것을 우월하게 평가하지 말고, 경제력만을 나라의 목표로 삼지 않고, 새로운 의미의 선진국을 목표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Ⅱ. 결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은 인류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지구가 쟁반이나, 바둑판처럼 생겼다면, 지구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테고,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는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나라가 지구 구성에 일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족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미개한 것이 아니며, 환경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발전한 것뿐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고 하여,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라간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웃나라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대일수록,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해야지만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은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했기에, 오랜 기간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자세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여 세계시민으로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회복일 것이다. 각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선조의 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서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의 것을 발전시킨다면 서구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요즈음 동양의 정신문화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서양에서 일고 있다.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강의마다 노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가르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양의 자연친화사상과 조화사상이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면서 피폐해진 환경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정신문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서구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이기주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싶다.
식상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양을 따라가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서구우월주의의 극복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월등하다는 시각으로 우리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중심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양의 문명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우리사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되, 우리선조가 물려준 유산은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강대국의 의미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오래도록 꿈꾸었던 선진국 진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무엇이 선진이고 무엇이 후진을 나누는 기준일까? 경제력만을 가지고, 서양의 모든 것을 우월하게 평가하지 말고, 경제력만을 나라의 목표로 삼지 않고, 새로운 의미의 선진국을 목표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Ⅱ. 결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은 인류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지구가 쟁반이나, 바둑판처럼 생겼다면, 지구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테고,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는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나라가 지구 구성에 일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족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미개한 것이 아니며, 환경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발전한 것뿐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고 하여,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라간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웃나라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대일수록,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해야지만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은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했기에, 오랜 기간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자세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여 세계시민으로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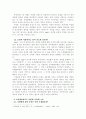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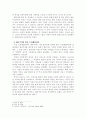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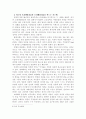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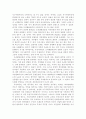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