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대민속신앙
(1)단군신앙
(2)미륵신앙
2. 가정신앙
(1)조상신
(2)조왕신
(3)산신
(4)터주신
(5)업신
(5)용단지
(6)측신
3. 마을신앙
(1)서낭당
(2)산신당
(3)장승
(4)솟대
(5)동제
(6)돌탑
(7)기우제
4. 무속신앙
(1)무속
(2)무당
(3)굿
5. 귀신신앙
- 천신
- 천사
- 산신
- 용신
- 호국신
- 일월신
- 역신
- 금수신
- 혼신
- 사직신
- 세신
- 성황신
- 여귀
- 무신
※ 고시레※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
<이야기 4>
<이야기 5>
(1)단군신앙
(2)미륵신앙
2. 가정신앙
(1)조상신
(2)조왕신
(3)산신
(4)터주신
(5)업신
(5)용단지
(6)측신
3. 마을신앙
(1)서낭당
(2)산신당
(3)장승
(4)솟대
(5)동제
(6)돌탑
(7)기우제
4. 무속신앙
(1)무속
(2)무당
(3)굿
5. 귀신신앙
- 천신
- 천사
- 산신
- 용신
- 호국신
- 일월신
- 역신
- 금수신
- 혼신
- 사직신
- 세신
- 성황신
- 여귀
- 무신
※ 고시레※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
<이야기 4>
<이야기 5>
본문내용
- 역신
사람과 제상에 질역(疾疫)을 주는 귀신이다. 처용부인을 유혹하고 수로부인을 납치한 것을 비롯하여 선덕여왕이 병이 들었을 때 밀본법사가 약사경 독경하니 6환장이 날아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죽였다. 또한 활의 명수 거타지가 바다용의 요청으로 괴신을 살해하고 보니 늙은 여우의 정(精)이었다는 것이 역신이다.
- 금수신
신라 21대 소지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했을 때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 울었다. 까마귀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왕의 밀실에 있는 거문고 갑을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여 거문고 갑을 쏘았더니, 한 궁녀와 수도인이 간통하고 있었다. 그후 대보름 날 까마귀·쥐신에게 약밥을 주는 풍습이 생겼다.
- 혼신
인간의 영혼이 곳곳에 나타나 갖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 사직신
사(社)는 토지신으로 동쪽에 두고, 직(稷)은 곡식신으로 서쪽에 두어 신은 남북을 향하게 하였다. 고려의 종묘사직은 성종 10년에, 조선은 태조 3년에 만들어졌다. 사에는 후토씨(后土氏), 직에는 후직씨(后稷氏)를 각각 안치했다. 각 주·현에 성의 서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서울에서는 왕이, 지방에서는 지방장관이 오곡의 풍요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 세신
『해동역사』에 \'고려 동쪽 동굴에 세신이 있다.…항상 정월 보름에 신맞이 제사를 지내는데 팔관제라 한다\'고 했다.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 때 불교의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고 죄를 참회했다. 고려시대에는 경향각지에서 정월 15일부터 연등을 했다. 고려 태조는 \'전왕 때부터 매년 팔관재를 지내고 복을 빌었다.\' 며 유희로서 부처님과 신을 기리고 우국충절의 혼령들을 위로했다.
- 성황신
각 성읍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 여귀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귀신이다. 서울에서는 한성부원이 7월 보름·청명·10월에 각각 한번씩 제사를 지냈다. 모든 원한에 의한 질병·액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 무신
무당이 모시는 3신(환인·환웅·단검)과 제석, 시왕(염라국의 10대명왕), 3불(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 만명(김유신의 어머니), 어비대왕(처용)과 바리공주(처용의 아내)로 어비는 무섭다, 바리는 버렸다는 말이다. 법우화상(지리산 성모천황과 결혼하여 8선녀를 낳음), 성황신, 대감신(유비·장비·관운장), 토지신, 수문신(출입문신), 왕래대감(떠돌이 귀신), 성주대감(집안신), 태자귀 등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고시레※
믿음을 기저(基底)로 하는 어떤 행위에는 믿음의 대상(對象)과 의례(儀禮), 의례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설화(說話)가 존재한다. 마을의 평안(平安)과 개인의 복(福)을 기원하면서 행하는 당산제(堂山祭)의 당산신(堂山神)과 당산제의(堂山祭儀), 그리고 제관(祭官)과 당신화(堂神話)가 그 예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 전승(傳承)되고 있는 신앙에는 믿음을 기본으로 믿음의 대상, 의례, 믿음을 행하는 사람, 설화 등이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설화는 사라지고, 이유도 모르는 체 행위(의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행위는 사라지고 설화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혹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거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설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 중의 하나로 고시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조금 떼어 ‘고수레’라고 외치면서 허공에 던지는 민간 신앙을 ‘고수레’ 혹은 ‘고시래’, ‘고시레’라 한다. ‘고수레’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음식을 던지면서 ‘고수레’라고 말을 하는 행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음식을 받아 대상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고시레 설화를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죽은 이를 위해 음식을 던져주는 이야기, 음식을 던져 주면서 자신의 복(福)을 기원하는 이야기, 자신에게 올지 모르는 액(厄)을 미리 막기 위해 음식을 던져주는 이야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 1>
고씨레. 성이 고씨. 고씨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데요. 어렵게 살았는데, 배를 굶주리다가 들판에서 논두렁을 그으 베고 죽었데요. (조사자 : 아, 굶어 죽었군요?) 네에. 그래 가지구 일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저기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러는, 미리 그 사람에게 고사지낸다는 그런 애기두 있데요.
<이야기 2>
도선이 그이두 그렇게 유명하니 …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최 어디다 쓸데가 없어서 전라도 저 만경들에다 갓다설랑 거기다 쓰고선 거시기 한다고 거기다 썼는데, 인제 써놓고 보니깐 거 농사꾼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장난을 했던지,
“아 우리 왔는데 도선 어머니 진지 좀 잡수”
아 그러고 놨다.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후로 썩 잘 됐단 말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밥만 잡수라고 갖다 논 사람의 농사는 다 잘되어. 인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런덴 갈 수가 없으니까,
“고씨네-”하고 숟갈로 밥을 떠서 글구 던져,
(조사자 : 들에서 밥 먹을 적에 던지는 게 그거에요?)
그래 그거야, 도선 어머니가 고씨여 성이 고씨니깐 고씨네 이러지
<이야기 3>
도선이가 중이닌까는 대를 이어야지 제사두 먹을 텐데, 자기 어머니가 고신이에요. 저기 어머니 묻을 때 다른 데다 묻으면 거 제사 못 지내줄 거 아니요? 그래 전라도 만경들에 묻었는데, 가문단 말이에요. 꿈에 현몽 하기를
“나한테 밥 한 술 내 놓으면 비가 내린다”
몇몇 사람인데 의지가 맞는 사람인데 거기다 인제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밥을 갖다 놓고, 그래구 나서 사흘이 되었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는,
“저 자식 인제 미친 자식이야”
라고 모두 욕을 하는데, 아 지 엄마가 있으니까 폭우가 하여튼 그 사람 있는 동네만 비가 왔어요, 그 사람 동네만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곁에서는 같이, 사람은 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먼데 사람은 밥을 갖다 놓구, 고시례한단 말이야
<이야기 4>
그이가 고시레라는 이가 연안 벌판에서
사람과 제상에 질역(疾疫)을 주는 귀신이다. 처용부인을 유혹하고 수로부인을 납치한 것을 비롯하여 선덕여왕이 병이 들었을 때 밀본법사가 약사경 독경하니 6환장이 날아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죽였다. 또한 활의 명수 거타지가 바다용의 요청으로 괴신을 살해하고 보니 늙은 여우의 정(精)이었다는 것이 역신이다.
- 금수신
신라 21대 소지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했을 때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 울었다. 까마귀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왕의 밀실에 있는 거문고 갑을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여 거문고 갑을 쏘았더니, 한 궁녀와 수도인이 간통하고 있었다. 그후 대보름 날 까마귀·쥐신에게 약밥을 주는 풍습이 생겼다.
- 혼신
인간의 영혼이 곳곳에 나타나 갖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 사직신
사(社)는 토지신으로 동쪽에 두고, 직(稷)은 곡식신으로 서쪽에 두어 신은 남북을 향하게 하였다. 고려의 종묘사직은 성종 10년에, 조선은 태조 3년에 만들어졌다. 사에는 후토씨(后土氏), 직에는 후직씨(后稷氏)를 각각 안치했다. 각 주·현에 성의 서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서울에서는 왕이, 지방에서는 지방장관이 오곡의 풍요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 세신
『해동역사』에 \'고려 동쪽 동굴에 세신이 있다.…항상 정월 보름에 신맞이 제사를 지내는데 팔관제라 한다\'고 했다.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 때 불교의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고 죄를 참회했다. 고려시대에는 경향각지에서 정월 15일부터 연등을 했다. 고려 태조는 \'전왕 때부터 매년 팔관재를 지내고 복을 빌었다.\' 며 유희로서 부처님과 신을 기리고 우국충절의 혼령들을 위로했다.
- 성황신
각 성읍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 여귀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귀신이다. 서울에서는 한성부원이 7월 보름·청명·10월에 각각 한번씩 제사를 지냈다. 모든 원한에 의한 질병·액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 무신
무당이 모시는 3신(환인·환웅·단검)과 제석, 시왕(염라국의 10대명왕), 3불(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 만명(김유신의 어머니), 어비대왕(처용)과 바리공주(처용의 아내)로 어비는 무섭다, 바리는 버렸다는 말이다. 법우화상(지리산 성모천황과 결혼하여 8선녀를 낳음), 성황신, 대감신(유비·장비·관운장), 토지신, 수문신(출입문신), 왕래대감(떠돌이 귀신), 성주대감(집안신), 태자귀 등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고시레※
믿음을 기저(基底)로 하는 어떤 행위에는 믿음의 대상(對象)과 의례(儀禮), 의례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설화(說話)가 존재한다. 마을의 평안(平安)과 개인의 복(福)을 기원하면서 행하는 당산제(堂山祭)의 당산신(堂山神)과 당산제의(堂山祭儀), 그리고 제관(祭官)과 당신화(堂神話)가 그 예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 전승(傳承)되고 있는 신앙에는 믿음을 기본으로 믿음의 대상, 의례, 믿음을 행하는 사람, 설화 등이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설화는 사라지고, 이유도 모르는 체 행위(의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행위는 사라지고 설화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혹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거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설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 중의 하나로 고시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조금 떼어 ‘고수레’라고 외치면서 허공에 던지는 민간 신앙을 ‘고수레’ 혹은 ‘고시래’, ‘고시레’라 한다. ‘고수레’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음식을 던지면서 ‘고수레’라고 말을 하는 행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음식을 받아 대상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고시레 설화를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죽은 이를 위해 음식을 던져주는 이야기, 음식을 던져 주면서 자신의 복(福)을 기원하는 이야기, 자신에게 올지 모르는 액(厄)을 미리 막기 위해 음식을 던져주는 이야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 1>
고씨레. 성이 고씨. 고씨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데요. 어렵게 살았는데, 배를 굶주리다가 들판에서 논두렁을 그으 베고 죽었데요. (조사자 : 아, 굶어 죽었군요?) 네에. 그래 가지구 일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저기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러는, 미리 그 사람에게 고사지낸다는 그런 애기두 있데요.
<이야기 2>
도선이 그이두 그렇게 유명하니 …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최 어디다 쓸데가 없어서 전라도 저 만경들에다 갓다설랑 거기다 쓰고선 거시기 한다고 거기다 썼는데, 인제 써놓고 보니깐 거 농사꾼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장난을 했던지,
“아 우리 왔는데 도선 어머니 진지 좀 잡수”
아 그러고 놨다.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후로 썩 잘 됐단 말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밥만 잡수라고 갖다 논 사람의 농사는 다 잘되어. 인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런덴 갈 수가 없으니까,
“고씨네-”하고 숟갈로 밥을 떠서 글구 던져,
(조사자 : 들에서 밥 먹을 적에 던지는 게 그거에요?)
그래 그거야, 도선 어머니가 고씨여 성이 고씨니깐 고씨네 이러지
<이야기 3>
도선이가 중이닌까는 대를 이어야지 제사두 먹을 텐데, 자기 어머니가 고신이에요. 저기 어머니 묻을 때 다른 데다 묻으면 거 제사 못 지내줄 거 아니요? 그래 전라도 만경들에 묻었는데, 가문단 말이에요. 꿈에 현몽 하기를
“나한테 밥 한 술 내 놓으면 비가 내린다”
몇몇 사람인데 의지가 맞는 사람인데 거기다 인제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밥을 갖다 놓고, 그래구 나서 사흘이 되었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는,
“저 자식 인제 미친 자식이야”
라고 모두 욕을 하는데, 아 지 엄마가 있으니까 폭우가 하여튼 그 사람 있는 동네만 비가 왔어요, 그 사람 동네만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곁에서는 같이, 사람은 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먼데 사람은 밥을 갖다 놓구, 고시례한단 말이야
<이야기 4>
그이가 고시레라는 이가 연안 벌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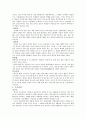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