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 1
[연보] ----------- 1
2. 시 세계
2.1 농무 ----------- 2
2.2 달 넘세--------- 4
2.3 쓰러진 자의 꿈-- 6
3. 이야기 시 -------- 8
4. 맺음말 ---------- 10
참고문헌 --------- 10
[연보] ----------- 1
2. 시 세계
2.1 농무 ----------- 2
2.2 달 넘세--------- 4
2.3 쓰러진 자의 꿈-- 6
3. 이야기 시 -------- 8
4. 맺음말 ---------- 10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언 듯 먼 마을에서 아저씨들이 오면
거멓게 빛깔이 변해가는 제 가냘픈 우리는 칸데라를 들고 나가
얼굴이 슬펐다. 지붕을 뒤져 참새를 잡는다.
무엇인가 들릴 듯도 하고 보일 듯도 한 것에 이 답답한 가슴에 구죽죽이
조용히 귀를 대이고 있었다. 겨울비가 내리는 당숙의 제삿날 밤.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 「묘비」(1956) 전문 그 당숙의 이름을 나는 모르고.
- 「제삿날 밤」(1973) 전문
1956년에 발표된「묘비」는 한 사람의 쓸쓸한 죽음을 나무비로 묘사하여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의 삶이나 죽음을 실감나게 상상할 만한 근거나 단서를 제공받지 못한다. 즉 그의 죽음은 시인의 내면세계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후 1973년에 발표된 「제삿날 밤」에서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것을 통해 당숙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개혁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젊어서 죽은 당숙인데도 마을에서 아저씨들이 오는 것을 보면, 죽을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는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일깨워주기도 한다.
『농무』에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25편, 밤을 배경으로 한 시들도 2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겨울이나 밤의 잦은 등장은 농촌민중들의 절망적인 삶을 드러내는 배경적 의미와 함께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기다림의 시간적 의미를 내포한다.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밤늦도록 우리는 지난 얘기만 한다
진눈깨비 치는 백리 산길 산골 여인숙은 돌광산이 가까운데
낮이면 주막 뒷방에 숨어 잠을 자다 마당에는 대낮처럼 달빛이 환해
지치면 아낙을 불러 육백을 친다 달빛에도 부끄러워 얼굴들을 돌리고
억울하고 어리석게 죽은 밤 깊도록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한다
빛바랜 주인의 사진 아래서 누가 속고 누가 속였는가 따지지 않는다
음탕한 농지거리로 아낙을 웃기면 산비탈엔 달빛 아래 산국화가 하얗고
바람은 뒷산 나뭇가지에 와 엉겨 비겁하게 사느라고 야윈 어깨로
굶어죽은 소년들의 원귀처럼 우는데 밤새도록 우리는 빈 얘기만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두 주먹뿐
수제빗국 한 사발로 배를 채울 때 - 「달빛」전문
아낙은 신세타령을 늘어놓고
우리는 미친놈처럼 자꾸 웃음이 나온다
- 「눈길」전문
겨울이 절망을 넘어서서 탄생부활재생기쁨희망으로 상징되는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면, 밤은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의 빛,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밤은 고통의 상징이며 암담한 상황의 배경이자 인간들의 화합과 친화 혹은 그리움 같은 서로의 애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민중들의 것이 된다. 즉『농무』의 계절이나 시간적 배경들이 민중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달 넘세』(1985) - 민요시
신경림이『농무』에서 보여준 ‘민중적 서정성’은 이후 『새재』(1979),『달넘세』(1985), 장시집『남한강』(1987)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 가령 민요나 무가의 창조적 수용을 통한 민중현실의 깊이있는 탐색으로 이어진다. 특히 『달 넘세』는 『농무』에 드러나는 시의 발상과 어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그 폭과 넓이가 한층 확대되고 심화된 인상을 전한다.
먼저 『달 넘세』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농무』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모습의 민중들이 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세세한 삶이 시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멀리 뻗어나간 갯벌에서 묵밭에는 산쑥
어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도깨비 엉겅퀴 칡넝쿨이 어우러졌다
부서진 배 뒤로 저녁놀이 발갛다 옛날처럼 우물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고
갈대밭 위로 가마귀가 난다 노간주나무 아래 앉으면
바람 또한 시원하다
오늘도 고향을 떠나는 집이 다섯
서류를 만들면서 여기 살던 화전민들은
늙은 대서사는 서글프다 객지땅 어느 변두리에 가
떠돌이가 되었을까
- 「폐항」부분
-「산중」 부분
산다는 일이 때로 고되고 괴로울 때는
떳떳하게 산다는 일이 여인네들을 생각한다
더욱 힘겨울 때 아직도 살아서 뛰는
광주리 속의 물고기 같은
장바닥 여인네들의 새벽 싸움질을
-「외로울 때」 부분
「폐항」에 등장하는 어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은 어민들의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버려지고 소외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생존기반에서 유리되는 불안을 ‘갈대밭’ 위의 ‘가마귀’로 암시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희망 없는 그들의 피폐화된 삶의 모습을 ‘부서진 배’와 해가 지는 석양의 ‘저녁놀’을 통해 드러낸다.
「산중」에는 화전민이 시적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자본의 힘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된 산촌을 떠나 객지에서 떠돌이가 되어버린 존재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은 엉겅퀴, 칡넝쿨이 엉클어진 폐허로 묘사된다.
「외로울 때」에 이르러서는 장바닥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새벽 싸움질’을 삶의 당위로 받아들이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농민들의 삶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던 『농무』와는 달리 『달 넘세』에 이르러 다양한 민중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세세한 삶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시인의 시각이 농촌 현실에서 사회 전반적인 현실로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라보는 시인의 현실의식이 한층 더 견고해진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달 넘세』는 780년대 폭압적 정치상황을 살아오면서 폭넓은 민중적 정서를 그려내는 동시에 정치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어 분단외세와 같은 민족적 문제로 시적 관심을 확대시켰다.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였다 곪았네 곪았네
골마루에서 벌도 같이 서고 뎅이만 슬슬 굴려라
깊드리에서 메뚜기도 함께 잡았다 지금은 가려낼 때
그러다가 우리는 싸웠구나 속인 자를 가려낼 때
할퀴고 꼬집고 깨물면서 지금은 뿌리칠 때
거짓 손길 뿌리칠
거멓게 빛깔이 변해가는 제 가냘픈 우리는 칸데라를 들고 나가
얼굴이 슬펐다. 지붕을 뒤져 참새를 잡는다.
무엇인가 들릴 듯도 하고 보일 듯도 한 것에 이 답답한 가슴에 구죽죽이
조용히 귀를 대이고 있었다. 겨울비가 내리는 당숙의 제삿날 밤.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 「묘비」(1956) 전문 그 당숙의 이름을 나는 모르고.
- 「제삿날 밤」(1973) 전문
1956년에 발표된「묘비」는 한 사람의 쓸쓸한 죽음을 나무비로 묘사하여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의 삶이나 죽음을 실감나게 상상할 만한 근거나 단서를 제공받지 못한다. 즉 그의 죽음은 시인의 내면세계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후 1973년에 발표된 「제삿날 밤」에서 “울분 속에서 짧은 젊음을 보낸” 것을 통해 당숙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개혁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젊어서 죽은 당숙인데도 마을에서 아저씨들이 오는 것을 보면, 죽을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는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일깨워주기도 한다.
『농무』에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25편, 밤을 배경으로 한 시들도 2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겨울이나 밤의 잦은 등장은 농촌민중들의 절망적인 삶을 드러내는 배경적 의미와 함께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기다림의 시간적 의미를 내포한다.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밤늦도록 우리는 지난 얘기만 한다
진눈깨비 치는 백리 산길 산골 여인숙은 돌광산이 가까운데
낮이면 주막 뒷방에 숨어 잠을 자다 마당에는 대낮처럼 달빛이 환해
지치면 아낙을 불러 육백을 친다 달빛에도 부끄러워 얼굴들을 돌리고
억울하고 어리석게 죽은 밤 깊도록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한다
빛바랜 주인의 사진 아래서 누가 속고 누가 속였는가 따지지 않는다
음탕한 농지거리로 아낙을 웃기면 산비탈엔 달빛 아래 산국화가 하얗고
바람은 뒷산 나뭇가지에 와 엉겨 비겁하게 사느라고 야윈 어깨로
굶어죽은 소년들의 원귀처럼 우는데 밤새도록 우리는 빈 얘기만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두 주먹뿐
수제빗국 한 사발로 배를 채울 때 - 「달빛」전문
아낙은 신세타령을 늘어놓고
우리는 미친놈처럼 자꾸 웃음이 나온다
- 「눈길」전문
겨울이 절망을 넘어서서 탄생부활재생기쁨희망으로 상징되는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면, 밤은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의 빛,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밤은 고통의 상징이며 암담한 상황의 배경이자 인간들의 화합과 친화 혹은 그리움 같은 서로의 애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민중들의 것이 된다. 즉『농무』의 계절이나 시간적 배경들이 민중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달 넘세』(1985) - 민요시
신경림이『농무』에서 보여준 ‘민중적 서정성’은 이후 『새재』(1979),『달넘세』(1985), 장시집『남한강』(1987)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 가령 민요나 무가의 창조적 수용을 통한 민중현실의 깊이있는 탐색으로 이어진다. 특히 『달 넘세』는 『농무』에 드러나는 시의 발상과 어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그 폭과 넓이가 한층 확대되고 심화된 인상을 전한다.
먼저 『달 넘세』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농무』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모습의 민중들이 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세세한 삶이 시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멀리 뻗어나간 갯벌에서 묵밭에는 산쑥
어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도깨비 엉겅퀴 칡넝쿨이 어우러졌다
부서진 배 뒤로 저녁놀이 발갛다 옛날처럼 우물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고
갈대밭 위로 가마귀가 난다 노간주나무 아래 앉으면
바람 또한 시원하다
오늘도 고향을 떠나는 집이 다섯
서류를 만들면서 여기 살던 화전민들은
늙은 대서사는 서글프다 객지땅 어느 변두리에 가
떠돌이가 되었을까
- 「폐항」부분
-「산중」 부분
산다는 일이 때로 고되고 괴로울 때는
떳떳하게 산다는 일이 여인네들을 생각한다
더욱 힘겨울 때 아직도 살아서 뛰는
광주리 속의 물고기 같은
장바닥 여인네들의 새벽 싸움질을
-「외로울 때」 부분
「폐항」에 등장하는 어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은 어민들의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버려지고 소외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생존기반에서 유리되는 불안을 ‘갈대밭’ 위의 ‘가마귀’로 암시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희망 없는 그들의 피폐화된 삶의 모습을 ‘부서진 배’와 해가 지는 석양의 ‘저녁놀’을 통해 드러낸다.
「산중」에는 화전민이 시적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자본의 힘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된 산촌을 떠나 객지에서 떠돌이가 되어버린 존재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은 엉겅퀴, 칡넝쿨이 엉클어진 폐허로 묘사된다.
「외로울 때」에 이르러서는 장바닥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새벽 싸움질’을 삶의 당위로 받아들이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농민들의 삶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던 『농무』와는 달리 『달 넘세』에 이르러 다양한 민중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세세한 삶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시인의 시각이 농촌 현실에서 사회 전반적인 현실로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라보는 시인의 현실의식이 한층 더 견고해진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달 넘세』는 780년대 폭압적 정치상황을 살아오면서 폭넓은 민중적 정서를 그려내는 동시에 정치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어 분단외세와 같은 민족적 문제로 시적 관심을 확대시켰다.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였다 곪았네 곪았네
골마루에서 벌도 같이 서고 뎅이만 슬슬 굴려라
깊드리에서 메뚜기도 함께 잡았다 지금은 가려낼 때
그러다가 우리는 싸웠구나 속인 자를 가려낼 때
할퀴고 꼬집고 깨물면서 지금은 뿌리칠 때
거짓 손길 뿌리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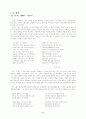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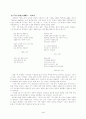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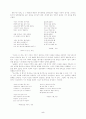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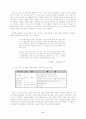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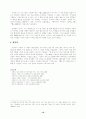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