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Ⅱ. 답사를 시작하며
1. 부석사의 역사
2. 부석사 찾아가는 길
3.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무량수전 (국보 제18호)
4.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국보 제 45호)
5.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 17호)
6.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 - 浮石과 선묘각, 선묘정 그리고 용정
7. 조사당(祖師堂, 국보 제19호)과 선비화
8.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와 부석사 고려각판(보물 제 735호)
Ⅲ. 답사를 마치며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Ⅱ. 답사를 시작하며
1. 부석사의 역사
2. 부석사 찾아가는 길
3.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무량수전 (국보 제18호)
4.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국보 제 45호)
5.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 17호)
6.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 - 浮石과 선묘각, 선묘정 그리고 용정
7. 조사당(祖師堂, 국보 제19호)과 선비화
8.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와 부석사 고려각판(보물 제 735호)
Ⅲ. 답사를 마치며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려건물이다. 이 연대를 기준으로 같은 부석사 내의 대표적인 가람으로써 무량수전의 중건시기를 15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삼는데 두 건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물론 건물의 격이나 규모, 시대적 차이를 제외하고도, 굳이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무량수전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조사당은 딱딱하다 이를 건축학적으로 살펴보자면, 무량수전의 팔작지붕은 처마의 유연한 곡선을 갖는데 비해 조사당의 맞배지붕은 직선적이다. 한편 건축양식에 있어서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이나 무량수전에 비해 기둥의 배흘림이 약해졌고 柱頭가 소로의 굽은 직선이며, 굽받침이 없는게 특색이라고 한다.
.
조사당 내부에는 원래 창건자인 의상 조사와 이 절에 주석하였던 역대 조사들의 영정을 모셨는데 최근에 조성했다는 석고 의상 조사상과 일대기를 그린 탱화가 안치되어 있었다. 원래 건물 내부에는 이전까지 4천 왕상 각 1면과 보살상 2면 등 6면으로 구성된 벽화, 바로 그 유명한 \'조사당벽화\'가 있었는데 국보 제46호로 제정된 이 벽화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건물 벽화로 지금은 오랜 보존을 위해 벽체를 해체하여 경내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보장각)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조사당을 둘러본 후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오던 길로 향하려 할 때 조사당 앞뜰에 있는 한 철망속에 푸르게 잎을 돋은 자그마한 나무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나무가 그 유명한선비화로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인데 대사가 천축으로 갈 때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내가 간 뒤 지팡이에서 가지와 잎이 날 것이다. 나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비나 이슬을 맞지 않고도 사시사철 늘 푸르니 그 영험함 과 이 나무의 잎을 따 삶은 물을 마시면 아들을 얻는다는 믿음이 생겨 뭇 사람들의 표적이 되므로 철창으로 보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굳이 철망 속에서 자라야 하는지...... 오죽이면 사람들의 등쌀이 못 견디어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만이 남을 뿐......
하지만 어지러운 속세 속에서의 이 의상대사의 마지막 흔적은 2중 철조망 속에서도 꿋꿋이 하얀 꽃까지 피어내며 조사당과 함께 의상대사의 마지막 발자취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8.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고려시대의 회화는 보존된 유적(遺蹟)이 매우 희귀해서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다. 부석사의 조사당벽화6면은 이 건물 내진 벽면에 그렸던 건축당초의 작품으로서 확인되었다. 조사당건물 창건연대는 이 건물을 중수할 때 발견한 묵서명문(墨書銘文) 에 따라서 서기 1377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벽화의 제작연대도 이로써 확인을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유존된 고려시대의 벽화는 이 조사당벽화를 비롯해서 예산수덕사대웅전벽화<1308년 건립(建立)>, 개성수락암동고분벽화, 장단법당방고분벽화(長湍法堂坊古墳壁畵), 개풍군공민왕릉벽화 등의 유례가 있으나 회화적인 격조로 보나 그 보존상태로 보나 유존이 고려시대의 벽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 조사당벽화(祖師堂壁畵)이다. 이 조사당벽화는 천왕상 각 1면과 보살상 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조사 당내진(祖師堂內陣) 원위치(原位置)의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살상(菩薩像)<불명미상(<佛名未詳)> (2) 다문천왕상(多聞天王像) (3) 황목천왕상(黃目天王像) (4) 증장천왕상(增長天王像) (5) 보살상(菩薩像)<불명미상(佛名未詳)>
와 부석사 고려각판(보물 제 735호) 이 각판은 부석사에 있는 정원본(貞元本)(40권), 진본 (晋本)(60권), 주본(周本) (80권) 등 3종의 한역본(漢譯本)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새긴 고려시대 목판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이란 크고 방정(方正)하고 넓은 뜻을 가진 법계를 증득(證得)하신 부처의 설법을 화려한 꽃으로 장엄한 것과 같은 경전이라는 것이다. 이 화엄경의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사상은 고대(古代) 한국문화(韓國文化)를 꽃 피우기 위한 기본 이념 으로 제시되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조사당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재 부석사 조사당 벽화와 부석사 고려각판이 보관되어 있는 보장각(부석사 내 전시관)을 찾아갔다.
조사당 벽화는 고려 우왕 3년(서기 1377년) 조사당 건축 당시 내벽에 그려 놓은 우리 나라 최고의 불화로서 사천왕상 4면과 보살상 2면으로 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 나라의 사원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벽화로 고려 회화사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부석사에 전하는 벽화 6점은 원래 조사당 벽면에 그려졌던 것이나, 일제 시대에 벽체에서 분리하여 무량수전에 보관하다가 현재는 보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사천왕들의 전반적인 인상은 매우 힘있는, 어느 사천왕 못지 않게 율동감이 넘치며 위엄이 엿보였다. 역시 우리 선현들의 불교미술이 출중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튼 고려시대의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우린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고려초기의 부석사의 화엄경판은 우리 나라 화엄종의 초조(初祖)인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화엄사상을 발전시켜 나간 부석사에 소장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화엄경판은 우리 나라에 유래가 없는 한 줄에 34자(字)씩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 희종(熙宗) 아들인 충명국사(沖明國師) 때(13세기)나 원응국사(圓應國師) 때(14세기) 새긴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 보장각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 까는 벽돌인 녹유전 <아미타경>을 보면 극락세계의 땅은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장엄한 극락세계의 수승을 표현한 것으로 부석사의 무량수전 역시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정토라는 생각 하에 그 내부를 청정하게 장엄하고자 무량수전 바닥을 녹유전으로 깔았다고 한다.
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녹유전은 표면에 0.3㎝ 정도의 유액을 발라서 녹색의 광택을 내뿜는데 세월의 유수함 앞에서도 아직까지 그 푸른 광택의 영롱함이 담겨 있어 매우 놀라웠다. 아무튼 이 녹유전을 통해 극락정토를 희원하는 신라인의 깊은 불심과 그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넉넉히 짐작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퇴계선생이 의상대사의 영정각(조사당)을 참배하고
.
조사당 내부에는 원래 창건자인 의상 조사와 이 절에 주석하였던 역대 조사들의 영정을 모셨는데 최근에 조성했다는 석고 의상 조사상과 일대기를 그린 탱화가 안치되어 있었다. 원래 건물 내부에는 이전까지 4천 왕상 각 1면과 보살상 2면 등 6면으로 구성된 벽화, 바로 그 유명한 \'조사당벽화\'가 있었는데 국보 제46호로 제정된 이 벽화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건물 벽화로 지금은 오랜 보존을 위해 벽체를 해체하여 경내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보장각)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조사당을 둘러본 후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오던 길로 향하려 할 때 조사당 앞뜰에 있는 한 철망속에 푸르게 잎을 돋은 자그마한 나무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나무가 그 유명한선비화로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인데 대사가 천축으로 갈 때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내가 간 뒤 지팡이에서 가지와 잎이 날 것이다. 나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비나 이슬을 맞지 않고도 사시사철 늘 푸르니 그 영험함 과 이 나무의 잎을 따 삶은 물을 마시면 아들을 얻는다는 믿음이 생겨 뭇 사람들의 표적이 되므로 철창으로 보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굳이 철망 속에서 자라야 하는지...... 오죽이면 사람들의 등쌀이 못 견디어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만이 남을 뿐......
하지만 어지러운 속세 속에서의 이 의상대사의 마지막 흔적은 2중 철조망 속에서도 꿋꿋이 하얀 꽃까지 피어내며 조사당과 함께 의상대사의 마지막 발자취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8.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고려시대의 회화는 보존된 유적(遺蹟)이 매우 희귀해서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다. 부석사의 조사당벽화6면은 이 건물 내진 벽면에 그렸던 건축당초의 작품으로서 확인되었다. 조사당건물 창건연대는 이 건물을 중수할 때 발견한 묵서명문(墨書銘文) 에 따라서 서기 1377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벽화의 제작연대도 이로써 확인을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유존된 고려시대의 벽화는 이 조사당벽화를 비롯해서 예산수덕사대웅전벽화<1308년 건립(建立)>, 개성수락암동고분벽화, 장단법당방고분벽화(長湍法堂坊古墳壁畵), 개풍군공민왕릉벽화 등의 유례가 있으나 회화적인 격조로 보나 그 보존상태로 보나 유존이 고려시대의 벽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 조사당벽화(祖師堂壁畵)이다. 이 조사당벽화는 천왕상 각 1면과 보살상 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조사 당내진(祖師堂內陣) 원위치(原位置)의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살상(菩薩像)<불명미상(<佛名未詳)> (2) 다문천왕상(多聞天王像) (3) 황목천왕상(黃目天王像) (4) 증장천왕상(增長天王像) (5) 보살상(菩薩像)<불명미상(佛名未詳)>
와 부석사 고려각판(보물 제 735호) 이 각판은 부석사에 있는 정원본(貞元本)(40권), 진본 (晋本)(60권), 주본(周本) (80권) 등 3종의 한역본(漢譯本)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새긴 고려시대 목판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이란 크고 방정(方正)하고 넓은 뜻을 가진 법계를 증득(證得)하신 부처의 설법을 화려한 꽃으로 장엄한 것과 같은 경전이라는 것이다. 이 화엄경의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사상은 고대(古代) 한국문화(韓國文化)를 꽃 피우기 위한 기본 이념 으로 제시되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조사당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재 부석사 조사당 벽화와 부석사 고려각판이 보관되어 있는 보장각(부석사 내 전시관)을 찾아갔다.
조사당 벽화는 고려 우왕 3년(서기 1377년) 조사당 건축 당시 내벽에 그려 놓은 우리 나라 최고의 불화로서 사천왕상 4면과 보살상 2면으로 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 나라의 사원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벽화로 고려 회화사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부석사에 전하는 벽화 6점은 원래 조사당 벽면에 그려졌던 것이나, 일제 시대에 벽체에서 분리하여 무량수전에 보관하다가 현재는 보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사천왕들의 전반적인 인상은 매우 힘있는, 어느 사천왕 못지 않게 율동감이 넘치며 위엄이 엿보였다. 역시 우리 선현들의 불교미술이 출중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튼 고려시대의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우린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고려초기의 부석사의 화엄경판은 우리 나라 화엄종의 초조(初祖)인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화엄사상을 발전시켜 나간 부석사에 소장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화엄경판은 우리 나라에 유래가 없는 한 줄에 34자(字)씩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 희종(熙宗) 아들인 충명국사(沖明國師) 때(13세기)나 원응국사(圓應國師) 때(14세기) 새긴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 보장각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 까는 벽돌인 녹유전 <아미타경>을 보면 극락세계의 땅은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장엄한 극락세계의 수승을 표현한 것으로 부석사의 무량수전 역시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정토라는 생각 하에 그 내부를 청정하게 장엄하고자 무량수전 바닥을 녹유전으로 깔았다고 한다.
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녹유전은 표면에 0.3㎝ 정도의 유액을 발라서 녹색의 광택을 내뿜는데 세월의 유수함 앞에서도 아직까지 그 푸른 광택의 영롱함이 담겨 있어 매우 놀라웠다. 아무튼 이 녹유전을 통해 극락정토를 희원하는 신라인의 깊은 불심과 그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넉넉히 짐작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퇴계선생이 의상대사의 영정각(조사당)을 참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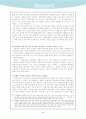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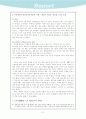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