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 次≫
Ⅰ. 서 론
Ⅱ. 본 론
1.바움가르텐의 미학과 판단력비판
2. 칸트의 판단력 비판
(1)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1)직관대상의 합목적성 형식의 표상
2)주관의 합목적성 쾌의 표상
(2)자연미와 예술미
1)형식으로서의 자연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Ⅱ. 본 론
1.바움가르텐의 미학과 판단력비판
2. 칸트의 판단력 비판
(1)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1)직관대상의 합목적성 형식의 표상
2)주관의 합목적성 쾌의 표상
(2)자연미와 예술미
1)형식으로서의 자연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를 설명 하고자했다. George Dickie, a. a. a. 번역판 S. 47
칸트 역시 미의 경험의 자극제로서 형식적 관계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 관계는 어떤 규정적인 객관의 규칙이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합목적적 관계이다. 미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은 주관이 합목적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합목적적 형식이다.
합목적적 형식은 취미론에 있어서 설정된 문제, 곧 “세계의 어떠한 특징이 미적 쾌를 환기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칸트의 답변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 판단의 대상은 무엇인가?
명백한 대답은 미적 판단의 대상이란 아름다운 대상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주-객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려고 한다.
①미적 쾌는 대상의 형식적 성질에 근거한다.
②그러나 쾌는 동시에 단지 그 성질들은 합목적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근거하며, 따라서, 미적 대상의 주관적 근거가 주장된다. 즉 주관에 표현된 대상에 관한 사실로서의 대상의 합목적적 형식에 기초하여서 미를 경험하는 주관에 관한 사실로서는 쾌는 ‘어떤 대상이 아름다다.’라고 하는 미적 판단에 의해 진술된다. 미적 판단은 비록 근본적으로 그 특성이 객관적 대상과의 관 계속에서 주관의 특성을 나타낼 뿐이지만 대상에 관한 속성을 진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미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며 KU,S. 77<칸트의 선험철학에서 구상력 개념>이용기-재인용
합목적성의 한갓 형식이 취미판단의 규정근거이다. KU,S. 60<칸트의 선험철학에서 구상력 개념>이용기-재인용
미가 합목적성의 형식이라고 함은 한편으로 어떤 실제적 의지가 선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규정된 목적의 표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직관의 대상이 형식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형식은 ①표상의 경험적 요소로서의 감각들의 다양에 대립적이며 ②대상의 개념적 규정성과 대립적이다. 만일 우리가 표상 또는 형식을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형식은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다. Menz3r는 칸트 미학이 대상의 형식과 주관의 형식화하하는 힘, 미적 판단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Paul ?Men-ZER-ZER,Kants Askthik in Ihrer Entwickling,s.139
표상 또는, 형식은 언제나 대상에 관한 표상이며 형식이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들에 합목적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상에 합목적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적 대상의 형식은 결코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객관적 성질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목적적으로 직관하는 주관성에 있어서 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미적 판단은 우리의 직관에 주어지는 대상에 관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관계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진술한다. 미적 대상성의 객관적 요소로서의 대상의 형식은 인시그이 경우에 있어서처럼 세계의 객관적 지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의 감정에 있어서 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다른 철학자들이 경우에 있어서 열거된 그 객관적 특징은 경험하는 주관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세계의 한 측면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칸트의 철학적 입장 전반에 따르면 형식은 주관의 마음의 소산이 되고 있다.
2)주관의 합목적성 쾌의 표상
취미판단의 주관성의 이 판단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진술되는 대상의 표상이 주관의 감정에 근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주관성이다. 여기서 취미판단의 주관성의 의미가 명백해져야 한다면, 이 판단에서 술어로서 진술되는 쾌의 감정의 의미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쾌.불쾌의 감정은 한갓 주관적인 것이며 결코 대상의 객관적 성질을 표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의 상태에 관한 의식으로서의 이 감정은 또한 이 상태에 대한 대상의표상의 관계의 의식으로 생각된다.
쾌의 감정은 주관의 미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상태에 대한 대상의 미적 표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대상의 표상에 대한 주관의 자기 자신의 느낌은 동시에 표상에 의한 주관의 촉발됨의 의식이어야 한다. Konrad Marc- Wogau,a.a.o.s.297.
이와 같은 주관의 상태에 대한 미적 대상의 관계는 하복적성의 관계이다. 미적 대상이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그 표상이 구상력과 오성의 조화로운 유희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미 판단의 합목적성은 언제나 미적 대상과 주관의 미적 상태의 관계의 의식이다.
미적 대상의 경험에 있어서의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인 쾌의 감정은 단지 내적으로 즐거운 상태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①구관에 의하여 호의를 입은 대상이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이다.
②미의 판정에 있어서 인식력들의 조화로운 유희가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이다.
미의 판단은 대상에 대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자연대상 또는, 예술대상에 대한 주관의 내적 상태에 의하여 내려지는 간접적 판단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의 과제를 실현하지 않는 구상력과 오성의 조화로운 유희의 동기로 간주될 수 있다.
오성의 범주에 의하여 규정되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인식의 대상은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 속에서 미적 대상으로 나타나나다.
미적 주관은 호의의 상태에서 미적 대상에 대하여 우리를 개방한다.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KU, S.210
따라서, 미적 판단력은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다. 그것은 대상을 개념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며, 그 대상을 수용하는 우리의 방식을 미적으로 판단한다. 이 ‘방식’이 선험적 분석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미는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사물의 객관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주관의 특별한 개방성의 관계속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물에 대한 미적 경험은 대상의 지적 과정을 수용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의 미의 경험을 의미한다. 미적 대상성은 미적 주관성의 의미를 통하여 명백히 해명될 수 있다.
칸트는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에 부가하여 미적 태도를 주관의 고유한 태도로 근거지우려고 한다. 미적 판단의 형식에 있어서 ‘관심 없는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미적 태도는 또한 ‘한갖 관상’또는 ‘한
칸트 역시 미의 경험의 자극제로서 형식적 관계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 관계는 어떤 규정적인 객관의 규칙이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합목적적 관계이다. 미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은 주관이 합목적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합목적적 형식이다.
합목적적 형식은 취미론에 있어서 설정된 문제, 곧 “세계의 어떠한 특징이 미적 쾌를 환기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칸트의 답변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 판단의 대상은 무엇인가?
명백한 대답은 미적 판단의 대상이란 아름다운 대상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주-객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려고 한다.
①미적 쾌는 대상의 형식적 성질에 근거한다.
②그러나 쾌는 동시에 단지 그 성질들은 합목적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근거하며, 따라서, 미적 대상의 주관적 근거가 주장된다. 즉 주관에 표현된 대상에 관한 사실로서의 대상의 합목적적 형식에 기초하여서 미를 경험하는 주관에 관한 사실로서는 쾌는 ‘어떤 대상이 아름다다.’라고 하는 미적 판단에 의해 진술된다. 미적 판단은 비록 근본적으로 그 특성이 객관적 대상과의 관 계속에서 주관의 특성을 나타낼 뿐이지만 대상에 관한 속성을 진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미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며 KU,S. 77<칸트의 선험철학에서 구상력 개념>이용기-재인용
합목적성의 한갓 형식이 취미판단의 규정근거이다. KU,S. 60<칸트의 선험철학에서 구상력 개념>이용기-재인용
미가 합목적성의 형식이라고 함은 한편으로 어떤 실제적 의지가 선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규정된 목적의 표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직관의 대상이 형식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형식은 ①표상의 경험적 요소로서의 감각들의 다양에 대립적이며 ②대상의 개념적 규정성과 대립적이다. 만일 우리가 표상 또는 형식을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형식은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다. Menz3r는 칸트 미학이 대상의 형식과 주관의 형식화하하는 힘, 미적 판단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Paul ?Men-ZER-ZER,Kants Askthik in Ihrer Entwickling,s.139
표상 또는, 형식은 언제나 대상에 관한 표상이며 형식이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들에 합목적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상에 합목적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적 대상의 형식은 결코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객관적 성질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목적적으로 직관하는 주관성에 있어서 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미적 판단은 우리의 직관에 주어지는 대상에 관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관계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진술한다. 미적 대상성의 객관적 요소로서의 대상의 형식은 인시그이 경우에 있어서처럼 세계의 객관적 지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의 감정에 있어서 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다른 철학자들이 경우에 있어서 열거된 그 객관적 특징은 경험하는 주관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세계의 한 측면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칸트의 철학적 입장 전반에 따르면 형식은 주관의 마음의 소산이 되고 있다.
2)주관의 합목적성 쾌의 표상
취미판단의 주관성의 이 판단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진술되는 대상의 표상이 주관의 감정에 근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주관성이다. 여기서 취미판단의 주관성의 의미가 명백해져야 한다면, 이 판단에서 술어로서 진술되는 쾌의 감정의 의미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쾌.불쾌의 감정은 한갓 주관적인 것이며 결코 대상의 객관적 성질을 표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의 상태에 관한 의식으로서의 이 감정은 또한 이 상태에 대한 대상의표상의 관계의 의식으로 생각된다.
쾌의 감정은 주관의 미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상태에 대한 대상의 미적 표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대상의 표상에 대한 주관의 자기 자신의 느낌은 동시에 표상에 의한 주관의 촉발됨의 의식이어야 한다. Konrad Marc- Wogau,a.a.o.s.297.
이와 같은 주관의 상태에 대한 미적 대상의 관계는 하복적성의 관계이다. 미적 대상이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그 표상이 구상력과 오성의 조화로운 유희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미 판단의 합목적성은 언제나 미적 대상과 주관의 미적 상태의 관계의 의식이다.
미적 대상의 경험에 있어서의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인 쾌의 감정은 단지 내적으로 즐거운 상태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①구관에 의하여 호의를 입은 대상이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이다.
②미의 판정에 있어서 인식력들의 조화로운 유희가 주관적으로 합목적적이다.
미의 판단은 대상에 대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자연대상 또는, 예술대상에 대한 주관의 내적 상태에 의하여 내려지는 간접적 판단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의 과제를 실현하지 않는 구상력과 오성의 조화로운 유희의 동기로 간주될 수 있다.
오성의 범주에 의하여 규정되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인식의 대상은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 속에서 미적 대상으로 나타나나다.
미적 주관은 호의의 상태에서 미적 대상에 대하여 우리를 개방한다.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KU, S.210
따라서, 미적 판단력은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다. 그것은 대상을 개념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며, 그 대상을 수용하는 우리의 방식을 미적으로 판단한다. 이 ‘방식’이 선험적 분석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미는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사물의 객관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주관의 특별한 개방성의 관계속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물에 대한 미적 경험은 대상의 지적 과정을 수용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의 미의 경험을 의미한다. 미적 대상성은 미적 주관성의 의미를 통하여 명백히 해명될 수 있다.
칸트는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에 부가하여 미적 태도를 주관의 고유한 태도로 근거지우려고 한다. 미적 판단의 형식에 있어서 ‘관심 없는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미적 태도는 또한 ‘한갖 관상’또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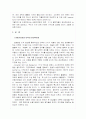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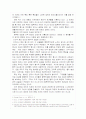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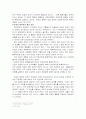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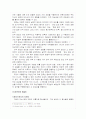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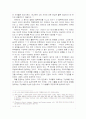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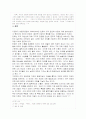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