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아시아의 개념과 지역적 특징
Ⅲ. 전통복식의 형식 분류
Ⅳ. 동북아시아의 전통복식
1. 한국
1) 지형 및 기후적 특성
2) 한국 복식의 역사
3) 전통 복식의 종류 및 특징
2. 중국
1) 역사 및 문화적 배경
2) 복식문화와 문양의 상징성
3) 전통복식의 종류 및 특징
3. 일본
1) 지형과 기후적 특성
2) 역사와 문화적 특성
3) 전통복식의 종류 및 특징
Ⅴ. 결론
Ⅵ. 참고자료
Ⅱ. 아시아의 개념과 지역적 특징
Ⅲ. 전통복식의 형식 분류
Ⅳ. 동북아시아의 전통복식
1. 한국
1) 지형 및 기후적 특성
2) 한국 복식의 역사
3) 전통 복식의 종류 및 특징
2. 중국
1) 역사 및 문화적 배경
2) 복식문화와 문양의 상징성
3) 전통복식의 종류 및 특징
3. 일본
1) 지형과 기후적 특성
2) 역사와 문화적 특성
3) 전통복식의 종류 및 특징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옆선이 트여있어 앞길 양 겨드랑이에 긴 끈을 달아 앞으로 매어 여민다.
㉣ 조끼
갑오경장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양복의 도입으로 인해 배자 대신 입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ㄷ. 비록 양복의 영향을 받은것이나 우리 고유의 옷과 조화가 잘 되게 변화된 것으로 오늘날 남자 한복의 기본적인 차림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마고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마괘자라고도 한다. 일명 덧저고리라고도 불리며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다.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나 깃과 동정이 없으며 앞을 여미지 않고 두 자락을 맞대기만 하는데, 오른쪽 자락에는 단추를 달고 왼쪽 자락에는 고리를 달아 끼운다. 단추 대신 양쪽에 끈을 달아 잡아매기도 한다. 단추는 천도 모양이 많으며 밀화, 호박, 금, 은등으로 만들어서 멋을 낸다.
㉥ 두루마기
두룰마기는 양복에 있어서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양복의 외투와 달리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입는다. 종류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두루마기, 겹두루마기, 누비두루마기, 솜두루마기 등이 있다.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저고리, 바지 차림으로만 외출하는것은 격식에 어긋난다.
㉦ 버선, 대님
버선은 흰색의 무명이나 광목 등으로 만들어 발에 꿰어 신었으며 모양은 버선코가 뾰족하여 위로 치켜졌고, 버선목에 비해 발목이 조금 좁게 되어있다. 버선을 신을 때는 시접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신는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버선, 겹버선, 솜버선, 누비버선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어린이용 타래버선이 있다.
대님은 남자의 한복 바짓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묶는 끈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복사뼈를 향하여 두번 감아 매준다.
㉧ 고의, 적삼
적삼은 주로 여름용 간이복으로 서민계급의 상의였다. 조끼처럼 호주머니를 덧붙인 편리한 옷으로 일반적으로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통용되었다. 고의는 적삼과 함께 입었던 홑겹으로 만든 여름용 바지로 일할 때 편하도록 만들어진 하의이다. 속고의는 내의에 속하는 것으로 팬티가 일반화 되면서 사라졌다.
② 의례복
㉠ 혼례복
전통혼례식에서 신랑이 입는 혼례복을 사모관대라 부르며 이것은 사모, 단령, 흉배, 각대, 목화로 구성되는 관복의 일종인 상복 차림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혼례시에 한해 신랑에게 이러한 사모관대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서구적인 혼례식이 일반적인 오늘날에도 폐백을 드릴때는 전통적인 혼례복인 사모관대 차림을 한다.
사모
앞은 낮고 뒤가 높게 턱이 지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예복용 모자이다. 뒤 중심에서 양 옆으로 날개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상복에 착용하던 관모이나 혼례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착용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오늘날까지 신랑이 예모로 착용한다.
단령
한복 고유의복 형태가 직선형태의 곧은 깃인것에 반해 깃의 모양이 둥근것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기록에 의하면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받아온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문무백관의 대표적인 관복이었다. 혼례에 사용된 것은 상복의 단령으로 가슴에는 흉배를 단다.
목화
원래 조선시대에 문무백관이 평상복에 신던 목이 긴 신발로, 겉은 흑색 우단으로 만들며 안은 흰색의 융을 대고 밑창은 가죽으로 만든다. 솔기에는 붉은색 선을 두른다.
㉡ 상례복
상례는 관혼상제의 의례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상례복은 상중에 있는 상
제나 복인이 입는 상복과 죽은자에게 입히는 수의로 구성된다.
수의
조선시대에는 집안어른이 환갑, 진갑을 지나 연로해지면 윤달이 든 해에 집안식구들끼리 모여 미리 수의를 지어두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윤달에 수의를 지어두면 오래산다는 옛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수의를 지을때는 바느질 도중에 실을 잇거나 그 끝을 옭아 매듭지지 않는데, 이는 죽은사람이 저승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래에는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간소화되면서 수의의 내용도 많이 간단해졌으나 아직까지도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다. 남자의 수의는 속적삼, 속고의,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도포, 행전 등으로 구성되고, 여성의 수의는 속적삼, 저고리, 속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원삼, 민족두리 등으로 구성된다. 수의용 천은 주로 삼베를 사용하나 지방이나 가풍에 따라 비단이나 명주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합성섬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유물에서는 무명을 사용한 수의도 발견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시신이 썩을 때 까맣게 된다고 하여 무명을 꺼린다.
상복
상중에 있는 상제나 친지들이 입는 옷으로 조선시대의 남자 상복은 굴건제복이라고 하여 굴건, 두건, 최의, 최상, 수질, 요질, 교대, 행전, 상장, 짚신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죽은 사람과 상복을 입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입는 기간과 사용하는 옷감의 거칠기를 달리하였으며 만듦새도 조금씩 달리하여 입었다. 이것을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의 오복의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남자의 경우는 흰색 도포나 두루마기에 굴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 흰색 치마저고리에 수질과 요질만을 두르는 정도로 간소화되었다. 때로는 더 간략하게 남자는 검은색 양복에 베로 만든 두건과 행전을 착용하고, 가슴에 나비모양의 상장을 달며, 여자는 흰색 저고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흰색 리본을 단다. 집안에 따라서는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기도 한다.
③ 제례복
제향을 드릴 때 입는 옷차림으로 조선시대에는 도포에 흑립이나 유건을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의 제복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었으나 옥색 한복을 많이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여자복식
① 일상복
㉠ 저고리
여자 저고리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저고리, 겹저고리, 박이겹저고리 등이 있으며 여름용으로는 적삼, 깨끼저고리, 겨울용에는 솜저고리, 누비저고리 등이 있다. 모양에 따라 민저고리, 삼회장저고리, 반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남자 저고리는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어 저고리가 속옷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는 저고리 차림 그대로가 겉옷이될 수가 있어서 남자 저고리 보다 색상과 직물의 사용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조끼
갑오경장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양복의 도입으로 인해 배자 대신 입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ㄷ. 비록 양복의 영향을 받은것이나 우리 고유의 옷과 조화가 잘 되게 변화된 것으로 오늘날 남자 한복의 기본적인 차림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마고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마괘자라고도 한다. 일명 덧저고리라고도 불리며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다.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나 깃과 동정이 없으며 앞을 여미지 않고 두 자락을 맞대기만 하는데, 오른쪽 자락에는 단추를 달고 왼쪽 자락에는 고리를 달아 끼운다. 단추 대신 양쪽에 끈을 달아 잡아매기도 한다. 단추는 천도 모양이 많으며 밀화, 호박, 금, 은등으로 만들어서 멋을 낸다.
㉥ 두루마기
두룰마기는 양복에 있어서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양복의 외투와 달리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입는다. 종류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두루마기, 겹두루마기, 누비두루마기, 솜두루마기 등이 있다.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저고리, 바지 차림으로만 외출하는것은 격식에 어긋난다.
㉦ 버선, 대님
버선은 흰색의 무명이나 광목 등으로 만들어 발에 꿰어 신었으며 모양은 버선코가 뾰족하여 위로 치켜졌고, 버선목에 비해 발목이 조금 좁게 되어있다. 버선을 신을 때는 시접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신는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버선, 겹버선, 솜버선, 누비버선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어린이용 타래버선이 있다.
대님은 남자의 한복 바짓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묶는 끈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복사뼈를 향하여 두번 감아 매준다.
㉧ 고의, 적삼
적삼은 주로 여름용 간이복으로 서민계급의 상의였다. 조끼처럼 호주머니를 덧붙인 편리한 옷으로 일반적으로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통용되었다. 고의는 적삼과 함께 입었던 홑겹으로 만든 여름용 바지로 일할 때 편하도록 만들어진 하의이다. 속고의는 내의에 속하는 것으로 팬티가 일반화 되면서 사라졌다.
② 의례복
㉠ 혼례복
전통혼례식에서 신랑이 입는 혼례복을 사모관대라 부르며 이것은 사모, 단령, 흉배, 각대, 목화로 구성되는 관복의 일종인 상복 차림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혼례시에 한해 신랑에게 이러한 사모관대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서구적인 혼례식이 일반적인 오늘날에도 폐백을 드릴때는 전통적인 혼례복인 사모관대 차림을 한다.
사모
앞은 낮고 뒤가 높게 턱이 지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예복용 모자이다. 뒤 중심에서 양 옆으로 날개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상복에 착용하던 관모이나 혼례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착용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오늘날까지 신랑이 예모로 착용한다.
단령
한복 고유의복 형태가 직선형태의 곧은 깃인것에 반해 깃의 모양이 둥근것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기록에 의하면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받아온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문무백관의 대표적인 관복이었다. 혼례에 사용된 것은 상복의 단령으로 가슴에는 흉배를 단다.
목화
원래 조선시대에 문무백관이 평상복에 신던 목이 긴 신발로, 겉은 흑색 우단으로 만들며 안은 흰색의 융을 대고 밑창은 가죽으로 만든다. 솔기에는 붉은색 선을 두른다.
㉡ 상례복
상례는 관혼상제의 의례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상례복은 상중에 있는 상
제나 복인이 입는 상복과 죽은자에게 입히는 수의로 구성된다.
수의
조선시대에는 집안어른이 환갑, 진갑을 지나 연로해지면 윤달이 든 해에 집안식구들끼리 모여 미리 수의를 지어두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윤달에 수의를 지어두면 오래산다는 옛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수의를 지을때는 바느질 도중에 실을 잇거나 그 끝을 옭아 매듭지지 않는데, 이는 죽은사람이 저승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래에는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간소화되면서 수의의 내용도 많이 간단해졌으나 아직까지도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다. 남자의 수의는 속적삼, 속고의,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도포, 행전 등으로 구성되고, 여성의 수의는 속적삼, 저고리, 속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원삼, 민족두리 등으로 구성된다. 수의용 천은 주로 삼베를 사용하나 지방이나 가풍에 따라 비단이나 명주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합성섬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유물에서는 무명을 사용한 수의도 발견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시신이 썩을 때 까맣게 된다고 하여 무명을 꺼린다.
상복
상중에 있는 상제나 친지들이 입는 옷으로 조선시대의 남자 상복은 굴건제복이라고 하여 굴건, 두건, 최의, 최상, 수질, 요질, 교대, 행전, 상장, 짚신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죽은 사람과 상복을 입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입는 기간과 사용하는 옷감의 거칠기를 달리하였으며 만듦새도 조금씩 달리하여 입었다. 이것을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의 오복의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남자의 경우는 흰색 도포나 두루마기에 굴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 흰색 치마저고리에 수질과 요질만을 두르는 정도로 간소화되었다. 때로는 더 간략하게 남자는 검은색 양복에 베로 만든 두건과 행전을 착용하고, 가슴에 나비모양의 상장을 달며, 여자는 흰색 저고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흰색 리본을 단다. 집안에 따라서는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기도 한다.
③ 제례복
제향을 드릴 때 입는 옷차림으로 조선시대에는 도포에 흑립이나 유건을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의 제복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었으나 옥색 한복을 많이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여자복식
① 일상복
㉠ 저고리
여자 저고리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홑저고리, 겹저고리, 박이겹저고리 등이 있으며 여름용으로는 적삼, 깨끼저고리, 겨울용에는 솜저고리, 누비저고리 등이 있다. 모양에 따라 민저고리, 삼회장저고리, 반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남자 저고리는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어 저고리가 속옷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는 저고리 차림 그대로가 겉옷이될 수가 있어서 남자 저고리 보다 색상과 직물의 사용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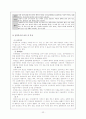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