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작품 검토
2. 사회 문화적 대변동
1) 사회변동의 원동력-화폐경제 발전
2)봉건사회의 동요
①부민층(富民層)의 증가와 신분 변동
②현실 중시 사고와 자아의식의 성장
3)서민문화의 성립
①산수화의 성격변화― 유산풍속(遊山風俗)
②향락적 유흥문화
③ 대중문예 확산― 판소리 ․ 방각본(坊刻本) 소설 ․ 탈춤
Ⅱ.맺는 말
1. 작품 검토
2. 사회 문화적 대변동
1) 사회변동의 원동력-화폐경제 발전
2)봉건사회의 동요
①부민층(富民層)의 증가와 신분 변동
②현실 중시 사고와 자아의식의 성장
3)서민문화의 성립
①산수화의 성격변화― 유산풍속(遊山風俗)
②향락적 유흥문화
③ 대중문예 확산― 판소리 ․ 방각본(坊刻本) 소설 ․ 탈춤
Ⅱ.맺는 말
본문내용
통계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통해 상공업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하나 는 지속적인 곡황(물가상승)이고 다른 하나 는 전황(화폐품귀)의 재현과 심화였다. 이렇 듯 조선후기 금속화폐 유통으로 서울은 도 시가 상공업화하여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 이 없을 정도로 화폐경제가 모든 경제활동 을 지배하는 상황이었다.
금전추구 풍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적 폐단을 유발하여 서울 저자에서 사기 와 날 치기가 횡행하고 가짜 동전이 유포되면서 유통 도 12 김홍도 <답상출시도> 질서가 혼란에 빠진 사례도 당시 문헌에 지적되고 있다. 당시 풍속화에는 화가들 모두 다 동전을 얻기 위한 상업적 생활에 젖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김홍도의 <답상출시도(踏霜出市圖)>(도12)는 이른 새벽에 시장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한편 김득신의 <귀시도(歸市圖)>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등짐을 지거나 어깨에 메고 혹은 머리에 이고 귀가하는 상업적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2)봉건사회의 동요
①부민층(富民層)의 증가와 신분 변동
봉건사회에 있어서 상품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문제 자체의 변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래 농업을 대본(大本)으로 하는 봉건적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후기 사회 모든 방면의 변동을 촉진시키는 대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부유 도매상인 부상대고(富商大賈) 등이 토지를 광점(廣占)하여 지주가 되고, 또한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층의 경제력이 위축되는 반면 부상대고 등 서민층에의 재부축적(財富蓄積)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08.
화폐경제는 신분간의 상하이동을 격심하게 만든 동인이 된다. 화폐경제의 발전이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토지는 사회신분 질서와 관계되어 나타나는 재부 상환의 잣대인 것이다. 신흥 부유층은 또한 관직의 상품화는 물론, 나아가서 신분계급 그 자체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봉건사회의 신분제도 내지 관료제도의 해체가 촉진되었다. 토지의 상품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층의 경제력은 약화되어 그들의 신분계급은 사실상 하강되는 반면, 富商大賈나 서민지주의 경제력은 반대로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신분계급은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인한 반작용은, 도적의 횡행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궁핍화 내지 농촌사회의 분화를 수반하여 지방관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것이 조선후기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단으로 지적된 삼정문란(三政紊亂)이나, 반사회적 반체제적 성격을 띠고 전국 각 지방으로 파급된 농민반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17.
이 당시 서민 부유층 대부분이 지향한 공통적인 특색은 역시 신분상승이었다. 그 결과 전통 양반들은 그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비양반 신분들도 족보를 위조 또는 매수하여 양반을 모칭(冒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명목상의 양반은 격증하게 되고 양반 가운데에도 위로는 대가(大家)명가(名家)등 문벌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으로 향반(鄕班)잔반(殘班)등 많은 층이 생기게 되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118. 신분상승의 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실상 열려있었다. 전후 복구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흉년재해 등으로 인한 진휼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가 정책적으로 納粟策을 실시하거나 空名帖을 발행하여 신분상승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다른 신분에의 모속(募屬)현상은 영 정조대 이후에 더욱 심해져 갔다. 호적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초적의 개변이나 재력 있는 농민들이 이른바 환부역조(換父易祖)의 방법으로 몰락 양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방법 등이 가능해져 재력 있는 서민층들의 상당수가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신분변동 시기에서는 족보제작의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연정선상에서 <담와(淡窩)> 홍계희(洪啓禧) 평생도>(중앙박물관 소장)나 <慕堂 洪履祥 평생도>(1781년, 중앙박물관소장) 등 관직생활의 기록화인 평생도가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는 풍조가 일고 있었다.
②현실 중시 사고와 자아의식의 성장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재부관(財富觀) 내지 경제관의 변화 속에서 명분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이 영리타산과 실리를 중요시하는 사고로 변질되고 있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20.
사실, 영리에서 실익을 따지는 것만큼 현실적 사고로 끌어내리는 것은 없다. 이해 타산적 의식보다 더한 현실적 사고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 의식이란 종전에 체념화한 나를 의식의 중심에 세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항인은 조선후기 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하여 사회 전면에 뚜렷이 부각된 집단이다. 심경호, 앞의 책, p. 143. 17-8세기 들어서면 훈련도감의 將校, 혜민서의 訓導, 호조의 算員, 武藝別監, 胥吏 등 중간계층이 물의를 일으킬 정도였다. 조선후기에 사회적으로 뚜렷이 부각된 집단.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있어서 여향인은 근대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잠재적 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여항문학은 18세기 이후 봉건사회 해체기에 돌출된 문화사적 현상이다. 강명관, 「閭巷 閭巷人 閭巷文學」, 『한국한문학연구』 제 17집, 1994.
그들은 사대부와 평민 천민의 중간에 위치한 신분으로 피지배계급이기는 하지만, 기술관 내지 하급관직의 종사자들로서 양반도 사이도 아닌 중간층에 속한다.
이들 여항인들에게는 강한 상호 유대감과 울분의 토로가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 ‘오당(吾黨)’, ‘아배(我輩)’라 스스로를 칭하며, 교유를 통하여 신분적 고착에서 오는 속박감을 풀면서 그들 특유의 동류의식과 공동문화 속에서 자아를 해방시켰다. 千柄植, 『朝鮮後期委巷詩社硏究』(국학자료원, 1991), pp 63-64.
당시 중인문학을 주도했던 송석원시사연도의 1791년 6월15일 밤 광경을 그린 것인데, 그 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신분적 소외감의 해소 책으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천금으로도 난정(蘭亭)의모임과 바꿀 수 없다”는 시사(詩社)를 통하여 시를
금전추구 풍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적 폐단을 유발하여 서울 저자에서 사기 와 날 치기가 횡행하고 가짜 동전이 유포되면서 유통 도 12 김홍도 <답상출시도> 질서가 혼란에 빠진 사례도 당시 문헌에 지적되고 있다. 당시 풍속화에는 화가들 모두 다 동전을 얻기 위한 상업적 생활에 젖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김홍도의 <답상출시도(踏霜出市圖)>(도12)는 이른 새벽에 시장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한편 김득신의 <귀시도(歸市圖)>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등짐을 지거나 어깨에 메고 혹은 머리에 이고 귀가하는 상업적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2)봉건사회의 동요
①부민층(富民層)의 증가와 신분 변동
봉건사회에 있어서 상품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문제 자체의 변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래 농업을 대본(大本)으로 하는 봉건적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후기 사회 모든 방면의 변동을 촉진시키는 대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부유 도매상인 부상대고(富商大賈) 등이 토지를 광점(廣占)하여 지주가 되고, 또한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층의 경제력이 위축되는 반면 부상대고 등 서민층에의 재부축적(財富蓄積)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08.
화폐경제는 신분간의 상하이동을 격심하게 만든 동인이 된다. 화폐경제의 발전이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토지는 사회신분 질서와 관계되어 나타나는 재부 상환의 잣대인 것이다. 신흥 부유층은 또한 관직의 상품화는 물론, 나아가서 신분계급 그 자체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봉건사회의 신분제도 내지 관료제도의 해체가 촉진되었다. 토지의 상품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층의 경제력은 약화되어 그들의 신분계급은 사실상 하강되는 반면, 富商大賈나 서민지주의 경제력은 반대로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신분계급은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인한 반작용은, 도적의 횡행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궁핍화 내지 농촌사회의 분화를 수반하여 지방관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것이 조선후기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단으로 지적된 삼정문란(三政紊亂)이나, 반사회적 반체제적 성격을 띠고 전국 각 지방으로 파급된 농민반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17.
이 당시 서민 부유층 대부분이 지향한 공통적인 특색은 역시 신분상승이었다. 그 결과 전통 양반들은 그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비양반 신분들도 족보를 위조 또는 매수하여 양반을 모칭(冒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명목상의 양반은 격증하게 되고 양반 가운데에도 위로는 대가(大家)명가(名家)등 문벌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으로 향반(鄕班)잔반(殘班)등 많은 층이 생기게 되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118. 신분상승의 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실상 열려있었다. 전후 복구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흉년재해 등으로 인한 진휼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가 정책적으로 納粟策을 실시하거나 空名帖을 발행하여 신분상승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다른 신분에의 모속(募屬)현상은 영 정조대 이후에 더욱 심해져 갔다. 호적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초적의 개변이나 재력 있는 농민들이 이른바 환부역조(換父易祖)의 방법으로 몰락 양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방법 등이 가능해져 재력 있는 서민층들의 상당수가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신분변동 시기에서는 족보제작의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연정선상에서 <담와(淡窩)> 홍계희(洪啓禧) 평생도>(중앙박물관 소장)나 <慕堂 洪履祥 평생도>(1781년, 중앙박물관소장) 등 관직생활의 기록화인 평생도가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는 풍조가 일고 있었다.
②현실 중시 사고와 자아의식의 성장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재부관(財富觀) 내지 경제관의 변화 속에서 명분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이 영리타산과 실리를 중요시하는 사고로 변질되고 있었다. 조기준 외 공저, 앞의 책, p. 220.
사실, 영리에서 실익을 따지는 것만큼 현실적 사고로 끌어내리는 것은 없다. 이해 타산적 의식보다 더한 현실적 사고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 의식이란 종전에 체념화한 나를 의식의 중심에 세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항인은 조선후기 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하여 사회 전면에 뚜렷이 부각된 집단이다. 심경호, 앞의 책, p. 143. 17-8세기 들어서면 훈련도감의 將校, 혜민서의 訓導, 호조의 算員, 武藝別監, 胥吏 등 중간계층이 물의를 일으킬 정도였다. 조선후기에 사회적으로 뚜렷이 부각된 집단.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있어서 여향인은 근대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잠재적 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여항문학은 18세기 이후 봉건사회 해체기에 돌출된 문화사적 현상이다. 강명관, 「閭巷 閭巷人 閭巷文學」, 『한국한문학연구』 제 17집, 1994.
그들은 사대부와 평민 천민의 중간에 위치한 신분으로 피지배계급이기는 하지만, 기술관 내지 하급관직의 종사자들로서 양반도 사이도 아닌 중간층에 속한다.
이들 여항인들에게는 강한 상호 유대감과 울분의 토로가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 ‘오당(吾黨)’, ‘아배(我輩)’라 스스로를 칭하며, 교유를 통하여 신분적 고착에서 오는 속박감을 풀면서 그들 특유의 동류의식과 공동문화 속에서 자아를 해방시켰다. 千柄植, 『朝鮮後期委巷詩社硏究』(국학자료원, 1991), pp 63-64.
당시 중인문학을 주도했던 송석원시사연도의 1791년 6월15일 밤 광경을 그린 것인데, 그 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신분적 소외감의 해소 책으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천금으로도 난정(蘭亭)의모임과 바꿀 수 없다”는 시사(詩社)를 통하여 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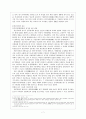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