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깊은 산속의 약초 같은 사람 - 신경림
1.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
2. 꽁꽁 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3. 물이 갈라지듯 흙덩이가 곡선을 그으며
4. 엄동설한 눈 속에 삿갓 하나 받치고
5. 구경꾼과 구경거리
6. 다양한 개인이 힘을 합쳐 이룬 민주주의
7. 실패를 거울삼고
8. 뿌리 없는 것이 뿌리 박은 것을 이긴다
9. 삶이란 아픔이다
10. 맞고 보내는 게 인생
11. 스님과 노신
12.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은 산속의 약초 같은 사람 - 신경림
1.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
2. 꽁꽁 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3. 물이 갈라지듯 흙덩이가 곡선을 그으며
4. 엄동설한 눈 속에 삿갓 하나 받치고
5. 구경꾼과 구경거리
6. 다양한 개인이 힘을 합쳐 이룬 민주주의
7. 실패를 거울삼고
8. 뿌리 없는 것이 뿌리 박은 것을 이긴다
9. 삶이란 아픔이다
10. 맞고 보내는 게 인생
11. 스님과 노신
12. 한 해를 보내면서
본문내용
길러 던져 심는 것)를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어요. 노동이 놀이가 된 것입니다. 심는 고역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손으로 심은 것이나 기계로 심은 것이나 더 낫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고역은 사람을 삐뚜러지고 잔인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고역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사람들은 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들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사무원,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변화시켜 노동의 고역(비지땀 흘리며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자식만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일을 변화시키는 일이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자신과 세상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노동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이 곧 사회적 실천이고 새 세상 만들기 운동이겠지요. 이것은 노동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하는 말입니다만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 노동 과정 자체도 즐거워야 하고, 그 결과도 흐뭇해야 합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떳떳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이 크게 둘로 양분되어 정신노동, 육체노동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도 빨리 어우러져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경독(耕讀)의 일체화라고 여겨요. 참된 경(耕)은 독(讀)을 필요로 하며, 독(讀)도 경(耕)을 통해서 심화되고 제구실도 할 수 있겠지요. 방에 틀어박혀 책상 붙들고 앉아서 천하명문이 나온다면 천하는 무색해질 것입니다. 보살님, 너절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1990. 2. 20.)
한 해를 보내면서
형. 누구도 참답게 사는 길을 처음부터 단번에 알지는 못한대요. 한평생 그 길을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합디다. 인생이란 각자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봐요. 물건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해요. 물건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야하는데 물건이 인간을 망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따져 보게 돼요. 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말처럼 물건 때문에 인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건을 인간성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하더니 살아갈수록 모를 것이 사람 같아 서글퍼집니다.
집에서 신는 구두는 동리 쓰레기터에서 주워다 뒤축을 수선한 겁니다. 안동이나 영주쯤 갈 때는 신고 갑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해서 수선하는 아저씨도 좋은 신 주웠다고 부러워하면서, 요즘은 수선해서 신는 사람도 드물고 수선일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심스러워 합디다. 이번 추위 때 입은 멋진 오리털 잠바는 서울 있는 친구가 그의 집 앞에서 주웠다며 준 건데,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버린 걸 보면 제법 알뜰한 사람 같아요. 형도 알다시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도 하고 설거지랑 빨래도 합니다. 물을 길어다 쓰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게 돼요. 날마다 몇 번씩 쓰는 물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니까 자연히 딴 물건도 아껴 쓰게 돼요.
이건 비단 나만이 아닐겁니다. 누구나 물을 길어 쓰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어쩌다 읍에서 수도물 쓰던 젊은이들이 와서 물 쓰는 걸 보면 나보다 한 열 배쯤 더 써요. 아까운 줄 모르는 게 확실해요. 글자가 생기자 인간의 기억력이 약해졌듯이 꼭지만 틀면 쏴 쏟아지는 수도가 생긴 다음부터 낭비가 시작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른바 발전이라는 것이 그와 맞먹는 후퇴를 안겨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절약은 해야죠.
물건을 아낀다는 건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자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며 고마움의 표시라고 여겨요. 낭비는 대상을 함부로 다루는 성실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어져서 국토와 이웃, 자기 자신까지도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는 버릇이 마침내 이웃도, 고향도, 심하면 자신의 인간성까지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란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물건을 어떻게 만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이루어지겠지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형제고, 한 국토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같은 동포요 민족이라서 우리는 어울려 살고 그 물을 샘솟게 해 주는 대지와 자연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는 그 물을 헤프게 쓰고 업신여길 뿐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대지와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파헤치며 상처 내는 짓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풀에 독초가 있고 벌레에 독충이 있듯이 인간 중에도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외눈박이 사는 곳에 두 눈 뜬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 당했던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건 비단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겁니다. 역사에서 옳게 사는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나 흐지부지 사는 사람들한테 당해 온 씁쓸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는데 그게 끝날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벼보다 피가 억셉니다. 육종하는 데 벼와 피의 교배종을 만들면 벼가 피와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풀도 비름이나 바랭이, 달갈이 같은 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 억센 풀과 곡식의 교배종을 만들면 억센 곡식이 생겨 잡초와 독초와도 대결할 수 있고 가뭄이나 장마에도 끄떡없이 자라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람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을 지킬 독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덜 익은 과실이 자길 따 먹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을 안기듯이, 착함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찌우는 먹이가 될 뿐이지요.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고 독한 외피를 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이야기가 억세고 착한 사람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사람이다보니 사람 문제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형, 잘 있으소. (1991. 12. 마지막 날.)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고역은 사람을 삐뚜러지고 잔인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고역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사람들은 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들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사무원,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변화시켜 노동의 고역(비지땀 흘리며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자식만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일을 변화시키는 일이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자신과 세상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노동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이 곧 사회적 실천이고 새 세상 만들기 운동이겠지요. 이것은 노동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하는 말입니다만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 노동 과정 자체도 즐거워야 하고, 그 결과도 흐뭇해야 합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떳떳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이 크게 둘로 양분되어 정신노동, 육체노동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도 빨리 어우러져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경독(耕讀)의 일체화라고 여겨요. 참된 경(耕)은 독(讀)을 필요로 하며, 독(讀)도 경(耕)을 통해서 심화되고 제구실도 할 수 있겠지요. 방에 틀어박혀 책상 붙들고 앉아서 천하명문이 나온다면 천하는 무색해질 것입니다. 보살님, 너절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1990. 2. 20.)
한 해를 보내면서
형. 누구도 참답게 사는 길을 처음부터 단번에 알지는 못한대요. 한평생 그 길을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합디다. 인생이란 각자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봐요. 물건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해요. 물건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야하는데 물건이 인간을 망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따져 보게 돼요. 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말처럼 물건 때문에 인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건을 인간성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하더니 살아갈수록 모를 것이 사람 같아 서글퍼집니다.
집에서 신는 구두는 동리 쓰레기터에서 주워다 뒤축을 수선한 겁니다. 안동이나 영주쯤 갈 때는 신고 갑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해서 수선하는 아저씨도 좋은 신 주웠다고 부러워하면서, 요즘은 수선해서 신는 사람도 드물고 수선일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심스러워 합디다. 이번 추위 때 입은 멋진 오리털 잠바는 서울 있는 친구가 그의 집 앞에서 주웠다며 준 건데,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버린 걸 보면 제법 알뜰한 사람 같아요. 형도 알다시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도 하고 설거지랑 빨래도 합니다. 물을 길어다 쓰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게 돼요. 날마다 몇 번씩 쓰는 물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니까 자연히 딴 물건도 아껴 쓰게 돼요.
이건 비단 나만이 아닐겁니다. 누구나 물을 길어 쓰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어쩌다 읍에서 수도물 쓰던 젊은이들이 와서 물 쓰는 걸 보면 나보다 한 열 배쯤 더 써요. 아까운 줄 모르는 게 확실해요. 글자가 생기자 인간의 기억력이 약해졌듯이 꼭지만 틀면 쏴 쏟아지는 수도가 생긴 다음부터 낭비가 시작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른바 발전이라는 것이 그와 맞먹는 후퇴를 안겨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절약은 해야죠.
물건을 아낀다는 건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자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며 고마움의 표시라고 여겨요. 낭비는 대상을 함부로 다루는 성실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어져서 국토와 이웃, 자기 자신까지도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는 버릇이 마침내 이웃도, 고향도, 심하면 자신의 인간성까지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란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물건을 어떻게 만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이루어지겠지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형제고, 한 국토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같은 동포요 민족이라서 우리는 어울려 살고 그 물을 샘솟게 해 주는 대지와 자연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는 그 물을 헤프게 쓰고 업신여길 뿐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대지와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파헤치며 상처 내는 짓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풀에 독초가 있고 벌레에 독충이 있듯이 인간 중에도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외눈박이 사는 곳에 두 눈 뜬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 당했던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건 비단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겁니다. 역사에서 옳게 사는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나 흐지부지 사는 사람들한테 당해 온 씁쓸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는데 그게 끝날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벼보다 피가 억셉니다. 육종하는 데 벼와 피의 교배종을 만들면 벼가 피와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풀도 비름이나 바랭이, 달갈이 같은 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 억센 풀과 곡식의 교배종을 만들면 억센 곡식이 생겨 잡초와 독초와도 대결할 수 있고 가뭄이나 장마에도 끄떡없이 자라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람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을 지킬 독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덜 익은 과실이 자길 따 먹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을 안기듯이, 착함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찌우는 먹이가 될 뿐이지요.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고 독한 외피를 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이야기가 억세고 착한 사람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사람이다보니 사람 문제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형, 잘 있으소. (1991. 12.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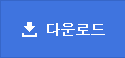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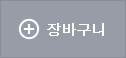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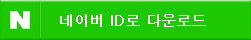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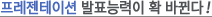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