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한소국의 규모
(1) 삼한의 구성
(2) 사료를 통한 삼한소국의 규모
(3) 삼한소국의 발전등급
(4) 삼한소국과 중국군현과의 비교
(5) 삼한소국 중 대국: 고대 국가의 모태
2. 삼한소국의 진왕과 수장의 존재형태
(1) 진왕과 관료
(2) 수장의 서열성
3. 소국의 구조와 계층구성
(1) 소국의 장수․거수=주수/국읍과 하호/읍락, 그리고 별읍의 관계
(2) 신지/읍군․읍차/읍장: 하호
(3) 소국의 계급관계와 읍락의 모습
(4) 삼한소국의 발전단계<고조선․부여국가의 발전단계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참고문헌
(1) 삼한의 구성
(2) 사료를 통한 삼한소국의 규모
(3) 삼한소국의 발전등급
(4) 삼한소국과 중국군현과의 비교
(5) 삼한소국 중 대국: 고대 국가의 모태
2. 삼한소국의 진왕과 수장의 존재형태
(1) 진왕과 관료
(2) 수장의 서열성
3. 소국의 구조와 계층구성
(1) 소국의 장수․거수=주수/국읍과 하호/읍락, 그리고 별읍의 관계
(2) 신지/읍군․읍차/읍장: 하호
(3) 소국의 계급관계와 읍락의 모습
(4) 삼한소국의 발전단계<고조선․부여국가의 발전단계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과 함께 중국의 군현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한 존재로서 ‘스스로 인수를 갖고 의책을 입는 존재’와는 구별되어 의책을 빌려 군현과의 공식적 접촉에 참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은 노비와 같은 존재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하호는 구체적 계층집단을 지칭했다기보다는 피지배 일반에 대한 범칭 또는 중국세력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삼한지역의 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민’들에 대한 폄칭 정도로 이해된다.
③ 정복전쟁의 기능미약/기마전<보전
ⅰ 散在山海間 無城郭(중략)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
ⅱ 有城柵 -『삼국지』위서 동이전 진한전
ⅲ 便步戰 兵仗與馬韓同(중략)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삼국지』위서 동이전 변진전
[해석] ⅰ 산과 바다사이에 흩어져 살며 성곽이 없다.(중략) 소와 말을 탈 줄 모르고, 소나 말은 죽은 사람을 안장할 때만 사용했다.
ⅱ 성곽과 목책이 있다.
ⅲ 걸어서 싸우는 데 익숙하고 병기는 마한과 비슷하다.(중략)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고, 또 성곽이 있다.
=> 삼한 각‘국’의 인류학적 정치 수준은 준국가단계인 ‘군장사회’로 이해되며[김정배,1986], 이 단계를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천관우,1989] 그러나 ‘성읍국가는’ 성읍, 즉 성곽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ⅰ에서 마한에는 성곽이 없다고 명시되어 ‘성읍국가’ 용어를 삼한에 적용해 보기가 어려워진다. ⅱ,ⅲ에서 진한과 변한의 경우에는 성책이 있다고 했지만, 이 성책은 국읍을 둘러싼 성곽의 규모가 아니라 목책과 토루 정도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이래의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가 철기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등장한 삼한 국의 정치적 수준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ⅰ.ⅲ을 살펴보면 삼한의 전쟁이 정복전쟁으로서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步戰은 농경에 사회경제적 기반을 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한 전투기술이었다. 삼한사회보다 좀더 상위단계에 있는 부여고구려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기마전(騎馬戰)을 이용했다. 기마전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주로 실시하는 전술인데, 마한에는 기마전을 운용하기위한 필요조건인 기마습속이 존재하지 않았다. 牛馬는 부장용이었을 뿐, 車乘用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한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의 성격은 정복전쟁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① 중국군현의 분열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
[해석] 신지가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때 대방군 태수 궁준과 낙랑 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에 나섰고, 이 싸움에서 궁존이 전사했지만, 두 군은 드디어 한을 멸망시켰다.
=> 245~246년의 어느 시점 위(魏)는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귀속시켰는데, 이에 반발한 한(韓)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 낙랑대방의 2군이 한을 멸하였다는 ‘기리영 전투’는 단순히 통역의 잘못으로 생긴 오해만이 전투의 발단은 아니었다. 진한 8국의 낙랑군 귀속은 韓세력이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었다. 우선 위의 명제(明帝)는 진한 8국의 낙랑군 귀속을 결정하기 이전에 비밀리에 대방태수와 낙랑태수를 보내어 2군을 평정하고, 韓國의 여러 신지들에게 읍군이나 읍장의 인수를 주었다. 이렇게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부종사 오림이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일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진한의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귀속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낙랑에 주었다”는 것은 위의 對韓정책이나 외교활동에 있어서 위정부의 대리권을 낙랑군이 가지며, 낙랑군은 교류의 대상을 진한 8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즉, 낙랑을 통해 진한과 직접 교통하고 이로써 마한의 영향력이 진한에까지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對韓정책의 변화이다.
② 천군의 주수견제
소연맹국의 중심지인 국읍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인 주수와 함께 천군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소국의 지배자가 제정일치적인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소연맹국에서는 주수와 천군으로의 제정분리가 이루어졌다. 소연맹국의 지배자가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면서 연맹왕국 체제를 성립시킬 때, 그 안에 편입된 소국의 신앙의례를 흡수통합해 나가면서 ‘국중대회(國中大會)’인 제천의례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천군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다만 국읍의 천군에 의해서 ‘主祭天神’하는 소연맹국 단계의 신앙의례가 아직 연맹왕국 체제인 ‘국중대회’로 파악되지 못하였던 것은 소연맹국 내의 제의권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던 정치력의 한계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강만길 외, 『한국사 2 -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한길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1997.
김영하,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2.
김재선, 엄애경, 이경 역편, 『(한글)동이전』, 서문문화사, 1999.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 1 - 한국 문화의 기원과 국가형성』, 신서원, 2006.
문창로,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신서원, 2000.
조법종, 「[사실, 이렇게 본다 1] 한국 고대사회의 피지배 예속민 하호」, 내일을 여는 역사 제12호, 2003.
조영훈, 「한국고대사의 복원 : 삼한 사회의 발전 과정 고찰 -진왕의 위상변화와 삼한사회의 분립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소, 2003.
진수,『(正史)三國志-위서』, 민음사, 2007.
한국고대사연구회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목 차
1. 삼한소국의 규모
(1) 삼한의 구성
(2) 사료를 통한 삼한소국의 규모
(3) 삼한소국의 발전등급
(4) 삼한소국과 중국군현과의 비교
(5) 삼한소국 중 대국: 고대 국가의 모태
2. 삼한소국의 진왕과 수장의 존재형태
(1) 진왕과 관료
(2) 수장의 서열성
3. 소국의 구조와 계층구성
(1) 소국의 장수거수=주수/국읍과 하호/읍락, 그리고 별읍의 관계
(2) 신지/읍군읍차/읍장: 하호
(3) 소국의 계급관계와 읍락의 모습
(4) 삼한소국의 발전단계<고조선부여국가의 발전단계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참고문헌
③ 정복전쟁의 기능미약/기마전<보전
ⅰ 散在山海間 無城郭(중략)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
ⅱ 有城柵 -『삼국지』위서 동이전 진한전
ⅲ 便步戰 兵仗與馬韓同(중략)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삼국지』위서 동이전 변진전
[해석] ⅰ 산과 바다사이에 흩어져 살며 성곽이 없다.(중략) 소와 말을 탈 줄 모르고, 소나 말은 죽은 사람을 안장할 때만 사용했다.
ⅱ 성곽과 목책이 있다.
ⅲ 걸어서 싸우는 데 익숙하고 병기는 마한과 비슷하다.(중략)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고, 또 성곽이 있다.
=> 삼한 각‘국’의 인류학적 정치 수준은 준국가단계인 ‘군장사회’로 이해되며[김정배,1986], 이 단계를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천관우,1989] 그러나 ‘성읍국가는’ 성읍, 즉 성곽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ⅰ에서 마한에는 성곽이 없다고 명시되어 ‘성읍국가’ 용어를 삼한에 적용해 보기가 어려워진다. ⅱ,ⅲ에서 진한과 변한의 경우에는 성책이 있다고 했지만, 이 성책은 국읍을 둘러싼 성곽의 규모가 아니라 목책과 토루 정도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이래의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가 철기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등장한 삼한 국의 정치적 수준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ⅰ.ⅲ을 살펴보면 삼한의 전쟁이 정복전쟁으로서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步戰은 농경에 사회경제적 기반을 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한 전투기술이었다. 삼한사회보다 좀더 상위단계에 있는 부여고구려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기마전(騎馬戰)을 이용했다. 기마전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주로 실시하는 전술인데, 마한에는 기마전을 운용하기위한 필요조건인 기마습속이 존재하지 않았다. 牛馬는 부장용이었을 뿐, 車乘用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한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의 성격은 정복전쟁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① 중국군현의 분열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
[해석] 신지가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때 대방군 태수 궁준과 낙랑 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에 나섰고, 이 싸움에서 궁존이 전사했지만, 두 군은 드디어 한을 멸망시켰다.
=> 245~246년의 어느 시점 위(魏)는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귀속시켰는데, 이에 반발한 한(韓)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 낙랑대방의 2군이 한을 멸하였다는 ‘기리영 전투’는 단순히 통역의 잘못으로 생긴 오해만이 전투의 발단은 아니었다. 진한 8국의 낙랑군 귀속은 韓세력이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었다. 우선 위의 명제(明帝)는 진한 8국의 낙랑군 귀속을 결정하기 이전에 비밀리에 대방태수와 낙랑태수를 보내어 2군을 평정하고, 韓國의 여러 신지들에게 읍군이나 읍장의 인수를 주었다. 이렇게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부종사 오림이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일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진한의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귀속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낙랑에 주었다”는 것은 위의 對韓정책이나 외교활동에 있어서 위정부의 대리권을 낙랑군이 가지며, 낙랑군은 교류의 대상을 진한 8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즉, 낙랑을 통해 진한과 직접 교통하고 이로써 마한의 영향력이 진한에까지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對韓정책의 변화이다.
② 천군의 주수견제
소연맹국의 중심지인 국읍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인 주수와 함께 천군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소국의 지배자가 제정일치적인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소연맹국에서는 주수와 천군으로의 제정분리가 이루어졌다. 소연맹국의 지배자가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면서 연맹왕국 체제를 성립시킬 때, 그 안에 편입된 소국의 신앙의례를 흡수통합해 나가면서 ‘국중대회(國中大會)’인 제천의례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천군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다만 국읍의 천군에 의해서 ‘主祭天神’하는 소연맹국 단계의 신앙의례가 아직 연맹왕국 체제인 ‘국중대회’로 파악되지 못하였던 것은 소연맹국 내의 제의권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던 정치력의 한계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강만길 외, 『한국사 2 -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한길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1997.
김영하,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2.
김재선, 엄애경, 이경 역편, 『(한글)동이전』, 서문문화사, 1999.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 1 - 한국 문화의 기원과 국가형성』, 신서원, 2006.
문창로,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신서원, 2000.
조법종, 「[사실, 이렇게 본다 1] 한국 고대사회의 피지배 예속민 하호」, 내일을 여는 역사 제12호, 2003.
조영훈, 「한국고대사의 복원 : 삼한 사회의 발전 과정 고찰 -진왕의 위상변화와 삼한사회의 분립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소, 2003.
진수,『(正史)三國志-위서』, 민음사, 2007.
한국고대사연구회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목 차
1. 삼한소국의 규모
(1) 삼한의 구성
(2) 사료를 통한 삼한소국의 규모
(3) 삼한소국의 발전등급
(4) 삼한소국과 중국군현과의 비교
(5) 삼한소국 중 대국: 고대 국가의 모태
2. 삼한소국의 진왕과 수장의 존재형태
(1) 진왕과 관료
(2) 수장의 서열성
3. 소국의 구조와 계층구성
(1) 소국의 장수거수=주수/국읍과 하호/읍락, 그리고 별읍의 관계
(2) 신지/읍군읍차/읍장: 하호
(3) 소국의 계급관계와 읍락의 모습
(4) 삼한소국의 발전단계<고조선부여국가의 발전단계
(5) 삼한소국 미발달의 원인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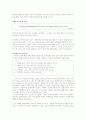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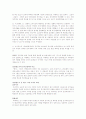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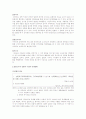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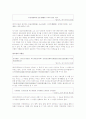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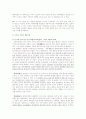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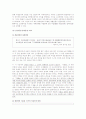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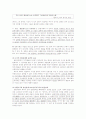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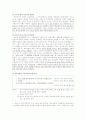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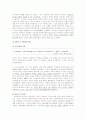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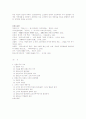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