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장구조의 변화
1-1. 명사문에서 동사문으로
1-2. 내포문의 변화
1-3. 동사의 격지배 변화
2. 문법 범주의 변화
2-1. 합성법의 변화
2-2. 파생법의 변화
2-3. 조사의 변화
2-4. 경어법 체계의 변화
2-5. 시상법의 변화
2-6. 서법의 변화
2-7. 연결어미의 변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 본 론
1. 문장구조의 변화
1-1. 명사문에서 동사문으로
1-2. 내포문의 변화
1-3. 동사의 격지배 변화
2. 문법 범주의 변화
2-1. 합성법의 변화
2-2. 파생법의 변화
2-3. 조사의 변화
2-4. 경어법 체계의 변화
2-5. 시상법의 변화
2-6. 서법의 변화
2-7. 연결어미의 변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명사형) +‘이라’
(마) ‘다, 다’(의문형) = ‘, ’(동명사형) +다
근대국어에서는 문장들이 동사문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사문이란 ‘무엇이 어찌하다’의 구조를 가진 [주어+(목적어 혹은 보어)+서술어] 형태의 문장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명사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 첨사 ‘가, 고’를 직결시켰다. 근대국어에 오면 그렇지 않은 예들이 많아진다. (바)의 ‘누구’는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바) 누구 「몽산법어 20」
(사) 이 벗은 누고고 「노결대언해 下 5」
(아) 네 뉜다 「삼역총해 8.1」
그러나 근대국어에도 (사)와 같은 예가 있었다. 이것은 후에 (아)와 같이 변하게 된다.
1-2. 내포문의 변화
내포란, 하나의 문장이 한 단어의 자격이 되어, 즉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등의 절이 되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서울: 학연사, 2007). p. 386.
내포문은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명사형 어미를 통해 실현된 내포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ㅁ’과 ‘-기’을 통해 실현되며, 중세국어에서는 ‘-디’에 의해 명사화되어 전체 문장의 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1)~(3)은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의 주어로 기능한 15세기. 17세기, 19세기(개화기) 국어의 예이며, (4)~(5)는 목적어로 기능한 15세기, 17세기, 19세기(개화기) 국어의 예이다.
(1) 가. 이 諸 佛ㅅ 甚히 기픈 뎌기라 信야 아로미[알-오-ㅁ-이] 어렵거늘
「석보상절 9:26」
나. 내 겨지비라 가져 가-디 어려「월인 석보 1:13」
(2) 가. 말 엿든 갑 뎌 우흠 을 줌이[주-ㅁ-이] 곳올타
「박통사언해 상 11」
나. 이 이 엇디 이리 잡-기 어려오뇨「노걸대언해 상 41」
(3) 가. 恒常 게어르지 아니케 運動하고 몸을 强게 이[-ㅁ-이] 緊 일이다.
「신정심상소학 2:2」
나. 람이 오륜을 모르면 와 김에 가-기-가 머지 아니 하리라
「초등녀학독본2」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3.
(4) 가. 閻浮에 려 나샤 正覺 일우샤[일우-시-오-ㅁ-] 뵈샤 (월인석보 서 6)
나. 須達이 가며러 쳔랴이 그지없고 布施-기- 즐겨 (석보상절 6:13)
(5) 가. 을 거둔 後에 그 곡셕 賤홈을[賤-오-ㅁ-을] 미더 (경민편언해 12)
나. 법다이 글-기- 됴히 엿니라 (노걸대언해 상 24)
(6) 가. 어린 兒孩들은 문 밧게 서셔 父親의 도라옴을[도라오-ㅁ-을] 기리더라
(국어독본 1:44)
나. 부모ㅣ 병환이 게시거든 ... 슈-시-기-를 권며 ... 회복-시-기-를 바라라
(초등녀학독본 23)
(7) 부인의게 미음 밧-기 시작더니 (혈의 누 47)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3 ~ 224
(1)의 가를 보면 명사화 어미 ‘-ㅁ’ 앞에, 현대 국어와는 달리, ‘-오’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명사화 내포문 구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7)의 예문처럼 ‘-기’로 실현된 내포문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명사화 어미의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변화로는 ‘-ㅁ’ 앞에 결합해 있던 ‘-오/우’가 소멸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16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했는데, <번역소학>(1518년)에 나타난 ‘-오/우-ㅁ’이 <소학언해>(1588년)에서 ‘-음’으로 교체되었다.
(8) 가. 일 아 사 더러이 너교미[너기-오-ㅁ-이] 외니라 (번역소학 6:26)
나. 유식니의 더러이 너김이[너기--ㅁ-이] 되니라 (소학언해 5:24)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8
둘째로는 16세기에 들면서 ‘-기’가 명사형 어미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합하는 용언 분포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기’는 선어말 어미와도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9) 큰 치위와 덥고 비 올제라두 뫼셔 셧기를 [시-엇-기-를] 날이 도록 하야
(소학언해 6:2)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9
마지막으로, 명사화 어미 ‘-디’가 점차 ‘-기’에 합류한 것을 말할 수 있다. 16세기 국어에서는 ‘-디’가 나타났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모두 ‘-기’로 합류되었다. 다음과 같이 <번역노걸대>(16세기)에는 ‘-디’가 나타났으나, <노걸대언해>(17세기)에는 ‘-기’가 나타났다.
(10) 가. 이 리 엇디 이리 잡-디 어려우뇨 (번역노걸대 상 45)
나. 이 이 엇디 이리 잡-기 어려오뇨 (노걸대언해 상 41)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30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현대 국어의 모습이 형성되었으며, 명사형 어미에 의한 내포문은 ‘-음’ 명사화나, ‘-기’명사화 구성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지만,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11) 가. 네 닐옴[니-오-ㅁ-도] 올타 커니와 (번역노걸대 상 5)
나. 네 니- 말-이 올커니와 「몽어노걸대 1:6」
이와 같이 명사화 구성은 현대국어에는 점차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다. 이는 명사화 구성이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예측하게 한다.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36~238
다음으로, 관형절에 의한 내포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머리 명사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내포문 안에 있는 경우는 관계절, 없는 경우는 보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서울: 학연사, 2007). p. 386.
(12) 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 보문
나. 지연이는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어제 만났다. - 관계절
이는 15세기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가. <나랏 菩薩이 듣고져 논> 법을 自然히 듣디
(마) ‘다, 다’(의문형) = ‘, ’(동명사형) +다
근대국어에서는 문장들이 동사문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사문이란 ‘무엇이 어찌하다’의 구조를 가진 [주어+(목적어 혹은 보어)+서술어] 형태의 문장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명사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 첨사 ‘가, 고’를 직결시켰다. 근대국어에 오면 그렇지 않은 예들이 많아진다. (바)의 ‘누구’는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바) 누구 「몽산법어 20」
(사) 이 벗은 누고고 「노결대언해 下 5」
(아) 네 뉜다 「삼역총해 8.1」
그러나 근대국어에도 (사)와 같은 예가 있었다. 이것은 후에 (아)와 같이 변하게 된다.
1-2. 내포문의 변화
내포란, 하나의 문장이 한 단어의 자격이 되어, 즉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등의 절이 되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서울: 학연사, 2007). p. 386.
내포문은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명사형 어미를 통해 실현된 내포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ㅁ’과 ‘-기’을 통해 실현되며, 중세국어에서는 ‘-디’에 의해 명사화되어 전체 문장의 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1)~(3)은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의 주어로 기능한 15세기. 17세기, 19세기(개화기) 국어의 예이며, (4)~(5)는 목적어로 기능한 15세기, 17세기, 19세기(개화기) 국어의 예이다.
(1) 가. 이 諸 佛ㅅ 甚히 기픈 뎌기라 信야 아로미[알-오-ㅁ-이] 어렵거늘
「석보상절 9:26」
나. 내 겨지비라 가져 가-디 어려「월인 석보 1:13」
(2) 가. 말 엿든 갑 뎌 우흠 을 줌이[주-ㅁ-이] 곳올타
「박통사언해 상 11」
나. 이 이 엇디 이리 잡-기 어려오뇨「노걸대언해 상 41」
(3) 가. 恒常 게어르지 아니케 運動하고 몸을 强게 이[-ㅁ-이] 緊 일이다.
「신정심상소학 2:2」
나. 람이 오륜을 모르면 와 김에 가-기-가 머지 아니 하리라
「초등녀학독본2」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3.
(4) 가. 閻浮에 려 나샤 正覺 일우샤[일우-시-오-ㅁ-] 뵈샤 (월인석보 서 6)
나. 須達이 가며러 쳔랴이 그지없고 布施-기- 즐겨 (석보상절 6:13)
(5) 가. 을 거둔 後에 그 곡셕 賤홈을[賤-오-ㅁ-을] 미더 (경민편언해 12)
나. 법다이 글-기- 됴히 엿니라 (노걸대언해 상 24)
(6) 가. 어린 兒孩들은 문 밧게 서셔 父親의 도라옴을[도라오-ㅁ-을] 기리더라
(국어독본 1:44)
나. 부모ㅣ 병환이 게시거든 ... 슈-시-기-를 권며 ... 회복-시-기-를 바라라
(초등녀학독본 23)
(7) 부인의게 미음 밧-기 시작더니 (혈의 누 47)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3 ~ 224
(1)의 가를 보면 명사화 어미 ‘-ㅁ’ 앞에, 현대 국어와는 달리, ‘-오’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명사화 내포문 구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7)의 예문처럼 ‘-기’로 실현된 내포문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명사화 어미의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변화로는 ‘-ㅁ’ 앞에 결합해 있던 ‘-오/우’가 소멸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16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했는데, <번역소학>(1518년)에 나타난 ‘-오/우-ㅁ’이 <소학언해>(1588년)에서 ‘-음’으로 교체되었다.
(8) 가. 일 아 사 더러이 너교미[너기-오-ㅁ-이] 외니라 (번역소학 6:26)
나. 유식니의 더러이 너김이[너기--ㅁ-이] 되니라 (소학언해 5:24)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8
둘째로는 16세기에 들면서 ‘-기’가 명사형 어미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합하는 용언 분포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기’는 선어말 어미와도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9) 큰 치위와 덥고 비 올제라두 뫼셔 셧기를 [시-엇-기-를] 날이 도록 하야
(소학언해 6:2)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29
마지막으로, 명사화 어미 ‘-디’가 점차 ‘-기’에 합류한 것을 말할 수 있다. 16세기 국어에서는 ‘-디’가 나타났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모두 ‘-기’로 합류되었다. 다음과 같이 <번역노걸대>(16세기)에는 ‘-디’가 나타났으나, <노걸대언해>(17세기)에는 ‘-기’가 나타났다.
(10) 가. 이 리 엇디 이리 잡-디 어려우뇨 (번역노걸대 상 45)
나. 이 이 엇디 이리 잡-기 어려오뇨 (노걸대언해 상 41)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30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현대 국어의 모습이 형성되었으며, 명사형 어미에 의한 내포문은 ‘-음’ 명사화나, ‘-기’명사화 구성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지만,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11) 가. 네 닐옴[니-오-ㅁ-도] 올타 커니와 (번역노걸대 상 5)
나. 네 니- 말-이 올커니와 「몽어노걸대 1:6」
이와 같이 명사화 구성은 현대국어에는 점차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다. 이는 명사화 구성이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예측하게 한다. 권재길, 『한국어 문법사』(서울: 박이정, 1998). p. 236~238
다음으로, 관형절에 의한 내포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머리 명사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내포문 안에 있는 경우는 관계절, 없는 경우는 보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서울: 학연사, 2007). p. 386.
(12) 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 보문
나. 지연이는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어제 만났다. - 관계절
이는 15세기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가. <나랏 菩薩이 듣고져 논> 법을 自然히 듣디
키워드
추천자료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변화와 운영과제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변화와 운영과제 및 개선방안 지적재산권의 환경변화와 전자상거래 관련 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지적재산권의 환경변화와 전자상거래 관련 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위험사회와 형법의 변화 및 정보위험사회에 적합한 형벌규범의 기능변화
위험사회와 형법의 변화 및 정보위험사회에 적합한 형벌규범의 기능변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제1부 사회변화와 아동복지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제1부 사회변화와 아동복지  [금리정책, 통화정책, 고금리정책, 환율정책]금리정책의 변화추이,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금...
[금리정책, 통화정책, 고금리정책, 환율정책]금리정책의 변화추이,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금... [조직관리][조직][인사관리][인사][갈등][위험][인간관계]조직의 인사관리, 조직의 변화관리,...
[조직관리][조직][인사관리][인사][갈등][위험][인간관계]조직의 인사관리, 조직의 변화관리,... [산림경영][산림경영 연구사][산림경영 기후변화협약][산림경영 시스템][산림경영 내실화 과...
[산림경영][산림경영 연구사][산림경영 기후변화협약][산림경영 시스템][산림경영 내실화 과... 아동복지의 대상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
아동복지의 대상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 <조직행위론 성격> 성격검사, 성격 검사 유형, MBTI, 기업사례, 홀마크의 문제점, 홀마크의 ...
<조직행위론 성격> 성격검사, 성격 검사 유형, MBTI, 기업사례, 홀마크의 문제점, 홀마크의 ... 우수레포트[9.11 테러와 중국 안보정책] 9.11테러 이전 중국의 안보정책, 911테러 이후 중국 ...
우수레포트[9.11 테러와 중국 안보정책] 9.11테러 이전 중국의 안보정책, 911테러 이후 중국 ... [건강가정론]사회가 급변하며 발생되는 현대가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
[건강가정론]사회가 급변하며 발생되는 현대가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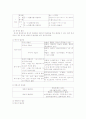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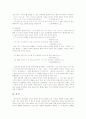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