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었던 것이다.
육사의 시 「소년에게」를 읽으면 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게 추억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차듸찬 아침이슬
진주가 빛나는 못가
蓮꽃 하나 다복히 피고
少年아 네가 낳다니
맑은 넋에 깃드려
박꽃처럼 자랐세라
큰江 목놓아 흘러
여을은 흰 돌쪽마다
소리 夕陽을 새기고
너는 駿馬 달리며
竹刀 져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 단여도
噴水 있는 風景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곳
희고 푸른 지음을 노래하며
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少年에게」전문-
육사는 또한 아름다운 이국의 풍경에 사로잡혀 시 「소공원」을 짓기도 하였고, 관능적 분위기에 도취된 이국에서의 모습을 시 「아편」에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편」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들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감각적 이미지 구사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나릿한 南蠻의 밤
燔祭의 두레ㅅ불 타오르고
玉돌보다 찬 넉시잇서
紅疫이 발반하는 거리로 쏠려
거리엔 「노아」의 洪水 넘쳐나고
위태한 섬우에 빛난 별하나
너는 고 알몸동아리 香氣를
봄마다 바람실은 돗대처럼오라
무지개가치 恍惚한 삶의 光榮
罪와 겻드러도 삶즉한 누리.
-「鴉片」전문-
(2) 쫓기는 자의 불안과 실향민 의식
그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사의 삶은 일본 관헌에 항상 감시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비밀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서 혹은 사상 운동가로서 혹은 혁명적 투쟁의 선봉에 선 행동가로서 육사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쫓기는 자의 불안 의식과 체포된 자의 수인 의식 그리고 고향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실향민 의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육사의 초기시 「황혼」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독한 영혼의 메아리를 듣는다. 황혼의 시간성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갈림길에서 타오르는 황홀한 붉은 빛의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어둠에 묻혀 스러지는 짧은 순간이며 밝음의 종말이기도 하다. 황혼 속에서 인간은 고독해진다. 그리고 그 고독감은 황혼이 자아의 속으로 스며들 때 신비로운 몽상을 불러일으킨다.
내 골방의 커-텐을 것고
정성된 맘으로 黃昏을 마저드리노니
바다의 흰갈메기들 갓치도
人間은 얼마나 외로운것이냐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내미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맛추어보련다
그리고 네품안에 안긴 모-든것이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十二星座의 반ㅅ작이는 별들에게도
鐘소리 저문 森林속 그윽한 修女들에게도
쎄멘트 장판우 그만흔 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업는 그들의 心臟이얼마나 떨고잇슬가
『고비』沙漠을 끈어가는 駱駝탄 行商隊에게나
『아푸리카』綠陰속 활쏘는 『인데안』에게라도
黃昏아 네부드러운 품안에안기는 동안이라도
地球의 半쪽만을 나의타는 입술에 맛겨다오
내 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黃昏아 來日도 저-푸른 커-텐을 것게하겠지
情情히 살어지긴 시내물 소리갓해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도라올줄 모르나부다
-五月의 病床에서-
-「黃昏」전문-
불안한 방랑자의 의식은 「강건너 간 노래」에서 더욱 심화되어 표현된다. 강은 현실적으로 조선과 중국의 경계선 사이의 압록강과 두만강이겠지만 이 시에서의 강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섣달 보름 밝은 밤이며 시인이 말하는 ‘강 건너 간 노래’는 좌절과 상실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그가 처한 현실은 밤 또는 사막으로 비유되며 자신의 노래조차 하늘 끝 사막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절망감이 전편을 지배한다. 이러한 절망적 분위기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섯달에도 보름 달발근밤
압내江 어러 조이든밤에
내가부른 노래는 江건너갓소
江건너 하늘에 沙漠도 다은곳
내노래는 제비가티 날러서갓소
못이즐 게집애가 집조차 업다기에
가기는 갓지만 어린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모래불에 러져 타서죽겟죠.
沙漠은 업시 푸른하늘이 덥혀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밤
밤은옛일을무지개 보다곱게 내나니
한가락 여기두고 한가락 어데맨가
내가부른 노래는 그밤에 江건너 갓소.
-「江건너간노래」전문-
(3) 대륙적 풍모, 강인한 정신성
육사의 시가 한국 현대시에 미친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드물게 보이는 대륙적 풍모와 강인한 정신성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의 서정시는 가늘고 섬세한 여성적 발성법에 의지한 측면이 많았고 이것은 우리 시의 폭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육사의 시에서는 이러한 우리 근대시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남성적 강인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뮤-즈」에는 드넓은 공간적 배경이 펼쳐진다. 북쪽 해안의 매운 바람 속에 거침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나이다운 모습에 시인은 후회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왕자’처럼 묘사한다. 「남한산성」에서는 자신을 ‘제왕에 길들은 교룡’으로 묘사하며 승천하는 꿈을 그려 보인다.
넌 帝王에 길드린 蛟龍
化石되는 마음에 잇기가 끼여
昇天하는 꿈을 길러준 洌水
목이 째지라 울어 예가도
저녁 놀빛을 걷어 올리고
어데 비바람 잇슴즉도 안해라.
-「南漢山城」전문-
이러한 강인한 의지적 자세가 잘 나타난 육사의 시에 「교목」과 「꽃」이 있다. 「교목」에서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고 외친다.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지적 자세는 고독한 행동주의자의 결연한 신념같은 것을 엿보게 한다. 또한「꽃」에서는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자거려’라는 표현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과 신념의 자세는 드넓은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지닌 시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시의 끝 구절에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자세에서 우리는 그의 대표시 「광야」에서 보여지는 초인의 모습을 예감할 수 있다.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세월에 불타고 웃둑 남아서셔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날근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안이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츰내 湖水속 깊이
육사의 시 「소년에게」를 읽으면 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게 추억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차듸찬 아침이슬
진주가 빛나는 못가
蓮꽃 하나 다복히 피고
少年아 네가 낳다니
맑은 넋에 깃드려
박꽃처럼 자랐세라
큰江 목놓아 흘러
여을은 흰 돌쪽마다
소리 夕陽을 새기고
너는 駿馬 달리며
竹刀 져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 단여도
噴水 있는 風景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곳
희고 푸른 지음을 노래하며
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少年에게」전문-
육사는 또한 아름다운 이국의 풍경에 사로잡혀 시 「소공원」을 짓기도 하였고, 관능적 분위기에 도취된 이국에서의 모습을 시 「아편」에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편」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들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감각적 이미지 구사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나릿한 南蠻의 밤
燔祭의 두레ㅅ불 타오르고
玉돌보다 찬 넉시잇서
紅疫이 발반하는 거리로 쏠려
거리엔 「노아」의 洪水 넘쳐나고
위태한 섬우에 빛난 별하나
너는 고 알몸동아리 香氣를
봄마다 바람실은 돗대처럼오라
무지개가치 恍惚한 삶의 光榮
罪와 겻드러도 삶즉한 누리.
-「鴉片」전문-
(2) 쫓기는 자의 불안과 실향민 의식
그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사의 삶은 일본 관헌에 항상 감시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비밀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서 혹은 사상 운동가로서 혹은 혁명적 투쟁의 선봉에 선 행동가로서 육사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쫓기는 자의 불안 의식과 체포된 자의 수인 의식 그리고 고향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실향민 의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육사의 초기시 「황혼」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독한 영혼의 메아리를 듣는다. 황혼의 시간성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갈림길에서 타오르는 황홀한 붉은 빛의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어둠에 묻혀 스러지는 짧은 순간이며 밝음의 종말이기도 하다. 황혼 속에서 인간은 고독해진다. 그리고 그 고독감은 황혼이 자아의 속으로 스며들 때 신비로운 몽상을 불러일으킨다.
내 골방의 커-텐을 것고
정성된 맘으로 黃昏을 마저드리노니
바다의 흰갈메기들 갓치도
人間은 얼마나 외로운것이냐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내미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맛추어보련다
그리고 네품안에 안긴 모-든것이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十二星座의 반ㅅ작이는 별들에게도
鐘소리 저문 森林속 그윽한 修女들에게도
쎄멘트 장판우 그만흔 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업는 그들의 心臟이얼마나 떨고잇슬가
『고비』沙漠을 끈어가는 駱駝탄 行商隊에게나
『아푸리카』綠陰속 활쏘는 『인데안』에게라도
黃昏아 네부드러운 품안에안기는 동안이라도
地球의 半쪽만을 나의타는 입술에 맛겨다오
내 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黃昏아 來日도 저-푸른 커-텐을 것게하겠지
情情히 살어지긴 시내물 소리갓해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도라올줄 모르나부다
-五月의 病床에서-
-「黃昏」전문-
불안한 방랑자의 의식은 「강건너 간 노래」에서 더욱 심화되어 표현된다. 강은 현실적으로 조선과 중국의 경계선 사이의 압록강과 두만강이겠지만 이 시에서의 강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섣달 보름 밝은 밤이며 시인이 말하는 ‘강 건너 간 노래’는 좌절과 상실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그가 처한 현실은 밤 또는 사막으로 비유되며 자신의 노래조차 하늘 끝 사막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절망감이 전편을 지배한다. 이러한 절망적 분위기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섯달에도 보름 달발근밤
압내江 어러 조이든밤에
내가부른 노래는 江건너갓소
江건너 하늘에 沙漠도 다은곳
내노래는 제비가티 날러서갓소
못이즐 게집애가 집조차 업다기에
가기는 갓지만 어린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모래불에 러져 타서죽겟죠.
沙漠은 업시 푸른하늘이 덥혀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밤
밤은옛일을무지개 보다곱게 내나니
한가락 여기두고 한가락 어데맨가
내가부른 노래는 그밤에 江건너 갓소.
-「江건너간노래」전문-
(3) 대륙적 풍모, 강인한 정신성
육사의 시가 한국 현대시에 미친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드물게 보이는 대륙적 풍모와 강인한 정신성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의 서정시는 가늘고 섬세한 여성적 발성법에 의지한 측면이 많았고 이것은 우리 시의 폭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육사의 시에서는 이러한 우리 근대시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남성적 강인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뮤-즈」에는 드넓은 공간적 배경이 펼쳐진다. 북쪽 해안의 매운 바람 속에 거침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나이다운 모습에 시인은 후회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왕자’처럼 묘사한다. 「남한산성」에서는 자신을 ‘제왕에 길들은 교룡’으로 묘사하며 승천하는 꿈을 그려 보인다.
넌 帝王에 길드린 蛟龍
化石되는 마음에 잇기가 끼여
昇天하는 꿈을 길러준 洌水
목이 째지라 울어 예가도
저녁 놀빛을 걷어 올리고
어데 비바람 잇슴즉도 안해라.
-「南漢山城」전문-
이러한 강인한 의지적 자세가 잘 나타난 육사의 시에 「교목」과 「꽃」이 있다. 「교목」에서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고 외친다.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지적 자세는 고독한 행동주의자의 결연한 신념같은 것을 엿보게 한다. 또한「꽃」에서는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자거려’라는 표현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과 신념의 자세는 드넓은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지닌 시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시의 끝 구절에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자세에서 우리는 그의 대표시 「광야」에서 보여지는 초인의 모습을 예감할 수 있다.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세월에 불타고 웃둑 남아서셔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날근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안이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츰내 湖水속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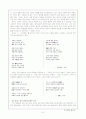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