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목계장터
(1) 작가소개
(2) 공간적 배경
(3) 시의 구성
(4) 시의 개요
(5) 시의 특징
(6) 작품 비교
1) 산이 날 애워싸고 - 박목월
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참고문헌
목계장터
(1) 작가소개
(2) 공간적 배경
(3) 시의 구성
(4) 시의 개요
(5) 시의 특징
(6) 작품 비교
1) 산이 날 애워싸고 - 박목월
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애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뭄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목계장터의 가락과 유사한 것은 박목월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바로 ‘산이 날 애워싸고’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목계장터보다 훨신 이전 작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목계장터의 음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산이 날 애워싸고’가 3음보인 데 반해 ‘목계장터’는 4음보이다. 또한 박목월의 시에는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는 슬픈 감정이 있고, 신경림의 시에는 맵찬 산서리나 모진 물여울도 견뎌내라는 의지가 있다고 분석된다.
가령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가 정밀하고 자족적인 사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면, 신경림의 시는 민중의 현실적인 삶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통개인적 공간’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전원세계로의 둔피와 자족적 공간 속으로의 안존과 같은 박목월의 시적 정조와는 달리, ‘목계장터’에서는 현실과의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목계장터의 화자인 ‘나’의 정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장 저 장을 떠돌며 살아가는 장꾼들의 삶의 애환과 비애는 두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치 ‘목계장터’는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 음악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목계장터’에 대해 한 비평가는 “이 작품에서는 비애보다는 현실을 견디는 삶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중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스스로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모순을 스스로 은폐하는 자기 위안일 뿐” 황정산, 70년대의 민중시,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사, 2000, 233쪽 인용
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계장터’에 “현실을 견대는 삶의 긍정성”이 나타나는지는 의문이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곧 삶을 긍정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름”과 “바람”과 “들꽃”과 “잔돌”은 자신의 소멸과 보잘 것 없음의 이미지와 통한다.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와같은 수동성의 의미를 지닌 구절의 음악적 반복이 이 소멸과 보잘 것 없음의 이미지를 독자의 내면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엔 삶에 대한 비애의 정서가 깔려 있다.
참고문헌
이 작품을 읽는다 : 우리 시의 한 계보에 관한 단상 - 신경림 「 목계장터 」 를 중심으로 김윤태 (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 | 1997 )
신경림 시 연구
연은순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한국문예비평연구 | 1999 )
신경림 시의 궤적과 내면의식 탐구 -시의 \"등가성 원리\"와 결부하여
한강희 ( 현대문학이론학회 | 현대문학이론연구 | 2005 )
신경림 문학의 세계
구중서 ( 창작과 비평사 , 1995 )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공광규 ( 푸른사상 , 2005 )
산이 날 애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뭄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목계장터의 가락과 유사한 것은 박목월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바로 ‘산이 날 애워싸고’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목계장터보다 훨신 이전 작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목계장터의 음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산이 날 애워싸고’가 3음보인 데 반해 ‘목계장터’는 4음보이다. 또한 박목월의 시에는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는 슬픈 감정이 있고, 신경림의 시에는 맵찬 산서리나 모진 물여울도 견뎌내라는 의지가 있다고 분석된다.
가령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가 정밀하고 자족적인 사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면, 신경림의 시는 민중의 현실적인 삶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통개인적 공간’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전원세계로의 둔피와 자족적 공간 속으로의 안존과 같은 박목월의 시적 정조와는 달리, ‘목계장터’에서는 현실과의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목계장터의 화자인 ‘나’의 정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장 저 장을 떠돌며 살아가는 장꾼들의 삶의 애환과 비애는 두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치 ‘목계장터’는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 음악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목계장터’에 대해 한 비평가는 “이 작품에서는 비애보다는 현실을 견디는 삶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중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스스로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모순을 스스로 은폐하는 자기 위안일 뿐” 황정산, 70년대의 민중시,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사, 2000, 233쪽 인용
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계장터’에 “현실을 견대는 삶의 긍정성”이 나타나는지는 의문이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곧 삶을 긍정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름”과 “바람”과 “들꽃”과 “잔돌”은 자신의 소멸과 보잘 것 없음의 이미지와 통한다.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와같은 수동성의 의미를 지닌 구절의 음악적 반복이 이 소멸과 보잘 것 없음의 이미지를 독자의 내면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엔 삶에 대한 비애의 정서가 깔려 있다.
참고문헌
이 작품을 읽는다 : 우리 시의 한 계보에 관한 단상 - 신경림 「 목계장터 」 를 중심으로 김윤태 (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 | 1997 )
신경림 시 연구
연은순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한국문예비평연구 | 1999 )
신경림 시의 궤적과 내면의식 탐구 -시의 \"등가성 원리\"와 결부하여
한강희 ( 현대문학이론학회 | 현대문학이론연구 | 2005 )
신경림 문학의 세계
구중서 ( 창작과 비평사 , 1995 )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공광규 ( 푸른사상 , 2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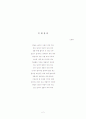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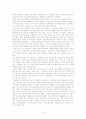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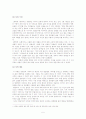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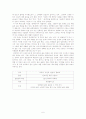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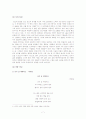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