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연암은 ‘양반전’, ‘호질’ 등의 작품을 통해 추악한 세태를 통렬히 꾸짖는 한편 자신은 벼슬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끊고 유유히 풍류를 즐겼다.
3) 열하일기에 대하여
26권 10책으로 구성된 열하일기는 규장각도서로써 1780년(정조 4) 그의 종형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을 따라 청(淸)나라 고종(高宗)의 칠순연(七旬宴)에 가는 도중 열하(熱河)의 문인들과 사귀고, 연경(燕京)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곳 문물 제도를 목격하고 견문한 바를 각 분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해 6월 24일 압록강 국경을 건너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동(遼東)성경(盛京)산하이관[山海關]을 거쳐 베이징[北京]에 도착하고, 열하로 가서, 8월 20일 다시 베이징에 돌아오기까지 약 2개월 동안 겪은 일을 날짜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적었다.
총 26편중 김연호 작가가 옮긴 열하일기에는 주요작품인 7편의 작품이 나와있다. 김연호 작가는 열하일기를 일컬어 문화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다양한 해석과 자주적인 시각 웅장한 문장의 표현으로 “수많은 기행문학의 백미” 라고 설명하였다. 이 책에 나와있는 7편의 작품을 알아보면,
◈ 권1 <도강록(渡江錄)> : 서문은 필자 미상이나, 풍습 및 관습이 치란(治亂)에 관계되고, 성곽건물경목(耕牧)도야(陶冶) 등 이용후생에 관계되는 일체의 방법을 거짓없이 기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도강록>은 후삼경자(後三更子)라는 말을 말머리로 시작하였다. 6월24일 신미에 시작하여 7월9일 을유에 그쳤다고 글을 소개한 뒤 압록강에서 랴오양[遼陽]까지 15일간(1780.6.24~7.9)의 기행문으로 쓰여져 있다. 내용의 주제 정도를 살펴보면 대략 중국인이 이용후생 적인 건설에 심취하고 있음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땅의 실용적 면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금강록의 특징뿐 아니라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날짜 후에는 꼭 날씨에 대해 서술해 있으며 일행이 지나가다가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8일 글에는 기와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청의 기와를 잇는 방법은 본받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기와를 묘사하고 있다. “모양은 동그란 통대를 네 쪽으로 쪼개 놓은 것과 같고 그 크기는 두 손바닥만하다. 보통 민가에서는 원앙와는 사용하지 않으며 섯가래 위에는 산자를 엮지 않는 대신에 삿자리를 몇 잎씩 편다. 또 진흙을 바르지 않고 곧장 기와를 잇는데 한 장은 엎치고 또 한 장은 젖혀서 자웅으로 서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연암은 ‘양반전’, ‘호질’ 등의 작품을 통해 추악한 세태를 통렬히 꾸짖는 한편 자신은 벼슬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끊고 유유히 풍류를 즐겼다.
3) 열하일기에 대하여
26권 10책으로 구성된 열하일기는 규장각도서로써 1780년(정조 4) 그의 종형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을 따라 청(淸)나라 고종(高宗)의 칠순연(七旬宴)에 가는 도중 열하(熱河)의 문인들과 사귀고, 연경(燕京)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곳 문물 제도를 목격하고 견문한 바를 각 분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해 6월 24일 압록강 국경을 건너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동(遼東)성경(盛京)산하이관[山海關]을 거쳐 베이징[北京]에 도착하고, 열하로 가서, 8월 20일 다시 베이징에 돌아오기까지 약 2개월 동안 겪은 일을 날짜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적었다.
총 26편중 김연호 작가가 옮긴 열하일기에는 주요작품인 7편의 작품이 나와있다. 김연호 작가는 열하일기를 일컬어 문화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다양한 해석과 자주적인 시각 웅장한 문장의 표현으로 “수많은 기행문학의 백미” 라고 설명하였다. 이 책에 나와있는 7편의 작품을 알아보면,
◈ 권1 <도강록(渡江錄)> : 서문은 필자 미상이나, 풍습 및 관습이 치란(治亂)에 관계되고, 성곽건물경목(耕牧)도야(陶冶) 등 이용후생에 관계되는 일체의 방법을 거짓없이 기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도강록>은 후삼경자(後三更子)라는 말을 말머리로 시작하였다. 6월24일 신미에 시작하여 7월9일 을유에 그쳤다고 글을 소개한 뒤 압록강에서 랴오양[遼陽]까지 15일간(1780.6.24~7.9)의 기행문으로 쓰여져 있다. 내용의 주제 정도를 살펴보면 대략 중국인이 이용후생 적인 건설에 심취하고 있음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땅의 실용적 면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금강록의 특징뿐 아니라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날짜 후에는 꼭 날씨에 대해 서술해 있으며 일행이 지나가다가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8일 글에는 기와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청의 기와를 잇는 방법은 본받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기와를 묘사하고 있다. “모양은 동그란 통대를 네 쪽으로 쪼개 놓은 것과 같고 그 크기는 두 손바닥만하다. 보통 민가에서는 원앙와는 사용하지 않으며 섯가래 위에는 산자를 엮지 않는 대신에 삿자리를 몇 잎씩 편다. 또 진흙을 바르지 않고 곧장 기와를 잇는데 한 장은 엎치고 또 한 장은 젖혀서 자웅으로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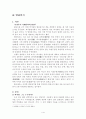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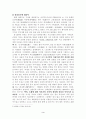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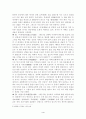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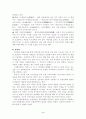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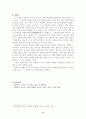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