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①플라톤의 생애 및 당시의 시대적 배경
②이상국가와 계급론
③이데아
④국가론
⑤국가의 교육론
⑥철인정치
⑦플라톤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결론
참고문헌
본론
①플라톤의 생애 및 당시의 시대적 배경
②이상국가와 계급론
③이데아
④국가론
⑤국가의 교육론
⑥철인정치
⑦플라톤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플라톤이 철학자들은 마치 태양의 현란한 빛처럼 그들을 비추고 있는 선 그 자체인 형상에 대한 비젼을 사실상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펼 때(508-9),그 자신도 몇몇 군데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거의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508-9).그런데 만일 그러한 “비젼”에서 철학가들 마다 제각기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면 어찌하겠는가?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그렇지 않으면 대립적인 주장의 갈등만이 존재할 것인가?누군가가 자기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견(異見)을 받아들이지 않고,심지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쉽게 생각을 한다.플라톤은 철학가들이 사회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밝혀 주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그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인가?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인가? 영혼이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각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가? 또한 이성,혈기,그리고 욕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만 좀더 언급하기로 하자.이 세 가지 구분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여러 학설에서도 보편화되어 왔지만,아마도 플라톤의 이론은 인간 본성에서 서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최초로 그럴듯하게 구분한 이론일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각 부분에 현대적 용어로,지성이니,개성이니,그리고 육체니 하는 명칭을 다시 붙이기는 하지만,인간의 본성은 정밀하게 혹은 속속들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예를 들어,감정이란 것도 이 세 부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이 그의 이상 국가를 위해 제시한 청사진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 첫째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철인 통치가들-이 절대 정치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플라톤의 요구에 관해서이다.그러나 아무리 교육 과정이 잘 계획되고,잘 실행된다 할지라도 아주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사실상 있을 수 있나? 철학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고지식한 낙관론이 아닌가 생각된다.우리에게는 권력의 남용이의 가능성에 대비할 어떤 정치 제도를 세울 필요가 없겠는가? 모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가정한다면,완전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상적인 생각에다 청사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가 아닌가? 현실에 입각한 정치 제도라면 이상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있는 그대로의 인간에게 관심을 두어야 마땅하다.플라톤은 “누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자문(自問)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
개개인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인가?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인가? 영혼이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각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가? 또한 이성,혈기,그리고 욕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만 좀더 언급하기로 하자.이 세 가지 구분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여러 학설에서도 보편화되어 왔지만,아마도 플라톤의 이론은 인간 본성에서 서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최초로 그럴듯하게 구분한 이론일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각 부분에 현대적 용어로,지성이니,개성이니,그리고 육체니 하는 명칭을 다시 붙이기는 하지만,인간의 본성은 정밀하게 혹은 속속들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예를 들어,감정이란 것도 이 세 부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이 그의 이상 국가를 위해 제시한 청사진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 첫째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철인 통치가들-이 절대 정치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플라톤의 요구에 관해서이다.그러나 아무리 교육 과정이 잘 계획되고,잘 실행된다 할지라도 아주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사실상 있을 수 있나? 철학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고지식한 낙관론이 아닌가 생각된다.우리에게는 권력의 남용이의 가능성에 대비할 어떤 정치 제도를 세울 필요가 없겠는가? 모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가정한다면,완전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상적인 생각에다 청사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가 아닌가? 현실에 입각한 정치 제도라면 이상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있는 그대로의 인간에게 관심을 두어야 마땅하다.플라톤은 “누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자문(自問)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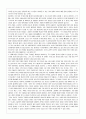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