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문 요약
1. 김기웅, <고분에서 엿볼 수 잇는 신라의 장송의례>,『신라종교의 신연구』경북인쇄소, 1984
1. 유해(유해)의 매장(매장)
2. 매장시설․부장품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장송의례의 한면
1. 김기웅, <고분에서 엿볼 수 잇는 신라의 장송의례>,『신라종교의 신연구』경북인쇄소, 1984
1. 유해(유해)의 매장(매장)
2. 매장시설․부장품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장송의례의 한면
본문내용
주제: 한국고대 매장양식과 내세관
- 신라 고분을 중심으로
논문 요약
왕릉: 삼국통일이전 - 고총(고총); 생시의 지상의 주거생활을 그대로 지하의 무덤으로 옮긴다는 취지. 현세의 생활도구가 고스란히 부장되어 있음.
통일이전신라 - 왕경으로부터 멀지 않은 평지에 수혈식(수혈식) 적석총→ 통일이후 - 왕경에서 흩어져 산 밑이나 언덕 위에 만들어졌으며 횡혈식(횡혈식) 석실분으로 변모, 무덤 봉토 무너짐 보완위한 호석제도(호석제도) 발전, 무덤 주위에는 십이지신상, 네 석사자, 방주석난간 배치, 무덤 앞에 석상(석상)놓고 양쪽에 문무석인(문무석인)과 석주 배치하는 복잡한 양식 정립
통일이전; 적석봉토분- 고총고분(금관총금령총서봉총천마총황남대총 북분)
토광묘, 옹관묘, 수혈식석곽묘, 화장묘(화장묘)(불교영향)
통일이후; 횡혈식석실분- (1.평지→2.산록→3.풍수지) ↔ (주거와의 혼거단계→가족공동묘지단계→단독분 단계)
1단계: ~지증왕릉[냇돌, 돌담식호석고분]
2단계: 법흥왕 ~ 경덕왕 (서악동 낭산, 남산, 명활산 기슭)[막돌, 산록돌담식호석고분→장식화단계, 갑석지대석버팀석, 상석, 적석형기단식호석고분]
3단계: 혜공왕대 이후 (하천유역의 산록 풍수지리 입각)[판석+탱주, 면석구분, 판석형기단식호석고분→탱석에 십이신상 조각, 분구 주위에 돌난간 완전한 기단화+불탑화, 석수상석인상석화표눙비 등 배치, 상석도 불간이나 제단식의 탁자형으로 높아짐)
1. 김기웅, <고분에서 엿볼 수 잇는 신라의 장송의례>,『신라종교의 신연구』경북인쇄소, 1984
삼국시대의 매장시설물인 고분의 문화상사회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구조형식이나 부장유물의 성격장법등의 구명은 되어있는 상태이나 종교관에 의거한 장례의식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당시의 장송의례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뒤이어 수용된 불교유교 사상의 영향에 의해 변질소멸됨에 따라 관계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고분 자체로는 알기 어려운 상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신라시대의 고분을 통해 당시의 장송의례를 단편적이나마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인류가 시체의 매장을 시작한 뒤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독특한 종교관에 의거한 각종 방법으로 정중하게 매장하였다.
인류가 의식적으로 시체를 매장하게 된 것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 중기부터로 네안데르탈인의 동굴주거유적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동굴주거의 흙바닥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매장하고 사냥한 짐승의 일부라든가 석기들을 부장하였다. 그 후 구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시체의 매장법이 다양해져, 시체의 머리 가까이에 묘석과 같은 돌을 세운다든가, 시체위에 돌을 놓든가, 머리를 돌위에 놓든가하고, 시체 위에 붉은 흙을 부린다든가 하고, 대부분의 시체는 강하게 구부러진 굴장의 상태였다. 이러한 시체매장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해석가능하지만 시체위에 돌을 놓든가 굴장하는 것은 사후의 인간에 대한 공포심에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주술로 여겨지며, 또
- 신라 고분을 중심으로
논문 요약
왕릉: 삼국통일이전 - 고총(고총); 생시의 지상의 주거생활을 그대로 지하의 무덤으로 옮긴다는 취지. 현세의 생활도구가 고스란히 부장되어 있음.
통일이전신라 - 왕경으로부터 멀지 않은 평지에 수혈식(수혈식) 적석총→ 통일이후 - 왕경에서 흩어져 산 밑이나 언덕 위에 만들어졌으며 횡혈식(횡혈식) 석실분으로 변모, 무덤 봉토 무너짐 보완위한 호석제도(호석제도) 발전, 무덤 주위에는 십이지신상, 네 석사자, 방주석난간 배치, 무덤 앞에 석상(석상)놓고 양쪽에 문무석인(문무석인)과 석주 배치하는 복잡한 양식 정립
통일이전; 적석봉토분- 고총고분(금관총금령총서봉총천마총황남대총 북분)
토광묘, 옹관묘, 수혈식석곽묘, 화장묘(화장묘)(불교영향)
통일이후; 횡혈식석실분- (1.평지→2.산록→3.풍수지) ↔ (주거와의 혼거단계→가족공동묘지단계→단독분 단계)
1단계: ~지증왕릉[냇돌, 돌담식호석고분]
2단계: 법흥왕 ~ 경덕왕 (서악동 낭산, 남산, 명활산 기슭)[막돌, 산록돌담식호석고분→장식화단계, 갑석지대석버팀석, 상석, 적석형기단식호석고분]
3단계: 혜공왕대 이후 (하천유역의 산록 풍수지리 입각)[판석+탱주, 면석구분, 판석형기단식호석고분→탱석에 십이신상 조각, 분구 주위에 돌난간 완전한 기단화+불탑화, 석수상석인상석화표눙비 등 배치, 상석도 불간이나 제단식의 탁자형으로 높아짐)
1. 김기웅, <고분에서 엿볼 수 잇는 신라의 장송의례>,『신라종교의 신연구』경북인쇄소, 1984
삼국시대의 매장시설물인 고분의 문화상사회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구조형식이나 부장유물의 성격장법등의 구명은 되어있는 상태이나 종교관에 의거한 장례의식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당시의 장송의례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뒤이어 수용된 불교유교 사상의 영향에 의해 변질소멸됨에 따라 관계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고분 자체로는 알기 어려운 상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신라시대의 고분을 통해 당시의 장송의례를 단편적이나마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인류가 시체의 매장을 시작한 뒤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독특한 종교관에 의거한 각종 방법으로 정중하게 매장하였다.
인류가 의식적으로 시체를 매장하게 된 것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 중기부터로 네안데르탈인의 동굴주거유적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동굴주거의 흙바닥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매장하고 사냥한 짐승의 일부라든가 석기들을 부장하였다. 그 후 구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시체의 매장법이 다양해져, 시체의 머리 가까이에 묘석과 같은 돌을 세운다든가, 시체위에 돌을 놓든가, 머리를 돌위에 놓든가하고, 시체 위에 붉은 흙을 부린다든가 하고, 대부분의 시체는 강하게 구부러진 굴장의 상태였다. 이러한 시체매장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해석가능하지만 시체위에 돌을 놓든가 굴장하는 것은 사후의 인간에 대한 공포심에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주술로 여겨지며,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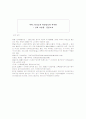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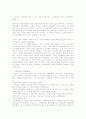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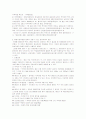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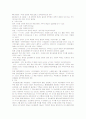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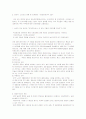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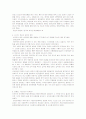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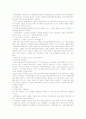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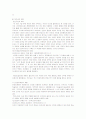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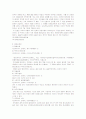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