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ⅱ) 무녀의 역할
ⅲ) 무녀의 신분과 가족생활
ⅳ) 무녀와 굿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ⅱ) 무녀의 역할
ⅲ) 무녀의 신분과 가족생활
ⅳ) 무녀와 굿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무녀(巫女)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ⅱ) 무녀의 역할
ⅲ) 무녀의 신분과 가족생활
ⅳ) 무녀와 굿
Ⅲ. 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조선시대 생활상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여성들의 삶이었다. 그 여성들 중에서도 다수의 평민 여성들의 아니라 그들에게 조차 천시 받았을 것 같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런 여성 중에서 무녀는 흥미로운 존재라 여겨졌기에, 본 발표문에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은 무녀라는 말보다는 무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무당의 사전 상 정의는 ‘귀신을 섬기면서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여자’라고 한다. 무당이란 말을 남무(男巫)나 여무(女巫) 둘 다 지칭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무당의 여무(女巫)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자 무당은 무당이라 칭하지 않고 주로 ‘격’ 이익(李瀷 1681~1763),『성호사설([星湖僿說)』 제7권 인사문(人事門) 무(巫)
이나 ‘박수’ 이규보(李奎報 1168~1241),『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제2권 고율시(古律時) 노무편(老巫篇) 병서(幷序)
등으로 불리었다.
무녀와 무당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무당조차도 ‘무당’이란 말은 낮춰 부르는듯하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당이란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낮춰 부르던 말이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근대화가 되는 과정 중에 무당을 구시대의 한낱 미신으로 여겨 사회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이들의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시대 때의 무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조선시대 때 금지에도 불구하고 무녀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와 무녀의 신분과 가족, 생활모습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조선 초부터 무당에 대한 금지는 계속 있어 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에서는 국무당(國巫堂)를 직접 채용하여 도성 안에 살게 하고 굿을 하였다. 왕실에서 조차 병이 나고 위독해지면 무당에게 치료를 맡겼다. 그 예로 태종의 아들인 성녕대군이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무당이 치료를 한다고 귀신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죽게 되자 그 무당들을 유배 보냈다고 한다.『조선왕조실록』 태종18년(1418년) 2월 11일, 3월 5일
또한 성종이 병이 들자 대비가 무녀(巫女)를 시켜 대성전(大成殿) 공자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전각.
뜰 가운데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 병이 낫기를 빌었다. 그러자 성균관 안의 유생들이 무당을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ⅱ) 무녀의 역할
ⅲ) 무녀의 신분과 가족생활
ⅳ) 무녀와 굿
Ⅲ. 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조선시대 생활상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여성들의 삶이었다. 그 여성들 중에서도 다수의 평민 여성들의 아니라 그들에게 조차 천시 받았을 것 같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런 여성 중에서 무녀는 흥미로운 존재라 여겨졌기에, 본 발표문에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은 무녀라는 말보다는 무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무당의 사전 상 정의는 ‘귀신을 섬기면서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여자’라고 한다. 무당이란 말을 남무(男巫)나 여무(女巫) 둘 다 지칭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무당의 여무(女巫)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자 무당은 무당이라 칭하지 않고 주로 ‘격’ 이익(李瀷 1681~1763),『성호사설([星湖僿說)』 제7권 인사문(人事門) 무(巫)
이나 ‘박수’ 이규보(李奎報 1168~1241),『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제2권 고율시(古律時) 노무편(老巫篇) 병서(幷序)
등으로 불리었다.
무녀와 무당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무당조차도 ‘무당’이란 말은 낮춰 부르는듯하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당이란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낮춰 부르던 말이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근대화가 되는 과정 중에 무당을 구시대의 한낱 미신으로 여겨 사회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이들의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시대 때의 무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조선시대 때 금지에도 불구하고 무녀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와 무녀의 신분과 가족, 생활모습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Ⅱ. 본론
ⅰ) 무녀 금지와 무세(巫稅)
조선 초부터 무당에 대한 금지는 계속 있어 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에서는 국무당(國巫堂)를 직접 채용하여 도성 안에 살게 하고 굿을 하였다. 왕실에서 조차 병이 나고 위독해지면 무당에게 치료를 맡겼다. 그 예로 태종의 아들인 성녕대군이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무당이 치료를 한다고 귀신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죽게 되자 그 무당들을 유배 보냈다고 한다.『조선왕조실록』 태종18년(1418년) 2월 11일, 3월 5일
또한 성종이 병이 들자 대비가 무녀(巫女)를 시켜 대성전(大成殿) 공자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전각.
뜰 가운데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 병이 낫기를 빌었다. 그러자 성균관 안의 유생들이 무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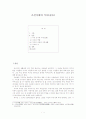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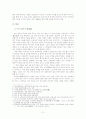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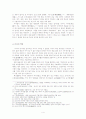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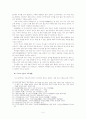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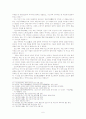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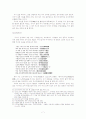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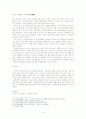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