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증조모의 삶: 식민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3. 새비아주머니와 새비 아저씨의 삶: 빨갱이의 가족, 원폭피해자로서의 삶
4. 할머니의 삶: 끊어지지 않는 가부장적 폭력의 희생자
5. 엄마와 딸: 애증의 관계를 넘어
2. 증조모의 삶: 식민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3. 새비아주머니와 새비 아저씨의 삶: 빨갱이의 가족, 원폭피해자로서의 삶
4. 할머니의 삶: 끊어지지 않는 가부장적 폭력의 희생자
5. 엄마와 딸: 애증의 관계를 넘어
본문내용
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바깥에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울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집으로 가는 아이였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방어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곤 하던 내 존재를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다.(95)
‘울지 않는 아이’였다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지연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집에 이르지 않던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과 겹쳐보면서 묘하게 공감과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지연은 윗세대의 여성들이 자신보다도 더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갔다는 것에 감명과 용기를 얻는다. 증조모는 일제시대에 살아남아야 했으며, 할머니 영옥은 불과 열두 살의 나이에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였다. 한국 전쟁 당시 학살과 피난, 폭격의 기억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삶에 깊이 각인된다.
모두 열 명이 총살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운동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증조모는 앞만 보면서 걸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열두 살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려 애썼다. 증조모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은 뒤에도 그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죽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그 열 명만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첫 번째 영옥이도 그때 죽었고, 다시 태어난 영옥이는 그전의 영옥이와는 다른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증조모, 증조부, 할머니는 죽음으로 서로 헤어질 때까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셋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부서졌다. 겉으로 보아 가장 달라진 사람은 증조모였다. 증조모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약이 없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람을 쉽게 의심했고, 자신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 마음을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다. (141-142)
할머니는 지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 본다”며, 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마음의 병이 깊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할머니의 딸 미선에게도 형편없는 어른이었다며 울먹인다.
할머니와 엄마는 언제부턴가 사이가 틀어져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지연은 10살 무렵 할머니 댁에 맡겨졌던 기억만 있을 뿐, 자신 역시 엄마로 인해 할머니와 소원해져, 자신의 결혼식에도 할머니에게 연락드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혼을 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희령에 내려와 할머니와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인생사를 들으며, 지연은 그동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차 이해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본처에게로 떠나버린 뒤로 할머니는 엄마를 등에 업고 허드렛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갔다. 남편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책 잡히고 비난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끝가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정작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부정한 엄마를 원망한다. 이렇게 가난과 멸시, 우울 속에서 살 바에야 왜 자신을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느냐고 탓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간다. 지연의 어머니 미선은 어머니의 한 많은 삶, 아버지의 부재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녀는 체제 순응적이고 ‘여자는 남자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가부장제적 사고, 혹은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내면화한다. 그것이 요즘 세대인 지연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원인이 되지만 지연은 할머니를 통해 엄마의 삶의 배경을 알게 됨에 따라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살아간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얻은, 자신도 그들처럼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각성이다.
나는 남편의 외도와 그와의 이혼이 내 무릎을 한순간 꺾이게 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 내가 믿었던 만큼, 내가 믿고 싶었던 만큼 그는 내게 정말 의미있고 비중있는 존재였을까. 그의 외도를 알기 전의 나는 정말 내 믿음대로 덜 아프고 덜 병들어 있었을까.
나는 그와의 결혼으로 내가 지닌 문제와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부터 동시에 도망치고자 했다.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처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라아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미지근한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었을까. 이혼 후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은 남편의 기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나의 기만의 결과이기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니, 그 중 나를 더 아프게 한 건 나에 대한 기만이었다. (299)
나는 내게 어깨를 빌려준 이름 모를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299)
소설은 지연이 할머니가 간직한 옛 편지들을 바탕으로 희자 할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희자는 독일로 건너가 암호학자가 되었으며 ‘조국일 빛낸 해외동포’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다. 지연의 편지에 희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 모든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영옥이 언니 하나 뿐일 거에요.”라고 답장을 해온다.
그렇게 지연은 ‘예전의 여자들’을 생각해본다.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들을. 그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욕구를 꾹꾹 누르며 체념하는 대신에 말이다. 그리고 지연은 자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를 택하고 싸워주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욕망을 이야기하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울지 않는 아이’였다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지연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집에 이르지 않던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과 겹쳐보면서 묘하게 공감과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지연은 윗세대의 여성들이 자신보다도 더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갔다는 것에 감명과 용기를 얻는다. 증조모는 일제시대에 살아남아야 했으며, 할머니 영옥은 불과 열두 살의 나이에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였다. 한국 전쟁 당시 학살과 피난, 폭격의 기억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삶에 깊이 각인된다.
모두 열 명이 총살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운동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증조모는 앞만 보면서 걸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열두 살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려 애썼다. 증조모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은 뒤에도 그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죽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그 열 명만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첫 번째 영옥이도 그때 죽었고, 다시 태어난 영옥이는 그전의 영옥이와는 다른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증조모, 증조부, 할머니는 죽음으로 서로 헤어질 때까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셋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부서졌다. 겉으로 보아 가장 달라진 사람은 증조모였다. 증조모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약이 없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람을 쉽게 의심했고, 자신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 마음을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다. (141-142)
할머니는 지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 본다”며, 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마음의 병이 깊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할머니의 딸 미선에게도 형편없는 어른이었다며 울먹인다.
할머니와 엄마는 언제부턴가 사이가 틀어져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지연은 10살 무렵 할머니 댁에 맡겨졌던 기억만 있을 뿐, 자신 역시 엄마로 인해 할머니와 소원해져, 자신의 결혼식에도 할머니에게 연락드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혼을 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희령에 내려와 할머니와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인생사를 들으며, 지연은 그동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차 이해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본처에게로 떠나버린 뒤로 할머니는 엄마를 등에 업고 허드렛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갔다. 남편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책 잡히고 비난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끝가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정작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부정한 엄마를 원망한다. 이렇게 가난과 멸시, 우울 속에서 살 바에야 왜 자신을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느냐고 탓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간다. 지연의 어머니 미선은 어머니의 한 많은 삶, 아버지의 부재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녀는 체제 순응적이고 ‘여자는 남자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가부장제적 사고, 혹은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내면화한다. 그것이 요즘 세대인 지연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원인이 되지만 지연은 할머니를 통해 엄마의 삶의 배경을 알게 됨에 따라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살아간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얻은, 자신도 그들처럼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각성이다.
나는 남편의 외도와 그와의 이혼이 내 무릎을 한순간 꺾이게 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 내가 믿었던 만큼, 내가 믿고 싶었던 만큼 그는 내게 정말 의미있고 비중있는 존재였을까. 그의 외도를 알기 전의 나는 정말 내 믿음대로 덜 아프고 덜 병들어 있었을까.
나는 그와의 결혼으로 내가 지닌 문제와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부터 동시에 도망치고자 했다.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처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라아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미지근한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었을까. 이혼 후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은 남편의 기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나의 기만의 결과이기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니, 그 중 나를 더 아프게 한 건 나에 대한 기만이었다. (299)
나는 내게 어깨를 빌려준 이름 모를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299)
소설은 지연이 할머니가 간직한 옛 편지들을 바탕으로 희자 할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희자는 독일로 건너가 암호학자가 되었으며 ‘조국일 빛낸 해외동포’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다. 지연의 편지에 희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 모든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영옥이 언니 하나 뿐일 거에요.”라고 답장을 해온다.
그렇게 지연은 ‘예전의 여자들’을 생각해본다.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들을. 그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욕구를 꾹꾹 누르며 체념하는 대신에 말이다. 그리고 지연은 자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를 택하고 싸워주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욕망을 이야기하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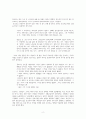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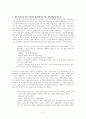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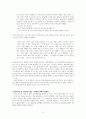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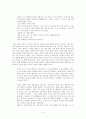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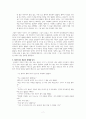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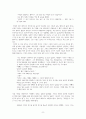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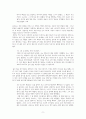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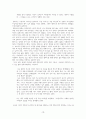










소개글